목차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 성호의 학문적 기반
Ⅱ. 퇴계에 대한 존숭과 학적 사숙
1. 인간적 흠숭의 염
2. 이기사칠논변에 대한 견해
3. 퇴계의 시무에 대한 평론
1. 문제의 제기
2. 성호의 학문적 기반
Ⅱ. 퇴계에 대한 존숭과 학적 사숙
1. 인간적 흠숭의 염
2. 이기사칠논변에 대한 견해
3. 퇴계의 시무에 대한 평론
본문내용
3. 退溪의 時務에 대한 評論
원래 유학의 근본정신은 이른바 <爲己之學>(論·憲問, 衛靈公)의 확립이 아닐 수 없다. 爲己가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분야적 제한에서 벗어나 포괄자로서의 인간, 즉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유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修己>의 정신이고, 한편 이를 실천하는 <安人> 내지는 <博施濟衆>의 정신을 동반하는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 이 修己 또는 爲己의 유가적 정신은 그의 학문과 덕행에 걸쳐 始終如一함을 익히 아는 터이다. 퇴계의 한 술회를 들어 보면 『군자의 학문이란 본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일뿐, 이는 마치 深山의 무성한 숲속에서 한 그루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뿜으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바로 군자가 爲己하는 뜻과 合致하니 깊히 體案할 것이라』
) 退溪全下, 언행록 권1, 敎人 李德弘記
고 한바 있다.
퇴계는 讀書求道의 林間생활을 매우 만족한 듯이 서술하고 있음을 그의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중의 이 맛을 그대는 아는가, 世事따위는 말할 건더기도 안 되네』(山中氣味君知否, 世事都無一句論)라고 읊기도 하고, <秋懷>라는 題下의 詩에는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르는 파리와 같다』(富貴等浮烟, 名譽如飛蠅)고도 하여 그의 無 로운 虛心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퇴계의 이 같은 생활과 심경은 자칫 소극적인 避世主義 내지는 은둔생활적 처세술이라고 해석되어질 혐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민생이 불안하고 남북의 外患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 법하다. 때문에 후대에 접어 들어서는 퇴계로부터는 학문을 율곡에게서는 경장론을 주목하고 또 그 같은 제약에서 兩學者를 규정하려 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사상의 분석에 입각해 보아야 할 줄 안다. 여기서 문제는 퇴계나 성호에게 있어서 이른바 <知行>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다.
-426-
우리는 퇴계의 知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 進論> 또는 <互進論>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先知後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星湖의 퇴계학 이해에 있어서도 퇴계가 성리학에 기본해서 근본유학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성호 역시 지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자나 퇴계와 거의 다름없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성호 역시 先知後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문과 실천의 문제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성호가 보기로는 양명학에서의 知行合一論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고 보면 오히려 知와 行은 선후의 분별이 있고나서 바람직하다고 내다 본다.
성호는 학문을 하는 데는 우선 <治心>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다고 했고, 治心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致知>를 선행해서 착수할 것이고, 知가 이른 다음에야 行이 가히 따라야 할 것으로 순서를 안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례에 따라서 六經 四書와 濂洛群哲을 배우고 또한 우리나라 儒賢의 책을 익혀 가면서 학문적인 근원에로의 환원, 즉 <沿流沂源>
) 星全下, 권49, 面18, 四七新編序
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문도 알고 보면 배우고 묻는다는 행동적인 면이 있는 만치 지행은 원래 합일하는 것임을 일차적으로 그는 긍정한다. 그러나 行에도 이른바 <精案明覺>이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데서 그렇지 못한 이른바 <冥行>이 있고, 학문을 思素해야 함에도 잘못된 <妄想>이 있을 수 있는 데서 신중한 문제의식을 지닌다. 성호는 孝弟와 같은 것은 몸으로써 배움이고, 讀書窮理는 마음으로써 배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구분하고, 다음 독서궁리는 우선 知가 行에 앞서야 하므로 결국 先知後行의 합리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학문과 思素―즉 지와 행은 두가지 일이 아니면서도 先後를 두고 접근하는 데서 이른바 <殆와 岡>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僿說下, p.5 지행합일
-427-
이 知行의 선후적 進은 원래 퇴계에서 이론적 정착을 본 문제였다. 성호는 퇴계에서 그의 현실과 미래의 국가와 민생의 장래에 관하여 앞질러 생각하고 있음을 살핀다. 즉 성호는 퇴계가 黃仲擧에 주는 答信에서 남과 북의 우환이 조석간에 돌발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볼 때 무엇하나 믿을 게 없다고 불안해 한다. 퇴계는 사실상 그가 山林에서의 즐거움을 누린다 한들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退溪全上, 권19, 面3
그리고 朝野에서는 태평을 누릴 때 퇴계는 時勢에 어두운 현실에서 미래를 우려하였음을 성호는 음미하면서, 과연 그후 40년이 채 안되어 임진란을 겪고, 인조 초에는 호란으로 민생이 도탄에서 헤매게 되었음을 통감하고 있다.
) 僿說上, 退溪先見
성호는 그때 우리 국민상하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양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였다. 나무에 좀이 쓸 듯 국민이 퇴폐하고 국정이 소란한데 어찌 外夷가 틈타지 않겠느냐고 피력한다. 옛날 漢土의 漢나라와 晋나라에서 黨錮와 청담 때문에 社稷이 붕괴되었음을 알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신이 모두 협력하여 정치를 쇄신하고 更張을 회복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黨說上, 堂習召亂
성호는 평생을 산림처사로 초야에 머물렀으나 그의 선비로서의 기개는 天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가난한 선비이기는 하였으나 산림간에서의 포효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른바 후세치용의 諸說을 제시하면서 학문한 바의 실천으로서 국가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지니고 또한 중흥책을 모색한다. 그의 士農合一論이나 유비무환을 위한 문무겸중책의 강조는 성호의 유자적 측면과 경세적 측면이 대립적이기에 앞서서 지행선후의 행동철학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호의 폭넓은 사고와 이론과 품행에서도 퇴계의 정신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성호의 도학정신과 치세사상은 지행의 兼全관계로 수렴시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428-
원래 유학의 근본정신은 이른바 <爲己之學>(論·憲問, 衛靈公)의 확립이 아닐 수 없다. 爲己가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분야적 제한에서 벗어나 포괄자로서의 인간, 즉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유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修己>의 정신이고, 한편 이를 실천하는 <安人> 내지는 <博施濟衆>의 정신을 동반하는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 이 修己 또는 爲己의 유가적 정신은 그의 학문과 덕행에 걸쳐 始終如一함을 익히 아는 터이다. 퇴계의 한 술회를 들어 보면 『군자의 학문이란 본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일뿐, 이는 마치 深山의 무성한 숲속에서 한 그루 난초가 온종일 향기를 뿜으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바로 군자가 爲己하는 뜻과 合致하니 깊히 體案할 것이라』
) 退溪全下, 언행록 권1, 敎人 李德弘記
고 한바 있다.
퇴계는 讀書求道의 林間생활을 매우 만족한 듯이 서술하고 있음을 그의 문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중의 이 맛을 그대는 아는가, 世事따위는 말할 건더기도 안 되네』(山中氣味君知否, 世事都無一句論)라고 읊기도 하고, <秋懷>라는 題下의 詩에는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나르는 파리와 같다』(富貴等浮烟, 名譽如飛蠅)고도 하여 그의 無 로운 虛心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퇴계의 이 같은 생활과 심경은 자칫 소극적인 避世主義 내지는 은둔생활적 처세술이라고 해석되어질 혐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민생이 불안하고 남북의 外患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 법하다. 때문에 후대에 접어 들어서는 퇴계로부터는 학문을 율곡에게서는 경장론을 주목하고 또 그 같은 제약에서 兩學者를 규정하려 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사상의 분석에 입각해 보아야 할 줄 안다. 여기서 문제는 퇴계나 성호에게 있어서 이른바 <知行>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다.
-426-
우리는 퇴계의 知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 進論> 또는 <互進論>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先知後行>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星湖의 퇴계학 이해에 있어서도 퇴계가 성리학에 기본해서 근본유학적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성호 역시 지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자나 퇴계와 거의 다름없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성호 역시 先知後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문과 실천의 문제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성호가 보기로는 양명학에서의 知行合一論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고 보면 오히려 知와 行은 선후의 분별이 있고나서 바람직하다고 내다 본다.
성호는 학문을 하는 데는 우선 <治心>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다고 했고, 治心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致知>를 선행해서 착수할 것이고, 知가 이른 다음에야 行이 가히 따라야 할 것으로 순서를 안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례에 따라서 六經 四書와 濂洛群哲을 배우고 또한 우리나라 儒賢의 책을 익혀 가면서 학문적인 근원에로의 환원, 즉 <沿流沂源>
) 星全下, 권49, 面18, 四七新編序
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문도 알고 보면 배우고 묻는다는 행동적인 면이 있는 만치 지행은 원래 합일하는 것임을 일차적으로 그는 긍정한다. 그러나 行에도 이른바 <精案明覺>이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 데서 그렇지 못한 이른바 <冥行>이 있고, 학문을 思素해야 함에도 잘못된 <妄想>이 있을 수 있는 데서 신중한 문제의식을 지닌다. 성호는 孝弟와 같은 것은 몸으로써 배움이고, 讀書窮理는 마음으로써 배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구분하고, 다음 독서궁리는 우선 知가 行에 앞서야 하므로 결국 先知後行의 합리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학문과 思素―즉 지와 행은 두가지 일이 아니면서도 先後를 두고 접근하는 데서 이른바 <殆와 岡>의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僿說下, p.5 지행합일
-427-
이 知行의 선후적 進은 원래 퇴계에서 이론적 정착을 본 문제였다. 성호는 퇴계에서 그의 현실과 미래의 국가와 민생의 장래에 관하여 앞질러 생각하고 있음을 살핀다. 즉 성호는 퇴계가 黃仲擧에 주는 答信에서 남과 북의 우환이 조석간에 돌발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볼 때 무엇하나 믿을 게 없다고 불안해 한다. 퇴계는 사실상 그가 山林에서의 즐거움을 누린다 한들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退溪全上, 권19, 面3
그리고 朝野에서는 태평을 누릴 때 퇴계는 時勢에 어두운 현실에서 미래를 우려하였음을 성호는 음미하면서, 과연 그후 40년이 채 안되어 임진란을 겪고, 인조 초에는 호란으로 민생이 도탄에서 헤매게 되었음을 통감하고 있다.
) 僿說上, 退溪先見
성호는 그때 우리 국민상하가 대처하기에 따라서 양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였다. 나무에 좀이 쓸 듯 국민이 퇴폐하고 국정이 소란한데 어찌 外夷가 틈타지 않겠느냐고 피력한다. 옛날 漢土의 漢나라와 晋나라에서 黨錮와 청담 때문에 社稷이 붕괴되었음을 알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신이 모두 협력하여 정치를 쇄신하고 更張을 회복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黨說上, 堂習召亂
성호는 평생을 산림처사로 초야에 머물렀으나 그의 선비로서의 기개는 天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가난한 선비이기는 하였으나 산림간에서의 포효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른바 후세치용의 諸說을 제시하면서 학문한 바의 실천으로서 국가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지니고 또한 중흥책을 모색한다. 그의 士農合一論이나 유비무환을 위한 문무겸중책의 강조는 성호의 유자적 측면과 경세적 측면이 대립적이기에 앞서서 지행선후의 행동철학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호의 폭넓은 사고와 이론과 품행에서도 퇴계의 정신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성호의 도학정신과 치세사상은 지행의 兼全관계로 수렴시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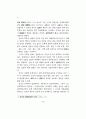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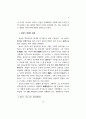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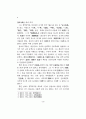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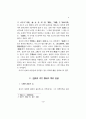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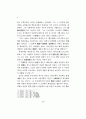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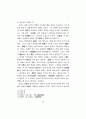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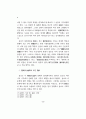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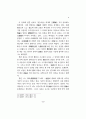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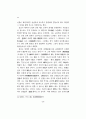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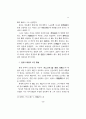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