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바꾸어 말하면 자기자신의 학력과 자신이 놓여 있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무모하게 정치세계로 뛰어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 하고, 그것보다도 지금은 물러나서 학문수양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완성시키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신의 출처진퇴의 문제에 언급하여, 「義之所在, 隨人隨時, 變動不居」, 즉 이 사회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생활방식을 가져야만, 인간으로서의 올바름을 잃지 않고 마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바꾸면 학문과 수양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아니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가, 또 그 사람이 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자기자신에게는, 물러나서 학문수양에 힘쓰는 일만이 時宜에 맞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南時甫가 「爲我의 學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던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이퇴계는, 事功派인 陳龍川의 비판에 답한 주자의 말
) 주자문집, 권36.
, 『延平答問』 가운데의 「草木衣食云云」의 말, 또한 같은 『延平答問』 중에도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의 「諸宮觀梅寄康侯」의 시
) 楊龜山先生全集, 권42.
를 들어서, 겉으로 나타난 形跡面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자신의 학문은 楊朱의 爲我의 학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258-
이것은 특별히 이퇴계에 한한 문제는 아니고, 안자나 李延平에 대해서도, 또한 주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자, 李延平 거기에 주자나 이퇴계도 포함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의 학문과 양주의 爲我의 학설과의 相違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주의 爲我主義는 맹자가 「군주를 무시한다」
) 孟子, 文公章句下.
고 하여 엄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양주는 그의 貴生의 견지에서, 名聞利達을 자기 생을 해치는 것으로서 물리쳤는데, 그 결과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 孟子, 盡心章句上.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안자, 李延平, 주자,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名聞利達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은 양주와 비슷하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단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지하게 몰두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안자라 할지라도 천하국가를 治理하는 방법을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 論語, 衛靈公篇.
그들의 인성론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을 전제로 해서 구성되고 있고, 따라서 학문 그 자체가 그 중에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中庸』은, 자기를 완성시키고, 타인은 물론 사물을 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외를 통합하는 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중용, 제25장.
이 점이야말로 양주의 학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자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유학의 특질은, 자기자신을 형성·완성하고, 他者를 他者로서 형성·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하여, 여기에 내외를 통합시키는 도가 있다고 해서, 修己治人의 도를 배우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明德에서 新民으로, 修己에서 治人으로 확충시켜 가는 곳에 유학의 특색이 있었다. 『中庸』에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 중용, 제27장.
이라고 있고, 또한 『역』에 「崇德而廣業」
) 주역, 繫辭傳上.
이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이어받아 이퇴계도
-259-
心은 萬事의 근본이며, 性은 萬善의 근원이라고 듣고 있다. 그러기에 先儒가 학문을 논할 경우에는, 반드시 放心을 거두어 들이고, 덕성을 기르는 것을 공부의 맨 처음의 着手處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실은 본원의 바탕을 성취해서 도를 완성하고, 사업을 광대하게 하는 기초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 퇴계선생문집, 권16, 答奇明彦.
.
라고 말해, 存養의 공부에 의해서 本原의 地를 성취하는 것이 凝道廣業의 기초라고 하고 있다. 또한
(子路처럼)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충고받는 것을 기뻐하고, (舜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겨하며,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을 거듭한다면, 도덕이 내 몸에 구축되어 자연히 훌륭한 공적을 쌓고, 자연히 광대한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비로소,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다스려서 도를 실행한다고 하는 책무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同上.
.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상과 같이 안자, 李延平, 주자, 그리고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나가 경세의 일을 하기 보다도, 자기 수양쪽에 비중을 두고, 내성적인 존양성찰 공부를 학문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바깥 세계보다도, 먼저 내면적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韜晦라든가 韜晦志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산 시대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韜晦涵養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儒者중에서 韜晦의 길을 택한 사람들, 韜晦지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모두 내성적인 자기수양쪽에 학문의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퇴계는 儒者의 韜晦와 楊朱의 爲我主義와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延平答問』중에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의 「諸宮觀梅寄康侯」의 시를 들고, 또한 「最可賞味」
) 퇴계선생문집, 권34, 答金士純.
라고 평하고, 문인에게 味讀을 권유하고 있다.
-260-
欲驅殘臘變春風 只有寒梅作選鋒 莫把疎英輕鬪雪 好藏淸艶月明中
이시의 의미는, 「겨울의 寒氣를 쫓아버리고 따뜻한 춘풍으로 변할려고 하는 때, 그 先鋒이 되는 것은 寒梅이다. 그러나 이 한매의 疎英을 차디찬 눈과 경망스럽게 싸우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는 그 청아한 자태를 月明가운데 살짜기 놓아두는 쪽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있다. 儒者가 말하는 韜晦涵養의 眞意를, 실로 的確하게 表明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양 자 譯)
) 주자문집, 권36.
, 『延平答問』 가운데의 「草木衣食云云」의 말, 또한 같은 『延平答問』 중에도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의 「諸宮觀梅寄康侯」의 시
) 楊龜山先生全集, 권42.
를 들어서, 겉으로 나타난 形跡面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자신의 학문은 楊朱의 爲我의 학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258-
이것은 특별히 이퇴계에 한한 문제는 아니고, 안자나 李延平에 대해서도, 또한 주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자, 李延平 거기에 주자나 이퇴계도 포함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의 학문과 양주의 爲我의 학설과의 相違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주의 爲我主義는 맹자가 「군주를 무시한다」
) 孟子, 文公章句下.
고 하여 엄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양주는 그의 貴生의 견지에서, 名聞利達을 자기 생을 해치는 것으로서 물리쳤는데, 그 결과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 孟子, 盡心章句上.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냉담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안자, 李延平, 주자,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名聞利達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은 양주와 비슷하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단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지하게 몰두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안자라 할지라도 천하국가를 治理하는 방법을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 論語, 衛靈公篇.
그들의 인성론 그 자체가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을 전제로 해서 구성되고 있고, 따라서 학문 그 자체가 그 중에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中庸』은, 자기를 완성시키고, 타인은 물론 사물을 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외를 통합하는 도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중용, 제25장.
이 점이야말로 양주의 학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자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유학의 특질은, 자기자신을 형성·완성하고, 他者를 他者로서 형성·완성시키는 것을 性의 德이라고 하여, 여기에 내외를 통합시키는 도가 있다고 해서, 修己治人의 도를 배우는 곳에 있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明明德에서 新民으로, 修己에서 治人으로 확충시켜 가는 곳에 유학의 특색이 있었다. 『中庸』에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 중용, 제27장.
이라고 있고, 또한 『역』에 「崇德而廣業」
) 주역, 繫辭傳上.
이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이어받아 이퇴계도
-259-
心은 萬事의 근본이며, 性은 萬善의 근원이라고 듣고 있다. 그러기에 先儒가 학문을 논할 경우에는, 반드시 放心을 거두어 들이고, 덕성을 기르는 것을 공부의 맨 처음의 着手處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실은 본원의 바탕을 성취해서 도를 완성하고, 사업을 광대하게 하는 기초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 퇴계선생문집, 권16, 答奇明彦.
.
라고 말해, 存養의 공부에 의해서 本原의 地를 성취하는 것이 凝道廣業의 기초라고 하고 있다. 또한
(子路처럼)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충고받는 것을 기뻐하고, (舜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겨하며,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을 거듭한다면, 도덕이 내 몸에 구축되어 자연히 훌륭한 공적을 쌓고, 자연히 광대한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비로소,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다스려서 도를 실행한다고 하는 책무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同上.
.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상과 같이 안자, 李延平, 주자, 그리고 이퇴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나가 경세의 일을 하기 보다도, 자기 수양쪽에 비중을 두고, 내성적인 존양성찰 공부를 학문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바깥 세계보다도, 먼저 내면적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韜晦라든가 韜晦志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산 시대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나, 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韜晦涵養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儒者중에서 韜晦의 길을 택한 사람들, 韜晦지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모두 내성적인 자기수양쪽에 학문의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퇴계는 儒者의 韜晦와 楊朱의 爲我主義와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延平答問』중에 인용되어 있는 楊龜山의 「諸宮觀梅寄康侯」의 시를 들고, 또한 「最可賞味」
) 퇴계선생문집, 권34, 答金士純.
라고 평하고, 문인에게 味讀을 권유하고 있다.
-260-
欲驅殘臘變春風 只有寒梅作選鋒 莫把疎英輕鬪雪 好藏淸艶月明中
이시의 의미는, 「겨울의 寒氣를 쫓아버리고 따뜻한 춘풍으로 변할려고 하는 때, 그 先鋒이 되는 것은 寒梅이다. 그러나 이 한매의 疎英을 차디찬 눈과 경망스럽게 싸우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는 그 청아한 자태를 月明가운데 살짜기 놓아두는 쪽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있다. 儒者가 말하는 韜晦涵養의 眞意를, 실로 的確하게 表明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양 자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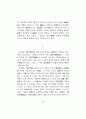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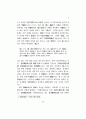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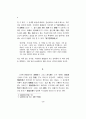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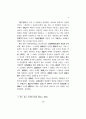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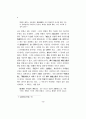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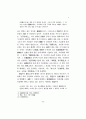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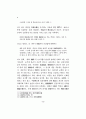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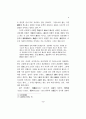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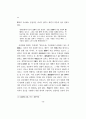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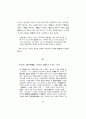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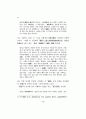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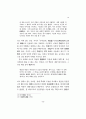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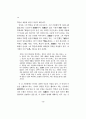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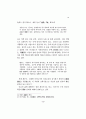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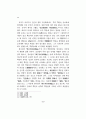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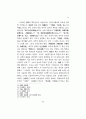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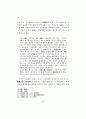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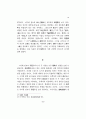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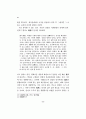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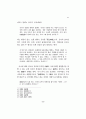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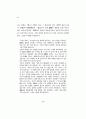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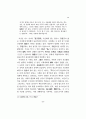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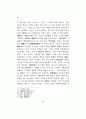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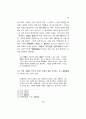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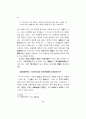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