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의 제기
Ⅲ. 이기론
Ⅳ. 교육이론
Ⅴ. 교육이론의 적용:교육적 발언의
재음미
Ⅵ. 결 어
Ⅱ. 문제의 제기
Ⅲ. 이기론
Ⅳ. 교육이론
Ⅴ. 교육이론의 적용:교육적 발언의
재음미
Ⅵ. 결 어
본문내용
법을 물으니 \'그저 익숙히 읽는 것뿐이다. 글을 읽는 사람이 비록 글의 뜻을 알았으나 만약 익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읽는 대로 곧 잊어버리게 되어 마음에 간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알고 난 뒤에 또 거기에 자세하고 익숙해 질 공부를 더한 뒤라야 비로소 마음을 간직할 수 있으며 또 흐뭇한 맛도 있을 것이다.\'
) 問讀書之法, 先生曰止是熟, 凡讀書者, 雖曉文義, 若未熟則旋讀旋忘, 未能存之於心, 心也旣學而又加溫熟之功, 然後方能存之於心, 而存浹洽之味矣(言行錄, 讀書, 金誠一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고요히 앉아 마음을 편안하고 맑게 하여서 天理를 體認하라.\'
) 先生曰延平默坐澄心體認天理之說, 最關於學者, 讀書窮理之法(言行錄, 金誠一記)
는 것이다. \'혹시 모르는 곳이 있으면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우선 한 쪽에 미루어 두었다가 따로 다시 끌어내어 마음을 비워서 깊이 하면 드디어 환히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 如有不得者, 亦不强探力索, 姑置一邊, 時復拈出, 虛心玩味, 未有不洞然處(言行錄, 學問).
고 하였다. 말하자면 \'不强探力索\', 虛心琓味\', \'默坐澄心\', \'體認天理\'한다는 말이다.
-57-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일까? 퇴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학자들이 할 일을 묻고 좋은 말을 청하면, 그 깊고 얕음을 따라 알려주시되, 만일 깨우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알아들은 뒤라야 그치었다.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심에 있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아서
) 訓誨後學, 不厭不倦, 待之如朋友, 終不以師道自處, 士子遠來, 質疑請益, 則隨 其淺深而告詔之, 必以立志爲先, 主敬窮理爲用工地頭, 諄諄誘掖, 啓發乃已(言 行錄 一, 敎人).
, 비록 병환이 있어도 강론을 멈추지 않았다. 돌아가기 전달에 이미 중한 병환에 있었지만, 여러 제자들과 강론하심이 보통 때와 다름 없어서, 제자들은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고 강론을 그쳤지만, 며칠 뒤 병환은 중해졌다.\"(金誠一) 둘째, \"선생은, 학자와 더불어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하였다. 그래서 비록 章句에 대한 비속한 선비의 말이라도 또한 유의하여 듣고 마음을 비워 연구해 보며, 또 거듭 거듭 참고하고 고쳐서 끝내 바른 곳으로 귀결지은 뒤에야 그만 두었다. 그가 변론할 때에는 기운이 부드럽고 말은 온화하며, 이치가 밝고 뜻이 바르며, 비록 여러 가지 의견이 다투어 일어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이야기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이 그친 뒤에라야 천천히 한 마디로 조리를 따지어 해석하지마는, 꼭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 않고,\'내 소견은 이러한데 어떠할 지 모르겠다\' 고 하였다\".(金誠一)
) 先生與學者講論到疑處, 不主己見, 必博采衆論(言行錄, 二, 講辨).
셋째, \"후배들을 가르침에는 싫어하지도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으며, 친구처럼 대접해서 끝까지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젊은 선비들이 멀리서 찾아와 물으며 가르침을 청하면, 그 깊고 얕음을 따라 가르치되,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으로써 공부하는 첫머리로 삼아서 다정스레 타일러 알게 한 뒤에야 그만 두었다.\"(金誠一)
) 註 97과 같은 내용이다.
-58-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태도나 모습을 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첫째, 가르침을 좋아 하였다는 점, 둘째,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점, 셋째, 친구처럼 다정스럽게 했다는 점, 넷째, 끝까지 알도록 해주었다는 점, 다섯째,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스승\'의 상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교사는 \'아는 자\'로 등장하는데, 퇴계는 자신이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고 \'모르는 자\'로서 등장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탐구할 의욕을 갖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퇴계는 \'배우는 자와 더불어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하였다.\'
) 註 98과 같은 내용이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奇明彦에게 주는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편지에 의하면, \"義理의 無窮함을 깊이 알게 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며, 내 허물 듣기를 기뻐하고 착한 것을 취하기를 즐기어서 참다운 노력을 오래 쌓으면 道가 이루어지고 德이 서게 되어 功이 저절로 높아지고 業이 저절로 넓어지게 될 것\"
) 深知義理之無窮, 常兼然有不自滿之意, 喜聞過樂取善而眞積力久, 則道成而德 立, 功自崇而業自廣(全書, 答 奇明彦).
이라 하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하여 교육자가 본을 받아야 할 놀라운 점은 \'義理의 無窮함을 깊이 알게 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최고로 교육받은 상태요,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59-
Ⅵ. 結 語
퇴계의 교육 이론을 하나의 시론으로서 연구한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 자신의 理氣論이 그의 궁극적인 교육이론이라는 것과,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교육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보다 교육현실에 가까운 윤리론, 인식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이론을 구축하고, 이 교육이론에 비추어 퇴계 자신의 교육에 관한 제발언을 음미하려는 데 있었다.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것은 차치하고,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다. 그 느낀 바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에 대신 하고자 한다. 대개의 경우 훌륭한 이론과 명제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 놓은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만들어 내 놓은 이론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퇴계는 자신이 정립한 이론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비로소 퇴계의 自銘에 나와 있는 \'學求愈邈 이라는 말이 겨우 이해되는 듯 하다.
-60-
) 問讀書之法, 先生曰止是熟, 凡讀書者, 雖曉文義, 若未熟則旋讀旋忘, 未能存之於心, 心也旣學而又加溫熟之功, 然後方能存之於心, 而存浹洽之味矣(言行錄, 讀書, 金誠一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고요히 앉아 마음을 편안하고 맑게 하여서 天理를 體認하라.\'
) 先生曰延平默坐澄心體認天理之說, 最關於學者, 讀書窮理之法(言行錄, 金誠一記)
는 것이다. \'혹시 모르는 곳이 있으면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우선 한 쪽에 미루어 두었다가 따로 다시 끌어내어 마음을 비워서 깊이 하면 드디어 환히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 如有不得者, 亦不强探力索, 姑置一邊, 時復拈出, 虛心玩味, 未有不洞然處(言行錄, 學問).
고 하였다. 말하자면 \'不强探力索\', 虛心琓味\', \'默坐澄心\', \'體認天理\'한다는 말이다.
-57-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일까? 퇴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학자들이 할 일을 묻고 좋은 말을 청하면, 그 깊고 얕음을 따라 알려주시되, 만일 깨우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알아들은 뒤라야 그치었다.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심에 있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아서
) 訓誨後學, 不厭不倦, 待之如朋友, 終不以師道自處, 士子遠來, 質疑請益, 則隨 其淺深而告詔之, 必以立志爲先, 主敬窮理爲用工地頭, 諄諄誘掖, 啓發乃已(言 行錄 一, 敎人).
, 비록 병환이 있어도 강론을 멈추지 않았다. 돌아가기 전달에 이미 중한 병환에 있었지만, 여러 제자들과 강론하심이 보통 때와 다름 없어서, 제자들은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고 강론을 그쳤지만, 며칠 뒤 병환은 중해졌다.\"(金誠一) 둘째, \"선생은, 학자와 더불어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하였다. 그래서 비록 章句에 대한 비속한 선비의 말이라도 또한 유의하여 듣고 마음을 비워 연구해 보며, 또 거듭 거듭 참고하고 고쳐서 끝내 바른 곳으로 귀결지은 뒤에야 그만 두었다. 그가 변론할 때에는 기운이 부드럽고 말은 온화하며, 이치가 밝고 뜻이 바르며, 비록 여러 가지 의견이 다투어 일어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이야기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이 그친 뒤에라야 천천히 한 마디로 조리를 따지어 해석하지마는, 꼭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하지 않고,\'내 소견은 이러한데 어떠할 지 모르겠다\' 고 하였다\".(金誠一)
) 先生與學者講論到疑處, 不主己見, 必博采衆論(言行錄, 二, 講辨).
셋째, \"후배들을 가르침에는 싫어하지도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으며, 친구처럼 대접해서 끝까지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젊은 선비들이 멀리서 찾아와 물으며 가르침을 청하면, 그 깊고 얕음을 따라 가르치되, 반드시 뜻을 세우는 것으로써 공부하는 첫머리로 삼아서 다정스레 타일러 알게 한 뒤에야 그만 두었다.\"(金誠一)
) 註 97과 같은 내용이다.
-58-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태도나 모습을 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첫째, 가르침을 좋아 하였다는 점, 둘째,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점, 셋째, 친구처럼 다정스럽게 했다는 점, 넷째, 끝까지 알도록 해주었다는 점, 다섯째,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스승\'의 상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교사는 \'아는 자\'로 등장하는데, 퇴계는 자신이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고 \'모르는 자\'로서 등장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탐구할 의욕을 갖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퇴계는 \'배우는 자와 더불어 강론하다가 의심나는 곳에 이르면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않고 반드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하였다.\'
) 註 98과 같은 내용이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스승\'으로 자처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奇明彦에게 주는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편지에 의하면, \"義理의 無窮함을 깊이 알게 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며, 내 허물 듣기를 기뻐하고 착한 것을 취하기를 즐기어서 참다운 노력을 오래 쌓으면 道가 이루어지고 德이 서게 되어 功이 저절로 높아지고 業이 저절로 넓어지게 될 것\"
) 深知義理之無窮, 常兼然有不自滿之意, 喜聞過樂取善而眞積力久, 則道成而德 立, 功自崇而業自廣(全書, 答 奇明彦).
이라 하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하여 교육자가 본을 받아야 할 놀라운 점은 \'義理의 無窮함을 깊이 알게 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최고로 교육받은 상태요,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59-
Ⅵ. 結 語
퇴계의 교육 이론을 하나의 시론으로서 연구한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 자신의 理氣論이 그의 궁극적인 교육이론이라는 것과,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교육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보다 교육현실에 가까운 윤리론, 인식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이론을 구축하고, 이 교육이론에 비추어 퇴계 자신의 교육에 관한 제발언을 음미하려는 데 있었다.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것은 차치하고,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다. 그 느낀 바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에 대신 하고자 한다. 대개의 경우 훌륭한 이론과 명제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 놓은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만들어 내 놓은 이론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퇴계는 자신이 정립한 이론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비로소 퇴계의 自銘에 나와 있는 \'學求愈邈 이라는 말이 겨우 이해되는 듯 하다.
-60-
추천자료
 학교교육과 교육이론 : 독일학교교육
학교교육과 교육이론 : 독일학교교육 부모교육이론 (민주적 부모교육이론 &행동수정)
부모교육이론 (민주적 부모교육이론 &행동수정) boobitt의 교육과정이론과 타일러의 교육과정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여라
boobitt의 교육과정이론과 타일러의 교육과정이론을 자세히 설명하여라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과 부모교육이론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과 부모교육이론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 교육실천교육이론교육철학의개념과상호관계,형이상학,인식론,가치론,철학의기능,독립의원리 설명
교육실천교육이론교육철학의개념과상호관계,형이상학,인식론,가치론,철학의기능,독립의원리 설명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개념,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발달배경, 학문기초미술교육(DBAE...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개념, 학문기초미술교육(DBAE)의 발달배경, 학문기초미술교육(DBAE...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행정이론의 발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행정이론의 발달 기능주의 교육이론과 갈등론적 교육이론의 비교
기능주의 교육이론과 갈등론적 교육이론의 비교 구조기능주의 교육이론 - 기능주의교육관,유기체론,학자별사회화이론.PPT자료
구조기능주의 교육이론 - 기능주의교육관,유기체론,학자별사회화이론.PPT자료 [교육철학 및 교육사] 07. 헬레니즘시대의 교육 요약정리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 교육기관, ...
[교육철학 및 교육사] 07. 헬레니즘시대의 교육 요약정리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 교육기관, ... [유아수학교육]몬테소리 소개 - 몬테소리의 생애,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과 목표 및 환경, 몬...
[유아수학교육]몬테소리 소개 - 몬테소리의 생애,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과 목표 및 환경, 몬... 교육敎育과정이론이란 : 교육과정이론은 무엇이며 왜 연구되어야 하는가?
교육敎育과정이론이란 : 교육과정이론은 무엇이며 왜 연구되어야 하는가? [교육행정이론] 교육행정의 이론(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
[교육행정이론] 교육행정의 이론(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 [부모교육이론] 기노트(Ginott)의 부모교육의 목적과 교육원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모교육이론] 기노트(Ginott)의 부모교육의 목적과 교육원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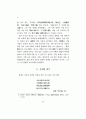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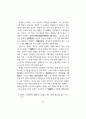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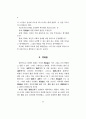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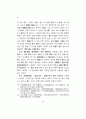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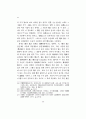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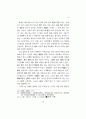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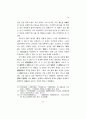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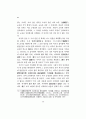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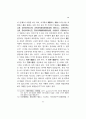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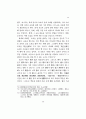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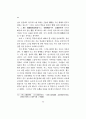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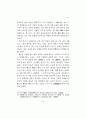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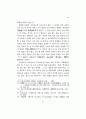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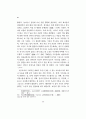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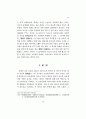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