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駕洛國記의 성격
Ⅲ. 首露王 神話와 즉위 의례
Ⅳ. 맺음말
Ⅱ. 駕洛國記의 성격
Ⅲ. 首露王 神話와 즉위 의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태이다. 그렇지만 수로왕 신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탈해와의 다툼이 변신술에 의한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건과 종주권, 정의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 때에 연행되던 의례적인 다툼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단 아래서 이것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다툼에서 수로가 승리를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신봉하던 수렵 문화의 집단이 수역의 원리를 믿던 어로 문화의 집단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들이 정복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의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을, 수로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다툼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여하간 이리하여 한 사람의 승리자로 등장한 수로는 즉위 의례의 과정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신화의 후반부이다. 후반부는 (1) 알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 榻上에 놓아두었다가 (2) 이튿날 이것을 벗겨보니 동자로 화해 있어 (3) 즉위를 하였다는 세 개의 단락으로 되었다. 이들 가운데서 단락 (3) 이 즉위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1) 과 (2) 의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와 계통적으로 간계가 있는 일본과 요나라의 즉위 의례를 비교여 이것들의 의미를 구명하는 상호 해명법을 원용하였다.
일본의 다이죠우사이에서는 신왕에게 이불을 사용하고 요나라의 시책의 에서는 이불을 덮어씌우는데, 이러한 의례적인 절차는 신왕을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 인도왕의 즉위 의례를 참조하여 보자기나 이불, 담요 등이 결국은 자궁의 각종 박막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볼 때, 신왕을 보자기로 싸는 것이나 이불이 나 담요로 덮어씌우는 것은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곧 원향에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로왕 신화에 이 원향에의 회귀가 의례적인 죽음을 가리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1) 죽어서 (2) 다시 태어나는데 (3) 신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즉위 의례적인 죽음을, 단락(2)가 신성왕으로서의 재생을, 단락 (3)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신들의 세계에의 통합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신화에는 수로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부차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의 치적 속에 제도를 정비하고 덕치를 행하여 통치권과 정의를 확립했다는 기술이 있어, 전반부에서 제기되었던 혼돈의 상태를 제거하고 명실 상부한 국가라는 소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하면, 수로왕 신화의 전반부는 후반부를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후반부는 재생 제의에 근거를 둔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었으며, 이 신화 전체는 왕건의 기원과 성립을 이야기하는 기원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삼국유사』(서울, 삼중당)
2. 김부식 : 1969, 『삼국사기』(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3. 魏收 : 1976, 『魏書』(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4. 陳壽 : 1975, 『三國志』(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5. 楊家駱 편 : 1973, 『遼史彙編』(1)(台北, 鼎文書局)
6. 井上光貞 校注 : 1969, 『日本書紀』(上)(東京, 岩波書店)
7. 김열규 : 1975,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8. 김영일 : 1987, 「가락국기 서사원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일고찰」, 『가라문화』5(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5∼34
9. 김택규 : 1980, 『한국민속문예론』(서울, 일조각)
10. 김화경 : 1983, 「온조신화연구」, 『인문연구』4(경산,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 121∼144
11. ――― : 1984, 「신라건국성화의 연구」, 『민족문화논총』6(경산,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 1∼20
12. 박지홍 : 1957, 「구지가 연구」『국어국문학』16(서울, 국어국문학회) pp. 527∼541
13. 이병기, 백철 : 1963, 『국문학전사』(서울, 신구문화사)
14. 이병도 : 1976, 『한국고대사회연구』(서울, 집문당)
15. 이강옥 : 1987,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5, (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133∼170
16. 현용준 : 1986, 『제주도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7. 井上秀雄 : 1978, 『朝鮮古代史序說』(東京, 寧樂社)
18. 大林太良 : 1966, 『神話學入門』(東京, 中央公論社)
19. ―――― : 1984, 『東アシ``アの王權神話』(東京, 弘文堂)
20. 折口信夫 : 1975, 『折口信夫全集』3(東京, 中央公論社)
21. 金錫亨, 朝鮮史硏究會 譯 : 1969, 『古代朝日關係史』(東京, 勁草書房)
22. 三品彰英 : 1971, 『建國神話の諸問題』(東京, 平凡社)
23. ―――― : 1979, 『三國遺事考證』(中)(東京, 書房)
24. Dundes, A. : 1980, 『Morphology of North America Indian folktale』(Academia Scientiarun Fennica, Helsinki)
25. Eliade, M. : 1954,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26. Hocart, A. M. : 1927, 『Kingship』(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27. Van Gennep. A. : 1960, 『The rites of passag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8. Von Franz. M. L. : 『Patterns of creativity mirrored in creation myth』(Spring Publications Co, Zurich)
진단학보, 권67, 진단학회,
1989. 6, 133-151
이 다툼에서 수로가 승리를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를 신봉하던 수렵 문화의 집단이 수역의 원리를 믿던 어로 문화의 집단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들이 정복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의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것을, 수로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다툼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여하간 이리하여 한 사람의 승리자로 등장한 수로는 즉위 의례의 과정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신화의 후반부이다. 후반부는 (1) 알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 榻上에 놓아두었다가 (2) 이튿날 이것을 벗겨보니 동자로 화해 있어 (3) 즉위를 하였다는 세 개의 단락으로 되었다. 이들 가운데서 단락 (3) 이 즉위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1) 과 (2) 의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와 계통적으로 간계가 있는 일본과 요나라의 즉위 의례를 비교여 이것들의 의미를 구명하는 상호 해명법을 원용하였다.
일본의 다이죠우사이에서는 신왕에게 이불을 사용하고 요나라의 시책의 에서는 이불을 덮어씌우는데, 이러한 의례적인 절차는 신왕을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 인도왕의 즉위 의례를 참조하여 보자기나 이불, 담요 등이 결국은 자궁의 각종 박막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볼 때, 신왕을 보자기로 싸는 것이나 이불이 나 담요로 덮어씌우는 것은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곧 원향에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로왕 신화에 이 원향에의 회귀가 의례적인 죽음을 가리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하지만 (1) 죽어서 (2) 다시 태어나는데 (3) 신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즉위 의례적인 죽음을, 단락(2)가 신성왕으로서의 재생을, 단락 (3)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신들의 세계에의 통합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신화에는 수로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부차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적인 절차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의 치적 속에 제도를 정비하고 덕치를 행하여 통치권과 정의를 확립했다는 기술이 있어, 전반부에서 제기되었던 혼돈의 상태를 제거하고 명실 상부한 국가라는 소우주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하면, 수로왕 신화의 전반부는 후반부를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후반부는 재생 제의에 근거를 둔 즉위 의례의 구전 상관물이었으며, 이 신화 전체는 왕건의 기원과 성립을 이야기하는 기원 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연 저, 최남선 편 : 1946, 『삼국유사』(서울, 삼중당)
2. 김부식 : 1969, 『삼국사기』(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3. 魏收 : 1976, 『魏書』(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4. 陳壽 : 1975, 『三國志』(서울, 경인문화사 영인본)
5. 楊家駱 편 : 1973, 『遼史彙編』(1)(台北, 鼎文書局)
6. 井上光貞 校注 : 1969, 『日本書紀』(上)(東京, 岩波書店)
7. 김열규 : 1975,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8. 김영일 : 1987, 「가락국기 서사원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일고찰」, 『가라문화』5(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5∼34
9. 김택규 : 1980, 『한국민속문예론』(서울, 일조각)
10. 김화경 : 1983, 「온조신화연구」, 『인문연구』4(경산,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 121∼144
11. ――― : 1984, 「신라건국성화의 연구」, 『민족문화논총』6(경산,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pp. 1∼20
12. 박지홍 : 1957, 「구지가 연구」『국어국문학』16(서울, 국어국문학회) pp. 527∼541
13. 이병기, 백철 : 1963, 『국문학전사』(서울, 신구문화사)
14. 이병도 : 1976, 『한국고대사회연구』(서울, 집문당)
15. 이강옥 : 1987,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가라문화』5, (마산,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pp. 133∼170
16. 현용준 : 1986, 『제주도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7. 井上秀雄 : 1978, 『朝鮮古代史序說』(東京, 寧樂社)
18. 大林太良 : 1966, 『神話學入門』(東京, 中央公論社)
19. ―――― : 1984, 『東アシ``アの王權神話』(東京, 弘文堂)
20. 折口信夫 : 1975, 『折口信夫全集』3(東京, 中央公論社)
21. 金錫亨, 朝鮮史硏究會 譯 : 1969, 『古代朝日關係史』(東京, 勁草書房)
22. 三品彰英 : 1971, 『建國神話の諸問題』(東京, 平凡社)
23. ―――― : 1979, 『三國遺事考證』(中)(東京, 書房)
24. Dundes, A. : 1980, 『Morphology of North America Indian folktale』(Academia Scientiarun Fennica, Helsinki)
25. Eliade, M. : 1954,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26. Hocart, A. M. : 1927, 『Kingship』(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27. Van Gennep. A. : 1960, 『The rites of passag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8. Von Franz. M. L. : 『Patterns of creativity mirrored in creation myth』(Spring Publications Co, Zurich)
진단학보, 권67, 진단학회,
1989. 6, 133-151
추천자료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건국신화(建國神話)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건국신화(建國神話) [신화와 철학] 그리스신화의 특징
[신화와 철학] 그리스신화의 특징 영화 속의 그리스 신화-신화 속의 페드라, 영화 속의 페드라
영화 속의 그리스 신화-신화 속의 페드라, 영화 속의 페드라 중국 신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상상력 : 만화 속에 녹아 있는 중국의 신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중국 신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상상력 : 만화 속에 녹아 있는 중국의 신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의 건국신화와 비교해서 본 로마 건국신화
우리의 건국신화와 비교해서 본 로마 건국신화 행성의 이름으로 신화 읽기- 첨단 과학에 남겨진 신화의 향기
행성의 이름으로 신화 읽기- 첨단 과학에 남겨진 신화의 향기 단군신화의 문학사적 의의
단군신화의 문학사적 의의 우리나라신화와 서양신화의 비교 report (홍익인간의 이해 단국대)
우리나라신화와 서양신화의 비교 report (홍익인간의 이해 단국대) [주몽, 동명성왕 고주몽, 주몽 탄생, 주몽신화, 고구려, 유리왕]주몽(동명성왕 고주몽)의 탄...
[주몽, 동명성왕 고주몽, 주몽 탄생, 주몽신화, 고구려, 유리왕]주몽(동명성왕 고주몽)의 탄... 주몽신화(고구려 건국신화)
주몽신화(고구려 건국신화) [미술과 신화,디자인]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영화심리 등에서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가 끼친...
[미술과 신화,디자인]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영화심리 등에서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가 끼친... [국어국문학과 공통] 고조선, 고구려, 신라, 가야, 탐라 등 한국의 건국신화 가운데 하나...
[국어국문학과 공통] 고조선, 고구려, 신라, 가야, 탐라 등 한국의 건국신화 가운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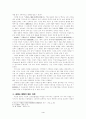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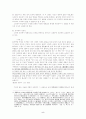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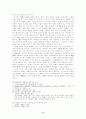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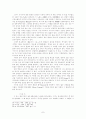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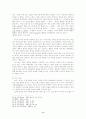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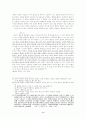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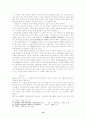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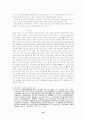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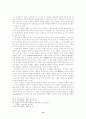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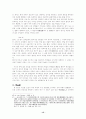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