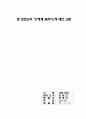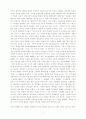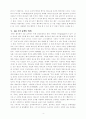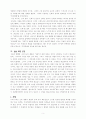목차
1. 들어가며
2. 저자의 문제제기 맥락
3.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4. 전망
2. 저자의 문제제기 맥락
3.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4. 전망
본문내용
준비해온 저자나 저자가 영향받았던 신학자들의 진지한 신학적인 작업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서구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한국의 기독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그런한 변화의 현실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으며 문제의 긴박성이 피부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면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서구와 아시아권의 종교문화적인 배경이 다른데서도 일정정도 연유하는 문제라고 본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해온 서구문화권은 첨단을 달리는 신학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면서도 기독교가 쇠퇴하는 걸 보면 신학의 발전과 종교의 건재는 반비례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구촌으로 묶어버린 현대의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의 물결 수년동안 멀고 먼 유람길에 올라서야 그 나라의 문물을 소개했던 박지원의 『북학의』같은 작품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있다. 불과 몇시간 전 일어났던 지구 반대켠 나라의 소식들도 우리는 금방 들을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점차 단일한 생활문화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각 나라의 특유한 종교, 전통문화들을 해체시키거나 쉽게 획일화 시켜버리는 결과를 빚고있다. 이제 머지 않아 신에대한 또는 우리의 신앙과 성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밀려들 것이다.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해서 우리 스스로를 대안없이 무장해체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를 살든, 인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며 자신 삶의 의미를 묻고 부여해야 하는 존재임을 볼 때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말할 것이며 성서 그 자체의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1세대 민중신학자 중에서 서남동 교수의 주장 중에서 '성서를 콘텍스트화 해야한다'는 말은 그 말이 제기 되었던 배경과는 또 다르게 오늘날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성서에만 매여서 그것을 늘 다시 재해석하려 드는 것도 좋지만, 그 한계점이 분명히 왔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그럴 때 우리는 망언득지(忘言得志)의 깊은 교훈을 되살려 열려진 체계로 신이 많들어 내신 다양한 가르침과 삶속에서 신에게 다가서는 열려진 신학, 신앙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체화된 작업은 신학만의 테두리만을 벗어난 간학문의 작업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