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서술양상―영화적 서술과 플롯의 해체
Ⅲ. 담론양상
1. 신뢰할 수 없는 담론과 수동적 청취자
2. 현대사회의 거대 담론과 익명성
3.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분열
Ⅳ. 결론
Ⅱ. 서술양상―영화적 서술과 플롯의 해체
Ⅲ. 담론양상
1. 신뢰할 수 없는 담론과 수동적 청취자
2. 현대사회의 거대 담론과 익명성
3.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분열
Ⅳ. 결론
본문내용
하기만 하다. 그러자 민은 보는 것이다. 그의 왼팔이 어깻죽지에서 훌렁 빠져나가는 것을. 저런. 그 팔끝에 달린 다섯 손가락. 고물고물 물살을 휘젓는 다섯 손가락. 마치 다섯 발짜리 문어처럼 그것은 저 혼자 헤엄쳐 나간다. 오른편 어깨도 허전하다. 어깨를 보았다. 이런. 그 팔도 떨어져 혼자 헤엄을 한다. 다음은 오른다리. 그의 목이 훌렁 떨어져 물 위에 둥실 뜬다. 그의 가운데 토막은 팔 다리와 목을 잃은 채 통나무 흐르듯 기우뚱 앞으로 나아간다. 그뿐이 아니다. 떨어진 왼팔이 순대를 길이로 자르듯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곧 살이 올라서 똑같은 두개의 왼팔이 되어 가물가물 헤엄쳐간다. 오른팔 오른다리. 가운데 토막. 모조리 쪼개진다. 쪼개진 조각들이 또 갈라지고 삽시간에 강은 수없이 많은 몸의 조각들로 덮여버렸다. 어느덧 조각이 하나 둘 가라앉기 시작한다.(최인훈, 1989, pp.196-197)
사실 「九雲夢」의 의미는 뒤에 겹겹이 이어지는 김용길 박사의 사색과 고고학자의 해설 등에 의해 대부분 밝혀지고 있다. 작자는 무질서하고 불연속적인 소설공간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을 덜어주기 위함인지 작품에 대한 해석을 작품내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 꿈의 내용은 김용길 박사에 의해 \"현대는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좌절의 시대며, 건너는 시대가 아니라 가라앉는 때며, 한 마디로 난파의 계절\"이고, 이때 \"현대인의 인격적 상황은 극심한 자기분열\"(최인훈, 1989, p.268)이라는 것으로 해독된다. 이것은 박사가 불경의 우화에 대해 사색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그대로 독고민의 꿈의 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처럼 망망하고 얼음풀린 물처럼 차가운\" 이 강은 현대인이 건너가야 할 \"바다처럼 방대한 조직과 풍문보다 불확실한 뉴스 문화의 홍수\"(p.269)로서 그것은 독고민이 무수한 말들에 의해 쫓기고 있는 현실을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설공간의 무질서와 지리멸렬한 언어들의 혼란은 \"한국 유적의 황폐성과 무질서성\"(p.276)이라는 말로 표현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담론의 횡포와, 개인의 정체성 위기와 자기분열이라는 상황은 이 소설이 발표된 60년대의 한국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九雲夢」의 서술방식과 담론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서술 방식은 서술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담론의 특성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전후의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의 전개와 산만하고 무질서한 소설공간은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서술자의 무관심한 태도였다. 영화의 필름을 돌리듯 장면을 언어화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에만 자신의 존재를 한정시키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포기한 서술자는 독자들의 혼란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발화의 주체가 되기보다 타인의 발화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객체로서 그 자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인공도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구운몽」의 담론들은 서술자도 주인공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로서 이러한 서술상황은 이 소설의 대부분의 담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현실적 좌표가 불분명한 공간 속에서 쫓기듯 방황하는 주인공에게 정체불명의 거대담론들은 상황 속에 관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믿을 만한 소리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선택적 판단이 강요되는 상황, 이것이 「구운몽」의 담론이 나타내는 상황이었다. 발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의 발화의 객체로서 끊임없이 상황에 끌려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수많은 풍문과 뉴스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분열에 빠지게 되는 현대인의 표상이라 하겠다. 「구운몽」이 보여주는 시공간의 불안정성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이른바 \"바벨탑적인 언어의 혼합\"
. 미하일 바흐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88, p.86.
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현대사회의 악마성에 대한 작가 최인훈의 위기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담론이 조우하는 현대사회에서 담론의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권력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때 중심 담론의 바깥에 있는 개인에게 그것은 폭력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최인훈, 九雲夢. 최인훈전집 제1권. 再版, 문학과 지성사, 1989.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김현 편,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 최인훈. 은애, 1979.
박혜경,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양상―최인훈소설 「춘향뎐」「놀부뎐」「구운몽」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3. 여름.
송재영, \"꿈의 연구―최인훈의 초현실주의 소설\", 작가세계, 1990. 봄.
정은주, \"최인훈의 <구운몽> <서유기> 연구―창작기법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0.
M. 바흐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 The Dialogic Imagination. Texas University Press. 1981.
빈센트 B. 라이치,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88.
츠베탕 토도로프,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까치. 1987.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1966.
――――――― , L\'arch 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 , \"The Subject and Power\", in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주체 와 권력\",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1993. pp.124-136.
주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4-11 두란노빌라 가동 302호
전화; (02)3661-3566 H.P. 011-9769-0751
(지난 1999년 4월부터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九雲夢」의 의미는 뒤에 겹겹이 이어지는 김용길 박사의 사색과 고고학자의 해설 등에 의해 대부분 밝혀지고 있다. 작자는 무질서하고 불연속적인 소설공간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을 덜어주기 위함인지 작품에 대한 해석을 작품내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 꿈의 내용은 김용길 박사에 의해 \"현대는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좌절의 시대며, 건너는 시대가 아니라 가라앉는 때며, 한 마디로 난파의 계절\"이고, 이때 \"현대인의 인격적 상황은 극심한 자기분열\"(최인훈, 1989, p.268)이라는 것으로 해독된다. 이것은 박사가 불경의 우화에 대해 사색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그대로 독고민의 꿈의 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처럼 망망하고 얼음풀린 물처럼 차가운\" 이 강은 현대인이 건너가야 할 \"바다처럼 방대한 조직과 풍문보다 불확실한 뉴스 문화의 홍수\"(p.269)로서 그것은 독고민이 무수한 말들에 의해 쫓기고 있는 현실을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설공간의 무질서와 지리멸렬한 언어들의 혼란은 \"한국 유적의 황폐성과 무질서성\"(p.276)이라는 말로 표현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담론의 횡포와, 개인의 정체성 위기와 자기분열이라는 상황은 이 소설이 발표된 60년대의 한국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九雲夢」의 서술방식과 담론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서술 방식은 서술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담론의 특성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전후의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의 전개와 산만하고 무질서한 소설공간은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데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서술자의 무관심한 태도였다. 영화의 필름을 돌리듯 장면을 언어화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에만 자신의 존재를 한정시키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포기한 서술자는 독자들의 혼란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발화의 주체가 되기보다 타인의 발화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객체로서 그 자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인공도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구운몽」의 담론들은 서술자도 주인공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로서 이러한 서술상황은 이 소설의 대부분의 담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현실적 좌표가 불분명한 공간 속에서 쫓기듯 방황하는 주인공에게 정체불명의 거대담론들은 상황 속에 관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믿을 만한 소리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선택적 판단이 강요되는 상황, 이것이 「구운몽」의 담론이 나타내는 상황이었다. 발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의 발화의 객체로서 끊임없이 상황에 끌려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수많은 풍문과 뉴스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분열에 빠지게 되는 현대인의 표상이라 하겠다. 「구운몽」이 보여주는 시공간의 불안정성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이른바 \"바벨탑적인 언어의 혼합\"
. 미하일 바흐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88, p.86.
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현대사회의 악마성에 대한 작가 최인훈의 위기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담론이 조우하는 현대사회에서 담론의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권력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때 중심 담론의 바깥에 있는 개인에게 그것은 폭력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최인훈, 九雲夢. 최인훈전집 제1권. 再版, 문학과 지성사, 1989.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김현 편, 우리시대의 작가연구총서 최인훈. 은애, 1979.
박혜경, \"고전문학의 현대적 수용양상―최인훈소설 「춘향뎐」「놀부뎐」「구운몽」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3. 여름.
송재영, \"꿈의 연구―최인훈의 초현실주의 소설\", 작가세계, 1990. 봄.
정은주, \"최인훈의 <구운몽> <서유기> 연구―창작기법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0.
M. 바흐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 The Dialogic Imagination. Texas University Press. 1981.
빈센트 B. 라이치,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88.
츠베탕 토도로프,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까치. 1987.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1966.
――――――― , L\'arch 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 , \"The Subject and Power\", in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주체 와 권력\", 이진우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1993. pp.124-136.
주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4-11 두란노빌라 가동 302호
전화; (02)3661-3566 H.P. 011-9769-0751
(지난 1999년 4월부터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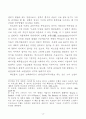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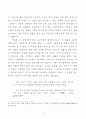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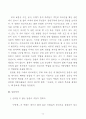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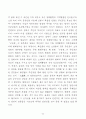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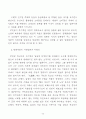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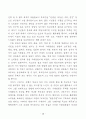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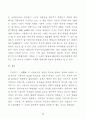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