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권력에 대한 성찰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자기 문화를 비하하는 문화적 식민주의에 대하여
◉우리 문화의 현주소
◉서구 중심적 인식틀로서의 ‘오리엔탈리즘ꡑ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권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자기 문화를 비하하는 문화적 식민주의에 대하여
◉우리 문화의 현주소
◉서구 중심적 인식틀로서의 ‘오리엔탈리즘ꡑ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권력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며
본문내용
하는 동도동기론과 서도서기론이외에는 모두 부당한 편견(예: 서도동기론, 동도서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이 지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마치‘보편적인 시각’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그것은 편견일 뿐이다.
그러나 동도동기론 서도서기론은 한 문화에 대한‘정당한 문화 읽기’이고, 현대의 해석철학자 가다머가 이야기하는‘정당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너무나 깊숙하게 물들어 있어서‘서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반면에, \'동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는 전적으로 반대되는‘비과학적, 미신적, 비합리적, 신비적, 비논리적, 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동서양에 대한 인식론적 이분법이자 언설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사실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차별적 사고 방식은 오늘날 제도교육, 지식인의 글쓰기, 메스컴과 광고를 통한‘기호 가치’의 \'수동적 소비’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시각 문화의 종속성은 이런 거대한 흐름의 단편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필자가 중국에 있으면서 보는, 노랗게 염색한 머리, 한뼘 높이의 구두굽, 알 수 없는 영어투성이의 티셔츠 등 서구지향적인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매일반이다.
1969년《예술계》창간호에서 박대인은 당시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음악계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의 예술가들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너무나도 과소평가 하여 왔던 것 같다. …(중략)… 한국은 사상, 음성, 감정, 형상, 색깔 및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풍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무사려(無思慮)한 모방과 서투른 수작 때문에 말살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는 자기 문화를 스스로 비하하고 과소평가 하면서 오로지 서양의 음악적 형식을 모방하여 자기도 서양인과 같은 예술가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비주체적인 한국 음악인들을 \'나도밤나무\' 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지금은 - (중략) - 자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 낼 때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나도밤나무’와 같은 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참된 밤나무’가 되었음을 굳게 인식할 때이다. - (중략) - 이제부터 우리는‘나도밤나무\'가 되기를 그만두고 열매를 맺는‘참된 밤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밤나무는 외견상으로는 밤나무와 비슷하나‘밤’이 열리지 않는다. 여름에 황백색의 꽃이 피고 가을에는‘밤’대신에 둥글고 붉은 열매가 열린다. 이러한 충고는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을 되찾은 해방 이후 5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우리들에게 한 외국인의 이런 오래된 지적이 가슴깊이 다가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왜곡된 문화사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없다면, 이러한 지적이 또 다른 반세기동안 여전히 유효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편견이 지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마치‘보편적인 시각’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그것은 편견일 뿐이다.
그러나 동도동기론 서도서기론은 한 문화에 대한‘정당한 문화 읽기’이고, 현대의 해석철학자 가다머가 이야기하는‘정당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너무나 깊숙하게 물들어 있어서‘서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반면에, \'동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는 전적으로 반대되는‘비과학적, 미신적, 비합리적, 신비적, 비논리적, 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러한 동서양에 대한 인식론적 이분법이자 언설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이다.
사실 이런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차별적 사고 방식은 오늘날 제도교육, 지식인의 글쓰기, 메스컴과 광고를 통한‘기호 가치’의 \'수동적 소비’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시각 문화의 종속성은 이런 거대한 흐름의 단편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필자가 중국에 있으면서 보는, 노랗게 염색한 머리, 한뼘 높이의 구두굽, 알 수 없는 영어투성이의 티셔츠 등 서구지향적인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매일반이다.
1969년《예술계》창간호에서 박대인은 당시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음악계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의 예술가들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너무나도 과소평가 하여 왔던 것 같다. …(중략)… 한국은 사상, 음성, 감정, 형상, 색깔 및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풍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무사려(無思慮)한 모방과 서투른 수작 때문에 말살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는 자기 문화를 스스로 비하하고 과소평가 하면서 오로지 서양의 음악적 형식을 모방하여 자기도 서양인과 같은 예술가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비주체적인 한국 음악인들을 \'나도밤나무\' 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지금은 - (중략) - 자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작품을 창작해 낼 때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나도밤나무’와 같은 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참된 밤나무’가 되었음을 굳게 인식할 때이다. - (중략) - 이제부터 우리는‘나도밤나무\'가 되기를 그만두고 열매를 맺는‘참된 밤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밤나무는 외견상으로는 밤나무와 비슷하나‘밤’이 열리지 않는다. 여름에 황백색의 꽃이 피고 가을에는‘밤’대신에 둥글고 붉은 열매가 열린다. 이러한 충고는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을 되찾은 해방 이후 50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우리들에게 한 외국인의 이런 오래된 지적이 가슴깊이 다가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왜곡된 문화사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없다면, 이러한 지적이 또 다른 반세기동안 여전히 유효할지도 모른다.
키워드
추천자료
 m버터플라이
m버터플라이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여성 고백체의 근대적 의미― 나혜석의 <고백>에 나타난 모성과 성욕
여성 고백체의 근대적 의미― 나혜석의 <고백>에 나타난 모성과 성욕 스크린 쿼터에 대하여...
스크린 쿼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의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의미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1920년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1920년대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를 읽고나서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를 읽고나서 [무역거래]한방화장품에 관한 보고서
[무역거래]한방화장품에 관한 보고서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 잭 웨더포드/사계절 2005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 잭 웨더포드/사계절 2005 영화 마지막 황제를 이용한 수업 활용 전략
영화 마지막 황제를 이용한 수업 활용 전략 만화 “궁”과 드라마 “궁”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만화 “궁”과 드라마 “궁”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개신교][구원론][예정설][神(신)개념][정치사회적 태도][부흥운동][자원봉사활동]개신교 수...
[개신교][구원론][예정설][神(신)개념][정치사회적 태도][부흥운동][자원봉사활동]개신교 수... [탈식민][탈식민지개혁][탈식민성][사회과학][문헌정보학][여성학][식민지][탈식민 정체성]탈...
[탈식민][탈식민지개혁][탈식민성][사회과학][문헌정보학][여성학][식민지][탈식민 정체성]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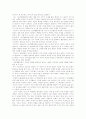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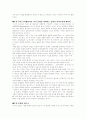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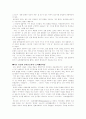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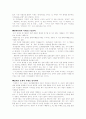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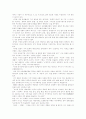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