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농민전쟁
1. 봉건체제 파탄과 농민층의 몰락
2. 제국주의 침탈과 상품경제 침탈
3.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4.정치, 사상적
Ⅱ. 한말의 지주제
1. 한말의 지주제
2. 고부(高阜) 김씨가의 지주경영과 자본전환
Ⅲ. 1862년 전남 지방의 농민 봉기
Ⅳ. 전남지방의 농민봉기 (1894)
가. 나주진관 (영광, 함평, 장성, 나주, 무안, 광주)
나. 순천 진관 (동부)
다. 장흥 (장흥, 강진)
1. 봉건체제 파탄과 농민층의 몰락
2. 제국주의 침탈과 상품경제 침탈
3.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4.정치, 사상적
Ⅱ. 한말의 지주제
1. 한말의 지주제
2. 고부(高阜) 김씨가의 지주경영과 자본전환
Ⅲ. 1862년 전남 지방의 농민 봉기
Ⅳ. 전남지방의 농민봉기 (1894)
가. 나주진관 (영광, 함평, 장성, 나주, 무안, 광주)
나. 순천 진관 (동부)
다. 장흥 (장흥, 강진)
본문내용
활발한 군세강화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장흥 연합 농민군은 12월 1일부터 10일가지는 피죽지세로 빛나는 승리를 거두며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강진병영을 점령하게 된다. 그 과정을 벽사역, 장령성전투, 강진현 병영전투, 석대들전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벽사역 장령성 전투〉금구, 원평, 나주, 남평, 화순, 능주, 본성, 등지의 농민군까지 합세한 장흥의 농민군은 12월 1일 사창에 집결하여 3일에는 벽사역과 장흥 인근까지 진출한다. 이들은 장흥 출신의 이방언, 이인환, 구교철, 이사경등과 금구의 김방서, 화순의 김수근, 능주의 조종순 등이 이끄는 1만명 이상의 대병력으로 장흥부와 벽사역을 사면에서 포위하자 벽사역을 중심으로 농민군을 체포, 처형하는 하는데 주력했던 벽사역 및 장흥부의 수성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수성군은 벽사역으로부터 장흥, 부안으로 철수하였으며 벽사역으로부터 철수하였으며 벽사역 찰방 김일월은 병영으로 가서 병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사는 농민군이 가까이 있으니 수군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초토영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는사이 농민군들은 12월 4일 아침 8시경 텅 빈 벽사역을 점령하고 각 공해와 역졸들이 살던 민가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농민군이 벽사역을 먼저 점령한 데에는 고부군민을 마구 학살하여 원한의 표적이 된 벽사역졸에 대한 응지의 뜻도 있었다.
12월 5일 농민군은 장령성 주위를 에워싸고 총공격을 떨쳤다. 장령성은 주변산을 이용하여 쌓은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으로서 동쪽만이 평지이고 그 외 3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남쪽으로는 탐진천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였다. 부사 박헌양은 이러한 장령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농민군측이 공격을 방어해보고자 했지만 5일 새벽, 북군을 공격해오는 주력부대와 남문,동문으로 진격해들어오는 나머지 농민군들에 의해 함학되었다. 박헌양 이하 수성장졸은 이렇다할 저항도 못한채 죽음을 당하였다.
〈강진현, 병영전투〉 장령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온 농민군은 강진 병영과 40리 거리의 장흥사창 장터를 향하여 달렸다. 장흥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병영을 공격하려는 작전이었다. 장흥의 농민군은 6일 오전 10시께 벽사역 뒤 언덕으로 진을 옮기고 오후 2시께에는 장흥과 강진의 경계면 사인점 들찬에 집결하였다. 이방언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공략하기 쉬운 강진현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12월 7일 오전 8시쯤, 사인정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은 강진형을 들이쳤다. 현감 이규하는 나주에 구원을 요청하러 간다는 핑게로 달아났다. 김한섭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은 대항하려 하였지만 농민군의 포위 공격으로 동문과 남문이 먼저 부서짐으로써 성은 함락되었다. 농민군은 무인지경인 강진현을 불태우고 농민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수성군들을 모두 잡아죽임으로써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해온 한을 일시적으로나마 풀었다. 농민군은 강진현을 함락시킨 여세를 몰아 강진, 장흥 양방면에서 강진 벼영을 압박해 들어갔다. 당시 병사 서병무는 도망가고 없었고 병영에는 감관 김두홉, 전도정, 박창현 등이 버티고 있었으나 출격할 엄두마저 내지 못하고 다만 성의 사면에 목책을 둘러치고 있을 뿐이었다. 10일 새벽 2시쯤 농민군은 네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해 병영 맞은 편 세 봉우리를 점령하고 일제히 포를 쏘아댔다. 수만의 농민군이 목책에 불을 지르며 기어오르고, 병사가 피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병영군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양쪽 다 상당한 희생을 치른 후 병영마저도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왔다.
한편 병영의 농민군의 수중에 함락되던 10월, 나주에 머물던 일본군은 三路로 나누어 장흥방향으로 급히 내려오고 있었으며 이두황군은 순천으로부터 이규태군은 영암방향으로부터 병영 함락 소식을 접하고 급히 장흥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장흥 동학 농민군의 최후 전투〉석대들 전투--병영마저 점령해 버린 농민군은 영암으로 진출하려던 당초 진로를 바꾸어 다시 장흥으로 돌아왔다. 영암에는 이미 경군이 남하하여 전라도 서남부 지방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일 장흥으로 돌아와 남문 밖과 건산 모정드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그날 밤과 13일 새벽 동위영병과 일병으로 이루어진 30명의 토벌군 선발대와 1차 접전을 하여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그러나 토벌군의 신식 무기의 위력에 밀려 퇴각했던 농민군은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다시 재집결하여 수만의 군세를 이루면서 장흥부를 재차 포위하였다. 그러나 15일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장흥읍에 도착하여 좌선봉 이규태의 통위영군과 합세함으로써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농민군은 용산, 웅치, 부산(夫山) 세 방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통위영군은 북쪽 주봉의 농민군을 막고 교도중대와 일본군은 성모서리 대밭에 숨어 있으면서 20,30명의 민병을 보내 농민군을 석대들로 유인케 하였다. 고읍(古邑)쪽으로부터 넘어온 농민군은 자울재를 넘어 석대들판을 가득 메우며 장흥부쪽으로 진출해 왔다. 기껏해야 20, 30미터밖에 나가지 않으며 심지에 부릉鱁 붙여 발사하는 조총과 죽창이나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믿고 신무기로 무장한 경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수 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자울재 너머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울재를 넘어 퇴각한 농민군 4-5천명은 17일에 또 다시 옥산리(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여기서 다시 농민군 100여명이 포살되고 20여명이 생포되었으며 생포자 중 10여명만이 풀려나고 나머지 농민군 역시 포살되었다. 이리하여 장흥 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농민군의 조직적 항전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혹은 인근의 천관산으로 혹은 강진의 대구,칠량 방향으로,혹은 보성쪽 회령 방향으로 혹은 회진 등 남쪽 바닷가쪽으로 숨어들었다가 배를 타고 숨어들기도 하였다. 일본군과 합세한 경군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며 농민군에 가담한 농민들을 색출하였고 매일 수십명씩 잡아다 장흥 將臺와 벽사역 뒤 저수지뚝 등에서 포살하였다.
〈벽사역 장령성 전투〉금구, 원평, 나주, 남평, 화순, 능주, 본성, 등지의 농민군까지 합세한 장흥의 농민군은 12월 1일 사창에 집결하여 3일에는 벽사역과 장흥 인근까지 진출한다. 이들은 장흥 출신의 이방언, 이인환, 구교철, 이사경등과 금구의 김방서, 화순의 김수근, 능주의 조종순 등이 이끄는 1만명 이상의 대병력으로 장흥부와 벽사역을 사면에서 포위하자 벽사역을 중심으로 농민군을 체포, 처형하는 하는데 주력했던 벽사역 및 장흥부의 수성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수성군은 벽사역으로부터 장흥, 부안으로 철수하였으며 벽사역으로부터 철수하였으며 벽사역 찰방 김일월은 병영으로 가서 병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사는 농민군이 가까이 있으니 수군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초토영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는사이 농민군들은 12월 4일 아침 8시경 텅 빈 벽사역을 점령하고 각 공해와 역졸들이 살던 민가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농민군이 벽사역을 먼저 점령한 데에는 고부군민을 마구 학살하여 원한의 표적이 된 벽사역졸에 대한 응지의 뜻도 있었다.
12월 5일 농민군은 장령성 주위를 에워싸고 총공격을 떨쳤다. 장령성은 주변산을 이용하여 쌓은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으로서 동쪽만이 평지이고 그 외 3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남쪽으로는 탐진천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였다. 부사 박헌양은 이러한 장령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농민군측이 공격을 방어해보고자 했지만 5일 새벽, 북군을 공격해오는 주력부대와 남문,동문으로 진격해들어오는 나머지 농민군들에 의해 함학되었다. 박헌양 이하 수성장졸은 이렇다할 저항도 못한채 죽음을 당하였다.
〈강진현, 병영전투〉 장령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온 농민군은 강진 병영과 40리 거리의 장흥사창 장터를 향하여 달렸다. 장흥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병영을 공격하려는 작전이었다. 장흥의 농민군은 6일 오전 10시께 벽사역 뒤 언덕으로 진을 옮기고 오후 2시께에는 장흥과 강진의 경계면 사인점 들찬에 집결하였다. 이방언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공략하기 쉬운 강진현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12월 7일 오전 8시쯤, 사인정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은 강진형을 들이쳤다. 현감 이규하는 나주에 구원을 요청하러 간다는 핑게로 달아났다. 김한섭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은 대항하려 하였지만 농민군의 포위 공격으로 동문과 남문이 먼저 부서짐으로써 성은 함락되었다. 농민군은 무인지경인 강진현을 불태우고 농민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수성군들을 모두 잡아죽임으로써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해온 한을 일시적으로나마 풀었다. 농민군은 강진현을 함락시킨 여세를 몰아 강진, 장흥 양방면에서 강진 벼영을 압박해 들어갔다. 당시 병사 서병무는 도망가고 없었고 병영에는 감관 김두홉, 전도정, 박창현 등이 버티고 있었으나 출격할 엄두마저 내지 못하고 다만 성의 사면에 목책을 둘러치고 있을 뿐이었다. 10일 새벽 2시쯤 농민군은 네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해 병영 맞은 편 세 봉우리를 점령하고 일제히 포를 쏘아댔다. 수만의 농민군이 목책에 불을 지르며 기어오르고, 병사가 피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병영군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양쪽 다 상당한 희생을 치른 후 병영마저도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왔다.
한편 병영의 농민군의 수중에 함락되던 10월, 나주에 머물던 일본군은 三路로 나누어 장흥방향으로 급히 내려오고 있었으며 이두황군은 순천으로부터 이규태군은 영암방향으로부터 병영 함락 소식을 접하고 급히 장흥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장흥 동학 농민군의 최후 전투〉석대들 전투--병영마저 점령해 버린 농민군은 영암으로 진출하려던 당초 진로를 바꾸어 다시 장흥으로 돌아왔다. 영암에는 이미 경군이 남하하여 전라도 서남부 지방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일 장흥으로 돌아와 남문 밖과 건산 모정드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그날 밤과 13일 새벽 동위영병과 일병으로 이루어진 30명의 토벌군 선발대와 1차 접전을 하여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그러나 토벌군의 신식 무기의 위력에 밀려 퇴각했던 농민군은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다시 재집결하여 수만의 군세를 이루면서 장흥부를 재차 포위하였다. 그러나 15일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장흥읍에 도착하여 좌선봉 이규태의 통위영군과 합세함으로써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농민군은 용산, 웅치, 부산(夫山) 세 방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통위영군은 북쪽 주봉의 농민군을 막고 교도중대와 일본군은 성모서리 대밭에 숨어 있으면서 20,30명의 민병을 보내 농민군을 석대들로 유인케 하였다. 고읍(古邑)쪽으로부터 넘어온 농민군은 자울재를 넘어 석대들판을 가득 메우며 장흥부쪽으로 진출해 왔다. 기껏해야 20, 30미터밖에 나가지 않으며 심지에 부릉鱁 붙여 발사하는 조총과 죽창이나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믿고 신무기로 무장한 경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수 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자울재 너머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울재를 넘어 퇴각한 농민군 4-5천명은 17일에 또 다시 옥산리(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여기서 다시 농민군 100여명이 포살되고 20여명이 생포되었으며 생포자 중 10여명만이 풀려나고 나머지 농민군 역시 포살되었다. 이리하여 장흥 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농민군의 조직적 항전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혹은 인근의 천관산으로 혹은 강진의 대구,칠량 방향으로,혹은 보성쪽 회령 방향으로 혹은 회진 등 남쪽 바닷가쪽으로 숨어들었다가 배를 타고 숨어들기도 하였다. 일본군과 합세한 경군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며 농민군에 가담한 농민들을 색출하였고 매일 수십명씩 잡아다 장흥 將臺와 벽사역 뒤 저수지뚝 등에서 포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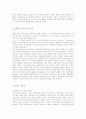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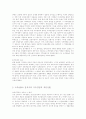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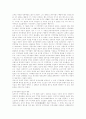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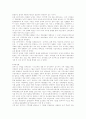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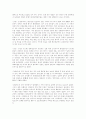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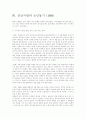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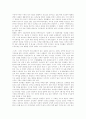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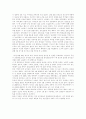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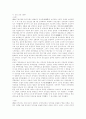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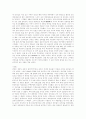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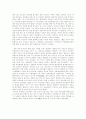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