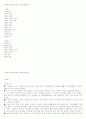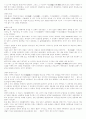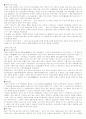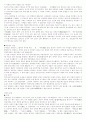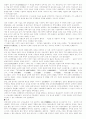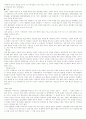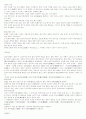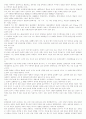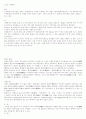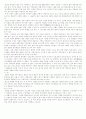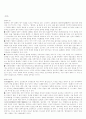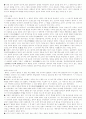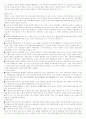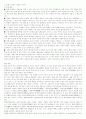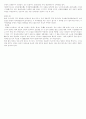목차
<신라>
신라의 왕
신라의 명칭
신라의 성립
신라의 발전과 전개
신라의 사회, 경제
신라의 문화
신라의 멸망
신라의 성곽
통일신라의 성곽
신라고분
신라의 불교
신라의 탑
<발해>
발해의 왕
발해의 명칭
발해의 성립
발해의 발전과 전개
발해의 문화
발해 고분
발해의 탑
신라의 왕
신라의 명칭
신라의 성립
신라의 발전과 전개
신라의 사회, 경제
신라의 문화
신라의 멸망
신라의 성곽
통일신라의 성곽
신라고분
신라의 불교
신라의 탑
<발해>
발해의 왕
발해의 명칭
발해의 성립
발해의 발전과 전개
발해의 문화
발해 고분
발해의 탑
본문내용
많이 뚫리고 형태도 다양한 허리띠 장식, 독특한 기와 문양 등에서도 발해 고유의 창조적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상 발해문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문화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적 요소도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해주에서 발굴된 유물의 경우이다. 연해주는 현재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과거에는 발해 영토의 일부분이었다. 따라서 연해주에서도 발해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곤 한다. 그 중에는 독특한 장식의 도기, 소그드 화폐, 경교 십자가 등도 있는데, 러시아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에서 전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발해 문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기에는 고구려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 후 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더욱 다양한 요소를 띄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없을 수 없었다. 과거 고구려 영역이었던 함경도 등지에서는 고구려전통이 많이 남아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았던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에서는 고구려 외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우리는 흔히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단순하게 계승한 것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러나 발해 문화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주변 및 토착 지역의 여러 문화를 발해인들이 혼합하여 만든 창조적 양식인 것이다. 발해 문화가 당나라 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중국 측의 입장을 우리는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해 문화가 그저 고구려의 것을 계승하였다고만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일 것이다. 발해인의 입장에서 발해 자체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발해 고분
발해 고분은 모두 남북향의 봉토묘로, 묘도나 묘문이 남쪽으로 나 있다. 묘실은 절대 다수가 단실이고(단지 1기만이 쌍실이다), 그 결구(結構)는 전실, 석실(石室), 토광(土壙)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석실묘가 발해 고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석실묘는 길림, 연변, 통화(通化) 등의 지역에 있는 고대 고분 중에서 모두 발견된다.
발해의 석실묘와 고대 고분의 형태는 서로 관계를 가지며, 더욱이 고구려 후기의 봉토 석실묘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발해 전기의 고분으로 대표적인 육정산 묘군 중에서, 정혜 공주 묘를 포함하는 왕실 귀족 묘는 집안 고구려 후기의 석실 봉토 묘와 그 결구상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여, 고구려의 고분 형식의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중·후기에는 당의 중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왕실 귀족의 고분도 당의 전실묘의 축조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전벽석정의 결구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형 묘는 여전히 석실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의 중원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왕실 귀족 등 상층 계급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발해고분은 축조의 재료와 규모로 볼 때 돌방무덤[石室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널무덤[石棺墓]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밖에도 널무덤[土壙墓] ·벽돌무덤[塼築墓] 등도 있다. 돌방무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돈화현 육정산고분에서 발견된 정혜공주(貞惠公主)무덤과 삼령둔고분군에서 발견된 삼령고분을 들 수 있다. 특히 1949년에 발견된 정혜공주무덤은 천장이 말각천정(抹角天井)의 구조인데, 이것은 고구려 후기의 큰 봉토돌방무덤[封土石室墓]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정혜공주묘비가 발견됨으로써 육정산고분군이 발해 초기의 왕실무덤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돌덧널무덤으로는 육정산고분군의 12호 ·103호 ·104호 ·203호 고분과 대주둔의 작은 고분들, 두도하자 2호분 등이다. 이들 고분들은 모두 무덤안길[甬道]이 없고 관 1개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한편 화룡현 용두산(龍頭山) 고분군에서 발견된 정효공주(貞孝公主)무덤은 벽돌무덤으로서 축조재료나 그 안에 그려진 벽화양식으로 보아 당(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벽화는 회화사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체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은 왕족 등을 비롯한 비교적 높은 신분층이 사용한 무덤양식이고, 돌덧널무덤은 그보다 하위의 신분층이나 관리들이 쓰던 것들이다. 일반인들은 주로 돌널무덤이나 널무덤을 썼다.
매장방식으로는 단인장(單人葬), 부부합장(夫婦合葬),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묻는 다인장(多人葬), 화장(火葬), 이차장(二次葬) 등이 있다. 발해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도기류가 주류를 이루며, 하남둔(河南屯) 성터 안에서 발견된 하남둔 고분군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각종 장식품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발해의 탑
발해 시대 탑의 경우 영광탑이 완벽하게 남아 있다.이 외에 정효공주 무덤 위에 탑이 존재했으며,192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훈춘의 마적달탑입니다.안타깝게도 이 마적달탑을 찍은 사진이 없기에 그 형태를 알 수 없다.어떤 학자는 이 마적달탑을 문왕의 아들인 대굉림을 위해 건설한 탑이 아닐까 추측하기도한다.
영광탑
. 평면은 4각형이다. 1층 4면 각각에는 왕(王), 립(立), 국(國), 토(土)라는 글자 모양의 벽돌 문양이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불교는 발해 왕실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탑을 보수할 때에 지하에 지궁(地宮)이라고 하는 무덤 칸이 확인되었다.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무덤에는 간단한 벽화를 그리고 사리함이 안치되어 있었다. 이 탑은 이미 청나라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1908년 장봉대라는 사람이 이 탑을 공자를 모신 노나라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풍상에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기록하여 영광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발해 정효공주 무덤 탑이나 마적달 탑 등과 비교된 뒤 1980년대에 와서야 발해시대의 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해 탑의 특징은 무덤 위에 있다는 것이니다. 지궁이라는 무덤칸이 있는데 이것은 발해의 독특한 형태이다. 그리고 전탑 위주다. 한반도 남부가 화강암을 사용한 석탑 위주에 반해서 발해는 전탑 중심이었는데, 이것은 환경의 영향이 라고 샌각되어진다.r
이상 발해문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문화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적 요소도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해주에서 발굴된 유물의 경우이다. 연해주는 현재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과거에는 발해 영토의 일부분이었다. 따라서 연해주에서도 발해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곤 한다. 그 중에는 독특한 장식의 도기, 소그드 화폐, 경교 십자가 등도 있는데, 러시아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에서 전래되었다고 주장한다.
발해 문화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기에는 고구려 문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 후 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더욱 다양한 요소를 띄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없을 수 없었다. 과거 고구려 영역이었던 함경도 등지에서는 고구려전통이 많이 남아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았던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에서는 고구려 외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우리는 흔히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단순하게 계승한 것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러나 발해 문화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주변 및 토착 지역의 여러 문화를 발해인들이 혼합하여 만든 창조적 양식인 것이다. 발해 문화가 당나라 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중국 측의 입장을 우리는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해 문화가 그저 고구려의 것을 계승하였다고만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일 것이다. 발해인의 입장에서 발해 자체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발해 고분
발해 고분은 모두 남북향의 봉토묘로, 묘도나 묘문이 남쪽으로 나 있다. 묘실은 절대 다수가 단실이고(단지 1기만이 쌍실이다), 그 결구(結構)는 전실, 석실(石室), 토광(土壙)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석실묘가 발해 고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석실묘는 길림, 연변, 통화(通化) 등의 지역에 있는 고대 고분 중에서 모두 발견된다.
발해의 석실묘와 고대 고분의 형태는 서로 관계를 가지며, 더욱이 고구려 후기의 봉토 석실묘와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발해 전기의 고분으로 대표적인 육정산 묘군 중에서, 정혜 공주 묘를 포함하는 왕실 귀족 묘는 집안 고구려 후기의 석실 봉토 묘와 그 결구상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여, 고구려의 고분 형식의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중·후기에는 당의 중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왕실 귀족의 고분도 당의 전실묘의 축조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전벽석정의 결구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형 묘는 여전히 석실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의 중원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왕실 귀족 등 상층 계급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발해고분은 축조의 재료와 규모로 볼 때 돌방무덤[石室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널무덤[石棺墓]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밖에도 널무덤[土壙墓] ·벽돌무덤[塼築墓] 등도 있다. 돌방무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돈화현 육정산고분에서 발견된 정혜공주(貞惠公主)무덤과 삼령둔고분군에서 발견된 삼령고분을 들 수 있다. 특히 1949년에 발견된 정혜공주무덤은 천장이 말각천정(抹角天井)의 구조인데, 이것은 고구려 후기의 큰 봉토돌방무덤[封土石室墓]의 구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정혜공주묘비가 발견됨으로써 육정산고분군이 발해 초기의 왕실무덤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돌덧널무덤으로는 육정산고분군의 12호 ·103호 ·104호 ·203호 고분과 대주둔의 작은 고분들, 두도하자 2호분 등이다. 이들 고분들은 모두 무덤안길[甬道]이 없고 관 1개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한편 화룡현 용두산(龍頭山) 고분군에서 발견된 정효공주(貞孝公主)무덤은 벽돌무덤으로서 축조재료나 그 안에 그려진 벽화양식으로 보아 당(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벽화는 회화사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대체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은 왕족 등을 비롯한 비교적 높은 신분층이 사용한 무덤양식이고, 돌덧널무덤은 그보다 하위의 신분층이나 관리들이 쓰던 것들이다. 일반인들은 주로 돌널무덤이나 널무덤을 썼다.
매장방식으로는 단인장(單人葬), 부부합장(夫婦合葬),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묻는 다인장(多人葬), 화장(火葬), 이차장(二次葬) 등이 있다. 발해고분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도기류가 주류를 이루며, 하남둔(河南屯) 성터 안에서 발견된 하남둔 고분군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각종 장식품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발해의 탑
발해 시대 탑의 경우 영광탑이 완벽하게 남아 있다.이 외에 정효공주 무덤 위에 탑이 존재했으며,192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훈춘의 마적달탑입니다.안타깝게도 이 마적달탑을 찍은 사진이 없기에 그 형태를 알 수 없다.어떤 학자는 이 마적달탑을 문왕의 아들인 대굉림을 위해 건설한 탑이 아닐까 추측하기도한다.
영광탑
. 평면은 4각형이다. 1층 4면 각각에는 왕(王), 립(立), 국(國), 토(土)라는 글자 모양의 벽돌 문양이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불교는 발해 왕실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탑을 보수할 때에 지하에 지궁(地宮)이라고 하는 무덤 칸이 확인되었다.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무덤에는 간단한 벽화를 그리고 사리함이 안치되어 있었다. 이 탑은 이미 청나라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1908년 장봉대라는 사람이 이 탑을 공자를 모신 노나라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풍상에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기록하여 영광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발해 정효공주 무덤 탑이나 마적달 탑 등과 비교된 뒤 1980년대에 와서야 발해시대의 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해 탑의 특징은 무덤 위에 있다는 것이니다. 지궁이라는 무덤칸이 있는데 이것은 발해의 독특한 형태이다. 그리고 전탑 위주다. 한반도 남부가 화강암을 사용한 석탑 위주에 반해서 발해는 전탑 중심이었는데, 이것은 환경의 영향이 라고 샌각되어진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