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서양의 책
(1) 고대의 도서출판-그리스.로마시대
(2) 중세의 도서출판
(3) 활판 인쇄술의 발명
(4) 16세기의 도서출판
(5) 17세기의 도서출판
(6) 18세기의 도서출판
3. 동양의 책
(1) 중국의 책
(2) 우리나라의 책
가. 고려의 인쇄 문화
나. 조선 전기의 출판물
다. 조선 중기의 출판물
라. 조선 후기의 출판물
4. 결론
2. 서양의 책
(1) 고대의 도서출판-그리스.로마시대
(2) 중세의 도서출판
(3) 활판 인쇄술의 발명
(4) 16세기의 도서출판
(5) 17세기의 도서출판
(6) 18세기의 도서출판
3. 동양의 책
(1) 중국의 책
(2) 우리나라의 책
가. 고려의 인쇄 문화
나. 조선 전기의 출판물
다. 조선 중기의 출판물
라. 조선 후기의 출판물
4. 결론
본문내용
판문화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조선 중기의 출판물
임진왜란은 찬란히 이어 오던 우리 문화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외세의 침입이었다. 이때 우리 출판문화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책과 활자와 각판(刻板)들이 불타고 약탈당했다. 전쟁중에도 15세기에 만들어진 갑인자와 을해자의 활자에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함으로써 출판 인쇄가 이어졌으며 특히 전란 이후의 인쇄 문화 복구를 위해 훈련도감에서 훈련도감자로 서책을 출간한 것은 우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자아내게 한다.
숙종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란 이전과 같은 출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삼주갑인자에 의한 인본과 김석주가 삼주갑인자 주조에 공헌한 아버지 김좌명의 영향을 받아 한구에게 글씨체를 쓰게 하여 한구자체활자를 주조했다. 이 동활자는 왕의 명령이나 교서관(校書館) 혹은 주자소와 같은 관(官)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석주 사가(私家)에서 주조한 것이다. 이 활자로 <자치통감감목>을 처음 찍어 내고 숙종 5년(1679) 김석주는 자신이 편찬한 <행군수지>를 인출하여 숙종에게 바치고 뒤이어 조부 김육의 <잠곡집>, 외조(外祖) 신익성의 <낙전당집> 등의 문집과 <여문초><삼대시가집><고문상하편> 등을 찍어 냈다.
라. 조선 후기의 출판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방에서의 출판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숙종 26년(1700) 2월 강화도에서, 숙종 36년(1710) 무주와 임피현에서, 숙종 38년(1712)년에는 나주 등지에서 인서체자로 책을 찍어 냈으며, 숙종 43년(1717) 여름에는 교서관에 있던 실록자를 무고(武庫)인 군기사(軍器寺)로 옮겨가 병서(兵書)를 찍었다.
1700년대 말경 무성(武城)에서는 전이채, 박치유 두 사람이 민간 목판 인쇄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민간출판으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고문진보><사요취선><농가집성><사문유취> 등 여러 가지 책을 출간했다.
고종 20년(1883) 10월 정부기관인 박문국(博文局)에서 신식연활자로 <한성순보> 창간호를 발행했다. 1884년에는 광인사에서 연활자로서는 최초의 단행본이라 할 수 있는 <충효경집주합벽>과 곧 이어 <농정신편> 등의 책을 출판했다. 1885년 한문신문이었던 <한성순보>를 개제(改題)하여 <한성주보>를 발간했는데 이 신문은 최초의 국한문 혼용신문이다. 또한 단행본으로는 최초의 국한문 혼용으로 1886년 정병하가 편찬한 <농정촬요>가 최초의 책이 아닌가 한다. 1889년 9월에는 선교사 게일이 존 번안의 <천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목판에 각자를 한 후 한지에 인쇄하여 호화판으로 발간했는데 이 책은 국문으로 번역된 최초의 단행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출판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885년 간행된 지리서인 한글본 <사민필지>이다. 이 책은 지구를 비롯하여 유럽, 아세사 등 5대주 각국의 국정을 기술하고 따로 천문도, 지구도 등을 덧붙여 놓았는데 당시 지식인들의 필독서였으며 한문본도 별도로 발간했다.
4. 결 론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책의 변천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서양과 동양의 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비교 - 책의 재료나 형식, 구성, 내용 등 - 할 수는 없어서 아쉬움은 남지만 동서양의 책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망라해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동양은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책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책의 변천과정에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은 책이 그 시대, 그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왔으며 반대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염두에 두는 일이다. 이는 책의 변천을 사회적·문화적인 부분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책의 재료란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재료가 그 사회에서 책 - 고대의 파피루스에 쓰여진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 의 재료로 선택받게 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재료의 변천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텍스트인데 텍스트의 경우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 자체로 놓고만 생각해서는 책의 시대적 변천을 이해할 수 없다.
동서양 모두 책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쇄기술의 발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필사본에 비해 인쇄술은 이용한 책의 생산은 대량의 책을 똑같은 활자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의 급속한 보급과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서양의 책의 변천과정을 볼 때 특이한 점은 재료나 형식 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중세 이후의 대부분의 인쇄물은 양피지에다 하는 게 보통이었고, 책의 형태도 codex가 일반적이었지만 동양의 경우는 중국의 제지 기술의 발명으로 재료는 대부분 종이를 썼고, 또한 책의 형태도 volumen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인쇄 초창기부터 수백년간 종교 서적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양의 경우 성서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서적의 출판은 러쉬를 이루었고, 특히 성서를 여러 개의 언어로 동시 출판하는 등 성서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양에서 역시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불경의 편찬이 또한 국가적인 관심사였고 실제고 많은 불경들이 편찬되었다. 숭유억불 사상이 강조된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불경의 편찬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경전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인쇄술과 책의 발달은 종교 서적으로 시작되어 찬란하게 꽃피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책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그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이러한 책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 책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책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책의 변천은 역사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다. 조선 중기의 출판물
임진왜란은 찬란히 이어 오던 우리 문화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외세의 침입이었다. 이때 우리 출판문화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책과 활자와 각판(刻板)들이 불타고 약탈당했다. 전쟁중에도 15세기에 만들어진 갑인자와 을해자의 활자에 목활자를 만들어 보충함으로써 출판 인쇄가 이어졌으며 특히 전란 이후의 인쇄 문화 복구를 위해 훈련도감에서 훈련도감자로 서책을 출간한 것은 우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자아내게 한다.
숙종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란 이전과 같은 출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삼주갑인자에 의한 인본과 김석주가 삼주갑인자 주조에 공헌한 아버지 김좌명의 영향을 받아 한구에게 글씨체를 쓰게 하여 한구자체활자를 주조했다. 이 동활자는 왕의 명령이나 교서관(校書館) 혹은 주자소와 같은 관(官)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석주 사가(私家)에서 주조한 것이다. 이 활자로 <자치통감감목>을 처음 찍어 내고 숙종 5년(1679) 김석주는 자신이 편찬한 <행군수지>를 인출하여 숙종에게 바치고 뒤이어 조부 김육의 <잠곡집>, 외조(外祖) 신익성의 <낙전당집> 등의 문집과 <여문초><삼대시가집><고문상하편> 등을 찍어 냈다.
라. 조선 후기의 출판물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방에서의 출판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숙종 26년(1700) 2월 강화도에서, 숙종 36년(1710) 무주와 임피현에서, 숙종 38년(1712)년에는 나주 등지에서 인서체자로 책을 찍어 냈으며, 숙종 43년(1717) 여름에는 교서관에 있던 실록자를 무고(武庫)인 군기사(軍器寺)로 옮겨가 병서(兵書)를 찍었다.
1700년대 말경 무성(武城)에서는 전이채, 박치유 두 사람이 민간 목판 인쇄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민간출판으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고문진보><사요취선><농가집성><사문유취> 등 여러 가지 책을 출간했다.
고종 20년(1883) 10월 정부기관인 박문국(博文局)에서 신식연활자로 <한성순보> 창간호를 발행했다. 1884년에는 광인사에서 연활자로서는 최초의 단행본이라 할 수 있는 <충효경집주합벽>과 곧 이어 <농정신편> 등의 책을 출판했다. 1885년 한문신문이었던 <한성순보>를 개제(改題)하여 <한성주보>를 발간했는데 이 신문은 최초의 국한문 혼용신문이다. 또한 단행본으로는 최초의 국한문 혼용으로 1886년 정병하가 편찬한 <농정촬요>가 최초의 책이 아닌가 한다. 1889년 9월에는 선교사 게일이 존 번안의 <천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목판에 각자를 한 후 한지에 인쇄하여 호화판으로 발간했는데 이 책은 국문으로 번역된 최초의 단행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시기의 출판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885년 간행된 지리서인 한글본 <사민필지>이다. 이 책은 지구를 비롯하여 유럽, 아세사 등 5대주 각국의 국정을 기술하고 따로 천문도, 지구도 등을 덧붙여 놓았는데 당시 지식인들의 필독서였으며 한문본도 별도로 발간했다.
4. 결 론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책의 변천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서양과 동양의 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비교 - 책의 재료나 형식, 구성, 내용 등 - 할 수는 없어서 아쉬움은 남지만 동서양의 책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망라해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동양은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책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책의 변천과정에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은 책이 그 시대, 그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왔으며 반대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염두에 두는 일이다. 이는 책의 변천을 사회적·문화적인 부분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책의 재료란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재료가 그 사회에서 책 - 고대의 파피루스에 쓰여진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 의 재료로 선택받게 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재료의 변천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텍스트인데 텍스트의 경우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 자체로 놓고만 생각해서는 책의 시대적 변천을 이해할 수 없다.
동서양 모두 책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쇄기술의 발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필사본에 비해 인쇄술은 이용한 책의 생산은 대량의 책을 똑같은 활자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의 급속한 보급과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서양의 책의 변천과정을 볼 때 특이한 점은 재료나 형식 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공통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중세 이후의 대부분의 인쇄물은 양피지에다 하는 게 보통이었고, 책의 형태도 codex가 일반적이었지만 동양의 경우는 중국의 제지 기술의 발명으로 재료는 대부분 종이를 썼고, 또한 책의 형태도 volumen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인쇄 초창기부터 수백년간 종교 서적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양의 경우 성서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서적의 출판은 러쉬를 이루었고, 특히 성서를 여러 개의 언어로 동시 출판하는 등 성서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양에서 역시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불경의 편찬이 또한 국가적인 관심사였고 실제고 많은 불경들이 편찬되었다. 숭유억불 사상이 강조된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불경의 편찬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경전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인쇄술과 책의 발달은 종교 서적으로 시작되어 찬란하게 꽃피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책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그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이러한 책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 책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책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책의 변천은 역사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추천자료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을 읽고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을 읽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월인석보해설
월인석보해설 『초가집에서 지구촌으로』를 읽고
『초가집에서 지구촌으로』를 읽고 고대 그리스의 도서관(페르가몬 도서관)
고대 그리스의 도서관(페르가몬 도서관) 제가 블루오션 전략을 읽고
제가 블루오션 전략을 읽고 서구복지발달과 우리나라 복지발달에 관해 비교분석
서구복지발달과 우리나라 복지발달에 관해 비교분석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2013년 2학기 일본대중문화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일본 대중문화에 관해 분석한 전공서적)
2013년 2학기 일본대중문화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일본 대중문화에 관해 분석한 전공서적)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 독후감 감상문 서평 필립 구든
세계사를 품은 영어 이야기 독후감 감상문 서평 필립 구든 사회계약론 줄거리 및 감상
사회계약론 줄거리 및 감상 (한국복식문화) 상대시대와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쓰인 남자의 두식과 관모에 대하여 설명하...
(한국복식문화) 상대시대와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쓰인 남자의 두식과 관모에 대하여 설명하... [독후감] 음식의 제국: 음식은 어떻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배해왔는가 (제목 : 인간의 탐욕...
[독후감] 음식의 제국: 음식은 어떻게 문명의 흥망성쇠를 지배해왔는가 (제목 : 인간의 탐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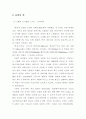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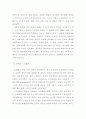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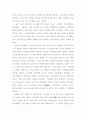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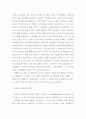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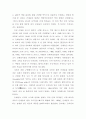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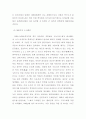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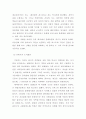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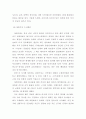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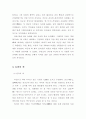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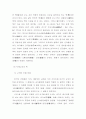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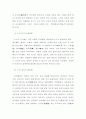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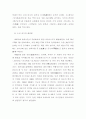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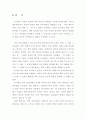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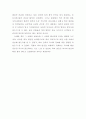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