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이저의 독서행위 이론
3. 심미적 이해와 치료적 전략
4. 치료적 관점에서의 문학해석
5. 마치는 말
2. 이저의 독서행위 이론
3. 심미적 이해와 치료적 전략
4. 치료적 관점에서의 문학해석
5. 마치는 말
본문내용
Wolfgang von Goethe,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Bd. VI), Munchen 1981, S. 9.
이 심정토로에는 자연관찰과 자연과의 합일된 감정이 뒤섞여 그려지고 있다. 시선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회상은 신이 만든 자연에 대한 경험과 연결되면서 극도의 흥분에 달한다. 이런 감정은 \'감상주의\'의 대가다운 만연체의 리듬으로 표현되면서(\"...하면 ...하면 ....하면, 그러면 ...한다\") 행복한 기분과 불행한 기분이 교차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문학에서 자연관찰을 이처럼 철저하게 묘사하는 곳도 많지 않다. 감정이입, 피부로 느껴지는 자연의 모습, 자연의 무한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일시와 신적인 것으로의 승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더 나아가 좀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행복감은 잡을 수 없고 경험하는 자의 한계 속에서 깨져버린다는 점이다. \"...하면\"이라는 문장의 긴 호흡이 재빨리 \"나는 그것으로 인해 파멸하고 있다네. 이러한 현상들이 내뿜는 황홀한 마력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을 뿐이라네\"로 끝난다. 이러한 파멸은 전적인 자아 상실,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해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베르테르가 결국 상심하고 자살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무한함, 즉 신적인 힘과 만물의 관련성과 조화 자체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베르테르는 흥미롭게도 그러한 경험을 \'참아내는\' 근본적인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경험한 것을 현재에 재현할 수 있는 예술가처럼 베르테르가 행동할 수 있었다면 무한성의 경험이 자아해체라는 그런 끔찍한 결말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적 투영에서 하나의 자기표현이 나온다면 예술작품은 \"네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네 영혼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런 예술성은 개개인이 어떤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자신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글을 쓴 괴테는 죽음을 맞지 않는데 비해 베르테르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고 만다. 베르테르를 죽이고 괴테는 산 것이다. 즉, 문학치료는 어쩌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는,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경험을 재현하고 있으면서 낯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죽음과는 낯설게 된다는 논리가 너무 비약적일까.
5. 마치는 말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은 우선 독서행위의 이론과 치료적 전략이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독서심리학이 단순한 심리주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규명해 보았다. 그 이유는 심리가 부정적으로 체현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독서심리학의 메커니즘도 아니고 또 치료학에서 말하는 동류요법도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동질성과 이질성)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이브한 독자나 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심미적 텍스트는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저는 이런 의미에서 독서가 치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단적 방법이나 치료에 있어서 상담자나 문예학자가 개입함으로써 문학은 원활히 읽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치료에서 뿐 아니라 독서심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료든 교양이든 결국은 자신(원초적 나르시시즘, 원초적 상흔, 고착)을 버리고 타자(이해, 사회화, 개방성)에로 나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작가/독자가 \'선택\'과 \'조합\'을 통해 세상을 재단한다는 이저의 주장은 곧 고착에 빠진, 오인의 구조를 갖고 있는 독자/환자의 인식과 정서를 동질적인 데서 벗어나 이질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동질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치료적 전략과 유사하다. 이것을 이저는 한마디로 \"동질적이 아닌 것이 영향의 조건이며, 이 조건이 독자에게서 텍스트의 의미구조로 실현된다 Das Nicht-Identische ist die Bedingung der Wirkung, die sich im Leser als die Sinnkonstitution des Textes realisiert\"
) Iser, a.a.O., S. 75.
고 표현한다. 이질적인 것에서 빈자리가 드러나고 그 빈자리를 곧 의미로 채우는 것이 독서의 과정이라면 이질적인 것에서 무의식이 드러나고 그 무의식의 자리에 자아를 설정해야 한다(\"Wo Es war, soll Ich werden\"
) Sigmund Freud, a.a.O. Bd. XV, S. 86 (XXXI. Vorlesung).
)는 프로이트의 견해와 다를 것이 없다. (현대)문학은 인간의 상처로 인해 발생된 것인 만큼 그것이 치유적 효과도 있다. 치료에서 우리는 보통 독자/환자가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 해도 절반은 고쳤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문학이 독자/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의식의 검열 없이 털어놓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식 없이 털어놓는 데는 단순한 동질성의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질성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더 드러낸다는 이저의 독서심리학은 수용미학의 차원을 넘어 영향미학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역동적 심리학을 토대로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저가 논증한 것은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기(氣) Energie를 방출하는 데까지는 정서적 동일시로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통찰(Einsicht)을 가져와 환자에게 그 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데는 이질성이라는 인지적 동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치료의 조건을 방증(傍證)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환자의 증상이 심할수록 인지적 구조(또는 상징)보다 클리세이적 상상이 더 우세함을 드러내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심정토로에는 자연관찰과 자연과의 합일된 감정이 뒤섞여 그려지고 있다. 시선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회상은 신이 만든 자연에 대한 경험과 연결되면서 극도의 흥분에 달한다. 이런 감정은 \'감상주의\'의 대가다운 만연체의 리듬으로 표현되면서(\"...하면 ...하면 ....하면, 그러면 ...한다\") 행복한 기분과 불행한 기분이 교차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문학에서 자연관찰을 이처럼 철저하게 묘사하는 곳도 많지 않다. 감정이입, 피부로 느껴지는 자연의 모습, 자연의 무한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일시와 신적인 것으로의 승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더 나아가 좀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행복감은 잡을 수 없고 경험하는 자의 한계 속에서 깨져버린다는 점이다. \"...하면\"이라는 문장의 긴 호흡이 재빨리 \"나는 그것으로 인해 파멸하고 있다네. 이러한 현상들이 내뿜는 황홀한 마력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을 뿐이라네\"로 끝난다. 이러한 파멸은 전적인 자아 상실,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의 해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베르테르가 결국 상심하고 자살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무한함, 즉 신적인 힘과 만물의 관련성과 조화 자체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베르테르는 흥미롭게도 그러한 경험을 \'참아내는\' 근본적인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경험한 것을 현재에 재현할 수 있는 예술가처럼 베르테르가 행동할 수 있었다면 무한성의 경험이 자아해체라는 그런 끔찍한 결말은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적 투영에서 하나의 자기표현이 나온다면 예술작품은 \"네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네 영혼의 거울이 될 것이다\". 그런 예술성은 개개인이 어떤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자신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글을 쓴 괴테는 죽음을 맞지 않는데 비해 베르테르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고 만다. 베르테르를 죽이고 괴테는 산 것이다. 즉, 문학치료는 어쩌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는,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경험을 재현하고 있으면서 낯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죽음과는 낯설게 된다는 논리가 너무 비약적일까.
5. 마치는 말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은 우선 독서행위의 이론과 치료적 전략이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독서심리학이 단순한 심리주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규명해 보았다. 그 이유는 심리가 부정적으로 체현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독서심리학의 메커니즘도 아니고 또 치료학에서 말하는 동류요법도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동질성과 이질성)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이브한 독자나 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심미적 텍스트는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저는 이런 의미에서 독서가 치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진단적 방법이나 치료에 있어서 상담자나 문예학자가 개입함으로써 문학은 원활히 읽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치료에서 뿐 아니라 독서심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료든 교양이든 결국은 자신(원초적 나르시시즘, 원초적 상흔, 고착)을 버리고 타자(이해, 사회화, 개방성)에로 나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작가/독자가 \'선택\'과 \'조합\'을 통해 세상을 재단한다는 이저의 주장은 곧 고착에 빠진, 오인의 구조를 갖고 있는 독자/환자의 인식과 정서를 동질적인 데서 벗어나 이질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동질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치료적 전략과 유사하다. 이것을 이저는 한마디로 \"동질적이 아닌 것이 영향의 조건이며, 이 조건이 독자에게서 텍스트의 의미구조로 실현된다 Das Nicht-Identische ist die Bedingung der Wirkung, die sich im Leser als die Sinnkonstitution des Textes realisiert\"
) Iser, a.a.O., S. 75.
고 표현한다. 이질적인 것에서 빈자리가 드러나고 그 빈자리를 곧 의미로 채우는 것이 독서의 과정이라면 이질적인 것에서 무의식이 드러나고 그 무의식의 자리에 자아를 설정해야 한다(\"Wo Es war, soll Ich werden\"
) Sigmund Freud, a.a.O. Bd. XV, S. 86 (XXXI. Vorlesung).
)는 프로이트의 견해와 다를 것이 없다. (현대)문학은 인간의 상처로 인해 발생된 것인 만큼 그것이 치유적 효과도 있다. 치료에서 우리는 보통 독자/환자가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 해도 절반은 고쳤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문학이 독자/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의식의 검열 없이 털어놓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식 없이 털어놓는 데는 단순한 동질성의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질성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더 드러낸다는 이저의 독서심리학은 수용미학의 차원을 넘어 영향미학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역동적 심리학을 토대로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저가 논증한 것은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기(氣) Energie를 방출하는 데까지는 정서적 동일시로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새로운 통찰(Einsicht)을 가져와 환자에게 그 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데는 이질성이라는 인지적 동기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치료의 조건을 방증(傍證)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환자의 증상이 심할수록 인지적 구조(또는 상징)보다 클리세이적 상상이 더 우세함을 드러내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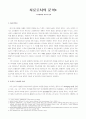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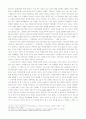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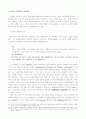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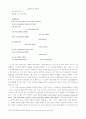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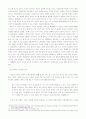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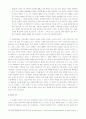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