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3.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양상
1) 설화, 향토적 소재의 차용
2) 민요적 율격
3) 반복, 병치 구조
4)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
4. 맺음말
2.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3.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양상
1) 설화, 향토적 소재의 차용
2) 민요적 율격
3) 반복, 병치 구조
4)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
4. 맺음말
본문내용
하고 있다. ①과 ②가 3음보격 a-a-b-a 반복구조라면 ③과 ④도 3음보격 반복 병치 구조를 보여준다.
소월시가 우리 구비문학의 구조와 율격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구비문학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적 감동을 주는 것은 반복 병치 구조와 3음보 율격을 창조적으로 사용한 데에 있다. 앞서 예를 든 민요가 전적으로 구비문학적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작품이라면 소월시는 그러한 구비문학적 요소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 위에 근대문학적 요소 즉 이미지와 의미적, 정서적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훨씬 함축적 의미가 풍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근대문학적 요소 즉 문자문학, 기록문학적 요소는 일차적 구술문화 시대의 구비문학과 소월시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
관용구(cliches)와 정형구(formulas)는 기록문학에서 볼 수 없는 구비문학의 특징이다. 구비문학 시대에는 획득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형식화된 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관용구와 정형구는 기록문학 시대의 쓰기에 해당하는 구실을 한다. 기록문학 시대에는 쓰기에 의해 획득된 내용이 보존되듯이 구비문학 시대에는 관용구와 정형구에 의해 획득된 의미가 보존된다. 따라서 구비문학 시대의 사고와 표현은 어느 정도 관용구와 정형구의 성격을 지닌다.
정동화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민요의 관용적 표현은 대체로 후렴, 지명, 수식어, 사물의 묘사숫자, 인물 묘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렴이다.」는 말을 하고 있다.
) 조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p. 64.
우리 민요에서는 후렴이 관용구, 정형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후렴구는 획득된 의미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 구연자와 청자가 후렴구라는 여음 형태의 관용구를 구송할 때 이미 지나간 내용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구술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휴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월시에 있어서 관용구는 구비문학의 관용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즉 획득된 지식을 보존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것은 의미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지못해 산다는 말이 있나니 「어버이」
잠못드는 용녀의 춤과 노래, 봄철의 밀물소리 「애모」
착한일하신분네 천당가옵시라 「아내몸」
마치 천리만리나 가고도싶은 「천리만리」
바다가변하여 뽕나무밭된다고 「바다가변하여…」
딸아들을 기르기는/훗길을보자는 심성이로다 「훗길」
하늘이 무어준 짝이라고 「부부」
한평생이라도 반백년/못사는 이인생에 「부부」
구만리 긴 하늘을 날아 건너 「구름」
말마소 내집도/정주곽산/차가고 배가는 곳이라고 「길」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왕십리」
죽자살자 언약도 하여보았지 「원앙침」
불귀불귀 다시불귀/삼수갑산에 다시불귀 「산」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접동새」
금의로 환고향하옵소서 「집생각」
솔대같이 굳은 맘 저저마다 있노라 「촛불켜는밤」
세월이 물과같이 흐른 두 달에
쓸쓸한 고개 아흔 아홉 고개
이 예들은 「앵두 같은 입술」이나 「은장도 드는 칼」, 혹은 「산이라면 곤륜산 물이라면 황하수」등과 같은 관용구이다. 이런 표현은 실제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입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술은 언제나 「앵두 같은」이란 어휘와 연결되어 정형구를 이룸으로써 음수율에 맞고 정형구라는 보다 큰 말의 단위를 만든다. 따라서 구비문학에서는 「앵두 같은」이란 말이 없으면 「입술」이란 말이 음수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운율로 맞추어진 정형구가 관용구로 쓰이면서 구비문학의 작법을 주도하고 창자 혹은 구연자의 암송은 축어적이 아니라 정형구 즉 관용구라는 보다 큰 말의 단위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구비문학적 작품은 이러한 관용구와 정형구의 조립에 불과하다. 가령 위의 예에서 「금의로 환고향 하옵소서」혹은 「솔대같이 굳은 맘 저저마다 있노라」와 같은 표현은 새로울 것이 없는 판에 박힌 관용구의 사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구가 구비문학 시대에는 세대를 거쳐 보존해야 할 정신의 소중한 부분이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이런 허다한 관용구는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다 뚜렷이 말해 준다고 보겠다.
4. 맺음말
소월의 작가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선이해는 구비문학의 구술성이라고 하겠다. 소월시는 구술문화의 구술성에 의해 형태화된 사고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소월시는 구비문학의 구술성이 요구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구비문학 시대에는 획득된 지식과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과 재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사고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기억의 필요성이 구비문학의 통사구문을 결정한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설화, 향토적 소재, 민요적 율격, 반복 병치구조, 관용구의 사용 등과 같은 특성은 소월시가 가진 구비문학적인 성격을 말해 준다. 설화와 향토적 소재의 차용은 소월시의 근원을 이루는 정서와 의미가 구비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민요적 율격은 강렬한 리듬과 균형잡힌 형식을 만들어 소월시가 구비문학적 율격의식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복과 병치구조는 소월시가 분석적, 추론적인 복잡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집합적이고 병렬적인 통사구조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은 모든 구비문학이 보여주는 인식체계, 즉 획득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형식화된 사고 패턴이 필수적이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월시가 그러한 구비문학적 성격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근대문학적 요소, 즉 기록문학이 가진 문자성과 문자/시각의 약호체계를 수용함으로서 구비문학적 요소를 창조적으로 개인화하고 특수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화, 특수화가 소월시를 다른 구비문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서와 시적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구술성, 구비문학적 특성, 설화, 향토적 소재, 민요적 율격, 관용구, 정형구.
소월시가 우리 구비문학의 구조와 율격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구비문학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적 감동을 주는 것은 반복 병치 구조와 3음보 율격을 창조적으로 사용한 데에 있다. 앞서 예를 든 민요가 전적으로 구비문학적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작품이라면 소월시는 그러한 구비문학적 요소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 위에 근대문학적 요소 즉 이미지와 의미적, 정서적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훨씬 함축적 의미가 풍부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근대문학적 요소 즉 문자문학, 기록문학적 요소는 일차적 구술문화 시대의 구비문학과 소월시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
관용구(cliches)와 정형구(formulas)는 기록문학에서 볼 수 없는 구비문학의 특징이다. 구비문학 시대에는 획득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형식화된 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관용구와 정형구는 기록문학 시대의 쓰기에 해당하는 구실을 한다. 기록문학 시대에는 쓰기에 의해 획득된 내용이 보존되듯이 구비문학 시대에는 관용구와 정형구에 의해 획득된 의미가 보존된다. 따라서 구비문학 시대의 사고와 표현은 어느 정도 관용구와 정형구의 성격을 지닌다.
정동화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민요의 관용적 표현은 대체로 후렴, 지명, 수식어, 사물의 묘사숫자, 인물 묘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렴이다.」는 말을 하고 있다.
) 조동화, 「한국민요의 사적연구」, 일조각, 1981. p. 64.
우리 민요에서는 후렴이 관용구, 정형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후렴구는 획득된 의미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 구연자와 청자가 후렴구라는 여음 형태의 관용구를 구송할 때 이미 지나간 내용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구술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휴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월시에 있어서 관용구는 구비문학의 관용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즉 획득된 지식을 보존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것은 의미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지못해 산다는 말이 있나니 「어버이」
잠못드는 용녀의 춤과 노래, 봄철의 밀물소리 「애모」
착한일하신분네 천당가옵시라 「아내몸」
마치 천리만리나 가고도싶은 「천리만리」
바다가변하여 뽕나무밭된다고 「바다가변하여…」
딸아들을 기르기는/훗길을보자는 심성이로다 「훗길」
하늘이 무어준 짝이라고 「부부」
한평생이라도 반백년/못사는 이인생에 「부부」
구만리 긴 하늘을 날아 건너 「구름」
말마소 내집도/정주곽산/차가고 배가는 곳이라고 「길」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왕십리」
죽자살자 언약도 하여보았지 「원앙침」
불귀불귀 다시불귀/삼수갑산에 다시불귀 「산」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접동새」
금의로 환고향하옵소서 「집생각」
솔대같이 굳은 맘 저저마다 있노라 「촛불켜는밤」
세월이 물과같이 흐른 두 달에
쓸쓸한 고개 아흔 아홉 고개
이 예들은 「앵두 같은 입술」이나 「은장도 드는 칼」, 혹은 「산이라면 곤륜산 물이라면 황하수」등과 같은 관용구이다. 이런 표현은 실제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입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술은 언제나 「앵두 같은」이란 어휘와 연결되어 정형구를 이룸으로써 음수율에 맞고 정형구라는 보다 큰 말의 단위를 만든다. 따라서 구비문학에서는 「앵두 같은」이란 말이 없으면 「입술」이란 말이 음수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운율로 맞추어진 정형구가 관용구로 쓰이면서 구비문학의 작법을 주도하고 창자 혹은 구연자의 암송은 축어적이 아니라 정형구 즉 관용구라는 보다 큰 말의 단위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구비문학적 작품은 이러한 관용구와 정형구의 조립에 불과하다. 가령 위의 예에서 「금의로 환고향 하옵소서」혹은 「솔대같이 굳은 맘 저저마다 있노라」와 같은 표현은 새로울 것이 없는 판에 박힌 관용구의 사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구가 구비문학 시대에는 세대를 거쳐 보존해야 할 정신의 소중한 부분이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이런 허다한 관용구는 소월시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다 뚜렷이 말해 준다고 보겠다.
4. 맺음말
소월의 작가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선이해는 구비문학의 구술성이라고 하겠다. 소월시는 구술문화의 구술성에 의해 형태화된 사고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소월시는 구비문학의 구술성이 요구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구비문학 시대에는 획득된 지식과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과 재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사고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기억의 필요성이 구비문학의 통사구문을 결정한다.
소월시에 나타나는 설화, 향토적 소재, 민요적 율격, 반복 병치구조, 관용구의 사용 등과 같은 특성은 소월시가 가진 구비문학적인 성격을 말해 준다. 설화와 향토적 소재의 차용은 소월시의 근원을 이루는 정서와 의미가 구비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민요적 율격은 강렬한 리듬과 균형잡힌 형식을 만들어 소월시가 구비문학적 율격의식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복과 병치구조는 소월시가 분석적, 추론적인 복잡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집합적이고 병렬적인 통사구조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관용구 정형구의 사용은 모든 구비문학이 보여주는 인식체계, 즉 획득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정되고 형식화된 사고 패턴이 필수적이었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소월시가 그러한 구비문학적 성격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근대문학적 요소, 즉 기록문학이 가진 문자성과 문자/시각의 약호체계를 수용함으로서 구비문학적 요소를 창조적으로 개인화하고 특수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화, 특수화가 소월시를 다른 구비문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서와 시적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구술성, 구비문학적 특성, 설화, 향토적 소재, 민요적 율격, 관용구, 정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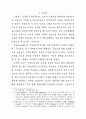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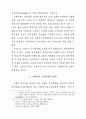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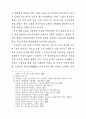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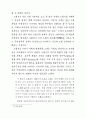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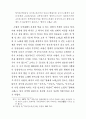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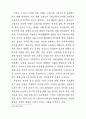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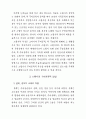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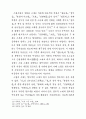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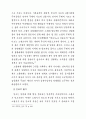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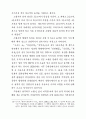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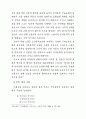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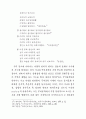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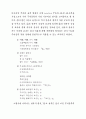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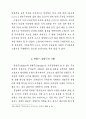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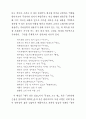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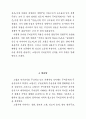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