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고개지(顧愷之)의 회화이론
(1) 전신(傳神)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함
(2) 생활을 반영하는 “이형사신(以形寫神)론”을 제시함
(3) 인물과 환경의 관계를 중시함
(4) 생활을 체험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론을 제시함
(5)기타
2>사혁(謝赫)의 “6법(六法)”과 요최(姚最)의 “심사조화(心師造化)”론
1)기운생동(氣韻生動)
2)골법용필(骨法用筆)
3)응물상형(應物象形)
4) 수류부채(隋類賦彩)
5)경영위치(經營位置)
6)전이모사(傳移模寫)
(1) 전신(傳神)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함
(2) 생활을 반영하는 “이형사신(以形寫神)론”을 제시함
(3) 인물과 환경의 관계를 중시함
(4) 생활을 체험하는 “천상묘득(遷想妙得)”론을 제시함
(5)기타
2>사혁(謝赫)의 “6법(六法)”과 요최(姚最)의 “심사조화(心師造化)”론
1)기운생동(氣韻生動)
2)골법용필(骨法用筆)
3)응물상형(應物象形)
4) 수류부채(隋類賦彩)
5)경영위치(經營位置)
6)전이모사(傳移模寫)
본문내용
뛰어나 흔히 고개지(顧愷之),장승요(張僧繇)와 함께 6조시대의 3대가로 불린다. 사혁(謝赫)은 고화품록(高 品綠)에서 그를 6법을 겸비한 제1품의 화가로 평가하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해낸 최고의 화가로 극찬하였다.
가 일승사(一乘寺)에 그린 화훼(花卉)는 사람들이 입체감을 느껴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화가들이 외래적인 회화채색법을 수용한 일례이다. 명암의 층차에 따라 채색하는 육탐미의 퇴훈법(退暈法)은 후대 건축의 채회(彩繪)에서 그 영향을 여전히 볼 수 있다.
5)경영위치(經營位置)
경영위치는 곧 구도의 설계이다. 고개지는 구도문제를 논하면서 \"실제로 마주 대하여 보고 교묘하게 마름질해야 한다\"
주 63) 참고<臨見妙裁>
고 제시하였다. 화면 위에 그리는 형상은 반드시 교묘한 재단을 거쳐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하여 교묘하게 재단하는가? 화가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한다. 구도의 좋고 나쁨은 화가의 사상적 수준의 고하(高下)를 반영한다. 사혁의 경영위치는 고개지의 구도이론과 그 견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고개지는 교묘한 재단을 요구하고 사혁은 경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양자 모두 작가가 구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국화의 구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니, 예를 들어 형상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산점투시(散點透視)를 취하는데, 고개지의 <낙신부도권(洛神賦圖卷)>은 곧 이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성기고 빽빽하며 모이고 분산되는 것을 중시하여 성긴 곳은 마치 말이 달릴 수 있게 해야 되고 빽빽한 곳은 마치 바람도 통하지 않을 듯이 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그리지 않은 곳도 그림임을 중시하여 공백을 남겨 하늘이나 물, 구름 등을 나타낸다. 사혁이 6법을 제시할 무렵에는 아직 중국화의 이와 같은 구도상의 특징들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지만 후대 화가들의 부단한 실천과 모색을 거쳐 점차 풍부하게 되었는데, 이는 누대에 걸쳐 예술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한 결과이다.
6)전이모사(傳移模寫)
6법의 마지막 법칙은 전이모사인데 이는 그림을 임모하는 기능이다. 당나라의 장언원(張彦遠)은 이 전이모사는 \"화가의 말단적인 일\"
張彦遠, 『歷代名 記』, 卷1, 『論 六法』. [至放傳模移寫, 乃] 家末事.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창작과 회화비평에서 직접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앞의 다섯 가지 법칙으로 이미 족하다. 혹자는, 전이모사란 창작에 있어서는 앞시대 사람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회화비평에 있어서는 작가가 앞시대의 유산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의미이지 사혁 자신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혁의 6법은 역대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당송대에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송대 「도화견문지(圖 見聞誌)」의 저자 곽약허(郭若虛,11세기후반경 활동)
곽약허(郭若虛, 11세기후반경 활동). 북송(北宋)의 저명한 회화사가, 회화이론가.
제Ⅳ장의 주1)참고.
는 심지어 \"6법의 정론(精論)은 만고불변\"
郭若虛, 『圖 見聞誌』, 卷1, 「論氣韻非師」. 六法精論, 萬古不移.
이라 하여 6법을 회화비평의 총결이기 때문에 6법이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은 이러한 역사시기를 넘어설 수 없다. 예술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이론도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6법은 어느 시대나 완전무결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가령 중국화는 필묵을 중시하여 정묘한 필묵이 요구되는데 6법은 단지 골법용필만 제시했을 뿐 먹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용묵(用墨)의 기법은 중당(中唐.766-820)을 거쳐 오대(五代,907-960)에 이르러서야 중시되기 시작하여 형호(荊浩,870-930)
형호(荊浩, 870?-930?). 오대(五代)의 저명한 화가, 회화이론가. 제Ⅲ장의 주148)
참고.
가 \"6요(六要)\"가운데에서 비로소 묵법(墨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용필용묵(用筆用墨)의 이론이 6법 가운데 모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6법이 제시된 이후 후대 사람들이 6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회화비평의 기준을 논하는 데 있어서 모두 6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밖에도 또한 회화창작과 비평의 기준으로서 6법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도 충분한 것은 아니니, 6법은 단지 예술성이라는 측면의 문제만을 논급하고 사상과 내용이라는 측면의 눈제는 존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는 6법에서 옥의 티와 같은 부분이다. 이러한 부족한 점이 역사적인 한계에 의해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6법과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문심조룡(文心雕龍)」은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에 대한 이론이 6법에 비해 완벽하고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문학과 현실의 관계라든가 문학이 현실을 어떰게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 또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등의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언급하고 있다. 나는, 비록 6법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명성을 떨칙고 있다 하더라도(6법은 외국에서도 비교적 중시되고 있다)이를 대할 때는 마땅히 우리가 모든 우수한 문예이론의 유산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둘로 나누어보는 과학적인 분석태도를 취해야지 \"만고불변\"이라는 식의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혁의 「고화품록」에는 6법 이외에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약간의 이론적인 관점이 있으니, 예를 들어
사물의 이법(理法)과 성정(性情)을 궁구하여 다 드러내 일이 말로 다 그려낼
수 없다
謝赫, 『古 品錄』, 「第一品五人」, 陸深微:窮理盡性, 事絶言家.
는 것이 그것이다.
화가는 창작하기 전에 묘사할 대상의 법칙과 특성을 깊이 연구하여 철저히 이해한 다음 그 형상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을 스승 삼고 홀로 드러내어 여기저기에서 따모으는 것을 천하게 여긴다
上同, 「第三品九人」, 長則:師心獨見①, 鄙於綜採. 저자는 ①의 見을 現으로
인용하였으나 品叢書 所收 津逮秘書本을 따른다.
는 것은 화가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모두 귀중한 것이다.
가 일승사(一乘寺)에 그린 화훼(花卉)는 사람들이 입체감을 느껴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화가들이 외래적인 회화채색법을 수용한 일례이다. 명암의 층차에 따라 채색하는 육탐미의 퇴훈법(退暈法)은 후대 건축의 채회(彩繪)에서 그 영향을 여전히 볼 수 있다.
5)경영위치(經營位置)
경영위치는 곧 구도의 설계이다. 고개지는 구도문제를 논하면서 \"실제로 마주 대하여 보고 교묘하게 마름질해야 한다\"
주 63) 참고<臨見妙裁>
고 제시하였다. 화면 위에 그리는 형상은 반드시 교묘한 재단을 거쳐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하여 교묘하게 재단하는가? 화가의 이성적 판단에 의거한다. 구도의 좋고 나쁨은 화가의 사상적 수준의 고하(高下)를 반영한다. 사혁의 경영위치는 고개지의 구도이론과 그 견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고개지는 교묘한 재단을 요구하고 사혁은 경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양자 모두 작가가 구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국화의 구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니, 예를 들어 형상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산점투시(散點透視)를 취하는데, 고개지의 <낙신부도권(洛神賦圖卷)>은 곧 이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 외에도 성기고 빽빽하며 모이고 분산되는 것을 중시하여 성긴 곳은 마치 말이 달릴 수 있게 해야 되고 빽빽한 곳은 마치 바람도 통하지 않을 듯이 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그리지 않은 곳도 그림임을 중시하여 공백을 남겨 하늘이나 물, 구름 등을 나타낸다. 사혁이 6법을 제시할 무렵에는 아직 중국화의 이와 같은 구도상의 특징들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지만 후대 화가들의 부단한 실천과 모색을 거쳐 점차 풍부하게 되었는데, 이는 누대에 걸쳐 예술가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한 결과이다.
6)전이모사(傳移模寫)
6법의 마지막 법칙은 전이모사인데 이는 그림을 임모하는 기능이다. 당나라의 장언원(張彦遠)은 이 전이모사는 \"화가의 말단적인 일\"
張彦遠, 『歷代名 記』, 卷1, 『論 六法』. [至放傳模移寫, 乃] 家末事.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창작과 회화비평에서 직접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앞의 다섯 가지 법칙으로 이미 족하다. 혹자는, 전이모사란 창작에 있어서는 앞시대 사람의 경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회화비평에 있어서는 작가가 앞시대의 유산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의미이지 사혁 자신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혁의 6법은 역대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당송대에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송대 「도화견문지(圖 見聞誌)」의 저자 곽약허(郭若虛,11세기후반경 활동)
곽약허(郭若虛, 11세기후반경 활동). 북송(北宋)의 저명한 회화사가, 회화이론가.
제Ⅳ장의 주1)참고.
는 심지어 \"6법의 정론(精論)은 만고불변\"
郭若虛, 『圖 見聞誌』, 卷1, 「論氣韻非師」. 六法精論, 萬古不移.
이라 하여 6법을 회화비평의 총결이기 때문에 6법이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은 이러한 역사시기를 넘어설 수 없다. 예술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이론도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6법은 어느 시대나 완전무결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가령 중국화는 필묵을 중시하여 정묘한 필묵이 요구되는데 6법은 단지 골법용필만 제시했을 뿐 먹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용묵(用墨)의 기법은 중당(中唐.766-820)을 거쳐 오대(五代,907-960)에 이르러서야 중시되기 시작하여 형호(荊浩,870-930)
형호(荊浩, 870?-930?). 오대(五代)의 저명한 화가, 회화이론가. 제Ⅲ장의 주148)
참고.
가 \"6요(六要)\"가운데에서 비로소 묵법(墨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용필용묵(用筆用墨)의 이론이 6법 가운데 모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6법이 제시된 이후 후대 사람들이 6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회화비평의 기준을 논하는 데 있어서 모두 6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밖에도 또한 회화창작과 비평의 기준으로서 6법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도 충분한 것은 아니니, 6법은 단지 예술성이라는 측면의 문제만을 논급하고 사상과 내용이라는 측면의 눈제는 존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는 6법에서 옥의 티와 같은 부분이다. 이러한 부족한 점이 역사적인 한계에 의해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6법과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문심조룡(文心雕龍)」은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에 대한 이론이 6법에 비해 완벽하고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문학과 현실의 관계라든가 문학이 현실을 어떰게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 또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등의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언급하고 있다. 나는, 비록 6법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명성을 떨칙고 있다 하더라도(6법은 외국에서도 비교적 중시되고 있다)이를 대할 때는 마땅히 우리가 모든 우수한 문예이론의 유산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둘로 나누어보는 과학적인 분석태도를 취해야지 \"만고불변\"이라는 식의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혁의 「고화품록」에는 6법 이외에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약간의 이론적인 관점이 있으니, 예를 들어
사물의 이법(理法)과 성정(性情)을 궁구하여 다 드러내 일이 말로 다 그려낼
수 없다
謝赫, 『古 品錄』, 「第一品五人」, 陸深微:窮理盡性, 事絶言家.
는 것이 그것이다.
화가는 창작하기 전에 묘사할 대상의 법칙과 특성을 깊이 연구하여 철저히 이해한 다음 그 형상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을 스승 삼고 홀로 드러내어 여기저기에서 따모으는 것을 천하게 여긴다
上同, 「第三品九人」, 長則:師心獨見①, 鄙於綜採. 저자는 ①의 見을 現으로
인용하였으나 品叢書 所收 津逮秘書本을 따른다.
는 것은 화가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모두 귀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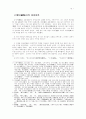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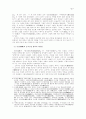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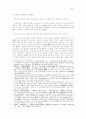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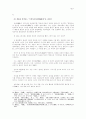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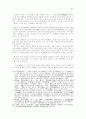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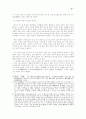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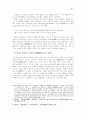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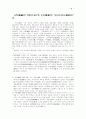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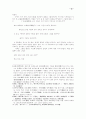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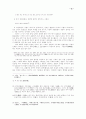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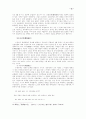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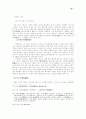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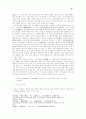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