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성선설(性善說)
1) 성선설이란
2) 성선설의 영향
3) 순자의 성악설과 비교
2. 원문 해설
1) 성(性)의 의의
가. 성(性)은 인의도덕의 본성
나. 성(性)은 선천적인 도덕성
다. 사단론
2) 성선의 논증
가. 인의예지 본유설
나. 본성(本性)을 존중하면 선(善)
다. 인성(人性)의 선(善)
1) 성선설이란
2) 성선설의 영향
3) 순자의 성악설과 비교
2. 원문 해설
1) 성(性)의 의의
가. 성(性)은 인의도덕의 본성
나. 성(性)은 선천적인 도덕성
다. 사단론
2) 성선의 논증
가. 인의예지 본유설
나. 본성(本性)을 존중하면 선(善)
다. 인성(人性)의 선(善)
본문내용
의 2 가지의 가운데에 있으며 뒤의 4 가지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다. 인성(人性)의 선(善)
<등문공 상 제1장>
등文公爲世子, 將之楚, 過宋而見孟子
등나라 문공이 세자로 있을 때에 초나라로 가려고 송나라를 지나다가 맹자를 찾아보았다.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맹자께서 성선(性善)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면 반드시 요, 순 임금을 이르셨다.성품이란 하늘에서 받은 생의 이치로, 지극히 착하여 악한 것이 없으니, 사람이 처음에는 요순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나, 뭇사람은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서 잃었고, 요순은 사사로운 욕심의 가림이 없어서 능히 그 성품을 채우므로 맹자께서 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양 性善을 반드시 요순을 들어 실증하여, 그 仁과 義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며, 성인은 배워서 이룰 수 있으므로 이에 힘쓰기를 게을리 않게 한 것이다.
정자 \"성품은 곧 이치이다. 천하의 이치가 원래는 스스로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착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타나서 절도에 맞으면 곧 가는데 마다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나타나서 절도에 맞지 않으면 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무릇 선과 악을 말함에는 모두 선함을 먼저하고 악을 뒤로 하며, 길흉을 말함에는 모두 길함을 먼저하고 흉함을 뒤로 하며, 시비를 말함에는 모두 옳은 것을 먼저하고 그른 것을 뒤로 한다\"
世子自楚反, 復見孟子.
孟子曰: [世子疑吾言乎? 夫道一而已矣.
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오다가 다시 맹자를 보니, 맹자 \"세자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대저 道는 하나일 따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성현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므로, 세자가 맹자의 말에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다시 와서 뵙기를 청한 것이니, 대개 따로 비근하게 행하기 쉬운 말이 있나 해서이다. 맹자께서 이것을 아시는 고로 다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해서 고금의 성인과 어리석은 이가 본래 같은 성품임을 밝혔으니, 앞에서 말을 다하여 다시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成衆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
성간이 제나라 경공더러 \'聖人도 장부며 나도 장부이니 내가 어찌 聖人을 두려워 하리요\' 하였으며, 안연이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다면 다 순임금과 같이 될 것이다\'하고, 공명의는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는 주공의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성간은 사람의 이름이다. 피는 성인을 이르는 것이다. 할 일을 하는 자가 역시 이와 같다고 함은 이것은 사람이 능히 할 일을 한다면 다 순임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명은 성, 의는 이름, 노나라의 어진 사람이다.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 함은, 대개 주공의 말인데 공명의가 역시 문왕을 반드시 스승 삼으려 하므로, 주공의 말을 외워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한 것이다. 맹자께서 이미 세자에게 고하기를 도는 둘이 없다 하고, 다시 이 세 사람의 말을 이끌어 밝혀서 세자로 하여금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하여 성현을 스승삼게 한 것이요, 다른 말은 다시 구할 것이 없다 하신 것이다.
今등, 絶長補短, 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
書曰: {若藥不瞑眩, 厥疾不추.} ]
이제 등나라 긴 것을 끊어서 짧은 것에 이으면(이리저리 두루 모으면) 거의 오십 리는 되니, 이것으로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경에 <약을 먹어서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은 끊음이다. 서는 《상서》의 열명편이다. 명현은 어지러움이다. 등나라가 비록 작으나 잘 다스릴 수 있으니, 다만 비근한 데만 편안히 하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여 악을 버리고 착한 것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맹자의 성선설을 달함이 비로소 이에 나타났고, <고자>편에 자세히 갖추었다. 그러나 잠잠히 기록하고 겉으로 통하면, 곧 맹자 7 편중에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 전의 성인들이 발하지 못한 것으로서 성인으로서의 공이 있으니, 정자의 말이 옳다.
참고문헌 ------------------------------------------------------
1. 김종무 지음, 맹자신해, 민음사, 1994.
2.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 1999.
3. 양구오롱 지음, 이영섭 옮김, 맹자평전, 미다스북스, 2002.
다. 인성(人性)의 선(善)
<등문공 상 제1장>
등文公爲世子, 將之楚, 過宋而見孟子
등나라 문공이 세자로 있을 때에 초나라로 가려고 송나라를 지나다가 맹자를 찾아보았다.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맹자께서 성선(性善)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면 반드시 요, 순 임금을 이르셨다.성품이란 하늘에서 받은 생의 이치로, 지극히 착하여 악한 것이 없으니, 사람이 처음에는 요순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나, 뭇사람은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서 잃었고, 요순은 사사로운 욕심의 가림이 없어서 능히 그 성품을 채우므로 맹자께서 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양 性善을 반드시 요순을 들어 실증하여, 그 仁과 義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며, 성인은 배워서 이룰 수 있으므로 이에 힘쓰기를 게을리 않게 한 것이다.
정자 \"성품은 곧 이치이다. 천하의 이치가 원래는 스스로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착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타나서 절도에 맞으면 곧 가는데 마다 착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나타나서 절도에 맞지 않으면 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무릇 선과 악을 말함에는 모두 선함을 먼저하고 악을 뒤로 하며, 길흉을 말함에는 모두 길함을 먼저하고 흉함을 뒤로 하며, 시비를 말함에는 모두 옳은 것을 먼저하고 그른 것을 뒤로 한다\"
世子自楚反, 復見孟子.
孟子曰: [世子疑吾言乎? 夫道一而已矣.
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오다가 다시 맹자를 보니, 맹자 \"세자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대저 道는 하나일 따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성현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므로, 세자가 맹자의 말에 의심이 없을 수 없어서 다시 와서 뵙기를 청한 것이니, 대개 따로 비근하게 행하기 쉬운 말이 있나 해서이다. 맹자께서 이것을 아시는 고로 다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해서 고금의 성인과 어리석은 이가 본래 같은 성품임을 밝혔으니, 앞에서 말을 다하여 다시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成衆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
성간이 제나라 경공더러 \'聖人도 장부며 나도 장부이니 내가 어찌 聖人을 두려워 하리요\' 하였으며, 안연이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다면 다 순임금과 같이 될 것이다\'하고, 공명의는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는 주공의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이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성간은 사람의 이름이다. 피는 성인을 이르는 것이다. 할 일을 하는 자가 역시 이와 같다고 함은 이것은 사람이 능히 할 일을 한다면 다 순임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명은 성, 의는 이름, 노나라의 어진 사람이다.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 함은, 대개 주공의 말인데 공명의가 역시 문왕을 반드시 스승 삼으려 하므로, 주공의 말을 외워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한 것이다. 맹자께서 이미 세자에게 고하기를 도는 둘이 없다 하고, 다시 이 세 사람의 말을 이끌어 밝혀서 세자로 하여금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하여 성현을 스승삼게 한 것이요, 다른 말은 다시 구할 것이 없다 하신 것이다.
今등, 絶長補短, 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
書曰: {若藥不瞑眩, 厥疾不추.} ]
이제 등나라 긴 것을 끊어서 짧은 것에 이으면(이리저리 두루 모으면) 거의 오십 리는 되니, 이것으로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경에 <약을 먹어서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은 끊음이다. 서는 《상서》의 열명편이다. 명현은 어지러움이다. 등나라가 비록 작으나 잘 다스릴 수 있으니, 다만 비근한 데만 편안히 하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여 악을 버리고 착한 것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맹자의 성선설을 달함이 비로소 이에 나타났고, <고자>편에 자세히 갖추었다. 그러나 잠잠히 기록하고 겉으로 통하면, 곧 맹자 7 편중에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 전의 성인들이 발하지 못한 것으로서 성인으로서의 공이 있으니, 정자의 말이 옳다.
참고문헌 ------------------------------------------------------
1. 김종무 지음, 맹자신해, 민음사, 1994.
2.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 1999.
3. 양구오롱 지음, 이영섭 옮김, 맹자평전, 미다스북스,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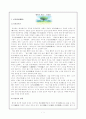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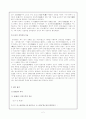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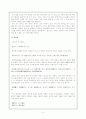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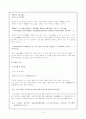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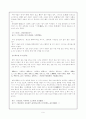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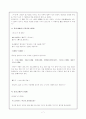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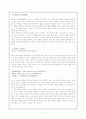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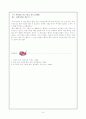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