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 리 말
1. 언어정책의 필요성
2. 공용어의 개념
Ⅱ.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의 체제
2. 표준어 규정의 의의와 문제점
Ⅲ. 맺 음 말
1. 언어정책의 필요성
2. 공용어의 개념
Ⅱ.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의 체제
2. 표준어 규정의 의의와 문제점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 칙뻠, 엽찝)
제24항 어간 받침 '가(ㄵ), 가(ㄶ)'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가, 가, 가, 가'은 된소 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가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 음 한다.
제26항 한자어에서 '가'받침 뒤에 연결되는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가'뒤에 연결되는 '가 가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가 가 가 가 가'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7장 소리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가'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 솜:니불, 막일-> 망닐, 내복약-> 내:봉냑, 신여성->신녀성, 눈요기->눈뇨기)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①'가 ,가 ,가, 가, 가'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가]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한다.
②사이시옷 뒤에 '가, 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가]으로 발음한다.
③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가]으로 발음한다.
2. 표준어 규정의 의의와 문제점
언어가 가지는 기능은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정보 교환을 먼저 꼽을 수 있다면 그들 사이에 소통 가능할 언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수긍하게 된다. 표준어의 필요성은 바로 공인된 공통의 언어를 확보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방언 가운데에서도 사용 영역이 확대되어 표준어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니와 방언은 그 자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방언을 비표준어로 규정짓기는 하지만 그것이 방언 어휘들의 폐어화나 사어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 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를 줄이는 것이 되므로 결국 표준어 사용은 언어 소통의 원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작업의 내용이 규정 자체의 작성에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표준어 선정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별 단어의 사정을 위한 작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언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교양 있는 서울말 역시 변화한다. 표준어는 이러한 변화와 상충하게 되는 일이 많다. 지금도 ‘-고’를 ‘-구’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표준어 규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개정될 때 몇 개의 단어들은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 ‘주착, 상치, 지리하다’ 등이 ‘주책, 상추, 지루하다’에 표준어의 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쓴다는 것 때문에 표준어를 바꾸어 버리게 되면 표준어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한 순간에 비표준어 사용자로 만들게 된다는 데 있다. 지키지 않은 사람을 고려할 것인가, 지킨 사람을 고려할 것인가는 표준어의 개정 작업에 늘 문제가 될 것이다.
Ⅲ .맺 음 말
언어정책은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국가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정책에는 공용어를 정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국가 정부의 언어정책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어 혹은 공용어와 관련되는 정책’과 다른 하나는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책’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책은 다루어지않는다. 이번 학습에서 언어정책의 필요성과 공용어의 개념, 표준어 규정에 대해 학습해 보았다.
우선, 공용어가 정해지면 공용어의 여러 방언 중에서 특정한 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어를 규정하게 된다. 표준어에는 어휘뿐 아니라 발음까지도 포함되고 표준어를 문자로 바르게 옮겨 적는 방식인 맞춤법도 이 언어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표준어 규정은 크게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나뉘어 지며, 표준어 사정원칙은 다시 총칙과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및 어휘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나뉘어진다. 표준 발음법은 총칙, 자음과 모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 선정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별 단어의 사정을 위한 작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어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언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교양 있는 서울말 역시 변화한다. 표준어는 이러한 변화와 상충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고, 국가 내부에서 국민 모두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참고문헌》
1. 국어정책자료집, 문화체육부(1997)
2. 세계의 언어정책, 국어학회편(1993), 태학사.
3. 국어 어문 규정집, 문교부(198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 국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1999)
5. 생활 속의 언어, 지상강좌 (2003)
6. 국어 정서법
제24항 어간 받침 '가(ㄵ), 가(ㄶ)'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가, 가, 가, 가'은 된소 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가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 음 한다.
제26항 한자어에서 '가'받침 뒤에 연결되는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7항 관형사형 '-(으)가'뒤에 연결되는 '가 가 가 가 가'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가 가 가 가 가'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7장 소리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가'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 솜:니불, 막일-> 망닐, 내복약-> 내:봉냑, 신여성->신녀성, 눈요기->눈뇨기)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①'가 ,가 ,가, 가, 가'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가]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한다.
②사이시옷 뒤에 '가, 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가]으로 발음한다.
③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가]으로 발음한다.
2. 표준어 규정의 의의와 문제점
언어가 가지는 기능은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정보 교환을 먼저 꼽을 수 있다면 그들 사이에 소통 가능할 언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수긍하게 된다. 표준어의 필요성은 바로 공인된 공통의 언어를 확보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방언 가운데에서도 사용 영역이 확대되어 표준어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니와 방언은 그 자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방언을 비표준어로 규정짓기는 하지만 그것이 방언 어휘들의 폐어화나 사어화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 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수를 줄이는 것이 되므로 결국 표준어 사용은 언어 소통의 원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작업의 내용이 규정 자체의 작성에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표준어 선정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별 단어의 사정을 위한 작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언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교양 있는 서울말 역시 변화한다. 표준어는 이러한 변화와 상충하게 되는 일이 많다. 지금도 ‘-고’를 ‘-구’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표준어 규정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개정될 때 몇 개의 단어들은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다. ‘주착, 상치, 지리하다’ 등이 ‘주책, 상추, 지루하다’에 표준어의 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쓴다는 것 때문에 표준어를 바꾸어 버리게 되면 표준어라는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한 순간에 비표준어 사용자로 만들게 된다는 데 있다. 지키지 않은 사람을 고려할 것인가, 지킨 사람을 고려할 것인가는 표준어의 개정 작업에 늘 문제가 될 것이다.
Ⅲ .맺 음 말
언어정책은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국가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정책에는 공용어를 정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국가 정부의 언어정책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어 혹은 공용어와 관련되는 정책’과 다른 하나는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책’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책은 다루어지않는다. 이번 학습에서 언어정책의 필요성과 공용어의 개념, 표준어 규정에 대해 학습해 보았다.
우선, 공용어가 정해지면 공용어의 여러 방언 중에서 특정한 방언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어를 규정하게 된다. 표준어에는 어휘뿐 아니라 발음까지도 포함되고 표준어를 문자로 바르게 옮겨 적는 방식인 맞춤법도 이 언어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표준어 규정은 크게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나뉘어 지며, 표준어 사정원칙은 다시 총칙과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및 어휘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나뉘어진다. 표준 발음법은 총칙, 자음과 모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 선정 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별 단어의 사정을 위한 작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어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언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교양 있는 서울말 역시 변화한다. 표준어는 이러한 변화와 상충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고, 국가 내부에서 국민 모두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참고문헌》
1. 국어정책자료집, 문화체육부(1997)
2. 세계의 언어정책, 국어학회편(1993), 태학사.
3. 국어 어문 규정집, 문교부(198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 국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1999)
5. 생활 속의 언어, 지상강좌 (2003)
6. 국어 정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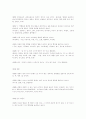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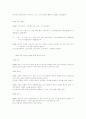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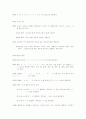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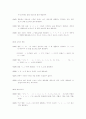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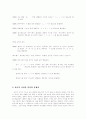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