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유가와 도가가 나타나게 된 배경
2. 유가란?
3. 도가란?
4. 유가 사상의 특징
5. 도가 사상의 특징
6. 유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
7.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
8. 유가와 도가의 공통점
9.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과 나의 생각
마치면서
본론
1. 유가와 도가가 나타나게 된 배경
2. 유가란?
3. 도가란?
4. 유가 사상의 특징
5. 도가 사상의 특징
6. 유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
7.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
8. 유가와 도가의 공통점
9. 유가와 도가의 차이점과 나의 생각
마치면서
본문내용
유가 사상의 특징
유가의 첫 번째 특징은 인본주의이다.
이 점은 천(天)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꾼 공자에서 시작된다. {논어} [선진(先進)]편에서 공자는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직 다 모르는 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느냐"고 하였고, 다시 귀신 섬기는 법을 묻자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의 관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仁)으로 표현하였다. '인'이란 사람다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형제,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자는 도(道)에 대해서도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중용}에서는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가의 도는 인도(人道)인 것이다. 이같은 생각을 이어 받은 맹자는 사람다움의 실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 뒤 성리학자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았고 양명학 또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유가의 두 번째 특징은 도덕 지향이다.
유가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도덕 욕구만을 인정하고 사적인 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이인(里仁)]편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밝은 사람은 군자이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밝은 사람은 소인이다"라고 했으며, [헌문(憲問)]편에서는 "이익될만한 일을 보거든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생각을 이어서 인간의 도덕심과 자연 법칙을 일치시키고, 생리적 욕구를 제외한 4단만을 인간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였다. 또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도 생리적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적 실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같은 흐름은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수양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성리학은 만물의 본질을 리(理)로 규정하고 그 리를 도덕 법칙으로 이해하였으며, 인간의 본성 또한 리라고 함으로써 도덕적 인간 주체를 확립하였다. 이 같은 유가의 입장은 부도덕한 것이나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난다.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비판한 것이나 성리학자들이 불교와 도교를 비판한 것이 모두 이 같은 관점에서 나왔다.
유가의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사회성이다.
유가의 이상적 인물은 자신의 도덕성을 사회에 온전히 드러낸 성인이었다. 공자는 {논어} [옹야(雍也)]편에서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인(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자공의 질문에, "어찌 인(仁)이라고만 하겠는가. 반드시 성(聖)의 경지일 것이다. 요순도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공자의 목적은 사회적 실현에 있었으며 그래서 공자 또한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다. "아침에 온 세상에 질서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말 속에 공자의 강한 사회적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유가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으며 그 기준은 {대학}이었다. {대학}은 자신이 가진 밝은 덕을 밝히고 나아가 백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회를 이룬다는 세 가지 강령(綱領)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생각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에 중심적인 이론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생각은 언제나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걱정하는 우환 의식으로 남았고 그 결과 관료 지향의 병폐를 낳기도 하였다.
유가의 첫 번째 특징은 인본주의이다.
이 점은 천(天)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꾼 공자에서 시작된다. {논어} [선진(先進)]편에서 공자는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직 다 모르는 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느냐"고 하였고, 다시 귀신 섬기는 법을 묻자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의 관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仁)으로 표현하였다. '인'이란 사람다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형제,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자는 도(道)에 대해서도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중용}에서는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가의 도는 인도(人道)인 것이다. 이같은 생각을 이어 받은 맹자는 사람다움의 실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 뒤 성리학자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았고 양명학 또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유가의 두 번째 특징은 도덕 지향이다.
유가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도덕 욕구만을 인정하고 사적인 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 [이인(里仁)]편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밝은 사람은 군자이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밝은 사람은 소인이다"라고 했으며, [헌문(憲問)]편에서는 "이익될만한 일을 보거든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생각을 이어서 인간의 도덕심과 자연 법칙을 일치시키고, 생리적 욕구를 제외한 4단만을 인간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였다. 또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도 생리적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적 실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같은 흐름은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수양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성리학은 만물의 본질을 리(理)로 규정하고 그 리를 도덕 법칙으로 이해하였으며, 인간의 본성 또한 리라고 함으로써 도덕적 인간 주체를 확립하였다. 이 같은 유가의 입장은 부도덕한 것이나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난다.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비판한 것이나 성리학자들이 불교와 도교를 비판한 것이 모두 이 같은 관점에서 나왔다.
유가의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사회성이다.
유가의 이상적 인물은 자신의 도덕성을 사회에 온전히 드러낸 성인이었다. 공자는 {논어} [옹야(雍也)]편에서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인(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자공의 질문에, "어찌 인(仁)이라고만 하겠는가. 반드시 성(聖)의 경지일 것이다. 요순도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공자의 목적은 사회적 실현에 있었으며 그래서 공자 또한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다. "아침에 온 세상에 질서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말 속에 공자의 강한 사회적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유가는 항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으며 그 기준은 {대학}이었다. {대학}은 자신이 가진 밝은 덕을 밝히고 나아가 백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회를 이룬다는 세 가지 강령(綱領)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생각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정치•경제•사회•교육 등에 중심적인 이론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생각은 언제나 지식인으로서 세상을 걱정하는 우환 의식으로 남았고 그 결과 관료 지향의 병폐를 낳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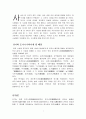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