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목차
1.시작하며
2.서론
3. 본론1
1)유가
2)묵가
3)도가
4)법가
5)음양가
본론2
――――――한대의 제자학――――――
본론3
――――――청대의 제자학――――――
목차
1.시작하며
2.서론
3. 본론1
1)유가
2)묵가
3)도가
4)법가
5)음양가
본론2
――――――한대의 제자학――――――
본론3
――――――청대의 제자학――――――
본문내용
상통일이라는 입자에 대항하는 내용을 지닌다.
또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의 「六家要旨」는 음양유묵명법도덕을 아우르며 천하의 다스림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주장의 방법은 각기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도가야말로 각 학파의 장점을 흡수하여 완벽하지만 유가와 같은 여타의 학파는 치우침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秦이 멸망하고 漢에 들어서면서 사상이 혼합통일되어 후대로까지 길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의 유가와 그에 못지 않게 주목받은 도가는 융합하여 선비들의 처세 철학으로 굳어진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벼슬을 하고, 물러나서는 숨는 것” “숨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고, 물러난 자를 眞人으로 삼는다.” (羅專方, 앞의 글, 1999, p.119.)
법가는 진의 멸망으로 그 세도 무너져 버린 듯 볼 수 도 있겠다. 그러나 비록 순수한 형식으로는 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가나 도가 등의 사상과 결합하여 “겉은 유가 안은 법가”로 하는 복합 정치 체제의 한 축을 이룬다. 음양가는 본래 상고시대 학술의 한 파였다. 역사가 전제왕권시대로 진입하게 된 후에 전제왕권과 신권 사이의 중개 역할을 충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다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묵가는 탈락하게 된다.
ⅲ. 한 무제 - 유학의 채택
웅대한 재략을 지닌 漢武帝(재위기간 B.C. 149-88)가 집권한 후 漢은 놀랍게 변화했다. 그중 학술 및 사상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가를 축출하고 儒術만을 오직 높인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때 동중서가 제시한 유학은 완전한 의미의 선진유학(先秦儒學)은 아니었다. 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음양도법명가 등의 사상을 흡수한 ‘新儒學’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진 멸망 후 잠시 고개를 들었던 제자학 연구는 다시 음지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는 어째서 유가가 안정된 漢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유가는 묵가와는 달리 차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군신부자부부의 의리를 강조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전통 사회와 정치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웠다. 때문에 사회가 일단 안정되면 유학의 우월성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유학이 말하는 정명주의는 황제 중심의 정치를 하는데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기존 가족체제에서의 효의 개념이 국가 단위로 발전해서도 충으로 이어지므로 백성의 심리 복종을 유발하기 용이했다는 측면도 있다.
본론3
청대 제자학이란 고거학(考據學) 고증학(考證學)이라고도 하며, 학문 연구는 정확한 음운과 뜻(訓),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학문풍토를 정착시켰다.
에 의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경서와 거의 동시대적인 언어자료라는 평가 아래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고거학이 이끄는 새로운 학문 분위기 속에서 폐기되다시피 한 제자의 학문은 오래된 증거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여러 학자들의 순자묵자노자장자 등에 대한 연구는 공맹독존(孔孟獨尊)의 거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유가 역시 제자(諸子) 중 하나의 학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은 공자맹자의 사상적인 전제(專制)로부터의 해방과 연구의 자유를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육경 이외에도 중시해야할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겨우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제자의 학문들은 경전 연구의 보조로 사용되게 되었다.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는 유가독존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했고, 사상적 자유를 추구한 것이며, 또 古史, 諸子의 연구는 훗날 있을 제자학 부흥운동과 연결된다. 청초의 명학(明學)으로부터 송학(宋學)으로, 다시 청중기의 청한학에서 전한의 공양학으로 소급했고, 선진의 제자학으로 소급하는 일련의 학문연구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청대의 학술연구는 시대를 역으로 거스르는 형태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사상적인 자유를 추구한 학술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유명종, 『淸代哲學史』, 이문출판사, 1989, p.406.
고증의 방법에 입각해 제자학을 연구한 왕중(汪中)은 大學의 저자가 증자(曾子)가 아닌 것을 고증으로 증명한다.
건륭(乾隆)연간(1711~1799) 『四庫全書』의 편찬은 선진시대의 제자에 관한 서적을 수집교감하고 문헌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제자학은 크게 진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교감(校勘)의 작업은 단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저자의 입론의 수준까지 파고들어 그 입론의 방식을 문제로 삼기까지 했다. 『老子道德經考異』, 『呂氏春秋新校正』, 『管子校定』등.
때문에 교정을 한 정교본(精校本)이라 칭해지는 제자관계의 판본이 속속 간행되었다.
연구 작업은 계속 발전하여 각 제자가 독자적으로 체계화한 사상에 대한 해명으로까지 발달하기에 이른다. 『墨子後序』, 『荀子痛論』 등.
4. 결론
이상으로 제자백가라 하여 춘추전국시대에 주장된 각 학파의 중심된 주장들을 형성배경과 함께 살펴보고 아울러 한 무제 이전까지와 청대의 연구까지 살펴보았다.
제자학 안에 선진시대 유학도 포함되겠지만 비교를 위하여 유학을 제자학과는 구별되는 동중서 이후의 유학으로 놓고 본다면, 유학과 제자학 연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 무제 이후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얻은 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유학이 활발하게 연구된 시기였기 때문에, 몇몇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학 이외의 사상은 연구될 수 없는 제자학 입장에서는 암흑기였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자학은 유학과의 반비례 입장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각종 사상들은 도태와 흡수병합을 거듭하며 각각의 중심적 요소들이 유학에 녹아들면서 중국 전통 사상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송영배, 『諸子百家의 思想』, 현음사, 1994.
오재환, 『중국사상사』, 신서원, 1999.
유명종, 『淸代哲學史』, 이문출판사, 1989.
森三樹三郞 著, 임병덕 譯, 『중국 사상사』, 온누리, 1986.
貝塚茂樹 著, 김석근 譯, 『諸子百家』, 까치, 1989.
戶川芳郞 外 著, 조성을 外 譯, 『유교사』, 이론과 실천, 1990.
羅傳芳, 『退溪學報』102, 「諸子學에서 官學에 이르기까지」, 퇴계학연구원, 1999.
또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의 「六家要旨」는 음양유묵명법도덕을 아우르며 천하의 다스림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주장의 방법은 각기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도가야말로 각 학파의 장점을 흡수하여 완벽하지만 유가와 같은 여타의 학파는 치우침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秦이 멸망하고 漢에 들어서면서 사상이 혼합통일되어 후대로까지 길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의 유가와 그에 못지 않게 주목받은 도가는 융합하여 선비들의 처세 철학으로 굳어진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벼슬을 하고, 물러나서는 숨는 것” “숨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고, 물러난 자를 眞人으로 삼는다.” (羅專方, 앞의 글, 1999, p.119.)
법가는 진의 멸망으로 그 세도 무너져 버린 듯 볼 수 도 있겠다. 그러나 비록 순수한 형식으로는 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가나 도가 등의 사상과 결합하여 “겉은 유가 안은 법가”로 하는 복합 정치 체제의 한 축을 이룬다. 음양가는 본래 상고시대 학술의 한 파였다. 역사가 전제왕권시대로 진입하게 된 후에 전제왕권과 신권 사이의 중개 역할을 충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다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묵가는 탈락하게 된다.
ⅲ. 한 무제 - 유학의 채택
웅대한 재략을 지닌 漢武帝(재위기간 B.C. 149-88)가 집권한 후 漢은 놀랍게 변화했다. 그중 학술 및 사상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가를 축출하고 儒術만을 오직 높인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때 동중서가 제시한 유학은 완전한 의미의 선진유학(先秦儒學)은 아니었다. 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음양도법명가 등의 사상을 흡수한 ‘新儒學’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진 멸망 후 잠시 고개를 들었던 제자학 연구는 다시 음지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는 어째서 유가가 안정된 漢의 정치 이념으로 채택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유가는 묵가와는 달리 차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군신부자부부의 의리를 강조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전통 사회와 정치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매우 쉬웠다. 때문에 사회가 일단 안정되면 유학의 우월성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유학이 말하는 정명주의는 황제 중심의 정치를 하는데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기존 가족체제에서의 효의 개념이 국가 단위로 발전해서도 충으로 이어지므로 백성의 심리 복종을 유발하기 용이했다는 측면도 있다.
본론3
청대 제자학이란 고거학(考據學) 고증학(考證學)이라고도 하며, 학문 연구는 정확한 음운과 뜻(訓),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학문풍토를 정착시켰다.
에 의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경서와 거의 동시대적인 언어자료라는 평가 아래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고거학이 이끄는 새로운 학문 분위기 속에서 폐기되다시피 한 제자의 학문은 오래된 증거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여러 학자들의 순자묵자노자장자 등에 대한 연구는 공맹독존(孔孟獨尊)의 거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유가 역시 제자(諸子) 중 하나의 학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은 공자맹자의 사상적인 전제(專制)로부터의 해방과 연구의 자유를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육경 이외에도 중시해야할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겨우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제자의 학문들은 경전 연구의 보조로 사용되게 되었다.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는 유가독존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했고, 사상적 자유를 추구한 것이며, 또 古史, 諸子의 연구는 훗날 있을 제자학 부흥운동과 연결된다. 청초의 명학(明學)으로부터 송학(宋學)으로, 다시 청중기의 청한학에서 전한의 공양학으로 소급했고, 선진의 제자학으로 소급하는 일련의 학문연구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청대의 학술연구는 시대를 역으로 거스르는 형태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사상적인 자유를 추구한 학술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유명종, 『淸代哲學史』, 이문출판사, 1989, p.406.
고증의 방법에 입각해 제자학을 연구한 왕중(汪中)은 大學의 저자가 증자(曾子)가 아닌 것을 고증으로 증명한다.
건륭(乾隆)연간(1711~1799) 『四庫全書』의 편찬은 선진시대의 제자에 관한 서적을 수집교감하고 문헌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제자학은 크게 진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교감(校勘)의 작업은 단지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저자의 입론의 수준까지 파고들어 그 입론의 방식을 문제로 삼기까지 했다. 『老子道德經考異』, 『呂氏春秋新校正』, 『管子校定』등.
때문에 교정을 한 정교본(精校本)이라 칭해지는 제자관계의 판본이 속속 간행되었다.
연구 작업은 계속 발전하여 각 제자가 독자적으로 체계화한 사상에 대한 해명으로까지 발달하기에 이른다. 『墨子後序』, 『荀子痛論』 등.
4. 결론
이상으로 제자백가라 하여 춘추전국시대에 주장된 각 학파의 중심된 주장들을 형성배경과 함께 살펴보고 아울러 한 무제 이전까지와 청대의 연구까지 살펴보았다.
제자학 안에 선진시대 유학도 포함되겠지만 비교를 위하여 유학을 제자학과는 구별되는 동중서 이후의 유학으로 놓고 본다면, 유학과 제자학 연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한 무제 이후 유학이 관학의 지위를 얻은 후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유학이 활발하게 연구된 시기였기 때문에, 몇몇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학 이외의 사상은 연구될 수 없는 제자학 입장에서는 암흑기였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자학은 유학과의 반비례 입장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각종 사상들은 도태와 흡수병합을 거듭하며 각각의 중심적 요소들이 유학에 녹아들면서 중국 전통 사상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송영배, 『諸子百家의 思想』, 현음사, 1994.
오재환, 『중국사상사』, 신서원, 1999.
유명종, 『淸代哲學史』, 이문출판사, 1989.
森三樹三郞 著, 임병덕 譯, 『중국 사상사』, 온누리, 1986.
貝塚茂樹 著, 김석근 譯, 『諸子百家』, 까치, 1989.
戶川芳郞 外 著, 조성을 外 譯, 『유교사』, 이론과 실천, 1990.
羅傳芳, 『退溪學報』102, 「諸子學에서 官學에 이르기까지」, 퇴계학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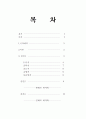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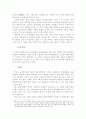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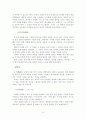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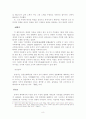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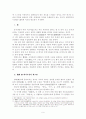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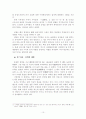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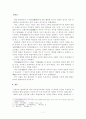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