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탈서구적 각성에서 출발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질성 간과
국가와 민족 담론 넘어서야
동아시아 국가간의 이질성 간과
국가와 민족 담론 넘어서야
본문내용
비껴가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동아시아 담론은 허구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은 우리의 인식의 실체를 객관화하고 재검토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일의적이고 공식화 되어왔던 문화해석의 틀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동아시아적 이어야 하며 서구와 동아시아의 이항대립은 정당한 것인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문화의 실체 규명 보다도 문화의 번역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타자를 우리의 언어로 재현할 것인가? 문화는 단순히 법적인 제도나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 속에 있으며 상징의 세계와 연결된 것인데 이를 몇 마디 단어로 이름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문제의식의 천착이 없는 동아시아 담론은 그것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담론과 똑같이 동양중심적 논리와 언어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보자.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와 문화적 동질성의 실천에 대한 동의는 어느 수준에까지 가능한 것인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시장의 확산과 국가간의 경쟁, 기업의 자율화와 국가간여의 확장성향, 전통과 현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수용하는 동아시아 담론은 어떤 것일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은 우리의 인식의 실체를 객관화하고 재검토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일의적이고 공식화 되어왔던 문화해석의 틀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동아시아적 이어야 하며 서구와 동아시아의 이항대립은 정당한 것인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문화의 실체 규명 보다도 문화의 번역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타자를 우리의 언어로 재현할 것인가? 문화는 단순히 법적인 제도나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 속에 있으며 상징의 세계와 연결된 것인데 이를 몇 마디 단어로 이름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문제의식의 천착이 없는 동아시아 담론은 그것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담론과 똑같이 동양중심적 논리와 언어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보자. 국가를 초월한 공동체와 문화적 동질성의 실천에 대한 동의는 어느 수준에까지 가능한 것인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시장의 확산과 국가간의 경쟁, 기업의 자율화와 국가간여의 확장성향, 전통과 현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수용하는 동아시아 담론은 어떤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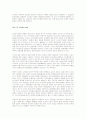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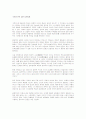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