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40) 이균성, 전게서. p. 239.
_ 배상책임제한약관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은 불감항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써 행하여졌거나 부주의하여 손해가 생길 것임을 알고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의 고의에 의한 불감항손실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주41)
주41) 이균성, 전게논문, p. 69 ; 田中誠二 吉田昻, エンメンタル, p. 205.
(3) 배상액제한약관무효설
_ 손해의 원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제한약관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주42)
주42) 이주홍,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특히 해상물건운송약관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p. 58.
_ 즉 배상액제한약관은 화물의 가액을 낮게 정함으로써 감항의무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면책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637] 다는 것이다.
_ 영국에서도 1924년 해상물건운송법제정 이전에는 감항의무에 위반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액제한약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불감항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모두 배상하여야 했다.주43)
주43) Ivamy, Carriage of Goods by Sea, 11he ed(London : Butterworths, 1979), p. 91.
_ 선박을 소독하지 않은 것은 감항능력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매 가축당 5파운드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주44)
주44) Tatlersall v. national Steamship Co. (1884) 12/Q, B. D. 297.
_ 가 있다. 독일 판례도 內海運航에 있어서 불감항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주45)
주45) Prussmann-Rabe, Sechandelsrecht, 2.Aufl.(Munchen : C. H. Back, 1983), Anm. D1, b 559; Abraham, Das Seerecht, 4. Aufl.(Berlin : Walter de Gruyter, 1974), S. 183.
_ 독일에서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HGB 제660조의 개별적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46)
주46) BGHZ 71, 167, 171.
_ 앞서 든 대법원판례 1965. 1. 12. 63다609에 대하여 배상액제한약관이 제78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주47)
주47) 배병태, 전게서, p. 227.
_ 가 있다.
(4) 사 견
_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불감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액제한약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론적 타당성과는 달리 현행법과 해운업계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1924년 조약하에 있는 해운업계에서는 손해액제한약관의 효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주48)
주48) Tetley, Marine Cargo Claims, 3rd ed. (Montreal: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1988), pp. 877 891.
_ 결국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도 이론적인 뒷받침보다는 운송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인정여부와 같은 차원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명문화한 개정상법하[638] 에서도 불감항과실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고, 상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주49)
주49) 이원석, 전게서, p.162 ; 채이식, 상법강의(하)(서울, 박영사 : 1992), p.765.
_ 이 때에도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은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인 운송인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하고 감독할 권한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의 고의 과실은 법인의 고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배상책임제한약관을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은 불감항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상법 제789조의 3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써 행하여졌거나 부주의하여 손해가 생길 것임을 알고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의 고의에 의한 불감항손실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주41)
주41) 이균성, 전게논문, p. 69 ; 田中誠二 吉田昻, エンメンタル, p. 205.
(3) 배상액제한약관무효설
_ 손해의 원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배상액제한약관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주42)
주42) 이주홍,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특히 해상물건운송약관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p. 58.
_ 즉 배상액제한약관은 화물의 가액을 낮게 정함으로써 감항의무위반으로 인한 엄중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면책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637] 다는 것이다.
_ 영국에서도 1924년 해상물건운송법제정 이전에는 감항의무에 위반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액제한약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불감항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모두 배상하여야 했다.주43)
주43) Ivamy, Carriage of Goods by Sea, 11he ed(London : Butterworths, 1979), p. 91.
_ 선박을 소독하지 않은 것은 감항능력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매 가축당 5파운드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주44)
주44) Tatlersall v. national Steamship Co. (1884) 12/Q, B. D. 297.
_ 가 있다. 독일 판례도 內海運航에 있어서 불감항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주45)
주45) Prussmann-Rabe, Sechandelsrecht, 2.Aufl.(Munchen : C. H. Back, 1983), Anm. D1, b 559; Abraham, Das Seerecht, 4. Aufl.(Berlin : Walter de Gruyter, 1974), S. 183.
_ 독일에서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HGB 제660조의 개별적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46)
주46) BGHZ 71, 167, 171.
_ 앞서 든 대법원판례 1965. 1. 12. 63다609에 대하여 배상액제한약관이 제78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주47)
주47) 배병태, 전게서, p. 227.
_ 가 있다.
(4) 사 견
_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불감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액제한약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론적 타당성과는 달리 현행법과 해운업계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1924년 조약하에 있는 해운업계에서는 손해액제한약관의 효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주48)
주48) Tetley, Marine Cargo Claims, 3rd ed. (Montreal: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1988), pp. 877 891.
_ 결국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도 이론적인 뒷받침보다는 운송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인정여부와 같은 차원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명문화한 개정상법하[638] 에서도 불감항과실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고, 상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주49)
주49) 이원석, 전게서, p.162 ; 채이식, 상법강의(하)(서울, 박영사 : 1992), p.765.
_ 이 때에도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은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인 운송인의 경우에는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해 유지 관리를 실행하고 감독할 권한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의 고의 과실은 법인의 고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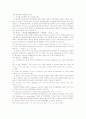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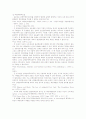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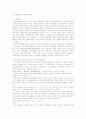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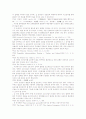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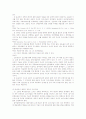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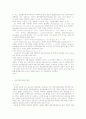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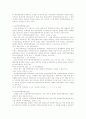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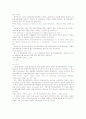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