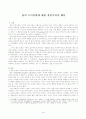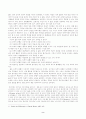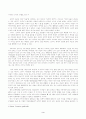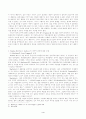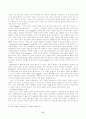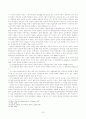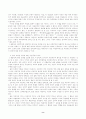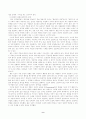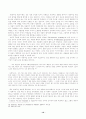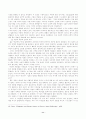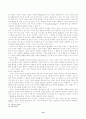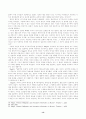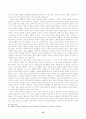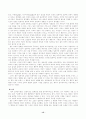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흄의 도덕감 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과 정의주의적 해석
2. Treatise Ⅲ, Part 1, Section 1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논쟁
3. 흄의 도덕감 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Ⅲ. 결론
Ⅱ. 본론
1. 흄의 도덕감 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과 정의주의적 해석
2. Treatise Ⅲ, Part 1, Section 1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논쟁
3. 흄의 도덕감 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듯이 인간의 정념도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도덕적 구분은 소감에 의존하고 정념과 느낌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정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우연적으로 처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한다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관념과 인상에 의해서 우리는 동일한 정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정념이 서로 부딪치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이익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개개인의 이익관심에서 벗어나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자극을 받는다면 동일한 정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적 구조는 동일하고, "마치 천체의 움직임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념에 근거하고 있는 흄의 도덕적 구분의 객관성은 정념들의 동일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흄의 도덕적 객관성은 정념들의 일치에 근거해 있다.
흄은 도덕적 분별을 도덕감이라는 주관적인 정념에 근거지웠지만, 인간 본성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인 도덕의 규준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도덕적 분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공감하여 발생하는 승인의 소감에 의존해 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욕구를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억제하듯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욕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즐거움에 공감하여 발생하는 즐거움에 의해서 억제해야 한다.
만약 흄이 이처럼 도덕적 분별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규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흄의 도덕감 이론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의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도덕적 명제는 단지 개개인의 감정의 표현이거나 혹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을 객관적인 규준에 의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정의주의적 입장에서도 때때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규준이 있어서 그 규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흄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는 행동에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결국 사회 전체나 그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된다. 이처럼 도덕적 분별의 일반적 기준을 상정하고 있는 체계가 정의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흄의 도덕감이론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흄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흄의 서술방식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의주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곳도 있고, 때로는 정의주의를 예견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흄의 도덕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도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흄은 도덕적 분별의 근거가 되는 소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태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섰을 때 불쾌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정념이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고, 일반적인 관점에 서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것,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념의 흐름에 의해서 단기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
만약 흄의 도덕철학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흄이 개인적인 정념에 도덕적 분별을 근거지우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흄은 도덕적 분별이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고 도덕적 소감, 즉 느낌에 도덕적 분별을 근거지웠기 때문에 도덕적 주관주의자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도덕적 소감이 다른 소감들과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본다면,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행위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즐거움에 공감할 때" 발생하는 소감이 도덕적 분별의 근거가 되는 소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덕적 즐거움을 다른 즐거움과 구별하는 것은 특징은, 이것이 공정한 관점에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에 공감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감이지만 이 소감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행동이 나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에, 그리고 타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흄의 도덕철학을 정의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흄의 도덕체계에서 도덕적 소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낼 수가 없다. 어떤 행위를 공정한 관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승인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하여 나와 동일한 태도를 갖게 하려는 설득의 근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다는 명제의 의미의 일부이다. 흄의 체계에서 당위는 사실에 의존해 있다.
참고문헌
김태길 (1998), 『윤리학』, 서울: 박영사.
김효명 (1995), 「흄의 자연주의」, 『흄의 자연주의』, 한국분석철학회 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11-35.
황경식 (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도덕적 구분은 소감에 의존하고 정념과 느낌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정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우연적으로 처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한다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관념과 인상에 의해서 우리는 동일한 정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정념이 서로 부딪치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이익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개개인의 이익관심에서 벗어나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자극을 받는다면 동일한 정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적 구조는 동일하고, "마치 천체의 움직임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념에 근거하고 있는 흄의 도덕적 구분의 객관성은 정념들의 동일한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흄의 도덕적 객관성은 정념들의 일치에 근거해 있다.
흄은 도덕적 분별을 도덕감이라는 주관적인 정념에 근거지웠지만, 인간 본성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인 도덕의 규준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도덕적 분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공감하여 발생하는 승인의 소감에 의존해 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욕구를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욕구에 의해서 억제하듯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욕구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타인의 즐거움에 공감하여 발생하는 즐거움에 의해서 억제해야 한다.
만약 흄이 이처럼 도덕적 분별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규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흄의 도덕감 이론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의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도덕적 명제는 단지 개개인의 감정의 표현이거나 혹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을 객관적인 규준에 의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 정의주의적 입장에서도 때때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규준이 있어서 그 규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흄은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는 행동에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결국 사회 전체나 그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된다. 이처럼 도덕적 분별의 일반적 기준을 상정하고 있는 체계가 정의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흄의 도덕감이론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흄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흄의 서술방식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의주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곳도 있고, 때로는 정의주의를 예견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흄의 도덕감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도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흄은 도덕적 분별의 근거가 되는 소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행동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태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섰을 때 불쾌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정념이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고, 일반적인 관점에 서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것,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념의 흐름에 의해서 단기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
만약 흄의 도덕철학을 정의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흄이 개인적인 정념에 도덕적 분별을 근거지우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흄은 도덕적 분별이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고 도덕적 소감, 즉 느낌에 도덕적 분별을 근거지웠기 때문에 도덕적 주관주의자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도덕적 소감이 다른 소감들과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본다면, 결코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행위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즐거움에 공감할 때" 발생하는 소감이 도덕적 분별의 근거가 되는 소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덕적 즐거움을 다른 즐거움과 구별하는 것은 특징은, 이것이 공정한 관점에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에 공감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감이지만 이 소감을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행동이 나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에, 그리고 타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흄의 도덕철학을 정의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흄의 도덕체계에서 도덕적 소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낼 수가 없다. 어떤 행위를 공정한 관망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승인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하여 나와 동일한 태도를 갖게 하려는 설득의 근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악하다는 명제의 의미의 일부이다. 흄의 체계에서 당위는 사실에 의존해 있다.
참고문헌
김태길 (1998), 『윤리학』, 서울: 박영사.
김효명 (1995), 「흄의 자연주의」, 『흄의 자연주의』, 한국분석철학회 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11-35.
황경식 (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추천자료
 교육심리학 - 행동주의 학습이론
교육심리학 - 행동주의 학습이론 청년발달에 관한 이론
청년발달에 관한 이론 다중지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다중지능에 관한 이론적 배경 청년발달의 이해 1 초기이론
청년발달의 이해 1 초기이론 [교육학]몬테소리교육의 이론과 실제(A+리포트)
[교육학]몬테소리교육의 이론과 실제(A+리포트) [심리철학]표상적 심리론의 이론적 배경 및 성격에 관한 고찰
[심리철학]표상적 심리론의 이론적 배경 및 성격에 관한 고찰 [교육학 서브노트]교수학습이론
[교육학 서브노트]교수학습이론 보육과정의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이론
보육과정의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이론 [보육과정] 발달이론 중 성숙주의와 행동주의에 따른 보육교사의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시고, ...
[보육과정] 발달이론 중 성숙주의와 행동주의에 따른 보육교사의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시고, ... 주입식 교육과 성장식 교육관 비교 및 피아제 인지발달단계이론의 설명과 교육적 시사점논하기
주입식 교육과 성장식 교육관 비교 및 피아제 인지발달단계이론의 설명과 교육적 시사점논하기 주입식 교육관과 성장식 교육관 비교 설명,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이론
주입식 교육관과 성장식 교육관 비교 설명,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이론 교육관과 에릭슨의 성격발달단계이론
교육관과 에릭슨의 성격발달단계이론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B형]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교육목표 및 원리, 교육...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B형]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교육목표 및 원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