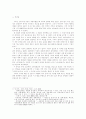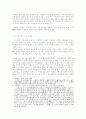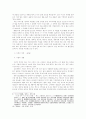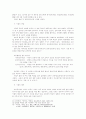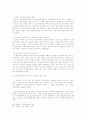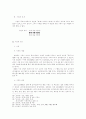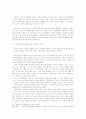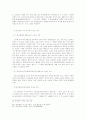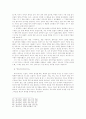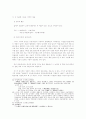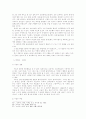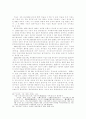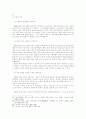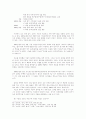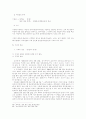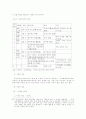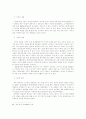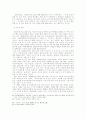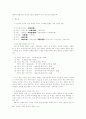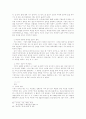-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Ⅰ. 머리말
Ⅱ. 서희의 선대
1. 서희의 조부
2. 서희의 부친
Ⅲ. 서희와 자손
1. 서희(서희)
2. 서희의 아들
3. 서희의 손자
Ⅳ. 서희의 후손
1. 서희의 증손
2. 서희의 현손
Ⅴ. 맺는말
Ⅱ. 서희의 선대
1. 서희의 조부
2. 서희의 부친
Ⅲ. 서희와 자손
1. 서희(서희)
2. 서희의 아들
3. 서희의 손자
Ⅳ. 서희의 후손
1. 서희의 증손
2. 서희의 현손
Ⅴ. 맺는말
본문내용
) 서신일(서신일) - 서필(서필)
2) 서필 - 서염(서염).서희(서희).서영(서영)
3) 서희 - 서눌(눌).서유걸(유걸).서유위(유위).서주행(주행)
4) 서유걸 - 서정(정).서존(존)
5) 서정 - 서균(서균)
6) 서균 - 서순(서순).서원(서원).서공(서공).서성(서성).서순(서순).서염(서염)
2. 5대 재상(재상)을 지낸 가계
고려 초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 내의령으로 재상이 된 뒤 5대가 재상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상(재상)이란 임금을 도와 백관을 지휘하던 2품 이상의 벼슬을 일컫는 말로 그야말로 당시 지배층의 실세들이었다. 서필을 포함한 6대의 최고 벼슬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희의 아버지 서필 - 내의령(내의령) 종1품
② 서희 - 내사령(내사령) 종1품
③ 서희의 아들 서눌 - 내사령(내사령) 종1품
서희의 아들 서유걸(유걸) - 상서도성 좌복야(좌복사) 정2품
④ 서희의 손자 서정(서정) - 판삼사사(판삼사사) 종1품
⑤ 서희의 증손 서균(서균) - 판장작감사(판장작감사) 종3품
⑥ 서희의 현손 서순(서순) - 동지추밀원사(동지추밀원사) 종2품
서희의 현손 서공(서공) - 판삼사사(판삼사사) 종1품
여기서 보면 서희의 손자 서균만 종3품인 판장작감사로 재상이 되는데 한 품계가 모자라고 나머지 5대는 모두 재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책도 국가의 최고 중추기관인 내의령, 내사령, 상서성, 삼사, 추밀원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170년(의종 24년) 정중부들이 무신의 난을 일으켜 문신들이 참화를 당할 때까지 서희 가계의 화려한 벼슬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3. 바른말을 잘하는 강직한 선비 가계.
서필의 열전에 보면 그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임금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왕의 하사품을 받을 수 없다. ② 공 없는 사람이란 바로 너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신이 사는 집을 바치고자 합니다. ④ 마굿간에 불이 나면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서희도 그러한 면을 유감없이 발휘한 3가지 사실이 열전에 실려 있다. ① 왕이 몰래 절에 가서 놀아서는 안 된다. ② 임금이 신하의 막사에 들어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③ 바른말하는 데는 관직의 높낮이가 없다
서희의 아들 서눌은 중승(중승)이란 어사대(어사대) 종4품 벼슬을 지냈는데 어사대는 정치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벼슬아치의 잘못을 탄핵하던 관아였다. 서눌은 항상 국법을 중요시하여 '귀화인도 국법대로 처리하자'고 했던 일화가 고려사에 나와있다. 서희의 증손인 서균은 「자기 뜻을 지키는 바가 태산과 같아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라에서 자주 그를 어사로 보내어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게 하니, 그가 지나가는 지방의 관리들이 몰래 명함을 들이밀며 교섭을 하고자 하였으나, 복양공(서균)은 홀로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하였다」고 하였고, 서희의 현손인 서순은 성질이 곧도 아첨하지 않아 주위의 질시를 받아 좌천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3. 외교와 국방에 종사한 인물이 많다.
서희 선생이 거란의 80만 대군을 혼자서 물리친 외교가이며 여진을 물리치고 압록강까지 확보한 전략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서희의 아들인 서눌도 거란 국내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을 적당히 구사한 대외정책을 쓰면서 우리 방비를 튼튼하게 하였다.
손자 서정은 전중소감(전중소감)으로 있을 때 거란에 다녀오고, 병부상서, 서북면병마사(서북면병마사) 겸 중군병마사(중군병마사) 같은 직책을 맡은 것을 보면 거란과의 외교와 국방에 대해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손인 서순은 외국에 사신을 가는 외교관 역할을 하였으며, 평안도를 지키는 절도사가 되어 국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서희는 장군이 아니었다.
서희는 18세에 급제하여 나이 50이 될 때까지 주로 상서성과 내사성 같은 상급기관의 주요 부서에서 일했다. 그러나 50이 넘어 거란이 고려를 넘보기 시작하자 중군사로 북쪽 국경을 지키고 52세 때인 993년에는 그 유명한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국가를 구한다. 이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군사를 이끌고 변방을 지키거나 성을 쌓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희는 문관이다. 우리가 흔히 거란을 무찔렀다고 해서 '서희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정
가. 서희의 생졸
서희가 태어난 해는 어느 사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추산해야 한다. 고려사 세가에 「목종 원년(998) 가을 7월 14일(경오), 태보내사령(태보내사령) 서희(서희)가 졸하였다」
) 『고려사』 3권, 세가3, 목종.
秋七月庚午 太保內史令 徐熙 卒.
고 했으며, 서희 열전에는 「목종 원년(998년) 돌아가시니 57세였다」
) 『고려사』 권 93, 열전 권 제6
고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에서 모두 돌아가신 해가 998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98년에서 57년을 거꾸로 역산해 가면 942년(태조25년) 임인(임인)년에 1살이 된다. 그런데 서희 열전에 보면 「광종 11년 나이 18세에 갑과에 급제하여 광평원외랑에 임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 『고려사』 권 93, 열전 권 제6, 서희전
光宗十一年年十八擢甲科超授廣評員外郞
. 광종 11년은 960년이기 때문에 만일 서희가 942년에 태어났다면 19세가 되어야 하고, 한편 960년에 18세라면 943년에 태어나야 마땅하기 때문에 1년의 오차가 생긴다.
서희가 태어난 942년에는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낙타 50필을 바쳤으나 태조가 사신교환을 거절한 해이다. 고려 태조는 "거란이 일찌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의심을 내어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아주 무도한 것으로 화친을 맺어 이웃을 삼을 것이 못된다"며, 사신 30명을 섬에 유배시키고 낙타를 만부교(만부교) 아래 매어놓아 굶겨 죽였던 것이다. 943년에는 4월에 태조가 「훈요십조(훈요십조)」를 내리고 5월에 승하한 해이다.
2) 서필 - 서염(서염).서희(서희).서영(서영)
3) 서희 - 서눌(눌).서유걸(유걸).서유위(유위).서주행(주행)
4) 서유걸 - 서정(정).서존(존)
5) 서정 - 서균(서균)
6) 서균 - 서순(서순).서원(서원).서공(서공).서성(서성).서순(서순).서염(서염)
2. 5대 재상(재상)을 지낸 가계
고려 초 서희의 아버지 서필이 내의령으로 재상이 된 뒤 5대가 재상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상(재상)이란 임금을 도와 백관을 지휘하던 2품 이상의 벼슬을 일컫는 말로 그야말로 당시 지배층의 실세들이었다. 서필을 포함한 6대의 최고 벼슬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희의 아버지 서필 - 내의령(내의령) 종1품
② 서희 - 내사령(내사령) 종1품
③ 서희의 아들 서눌 - 내사령(내사령) 종1품
서희의 아들 서유걸(유걸) - 상서도성 좌복야(좌복사) 정2품
④ 서희의 손자 서정(서정) - 판삼사사(판삼사사) 종1품
⑤ 서희의 증손 서균(서균) - 판장작감사(판장작감사) 종3품
⑥ 서희의 현손 서순(서순) - 동지추밀원사(동지추밀원사) 종2품
서희의 현손 서공(서공) - 판삼사사(판삼사사) 종1품
여기서 보면 서희의 손자 서균만 종3품인 판장작감사로 재상이 되는데 한 품계가 모자라고 나머지 5대는 모두 재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책도 국가의 최고 중추기관인 내의령, 내사령, 상서성, 삼사, 추밀원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170년(의종 24년) 정중부들이 무신의 난을 일으켜 문신들이 참화를 당할 때까지 서희 가계의 화려한 벼슬은 계속되었던 것이다.
3. 바른말을 잘하는 강직한 선비 가계.
서필의 열전에 보면 그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임금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왕의 하사품을 받을 수 없다. ② 공 없는 사람이란 바로 너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신이 사는 집을 바치고자 합니다. ④ 마굿간에 불이 나면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서희도 그러한 면을 유감없이 발휘한 3가지 사실이 열전에 실려 있다. ① 왕이 몰래 절에 가서 놀아서는 안 된다. ② 임금이 신하의 막사에 들어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③ 바른말하는 데는 관직의 높낮이가 없다
서희의 아들 서눌은 중승(중승)이란 어사대(어사대) 종4품 벼슬을 지냈는데 어사대는 정치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벼슬아치의 잘못을 탄핵하던 관아였다. 서눌은 항상 국법을 중요시하여 '귀화인도 국법대로 처리하자'고 했던 일화가 고려사에 나와있다. 서희의 증손인 서균은 「자기 뜻을 지키는 바가 태산과 같아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라에서 자주 그를 어사로 보내어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게 하니, 그가 지나가는 지방의 관리들이 몰래 명함을 들이밀며 교섭을 하고자 하였으나, 복양공(서균)은 홀로 (흔들리지 않고) 태연자약하였다」고 하였고, 서희의 현손인 서순은 성질이 곧도 아첨하지 않아 주위의 질시를 받아 좌천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3. 외교와 국방에 종사한 인물이 많다.
서희 선생이 거란의 80만 대군을 혼자서 물리친 외교가이며 여진을 물리치고 압록강까지 확보한 전략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서희의 아들인 서눌도 거란 국내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을 적당히 구사한 대외정책을 쓰면서 우리 방비를 튼튼하게 하였다.
손자 서정은 전중소감(전중소감)으로 있을 때 거란에 다녀오고, 병부상서, 서북면병마사(서북면병마사) 겸 중군병마사(중군병마사) 같은 직책을 맡은 것을 보면 거란과의 외교와 국방에 대해 상당한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손인 서순은 외국에 사신을 가는 외교관 역할을 하였으며, 평안도를 지키는 절도사가 되어 국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서희는 장군이 아니었다.
서희는 18세에 급제하여 나이 50이 될 때까지 주로 상서성과 내사성 같은 상급기관의 주요 부서에서 일했다. 그러나 50이 넘어 거란이 고려를 넘보기 시작하자 중군사로 북쪽 국경을 지키고 52세 때인 993년에는 그 유명한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국가를 구한다. 이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군사를 이끌고 변방을 지키거나 성을 쌓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희는 문관이다. 우리가 흔히 거란을 무찔렀다고 해서 '서희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정
가. 서희의 생졸
서희가 태어난 해는 어느 사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추산해야 한다. 고려사 세가에 「목종 원년(998) 가을 7월 14일(경오), 태보내사령(태보내사령) 서희(서희)가 졸하였다」
) 『고려사』 3권, 세가3, 목종.
秋七月庚午 太保內史令 徐熙 卒.
고 했으며, 서희 열전에는 「목종 원년(998년) 돌아가시니 57세였다」
) 『고려사』 권 93, 열전 권 제6
고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에서 모두 돌아가신 해가 998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98년에서 57년을 거꾸로 역산해 가면 942년(태조25년) 임인(임인)년에 1살이 된다. 그런데 서희 열전에 보면 「광종 11년 나이 18세에 갑과에 급제하여 광평원외랑에 임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 『고려사』 권 93, 열전 권 제6, 서희전
光宗十一年年十八擢甲科超授廣評員外郞
. 광종 11년은 960년이기 때문에 만일 서희가 942년에 태어났다면 19세가 되어야 하고, 한편 960년에 18세라면 943년에 태어나야 마땅하기 때문에 1년의 오차가 생긴다.
서희가 태어난 942년에는 거란이 사신을 보내와 낙타 50필을 바쳤으나 태조가 사신교환을 거절한 해이다. 고려 태조는 "거란이 일찌기 발해와 화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의심을 내어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아주 무도한 것으로 화친을 맺어 이웃을 삼을 것이 못된다"며, 사신 30명을 섬에 유배시키고 낙타를 만부교(만부교) 아래 매어놓아 굶겨 죽였던 것이다. 943년에는 4월에 태조가 「훈요십조(훈요십조)」를 내리고 5월에 승하한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