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고, 主觀的 不能이란 債務者에 의해서는 給付가 不能이지만 第3者는 給付가 可能한 경우라고 兩者를 區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一身專屬的 給付는 客觀的 不能에 속하에 되어 原始的 不能의 경우에 獨逸民法 306가 適用되는 것은 不當하다는 理由에서, 一身專屬的 給付를 主觀的 不能에 所屬시키기 위해 主觀的 不能을 그 不能이 債務者 自身의 一身上의 事情에 기하는 경우로 定義하는 少數說도 存在한다(이 見解가 우려의 通說인 듯하다).
주10) 學說로서는 原始的 主觀的 不能인 경우가 保證責任이 아니라 過失責任이라는 見解도 적지않게 存在한다.
주11) 우리의 學說은 目的이 不能한 契約이 無效라는 事實을 흔히 契約不成立이기에 無效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契約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에 관한 混同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目的의 不能은 法律行爲의 效力要件이지 成立要件은 아닌 것이다. 法律行爲의 成立要件으로서 들고 있는 \"目的\"은 當事者가 發生시키고자 하는 法律效果를 意味하지 目的物을 意味하지 않는다. 따라서 目的이 不能한 契約은 效力이 없는 契約일지는 몰라도 成立하지 않은 契約은 아니다. 더구나 筆者가 잘못보고 있지 않다면 獨民 306는 成立된 契約을 無效로 宣言하고 있는 規定이다. 獨逸法上 不能槪念이 債務者의 給付義務를 해방시켜 주는 役割을 하고, 目的이 不能만 契約을 無效로 함으로써 債權者의 反對給付義務도 消滅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단 債務者의 給付義務와 債權者의 反對給付義務가 成立되고 있음을 前提해야 한다. 즉 契約은 成立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契約의 不成立을 認定하고 있다면 給付義務의 解放效와 反對給付義務의 消滅 등은 說明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우리 學說이 目的이 不能한 契約을 不成立으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民法 第535條에 대해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할 수 있는 可能性이 封鎖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주12) 이하의 獨逸立法者意思에 관해서는 Soergel Kommentar-Wolf(12, Aufl. 1990), 306, 옆의 번호 1.
주13) 郭潤直, 民法總則, 357면; 장경학, 民法總則, 434면.
주14) 郭潤直, 위의 책.
주15) 金疇洙, 民法總則, 273면; 고상용, 民法總則, 350면.
주16) 독일의 判例와 通說이기도 하다.
주17) Emmerich, 앞의 책, 29면; Abschhlusbericht der Kommission zur U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1992, 16면.
주18) Emmerich, 위의 책.
주19) 原始的 不能이냐 後發的 不能이냐에 따른 法律效果의 差異가 不當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例는, 도자기를 賣渡하고 引渡하기 前에 過失로 깨뜨린 경우는 債務者가 履行 利益의 賠償을 해야 하는데, 도자기를 깨뜨리고 이를 賣渡한 경우는 信賴利益만을 賠償하면 된다는 結果가 그것이다(梁彰洙, 앞의 論文, 130면 참조).
주20) 梁彰洙, 앞의 論文, 129면 註(219).
주21) Larenz, Schuldrecht I,14. Aufl., 1987, 99면 註(5).
주22) 이에 반해 프랑스法은 無效 取消의 경우에 發生하는 損害賠償問題를 一括的으로 不法行爲法의 一般條項(Art. 1382, 1383, Code civil)에 의해 解決하고 있다.
주23) 李英俊, 民法總則, 201면; Braun, Die Unmoglichkeit der Leistung, JA 1983, 576면.
주24) Fabricius, Leistungsstorungen im Arbeitsverhaltnis, 1970, 102면.
주25) Emmerich, 앞의 책, 31면.
주26) Larenz, 앞의 책, 104면.
주27) Fikentscher, Schuldrecht, 8. Aufl., 1992, 219면, 옆번호 327.
주28) Medicus, \"Verschulden bei Vertragsverhandlungen\",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I, 1981, 511면.
주29) Metlicus가 옳게 指摘했드시(JZ 1988, 757), 無意味性(sinnlosigkeit)이라는 槪念은 抽象的이라서 危險하기 까지하다. 그러나 抽象的이면서도 一般의 用語使用槪念과 連結되는 묘한 長點을 이 用語는 지니고 있고, 그러한 뜻에서만 이 用語를 使用했음을 밝힌다.
주30) 우리 民法 第569條가 바로 그러한 例로 여겨진다. 獨逸法에서는 이 경우에 期待可能性(Zumutbarkeit) 槪念에 의해 債務者의 調達義務(Beschaffungspflicht)가 認定되고 있다.
주31) 玄勝種, 民法案意見書, 161면 이하.
주32) 郭潤直, 債權叢論, 137면에서 主觀的 不能과 客觀的 不能의 區分이 不必要하다고 하면서, 債權各論, 89면에서 民法 第535條를 原始的 客觀的 不能의 경우로 보는 것은, 原始的 主觀的 不能의 問題가 解明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循環論理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金疇洙, 債權總論 112면과 債權各論(上) 79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여기서의 \"客觀的\"이라는 意味는 \"主觀的\"인 것의 反對用語로서가 아니라 \"社會通念\" 내지 \"去來觀念\"이라는 意味로 通說이 使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社會通念\" 속에는 客觀的 主觀的 不能이 모두 包括되고 있다. 筆者의 이러한 느낌이 옳다면, 그것은 用語의 誤用으로서 理解에 混亂을 초래할 뿐이며, 또 \"社會通念\"이라는 모호한 槪念속에서는 不能의 成立여부에 대한 基準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姿意的 解釋이 可能하다는 危險性이 엿보인다.
주33) 李好挻, 債權法總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22면.
주34) 이러한 立場은 權利賣買의 경우에 原始的 客觀的 不可避하게 民法 第535條가 適用될 수 밖에 없다는 通說(宋德洙, 債權賣渡人의 擔保責任, 考試硏究, 1989.9月, 119면 참조)의 不當한 結果를 막아줄 것이며, 또 우리 判例(註釋債權各則 Ⅰ-金炫彩 제569조, 551면참조)가 民法 第569條를 不能의 경우로 여기지 않는다는 技巧的 方法도 不必要하게 만들 것이다.
주10) 學說로서는 原始的 主觀的 不能인 경우가 保證責任이 아니라 過失責任이라는 見解도 적지않게 存在한다.
주11) 우리의 學說은 目的이 不能한 契約이 無效라는 事實을 흔히 契約不成立이기에 無效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契約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에 관한 混同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目的의 不能은 法律行爲의 效力要件이지 成立要件은 아닌 것이다. 法律行爲의 成立要件으로서 들고 있는 \"目的\"은 當事者가 發生시키고자 하는 法律效果를 意味하지 目的物을 意味하지 않는다. 따라서 目的이 不能한 契約은 效力이 없는 契約일지는 몰라도 成立하지 않은 契約은 아니다. 더구나 筆者가 잘못보고 있지 않다면 獨民 306는 成立된 契約을 無效로 宣言하고 있는 規定이다. 獨逸法上 不能槪念이 債務者의 給付義務를 해방시켜 주는 役割을 하고, 目的이 不能만 契約을 無效로 함으로써 債權者의 反對給付義務도 消滅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단 債務者의 給付義務와 債權者의 反對給付義務가 成立되고 있음을 前提해야 한다. 즉 契約은 成立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契約의 不成立을 認定하고 있다면 給付義務의 解放效와 反對給付義務의 消滅 등은 說明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우리 學說이 目的이 不能한 契約을 不成立으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民法 第535條에 대해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할 수 있는 可能性이 封鎖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주12) 이하의 獨逸立法者意思에 관해서는 Soergel Kommentar-Wolf(12, Aufl. 1990), 306, 옆의 번호 1.
주13) 郭潤直, 民法總則, 357면; 장경학, 民法總則, 434면.
주14) 郭潤直, 위의 책.
주15) 金疇洙, 民法總則, 273면; 고상용, 民法總則, 350면.
주16) 독일의 判例와 通說이기도 하다.
주17) Emmerich, 앞의 책, 29면; Abschhlusbericht der Kommission zur U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1992, 16면.
주18) Emmerich, 위의 책.
주19) 原始的 不能이냐 後發的 不能이냐에 따른 法律效果의 差異가 不當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例는, 도자기를 賣渡하고 引渡하기 前에 過失로 깨뜨린 경우는 債務者가 履行 利益의 賠償을 해야 하는데, 도자기를 깨뜨리고 이를 賣渡한 경우는 信賴利益만을 賠償하면 된다는 結果가 그것이다(梁彰洙, 앞의 論文, 130면 참조).
주20) 梁彰洙, 앞의 論文, 129면 註(219).
주21) Larenz, Schuldrecht I,14. Aufl., 1987, 99면 註(5).
주22) 이에 반해 프랑스法은 無效 取消의 경우에 發生하는 損害賠償問題를 一括的으로 不法行爲法의 一般條項(Art. 1382, 1383, Code civil)에 의해 解決하고 있다.
주23) 李英俊, 民法總則, 201면; Braun, Die Unmoglichkeit der Leistung, JA 1983, 576면.
주24) Fabricius, Leistungsstorungen im Arbeitsverhaltnis, 1970, 102면.
주25) Emmerich, 앞의 책, 31면.
주26) Larenz, 앞의 책, 104면.
주27) Fikentscher, Schuldrecht, 8. Aufl., 1992, 219면, 옆번호 327.
주28) Medicus, \"Verschulden bei Vertragsverhandlungen\",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I, 1981, 511면.
주29) Metlicus가 옳게 指摘했드시(JZ 1988, 757), 無意味性(sinnlosigkeit)이라는 槪念은 抽象的이라서 危險하기 까지하다. 그러나 抽象的이면서도 一般의 用語使用槪念과 連結되는 묘한 長點을 이 用語는 지니고 있고, 그러한 뜻에서만 이 用語를 使用했음을 밝힌다.
주30) 우리 民法 第569條가 바로 그러한 例로 여겨진다. 獨逸法에서는 이 경우에 期待可能性(Zumutbarkeit) 槪念에 의해 債務者의 調達義務(Beschaffungspflicht)가 認定되고 있다.
주31) 玄勝種, 民法案意見書, 161면 이하.
주32) 郭潤直, 債權叢論, 137면에서 主觀的 不能과 客觀的 不能의 區分이 不必要하다고 하면서, 債權各論, 89면에서 民法 第535條를 原始的 客觀的 不能의 경우로 보는 것은, 原始的 主觀的 不能의 問題가 解明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循環論理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金疇洙, 債權總論 112면과 債權各論(上) 79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여기서의 \"客觀的\"이라는 意味는 \"主觀的\"인 것의 反對用語로서가 아니라 \"社會通念\" 내지 \"去來觀念\"이라는 意味로 通說이 使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社會通念\" 속에는 客觀的 主觀的 不能이 모두 包括되고 있다. 筆者의 이러한 느낌이 옳다면, 그것은 用語의 誤用으로서 理解에 混亂을 초래할 뿐이며, 또 \"社會通念\"이라는 모호한 槪念속에서는 不能의 成立여부에 대한 基準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姿意的 解釋이 可能하다는 危險性이 엿보인다.
주33) 李好挻, 債權法總論, 韓國放送通信大學, 122면.
주34) 이러한 立場은 權利賣買의 경우에 原始的 客觀的 不可避하게 民法 第535條가 適用될 수 밖에 없다는 通說(宋德洙, 債權賣渡人의 擔保責任, 考試硏究, 1989.9月, 119면 참조)의 不當한 結果를 막아줄 것이며, 또 우리 判例(註釋債權各則 Ⅰ-金炫彩 제569조, 551면참조)가 民法 第569條를 不能의 경우로 여기지 않는다는 技巧的 方法도 不必要하게 만들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감시/검열/통제의 수단인 통신질서확립법
감시/검열/통제의 수단인 통신질서확립법 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비진의의사표시 사례
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비진의의사표시 사례 [사회복지론] 장애인을 위한 독일의 재활 서비스 체계
[사회복지론] 장애인을 위한 독일의 재활 서비스 체계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위부
보험위부 [형법 케이스 풀이*학교시험대비*리포트 찹고자료] 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형법 케이스 풀이*학교시험대비*리포트 찹고자료] 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연구
장애청소년 수련활동 연구 [성폭력][성범죄][성폭행][전자팔찌][전자발찌][화학적거세][성희롱]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성폭력][성범죄][성폭행][전자팔찌][전자발찌][화학적거세][성희롱]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논술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임금
논술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임금  [분석/조사]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분석/조사]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장애아동복지서비스 개념, 현황, 문제점
장애아동복지서비스 개념, 현황, 문제점 UCP 600 한글 해석본
UCP 600 한글 해석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전략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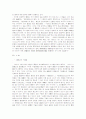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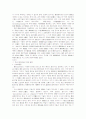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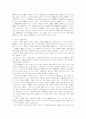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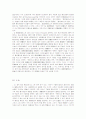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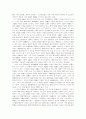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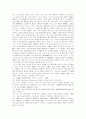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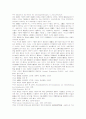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