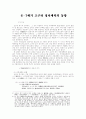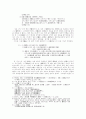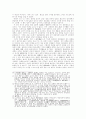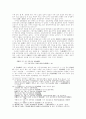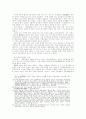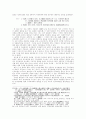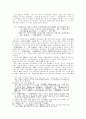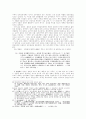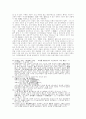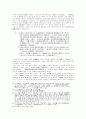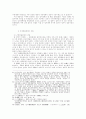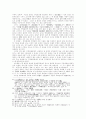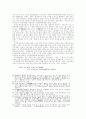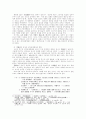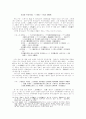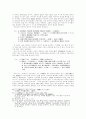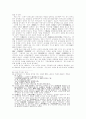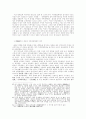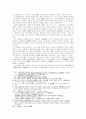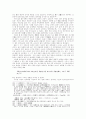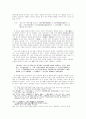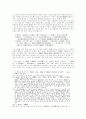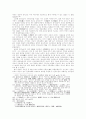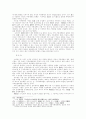목차
머 리 말
1. 新進政治勢力의 성장과 추이
(1) 귀족세력의 분열
(2) 신진정치세력의 성장
2. 귀족연립체제의 성립
(1) 귀족연립정권의 성립
(2) 莫離支의 등장과 정치운영체제의 변화
3. 淵蓋蘇文의 집권과 귀족연립체제의 붕괴
맺 음 말
1. 新進政治勢力의 성장과 추이
(1) 귀족세력의 분열
(2) 신진정치세력의 성장
2. 귀족연립체제의 성립
(1) 귀족연립정권의 성립
(2) 莫離支의 등장과 정치운영체제의 변화
3. 淵蓋蘇文의 집권과 귀족연립체제의 붕괴
맺 음 말
본문내용
구려본기 寶藏王 26·27년조 및 <<唐書>> 권220 高麗傳
연개소문의 弟 淵淨土도 12성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는데,
)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 文武王 6년조 및 <<唐書>> 권220 高麗傳
이러한 지방세력의 이탈 역시 남생 및 국내성의 이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국내성·신성·부여성 등 서북방의 중요 거점들을 차례로 상실함에 따라 고립된 평양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고구려가 對唐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지배 귀족세력들의 분열과 이탈이다. 對唐 전쟁의 중요 무력 기반인 지방세력의 이탈도 귀족세력의 분열·이탈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 고구려 말기 지방세력의 이탈의 원인은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리라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한 해명은 후고로 미루겠다.
그런데 이때 이처럼 귀족세력 간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된 이유는 기왕의 귀족 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를 붕괴시킨 연개소문家의 파행적인 집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는 불안정한 면도 적지 않았지만, 당시 귀족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분산적인 귀족세력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집권과 사적 권력의 강화는 이러한 정치운영체제를 붕괴시킨 것이다. 따라서 귀족세력 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상실함으로써 귀족세력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거듭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끝내 귀족세력의 분열과 이탈을 결과하였던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6·7세기 고구려 정치사의 전개 과정을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의 갈등·대립이라는 구조 속에서 귀족연립체제의 형성과 전개, 붕괴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6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나는 왕위계승전을 비롯한 귀족들의 정쟁은 기본적으로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귀족세력사이의 정치적 갈등이었다. 국내계 귀족은 舊都인 국내지역에 세력기반을 둔 구귀족세력이며, 평양계 귀족은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전후하여 왕권의 지지 기반으로 등장한 신진 정치세력이었다. 이들 평양계 귀족세력은 그 구성이 다양한데, 대체로 평양 지역의 지방 호족세력과 중국계 망명인 및 일부 富民으로서 정치적 진출에 성공한 세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왕은 이들 신진 정치세력을 지원하여 구귀족세력을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전제적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배세력을 편제하는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점차 독자적 운동력을 갖게 된 신·구귀족세력들은 왕위계승전을 통하여 왕권을 압도하면서 귀족연립체제를 성립시킨 것이다.
귀족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은 部體制 해체 이후 각 가문별로 결집되어 간 귀족집단이었다. 이들은 고구려 중기 왕권이 지향한 관료체제의 질서를 일면 부정하면서 새로운 정치 운영체제를 모색하였는데, 그것의 하나가 다수의 莫離支를 중심으로 하는 大對盧 - 莫離支 운영체제였다.
莫離支는 곧 2위의 관등인 太大兄과 동일한 官이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어디까지나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되는 고구려 후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막리지는 군사권을 장악한 官으로, 각 귀족집단의 개별적인 무력 배경이 요구되는 귀족연립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중추로 등장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정치운영체제는 각 귀족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막리지를 차지하고, 이들 막리지 중에서 임기 3년의 대대로가 교대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귀족세력 간의 합의와 세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극한적인 정쟁을 겪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귀족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운영체제는 귀족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조절 통제할 충분한 정치적 기능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성장,수·당제국의 출현이라는 대외적 정세 변동에 따라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 간의 모순을 심화시켜 결국 연개소문의 정변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집권 이후 太大對盧·太莫離支 등의 집권적 관직을 신설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私的 권력 기반의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것은 기왕의 大對盧 - 莫離支를 중심으로하는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연개소문의 사후 권력의 공백기에 귀족세력과 이와 연결된 지방 세력의 이탈을 초래하여, 끝내 對唐 전쟁에서의 패배를 결과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글의 논지가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해명되었어야 함에도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먼저 본 글은 6·7세기의 정치사를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귀족세력의 갈등·대립이란 틀 속에서 단순화시켜 이해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평양계 귀족세력은 그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1백 여년 동안 내부의 차별성과 분열이 없이 하나의 정치 세력권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동향을 추적해 볼 수 없었고, 말기까지도 국내계 귀족세력이 하나의 정치 세력권을 형성하였음을 보면, 이 시기 정치세력의 가장 큰 범주로서 평양계 - 국내계 귀족세력의 대립 구조를 설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만 이들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들의 세력 기반의 차이와 독자적인 운동력을 유지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는데, 이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음 고구려 후기 귀족연립체제는 그것이 중기 정치체제의 붕괴·해체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전제적 왕권기로 이해되고 있는 중기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필자도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터라, 본 글은 후기 정치사에 대한 분절적 현상적인 이해에 머무를 우려가 크다. 이 점 선학들의 가르침을 기다려 차츰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연개소문의 弟 淵淨土도 12성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는데,
)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 文武王 6년조 및 <<唐書>> 권220 高麗傳
이러한 지방세력의 이탈 역시 남생 및 국내성의 이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국내성·신성·부여성 등 서북방의 중요 거점들을 차례로 상실함에 따라 고립된 평양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고구려가 對唐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지배 귀족세력들의 분열과 이탈이다. 對唐 전쟁의 중요 무력 기반인 지방세력의 이탈도 귀족세력의 분열·이탈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 고구려 말기 지방세력의 이탈의 원인은 고구려의 지방지배체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리라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한 해명은 후고로 미루겠다.
그런데 이때 이처럼 귀족세력 간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된 이유는 기왕의 귀족 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를 붕괴시킨 연개소문家의 파행적인 집권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는 불안정한 면도 적지 않았지만, 당시 귀족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분산적인 귀족세력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집권과 사적 권력의 강화는 이러한 정치운영체제를 붕괴시킨 것이다. 따라서 귀족세력 간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상실함으로써 귀족세력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거듭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끝내 귀족세력의 분열과 이탈을 결과하였던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6·7세기 고구려 정치사의 전개 과정을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의 갈등·대립이라는 구조 속에서 귀족연립체제의 형성과 전개, 붕괴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6세기에 접어들어 나타나는 왕위계승전을 비롯한 귀족들의 정쟁은 기본적으로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귀족세력사이의 정치적 갈등이었다. 국내계 귀족은 舊都인 국내지역에 세력기반을 둔 구귀족세력이며, 평양계 귀족은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전후하여 왕권의 지지 기반으로 등장한 신진 정치세력이었다. 이들 평양계 귀족세력은 그 구성이 다양한데, 대체로 평양 지역의 지방 호족세력과 중국계 망명인 및 일부 富民으로서 정치적 진출에 성공한 세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왕은 이들 신진 정치세력을 지원하여 구귀족세력을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전제적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배세력을 편제하는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점차 독자적 운동력을 갖게 된 신·구귀족세력들은 왕위계승전을 통하여 왕권을 압도하면서 귀족연립체제를 성립시킨 것이다.
귀족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은 部體制 해체 이후 각 가문별로 결집되어 간 귀족집단이었다. 이들은 고구려 중기 왕권이 지향한 관료체제의 질서를 일면 부정하면서 새로운 정치 운영체제를 모색하였는데, 그것의 하나가 다수의 莫離支를 중심으로 하는 大對盧 - 莫離支 운영체제였다.
莫離支는 곧 2위의 관등인 太大兄과 동일한 官이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어디까지나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되는 고구려 후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막리지는 군사권을 장악한 官으로, 각 귀족집단의 개별적인 무력 배경이 요구되는 귀족연립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중추로 등장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정치운영체제는 각 귀족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막리지를 차지하고, 이들 막리지 중에서 임기 3년의 대대로가 교대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귀족세력 간의 합의와 세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극한적인 정쟁을 겪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귀족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운영체제는 귀족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조절 통제할 충분한 정치적 기능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성장,수·당제국의 출현이라는 대외적 정세 변동에 따라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 간의 모순을 심화시켜 결국 연개소문의 정변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집권 이후 太大對盧·太莫離支 등의 집권적 관직을 신설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私的 권력 기반의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것은 기왕의 大對盧 - 莫離支를 중심으로하는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연개소문의 사후 권력의 공백기에 귀족세력과 이와 연결된 지방 세력의 이탈을 초래하여, 끝내 對唐 전쟁에서의 패배를 결과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글의 논지가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해명되었어야 함에도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먼저 본 글은 6·7세기의 정치사를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귀족세력의 갈등·대립이란 틀 속에서 단순화시켜 이해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평양계 귀족세력은 그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1백 여년 동안 내부의 차별성과 분열이 없이 하나의 정치 세력권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동향을 추적해 볼 수 없었고, 말기까지도 국내계 귀족세력이 하나의 정치 세력권을 형성하였음을 보면, 이 시기 정치세력의 가장 큰 범주로서 평양계 - 국내계 귀족세력의 대립 구조를 설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만 이들 평양계·국내계 귀족세력들의 세력 기반의 차이와 독자적인 운동력을 유지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는데, 이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음 고구려 후기 귀족연립체제는 그것이 중기 정치체제의 붕괴·해체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전제적 왕권기로 이해되고 있는 중기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필자도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터라, 본 글은 후기 정치사에 대한 분절적 현상적인 이해에 머무를 우려가 크다. 이 점 선학들의 가르침을 기다려 차츰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