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상현실의 정의
2. 가상현실의 탄생배경
3. 가상현실의 공간적 특성
4. 가상현실 속 정체성- 상실일까? 아닐까?
5. 탈윤리성- 어떻게 된 일인가?
III. 결론 -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II. 본론
1. 가상현실의 정의
2. 가상현실의 탄생배경
3. 가상현실의 공간적 특성
4. 가상현실 속 정체성- 상실일까? 아닐까?
5. 탈윤리성- 어떻게 된 일인가?
III. 결론 -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본문내용
아닌 또 다른 지향적 의식활동의 중심을 인정하는 탈중심화를 통해 타자의 존재의 인정함으로써만 보여지는 자로서 이 세계에 나타나는 존재의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
자아는 세계 구성의 중심으로서의 주체의 유일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와 대등한 또 다른 구성의 중심인 그아닌 다른 자아를 인정하는 탈중심화를 통하여 비로소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세계성과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종관, 같은 논문, 347쪽
항상 자기 밖으로 나가있는 자아의 탈중심화는 타자아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자아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자아를 만남으로써, 내 앞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들이 인정됨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중심화에서 발생하는 자아성과 탈중심화에서 발생하는 타자성이라는 충돌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상현실 안에서도 나라는 존재와 타자아라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접했을 때,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우고 채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채워들려고 하는 서구적 형이상학.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후설의 현상학도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서양의 눈으로 우리의 자아와 윤리성을 재정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양인이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써 동양의 눈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나와 타자아의 충돌을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서양의 기술은 사고방식의 그 바탕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동양의 눈으로 봐야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긷고 있는 늙은 현자를 관찰했다. 그 노인은 밧줄에 매단 나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담아 두 손으로 당겨 올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사라졌다가 나무로 된 도르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보셨지요? 바퀴를 감고 있는 밧줄을 잡으시고 핸들을 조각하면 물을 긷게 되는 겁니다.” 노인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면 나의 마음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런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할 수가 없을 것이네. 얼마 안 가서 내 손목이 혼자서 핸들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겠지. 만약 내 마음과 몸이 내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되면, 내 일은 기쁨을 잃게 될 것이네. 내 일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물이 맛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나?”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옮김, 책세상, 2001, 127쪽
이 이야기에서처럼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채우고 채워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다. 비우고 또 비워야 찰 것이기 때문이다. 비워있어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비워있어야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 즉 ‘사람-사이에 있음’에서 가장 전형적인 행위는 ‘말’이며 관계맺음의 방식으로는 ‘실천’을 들 수 있다. 말함과 실천에서 관습, 윤리, 도덕, 사회, 국가 등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사이에 있음으로서의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 만남, 인격적인 체험 같은 것이며, 이를 통해 사이를 메움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사이에 있음이 사이를 두면서 맺고 있는 관계맺음의 방식이다. 사람-사이에 있음을 이어나가는 중심축은 ‘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맘나는 마음씀이다. 그 사이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숨은 ‘말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사이의 간격을 없애려는 것이 평등이며 거기에서는 인권을 중시하게 된다. 사람-사이에 있음이 무너지게 되면 도덕, 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이기상,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살림, 2003, 37쪽
사람-사이를 이어나가는 중심축은 ‘맘나’이며 ‘맘나’는 마음씀이라 했다. 마음씀을 통해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이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비워진 마음으로 너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성격들은 시간이 변화할 때마다 역시 따라서 변화한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지만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시대의 문법에 얹혀 살아가는 계산적 사유를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고민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거리, 사유할 거리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동양의 사고로 기술과 윤리라는 틀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욕구만을 채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놓은 마음으로 가장 인간다운 것을 발현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제대로 바라볼 때, 참다운 휴머니즘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참다운 휴머니즘이 나와 너의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一中一切中一 一 一切多 一
-의상, 법성계 法性偈
<참고문헌>
이종관, 「가상현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학술진흥재단, 1996
이채리, 「가상현실의 비실재론적 현실성」, 『제16회 한국 철학자 대회』, 2003
이기상, 「존재역운으로서의 기술」, 이기상 교수의 새몸닷컴
이종관, 『사이버문화와 예술의 유혹』, 문예출판사, 2003
마이클 하임, 여명숙 옮김,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2001
조관성, 『현상학과 윤리학』, 교육과학사, 2003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6
조셉 J 코켈만스, 임헌규 옮김,『후설의 현상학』, 청계, 2000
이기상,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살림, 2003
………
자아는 세계 구성의 중심으로서의 주체의 유일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와 대등한 또 다른 구성의 중심인 그아닌 다른 자아를 인정하는 탈중심화를 통하여 비로소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세계성과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종관, 같은 논문, 347쪽
항상 자기 밖으로 나가있는 자아의 탈중심화는 타자아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자아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자아를 만남으로써, 내 앞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들이 인정됨으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중심화에서 발생하는 자아성과 탈중심화에서 발생하는 타자성이라는 충돌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상현실 안에서도 나라는 존재와 타자아라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접했을 때,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우고 채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채워들려고 하는 서구적 형이상학.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후설의 현상학도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서양의 눈으로 우리의 자아와 윤리성을 재정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양인이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써 동양의 눈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나와 타자아의 충돌을 내면 안에서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서양의 기술은 사고방식의 그 바탕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동양의 눈으로 봐야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긷고 있는 늙은 현자를 관찰했다. 그 노인은 밧줄에 매단 나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담아 두 손으로 당겨 올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사라졌다가 나무로 된 도르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보셨지요? 바퀴를 감고 있는 밧줄을 잡으시고 핸들을 조각하면 물을 긷게 되는 겁니다.” 노인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면 나의 마음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런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할 수가 없을 것이네. 얼마 안 가서 내 손목이 혼자서 핸들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겠지. 만약 내 마음과 몸이 내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되면, 내 일은 기쁨을 잃게 될 것이네. 내 일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물이 맛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나?”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옮김, 책세상, 2001, 127쪽
이 이야기에서처럼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채우고 채워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다. 비우고 또 비워야 찰 것이기 때문이다. 비워있어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비워있어야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 즉 ‘사람-사이에 있음’에서 가장 전형적인 행위는 ‘말’이며 관계맺음의 방식으로는 ‘실천’을 들 수 있다. 말함과 실천에서 관습, 윤리, 도덕, 사회, 국가 등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사이에 있음으로서의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 만남, 인격적인 체험 같은 것이며, 이를 통해 사이를 메움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사이에 있음이 사이를 두면서 맺고 있는 관계맺음의 방식이다. 사람-사이에 있음을 이어나가는 중심축은 ‘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맘나는 마음씀이다. 그 사이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숨은 ‘말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사이의 간격을 없애려는 것이 평등이며 거기에서는 인권을 중시하게 된다. 사람-사이에 있음이 무너지게 되면 도덕, 윤리가 무너지게 된다. 이기상,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살림, 2003, 37쪽
사람-사이를 이어나가는 중심축은 ‘맘나’이며 ‘맘나’는 마음씀이라 했다. 마음씀을 통해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이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비워진 마음으로 너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의 성격들은 시간이 변화할 때마다 역시 따라서 변화한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내던져져 있지만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시대의 문법에 얹혀 살아가는 계산적 사유를 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고민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거리, 사유할 거리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동양의 사고로 기술과 윤리라는 틀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욕구만을 채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놓은 마음으로 가장 인간다운 것을 발현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제대로 바라볼 때, 참다운 휴머니즘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참다운 휴머니즘이 나와 너의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一中一切中一 一 一切多 一
-의상, 법성계 法性偈
<참고문헌>
이종관, 「가상현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학술진흥재단, 1996
이채리, 「가상현실의 비실재론적 현실성」, 『제16회 한국 철학자 대회』, 2003
이기상, 「존재역운으로서의 기술」, 이기상 교수의 새몸닷컴
이종관, 『사이버문화와 예술의 유혹』, 문예출판사, 2003
마이클 하임, 여명숙 옮김,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2001
조관성, 『현상학과 윤리학』, 교육과학사, 2003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6
조셉 J 코켈만스, 임헌규 옮김,『후설의 현상학』, 청계, 2000
이기상,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살림, 2003
키워드
추천자료
 아바타에 관하여 기원과 유래에 대하여
아바타에 관하여 기원과 유래에 대하여 사이버 공간속의 나 - 아바타
사이버 공간속의 나 - 아바타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영화감상문)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영화감상문) 인터넷 문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찰
인터넷 문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찰 싸이월드 열풍의 원인과 가상공간의 자아정체성
싸이월드 열풍의 원인과 가상공간의 자아정체성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재현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적 담론은 가능한가 ― 포스트모던과 신학적인 실천적 담론으로의 ...
재현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적 담론은 가능한가 ― 포스트모던과 신학적인 실천적 담론으로의 ... [가상공동체][가상공동체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가상공동체 사례]가상공동체의 발전, 가상공...
[가상공동체][가상공동체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가상공동체 사례]가상공동체의 발전, 가상공... [영화와 사상]매트릭스 속의 철학
[영화와 사상]매트릭스 속의 철학 유비쿼터스의 발전 방향
유비쿼터스의 발전 방향 애니 매트릭스
애니 매트릭스 증강현실,증강현실기술도입,증강현실도입사례,증강현실의산업적 발전전망
증강현실,증강현실기술도입,증강현실도입사례,증강현실의산업적 발전전망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대학]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대학, 사이버문화, 사이버문학, 사이버...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대학]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대학, 사이버문화, 사이버문학, 사이버... 상담이론과실제-인지행동 상담이론의 개요를 서술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 도식...
상담이론과실제-인지행동 상담이론의 개요를 서술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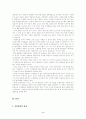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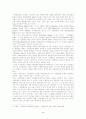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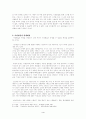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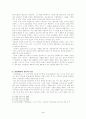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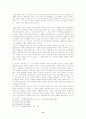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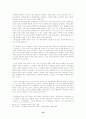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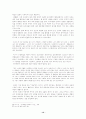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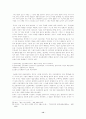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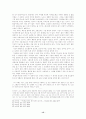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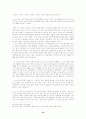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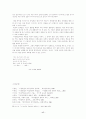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