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국유사란
2. 일연
(1) 일연의 생애
(2) 일연의 역사의식
3. 삼국유사
(1) 편찬 목적
(2)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3) 판본
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위치(가치)
* 참 고 문 헌 *
2. 일연
(1) 일연의 생애
(2) 일연의 역사의식
3. 삼국유사
(1) 편찬 목적
(2)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3) 판본
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위치(가치)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에서 연대의 착오와 인용 기사의 소루한 점 등 직업적 책임성의 결여로부터 나온 결함들이 왕왕 있다. 그 일례로 분명히 오간이 아닌 범위에서 첫편 왕력에서만 보더라도 전한 지황 원년 경진이 ‘병진’으로 오기되었으며 송 경편 원년은 ‘계해’인데 ‘계유’로 되었으며, 백제 무녕왕조의 ‘융’은 의자왕의 태자인데 고구려 보장왕의 태자로 기술하는 등등 이 같은 착오는 다른 편들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그 취급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삼국사기』의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신라의 사적에 편중하고 있다. 이 결함은 『삼국사기』와 함께 문헌의 제약으로부터 오는 공통된 원인이기도 하려니와 더욱이 저자는 경주 장산현 사람으로 그 생애의 대부분을 경상도 일원에서 시종하였으므로 그의 관심이나 견문에서 오는 제약은 저절로 이 지역을 중심한 자료에 편중함을 면치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자기 저서의 표제를 ‘삼국’으로 내세운 것도 어떤 과업으로부터 지정된 표제가 아닐 것이며, 삼국의 ‘유사’자료에 대하여 그 어떤 균형을 고려해 볼 책임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그 자료문헌의 제약을 별개문제로 하더라도 저자의 취미나 편향된 지식에 기초하여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 결과는 이 책이 오늘에 와서도 때로는 신라중심의 ‘유사’ 또는 불교중심의 ‘유사’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즉 『삼국유사』의 존재로 말미암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중국 사서에 의존하지 않게 됨은 물론, 중국의 사서와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민족의 신화, 전설, 일화, 사상, 종교 등 귀중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다.
『삼국사기』는 왕명에 의하여 사관이 저술한 정사로서, 체제가 정연하고 문사가 유창하고 화려하다. 이에 비하여 『삼국유사』는 선사 한 개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야사로서, 체제가 짜여지지 못했고 문사 또한 박잡하다 하겠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지만, 그 밖에 고조선기자 및 위만 조선을 비롯하여 가락 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단군을 국조로 받드는 배달 민족의 긍지를 갖게 해 주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던들 우리는 삼국 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를 중국의 사료인 <삼국지>의 동이전에 겨우 의존하는 초라함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는 당시의 사서 찬술의 규범에는 벗어나는 체제의 부정연과 내용의 탄괴잡다함이 오히려 오늘날 이 책을 더욱 귀한 재보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소이가 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일연 저; 리가원허경진 옮김,『한글 세대를 위한 우리 옛글 삼국유사』(한양출판사, 1996).
일연 저; 이민수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을유문화사, 1994).
일연 저; 김원중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신원문화사, 1994).
일연 저;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일연 저; 리상호 옮김,『신편(新編) 삼국유사(三國遺事)』(신서원, 1994).
일연 저; 박석봉고경석 엮음,『역해 삼국유사(三國遺事)』(서문 문화사, 1994).
일연 저; 이재호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솔 출판사, 1997).
일연 저; 하정룡이근직 엮음,『삼국유사교감연구(三國遺事校勘硏究)』(신서원, 1997).
뿐만 아니라 그 취급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삼국사기』의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신라의 사적에 편중하고 있다. 이 결함은 『삼국사기』와 함께 문헌의 제약으로부터 오는 공통된 원인이기도 하려니와 더욱이 저자는 경주 장산현 사람으로 그 생애의 대부분을 경상도 일원에서 시종하였으므로 그의 관심이나 견문에서 오는 제약은 저절로 이 지역을 중심한 자료에 편중함을 면치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자기 저서의 표제를 ‘삼국’으로 내세운 것도 어떤 과업으로부터 지정된 표제가 아닐 것이며, 삼국의 ‘유사’자료에 대하여 그 어떤 균형을 고려해 볼 책임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그 자료문헌의 제약을 별개문제로 하더라도 저자의 취미나 편향된 지식에 기초하여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 결과는 이 책이 오늘에 와서도 때로는 신라중심의 ‘유사’ 또는 불교중심의 ‘유사’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즉 『삼국유사』의 존재로 말미암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중국 사서에 의존하지 않게 됨은 물론, 중국의 사서와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민족의 신화, 전설, 일화, 사상, 종교 등 귀중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다.
『삼국사기』는 왕명에 의하여 사관이 저술한 정사로서, 체제가 정연하고 문사가 유창하고 화려하다. 이에 비하여 『삼국유사』는 선사 한 개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야사로서, 체제가 짜여지지 못했고 문사 또한 박잡하다 하겠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지만, 그 밖에 고조선기자 및 위만 조선을 비롯하여 가락 등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단군을 국조로 받드는 배달 민족의 긍지를 갖게 해 주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던들 우리는 삼국 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를 중국의 사료인 <삼국지>의 동이전에 겨우 의존하는 초라함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는 당시의 사서 찬술의 규범에는 벗어나는 체제의 부정연과 내용의 탄괴잡다함이 오히려 오늘날 이 책을 더욱 귀한 재보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소이가 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일연 저; 리가원허경진 옮김,『한글 세대를 위한 우리 옛글 삼국유사』(한양출판사, 1996).
일연 저; 이민수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을유문화사, 1994).
일연 저; 김원중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신원문화사, 1994).
일연 저; 리상호 옮김; 강운구 사진,『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 1999).
일연 저; 리상호 옮김,『신편(新編) 삼국유사(三國遺事)』(신서원, 1994).
일연 저; 박석봉고경석 엮음,『역해 삼국유사(三國遺事)』(서문 문화사, 1994).
일연 저; 이재호 옮김,『삼국유사(三國遺事)』(솔 출판사, 1997).
일연 저; 하정룡이근직 엮음,『삼국유사교감연구(三國遺事校勘硏究)』(신서원,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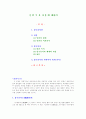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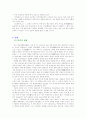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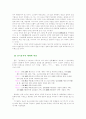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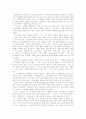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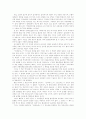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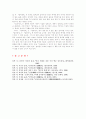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