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칠부가 활동하던 삼국시대 취락의 형태
신라시대의 신분 제도
신라시대의 신분 제도
본문내용
존재로서의 왕의 존재와 복속지역민의 일반민적 파악은 진흥왕의 일련의 순수비에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즉, 비문에 명기된 \'眞興太王\',\'新羅大王\' 및 \'朕\'이란 표현은 大王으로서의 존재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또한 비문에 공통적으로\'四方託境 廣獲民土\'하고 \'巡狩管境 訪採民心\'으로 표현된 통치행위 를 통해 전국가영역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통치대상이 民으로 편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운령비에서\'撫育新古黎庶\'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구려에서 광개토왕, 장수왕이 피통치의 대상을 구민과 복속민인 신래한예로 구별하면서도 이들을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라는 6세기초반경부터 복속민에 대한 파악을 \'노인\'에서 \'민\'으로 변화시켰으며 동시에 喙部의 長으로서 新羅國家를 대표하는 제한적 성격의 寐錦王이 초월적 존재인 大王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왕으로 군림케 되었다.
따라서 종래 신분구조는 매금왕 ; 상층신분층 - 중간신분층 - 민 - 노인 - 노비의 내용에서 대왕 - 상층신분층 - 중간 신분층 - 민 - 천민;노비로 변화되었으며 이같은 양상이 율령체계로 정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라는 6세기초반경부터 복속민에 대한 파악을 \'노인\'에서 \'민\'으로 변화시켰으며 동시에 喙部의 長으로서 新羅國家를 대표하는 제한적 성격의 寐錦王이 초월적 존재인 大王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왕으로 군림케 되었다.
따라서 종래 신분구조는 매금왕 ; 상층신분층 - 중간신분층 - 민 - 노인 - 노비의 내용에서 대왕 - 상층신분층 - 중간 신분층 - 민 - 천민;노비로 변화되었으며 이같은 양상이 율령체계로 정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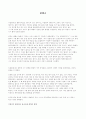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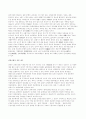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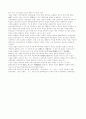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