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잃어버린 왕국 제 1장
잃어버린 왕국 제2권
잃어버린 왕국 제 3권
잃어버린 왕국 제4권
잃어버린 왕국 제 5권
잃어버린 왕국 제2권
잃어버린 왕국 제 3권
잃어버린 왕국 제4권
잃어버린 왕국 제 5권
본문내용
대진궁으로 천도하였건 그 궁터를 찾아가 보았다. 천지천황6년, 그러니까 667년 도읍을 옮겼던 대진궁의 조정은 불과 5년 동안 만 새로운 왕도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천지천황이 죽자 그의 아들 대우 왕자가 그 뒤를 이어 대왕의 위에 올랐으나 이듬해 요시노 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수계를 닦고 있던 대해인이 몸을 떨치고 일어나 전국은 내란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철천지한을 품고 대권을 쥔 대해인에 의해서 대진궁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었다. 대우왕자는 칼을 들어 자진해서 죽어버리고 대진의 신민들은 뿔뿔이 흩어저 헤어졌다. 대해인은 다시 왕도를 옛 도읍지인 아스까로 옮게 버리고 영화로 왔던 옛 궁터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었다.
비록 5년에 불과한 대진궁 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룩한 천지천황의 위업은 오늘도 찬란히 그 영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하는 일본의 국호인 <일본>이란 국호도 이때 만들어졌으며 한반도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마침내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되어 버리자, 천지천황은 한반도와의 태를 끊어 버리고 독자로서의 인권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가로서의 율령을 선포하였고 민중의 호적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5년에 불과한 왕국이었지만 국가로서의 기반이 닦이고 강력한 왕권이 수립되는 그 태동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5년 동안의 짧은 도읍지라 하지만 천지천황과 대우, 즉 홍문천황까지 2대의 천황이 재위하였던 왕도였으며, 대진궁이 초토화된 것은 672년이다.12년 앞서 660년에 망한 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부여이며 그 마지막 왕궁이 부소산에 있었다.
황폐한 도읍지로 하여금 인생무상, 삶의 허무, 비애감들을 그당시 사람들은 느낌.
세다의 다리는 임심의 난의 최대의 격전장. 한달가량 걸려 진행된 근강군과 아스까군의 싸움은 이 최후의 격전장에서 대해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싸움으로 대해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대우 태자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백강의 패배로 고향을 잃고 이곳으로 건너와 떼지어 살던 백제의 유민들은 5년 동안만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을 뿐 5년 뒤에 임신의 난으로 다시 한 번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 번이나 패배를 맛보고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멸망하는 비극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고려상인
고려왕조가 이조에 의해서 멸망하고 왕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기자 개성의 옛 유민들은 왕도의 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왕권을 잃은 대신 무서운 상흔으로 승화시켰다. 지금도 우리는 개성사람들을 깍정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개성상인>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개성 상인의 전통과, 멸망한 고려의 왕도 개성인들의 까정이 같은 자부심은 5백 년이 지난 이제에도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멸망한 근강의 유민, 백제의 유민들의 자부심은 천 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는 근강 상인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근강
대진사가 천지천황이 머물렀던 대진궁이 있는 왕궁 터라면, 백제의 유민들이 주로 살던 지역은 오늘날의 근강시 일대인 것이다. 비파호의 오른쪽 중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상인들의 고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상업의 중심지대로 옛 백제 유민들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백제 유민들이 꼭두서니 집단적으로 재배하던 곳이며, 누가다와 그녀의 아버지인 경왕의 일족들이 일찍부터 큰 세력
을 떨치면서 번영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옛날에는 대진궁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가곤 하였는데, 지금도 육로로 가느니 뱃길로 질러가면 훨씬 가깝다. 누가다의 여러 시에도 나타나 있듯이 천지천황 무렵에는 궁은 비록 대진사에 있었으나, 천황과 왕족들은 주로 배를 타고 이곳 근강시까지 와서 함께 수렵도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유민 귀실집사
천지천황은 백제의 유민인 귀실집사에게 <소금하>란 벼슬을 수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를 비롯한 백제의 백성 남녀 7백여 인을 근강국의 포생군에 살게 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유민들이 떼지어 살면서 꼭두서니 재배. 꼭두서니를 약용으로 키우고 꼭두서니를 길러 옷에 현란한 빛깔의 물감을 들이던 백제의 유민
천지천황
◎백제가 멸망하자 5만의 군사와 천 척이 넘는 병선을 보내어 백제를 부흥하려 하였으며,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패배하게 되자 백제의 유민들을 모두 받아들여 규슈와 대마도에 백제식 산성을 쌓았으며 백제의 유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찾아 나섬
◎소도-예로부터 조선족들은 큰 나무에 방울을 매어달아 이를 흔들면서 귀신들을 부르곤 했다.
◎서기681년 신라가 삼국통일. 문무대왕 그는 661년 부왕인 김춘추가 백제의 부흥군과 싸우다 전사하자, 그 뒤를 이어 신라의 3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당나라는 도독부를 설치하여 노골적으로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자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명하여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의 유민들과 힘을 합쳐 전쟁을 벌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상한 피리>에 대한 전설-문무대왕이 죽은 후 바닷속의 큰 용이 되어 삼한을 진호하게 있음을 보여줌(만파식적)
◎오늘날 일본인들의 묘제는 불교식으로 하여 대부분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화장한 묘에 죽은 사람의 신원과 죽은 날을 기록하여 넣어 두는 묘지의 제도는 7세기 후반에 시작했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의 왕도 사비성이 무너진다.
◎벽화고분, 장식고분으로 불려지는 무덤의 양식
우리 나라 전역에는 57기 정도의 장식고분이 있는데, 이 무덤에는 귀신들이 유택을 침범치 못하도록 벽에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등의 사신들을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생전 모습도 그려져 있다.
◎불가의 장례법- 화장, 수장, 입장과 토장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장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장묘법이다.
일본의 유래-천지천황이 백제의 망명세력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근강에서 망명왕국을 세울 것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는 백제 유민들을 주세력으로 하여 새로운 땅 근강에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킨다. 그것이 일본이다.
비록 5년에 불과한 대진궁 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룩한 천지천황의 위업은 오늘도 찬란히 그 영화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하는 일본의 국호인 <일본>이란 국호도 이때 만들어졌으며 한반도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마침내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되어 버리자, 천지천황은 한반도와의 태를 끊어 버리고 독자로서의 인권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국가로서의 율령을 선포하였고 민중의 호적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5년에 불과한 왕국이었지만 국가로서의 기반이 닦이고 강력한 왕권이 수립되는 그 태동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5년 동안의 짧은 도읍지라 하지만 천지천황과 대우, 즉 홍문천황까지 2대의 천황이 재위하였던 왕도였으며, 대진궁이 초토화된 것은 672년이다.12년 앞서 660년에 망한 백제의 마지막 왕도가 부여이며 그 마지막 왕궁이 부소산에 있었다.
황폐한 도읍지로 하여금 인생무상, 삶의 허무, 비애감들을 그당시 사람들은 느낌.
세다의 다리는 임심의 난의 최대의 격전장. 한달가량 걸려 진행된 근강군과 아스까군의 싸움은 이 최후의 격전장에서 대해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싸움으로 대해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대우 태자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 백강의 패배로 고향을 잃고 이곳으로 건너와 떼지어 살던 백제의 유민들은 5년 동안만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을 뿐 5년 뒤에 임신의 난으로 다시 한 번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 번이나 패배를 맛보고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멸망하는 비극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고려상인
고려왕조가 이조에 의해서 멸망하고 왕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기자 개성의 옛 유민들은 왕도의 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왕권을 잃은 대신 무서운 상흔으로 승화시켰다. 지금도 우리는 개성사람들을 깍정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개성상인>이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개성 상인의 전통과, 멸망한 고려의 왕도 개성인들의 까정이 같은 자부심은 5백 년이 지난 이제에도 면면히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멸망한 근강의 유민, 백제의 유민들의 자부심은 천 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앉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는 근강 상인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근강
대진사가 천지천황이 머물렀던 대진궁이 있는 왕궁 터라면, 백제의 유민들이 주로 살던 지역은 오늘날의 근강시 일대인 것이다. 비파호의 오른쪽 중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상인들의 고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상업의 중심지대로 옛 백제 유민들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백제 유민들이 꼭두서니 집단적으로 재배하던 곳이며, 누가다와 그녀의 아버지인 경왕의 일족들이 일찍부터 큰 세력
을 떨치면서 번영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옛날에는 대진궁에서 배를 타고 이곳으로 가곤 하였는데, 지금도 육로로 가느니 뱃길로 질러가면 훨씬 가깝다. 누가다의 여러 시에도 나타나 있듯이 천지천황 무렵에는 궁은 비록 대진사에 있었으나, 천황과 왕족들은 주로 배를 타고 이곳 근강시까지 와서 함께 수렵도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유민 귀실집사
천지천황은 백제의 유민인 귀실집사에게 <소금하>란 벼슬을 수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를 비롯한 백제의 백성 남녀 7백여 인을 근강국의 포생군에 살게 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유민들이 떼지어 살면서 꼭두서니 재배. 꼭두서니를 약용으로 키우고 꼭두서니를 길러 옷에 현란한 빛깔의 물감을 들이던 백제의 유민
천지천황
◎백제가 멸망하자 5만의 군사와 천 척이 넘는 병선을 보내어 백제를 부흥하려 하였으며,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패배하게 되자 백제의 유민들을 모두 받아들여 규슈와 대마도에 백제식 산성을 쌓았으며 백제의 유민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찾아 나섬
◎소도-예로부터 조선족들은 큰 나무에 방울을 매어달아 이를 흔들면서 귀신들을 부르곤 했다.
◎서기681년 신라가 삼국통일. 문무대왕 그는 661년 부왕인 김춘추가 백제의 부흥군과 싸우다 전사하자, 그 뒤를 이어 신라의 3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당나라는 도독부를 설치하여 노골적으로 자신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자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명하여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의 유민들과 힘을 합쳐 전쟁을 벌임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상한 피리>에 대한 전설-문무대왕이 죽은 후 바닷속의 큰 용이 되어 삼한을 진호하게 있음을 보여줌(만파식적)
◎오늘날 일본인들의 묘제는 불교식으로 하여 대부분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화장한 묘에 죽은 사람의 신원과 죽은 날을 기록하여 넣어 두는 묘지의 제도는 7세기 후반에 시작했다.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의 왕도 사비성이 무너진다.
◎벽화고분, 장식고분으로 불려지는 무덤의 양식
우리 나라 전역에는 57기 정도의 장식고분이 있는데, 이 무덤에는 귀신들이 유택을 침범치 못하도록 벽에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등의 사신들을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생전 모습도 그려져 있다.
◎불가의 장례법- 화장, 수장, 입장과 토장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장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장묘법이다.
일본의 유래-천지천황이 백제의 망명세력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 근강에서 망명왕국을 세울 것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는 백제 유민들을 주세력으로 하여 새로운 땅 근강에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킨다. 그것이 일본이다.
추천자료
 신진 사대부의 역사적의의 -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세대교체
신진 사대부의 역사적의의 -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세대교체 남해안 신석기 문화
남해안 신석기 문화 1.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1880년대 임오군란 갑신정변기의 일본의 대 조선 정책의 특징을...
1.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1880년대 임오군란 갑신정변기의 일본의 대 조선 정책의 특징을...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 문화운동
문화운동 삼한 소국의 발전 단계
삼한 소국의 발전 단계 [성리학][고려][조선]성리학의 기본이념, 성리학적 인간 이해, 고려말 성리학과 조선초의 성...
[성리학][고려][조선]성리학의 기본이념, 성리학적 인간 이해, 고려말 성리학과 조선초의 성... 한림별곡의 신역사주의적 고찰
한림별곡의 신역사주의적 고찰 [한국민족운동사] 1920년대의 항일전쟁 - 봉오동승첩, 삼둔자전투, 봉오동대첩, 청산리전투, ...
[한국민족운동사] 1920년대의 항일전쟁 - 봉오동승첩, 삼둔자전투, 봉오동대첩, 청산리전투, ... [한국민족운동사] 물산장려운동(物産奬勵運動) -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결성과정, 물산장려...
[한국민족운동사] 물산장려운동(物産奬勵運動) -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결성과정, 물산장려... [한국민족운동사] 물산 장려 운동(物産奬勵運動) -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결성 및 전개, 물...
[한국민족운동사] 물산 장려 운동(物産奬勵運動) -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결성 및 전개, 물... 정신분석 [성격 자기방어기제, 상담 목적]
정신분석 [성격 자기방어기제, 상담 목적] 한일합방보다는 ‘한일병합’이나 ‘경술국치(庚戌國恥)’가 올바른 표현임
한일합방보다는 ‘한일병합’이나 ‘경술국치(庚戌國恥)’가 올바른 표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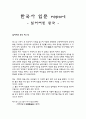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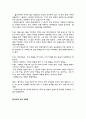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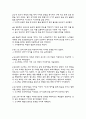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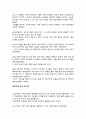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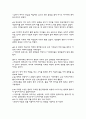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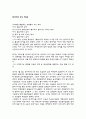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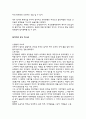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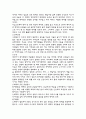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