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占有喪失
2. 중세법상의 보호
(1) 動産追及訴訟의 확장
(2) 소유자의 返還請求權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序說
2. 占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4. 小結
Ⅴ. 결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占有喪失
2. 중세법상의 보호
(1) 動産追及訴訟의 확장
(2) 소유자의 返還請求權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序說
2. 占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4. 小結
Ⅴ. 결론
본문내용
못하게 하여,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물론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가 유효함은 물론이다.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가장 전형적인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그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간접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빼앗긴 때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내용은 소유물의 반환, 즉 목적물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대체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그 요건이 같으며, 그 내용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있다. 즉, 점유권의 보호는 점유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므로 점유권과 소유권이 일치할 때에는 바로 소유권의 보호가 본질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권 보호규정이 소유권에 의해 그 한계를 가짐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소유권자의 보호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 동산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 물권의 경우 다소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동산물권에 공신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형법에서는 절도죄와 강도죄를 규정함으로써 재물의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 재산범이라할 수 있는 절도죄는 점점 그 역할을 민법으로 분담시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소유권 문제는 민법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등으로 해결되는 추세이다.
Ⅴ. 결론
게르만법은 점유와 소유 개념이 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로마법과는 다르게 발전해왔다.
게베레가 물권의 유일한 표현방식이었던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의 보호를 그 소유권의 이탈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가에 따라서 소유권보호의 형태가 분화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소유상실의 경우에는 현행범 여부에 따라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의 두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랑크 시대의 법규정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변화를 하게 된다. 즉 동산추급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그 성격이 일반적ㆍ추상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법은 盜品과 遺失物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代價辨償請求權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고유법규정의 엄격성이 완화되었고, 한자도시법에 의해 소유권보호사상이 법률생활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유자와 제 3자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원칙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게르만법은 로마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해 그 흠결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인해 그 보호도 각기 따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와 다르게 동산의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은 그 존부를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두 권리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이 소유권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모두 소유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동산소유권은 이중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것이 게르만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소유권 및 점유권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등을 통해서 그 보호를 이루고자함은 게르만법에 있어서 동산추급소권과 동산추적소권을 통해서 보호를 이루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결국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에서 보호의 차이점은 그 대상설정에 있으며,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가장 전형적인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그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간접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빼앗긴 때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내용은 소유물의 반환, 즉 목적물 점유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대체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그 요건이 같으며, 그 내용은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있다. 즉, 점유권의 보호는 점유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므로 점유권과 소유권이 일치할 때에는 바로 소유권의 보호가 본질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권 보호규정이 소유권에 의해 그 한계를 가짐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소유권자의 보호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 동산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 물권의 경우 다소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동산물권에 공신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형법에서는 절도죄와 강도죄를 규정함으로써 재물의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 재산범이라할 수 있는 절도죄는 점점 그 역할을 민법으로 분담시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소유권 문제는 민법의 소유권과 점유권의 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등으로 해결되는 추세이다.
Ⅴ. 결론
게르만법은 점유와 소유 개념이 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로마법과는 다르게 발전해왔다.
게베레가 물권의 유일한 표현방식이었던 게르만법에서는 소유권의 보호를 그 소유권의 이탈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가에 따라서 소유권보호의 형태가 분화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소유상실의 경우에는 현행범 여부에 따라 동산추적소송과 동산추급소송의 두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랑크 시대의 법규정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변화를 하게 된다. 즉 동산추급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그 성격이 일반적ㆍ추상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법은 盜品과 遺失物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代價辨償請求權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고유법규정의 엄격성이 완화되었고, 한자도시법에 의해 소유권보호사상이 법률생활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유자와 제 3자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원칙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게르만법은 로마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해 그 흠결을 보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인해 그 보호도 각기 따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와 다르게 동산의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은 그 존부를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두 권리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 따로이 소유권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모두 소유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동산소유권은 이중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것이 게르만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소유권 및 점유권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등을 통해서 그 보호를 이루고자함은 게르만법에 있어서 동산추급소권과 동산추적소권을 통해서 보호를 이루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결국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에서 보호의 차이점은 그 대상설정에 있으며, 내용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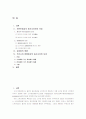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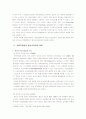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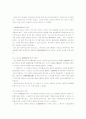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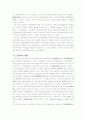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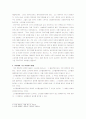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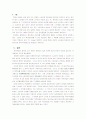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