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뜻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방향에로 기울어 판단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복잡한 상황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절의 수보다 더 많은 명제들을 갖게 된다. 만일 <나폴레옹이 바른쪽 측면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장을 동일한 진리치를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은 이미 45세가 넘었다>라는 문장으로써 대치한다면 첫째 명제뿐 아니라 셋째 명제도 바뀌어진다. 그리하여 셋째 명제의 진리치도-만일 그 의 나이가 군대를 적의 위치에로 끌고 가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아니었다면-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진리치를 가진 절들이 왜 그러한 경우에 항상 서로 대치될 수 없는가를 보여 준다. 절은 독립하여 표현하는 내용의 양보다 다른 절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양의 내용을 표현하다.
이러한 현상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자. <베벨은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것이다>>라고 공상해 본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명제를 표현한다 : (1)베벨은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 (2)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제의 표현에서 종속절의 단어들은 간접 지시체를 갖는 반면에, 둘째 명제의 표현에서는 동일한 단어들이 일상적 지시체를 갖는다. 이것은 본래의 복합 문장의 종속절이 한 번은 명제를 지시체로 갖고 또 한 번은 진리치를 지시체로 갖는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리치가 그 종속절의 포괄적 지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자를 동일한 진리치의 다른 표현으로 대치할 수 없다. 비슷한 결론이 <안다>, <발견한다>, <알려졌다>와 같은 표현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종속적 인과절과 그 주절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명제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 명제들은 본래의 절들에 독립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은 물에서 뜬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명제들을 갖는다. : (1)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다 ; (2) 만일 어떤 것이 물보다 그 밀도가 낮으면 그것은 물에서 뜬다 ; (3) 얼음은 물에서 뜬다. 그러나 셋째 명제는 앞의 두 명제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개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첫째와 셋째를 합친 것이나 둘째와 셋째를 합친 것이 본래의 문장의 뜻을 부여하지 않는다.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라는 종속절은 첫째 명제와 그리고 둘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속절은 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치는 우리의 둘째 명제를 따라서 그 진리치마저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비슷한다. : 만일 쇠가 물보다 그 밀도가 낮았었다면 쇠는 물 위에 떴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갖는다. 쇠는 물보다 그 밀도가 낮다는 명제와 어떤 것이 물보다 그 밀도가 낮으면 그것은 물위에 뜬다라는 명제이다. 여기에서도 그 부속절은 하나의 명제와 그리고 다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고려한 적이 있는 문장을 다시 보자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인이 덴마크로부터 분리된 후에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분쟁하였다.> 이 문장을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 덴마크로부터 분리된 적이 있다>라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첫째 명제로 갖게 되고 그리고 종속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되어지는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언젠가 분쟁하였다>라는 것을 둘째 명제로 갖는다. 여기에서도 그 종속절은 하나의 명제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종속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진리치를 갖고 있는 다른 종속절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언어에 나타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본질적으로 어떤 종속절은, 그 전제의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똑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하여 항상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1) 종속절이 어떤 명제의 한 부분만을 표현하는 한 하나의 진리치를 지칭하지 않을 때.
(2) 종속절이 하나의 진리치를 지칭하는 경우, 그 절의 기능은, 그 뜻이 하나의 독립된
명제뿐만 아니라 상위 명제의 부분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치를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첫째 이유는 (a) 단어들이 간접적 지시체를 가질 때와, (b) 문장의 부분이 고유 명칭이 아니면서 불확정적인 표현일 때 적용된다. 둘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되어져야 할 때 적용된다. (a) 종속절이 한 번은 그 일상적 지시체로, 또 한 번은 그 간접적 지시체의 문맥에서 해석된다. (b)종속절의 부분의 뜻은 (i) 그 종속절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현된 명제와 관련하여 전체 문장의 뜻을 보충하여 또한 (ii) 다른 명제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
어떤 절이 똑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하여 대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한 문장의 지시체는 그 문장의 진리치이고 그 문장은 어떤 명제를 그 뜻으로 갖는다는 우리의 견해를 논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출발점에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가 a=a와 a=b의 인식적 내용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였을 때 이 차이는 이제 다음의 사실로서 설명된다. 어떤 문장의 인식적 내용에 있어서 그 뜻, 즉 이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는 그 지시체, 말하자면 그 진리치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a=b이면 a와 b의 지시체는 똑같고 그러므로 a=b의 진리치는 a=a의 진리치와 똑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b의 뜻은 a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a=b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는 a=a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두 문장들은 똑같은 인식적 내용을 갖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만일 위에서처럼 우리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명제로부터 그 진리치에로의 보냄 또는 확언으로 뜻한다면 두 문장들의 판단들도 서로 다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다.y
다른 하나의 입장은 복잡한 상황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절의 수보다 더 많은 명제들을 갖게 된다. 만일 <나폴레옹이 바른쪽 측면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장을 동일한 진리치를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은 이미 45세가 넘었다>라는 문장으로써 대치한다면 첫째 명제뿐 아니라 셋째 명제도 바뀌어진다. 그리하여 셋째 명제의 진리치도-만일 그 의 나이가 군대를 적의 위치에로 끌고 가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아니었다면-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진리치를 가진 절들이 왜 그러한 경우에 항상 서로 대치될 수 없는가를 보여 준다. 절은 독립하여 표현하는 내용의 양보다 다른 절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양의 내용을 표현하다.
이러한 현상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자. <베벨은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것이다>>라고 공상해 본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명제를 표현한다 : (1)베벨은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 (2) 알사스-로렌 지방의 반환은 프랑스의 복수심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제의 표현에서 종속절의 단어들은 간접 지시체를 갖는 반면에, 둘째 명제의 표현에서는 동일한 단어들이 일상적 지시체를 갖는다. 이것은 본래의 복합 문장의 종속절이 한 번은 명제를 지시체로 갖고 또 한 번은 진리치를 지시체로 갖는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리치가 그 종속절의 포괄적 지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자를 동일한 진리치의 다른 표현으로 대치할 수 없다. 비슷한 결론이 <안다>, <발견한다>, <알려졌다>와 같은 표현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종속적 인과절과 그 주절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명제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 명제들은 본래의 절들에 독립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은 물에서 뜬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다음의 세 명제들을 갖는다. : (1)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다 ; (2) 만일 어떤 것이 물보다 그 밀도가 낮으면 그것은 물에서 뜬다 ; (3) 얼음은 물에서 뜬다. 그러나 셋째 명제는 앞의 두 명제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개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첫째와 셋째를 합친 것이나 둘째와 셋째를 합친 것이 본래의 문장의 뜻을 부여하지 않는다. <얼음은 물보다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라는 종속절은 첫째 명제와 그리고 둘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속절은 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치는 우리의 둘째 명제를 따라서 그 진리치마저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비슷한다. : 만일 쇠가 물보다 그 밀도가 낮았었다면 쇠는 물 위에 떴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갖는다. 쇠는 물보다 그 밀도가 낮다는 명제와 어떤 것이 물보다 그 밀도가 낮으면 그것은 물위에 뜬다라는 명제이다. 여기에서도 그 부속절은 하나의 명제와 그리고 다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고려한 적이 있는 문장을 다시 보자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인이 덴마크로부터 분리된 후에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분쟁하였다.> 이 문장을 <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이 덴마크로부터 분리된 적이 있다>라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첫째 명제로 갖게 되고 그리고 종속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되어지는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언젠가 분쟁하였다>라는 것을 둘째 명제로 갖는다. 여기에서도 그 종속절은 하나의 명제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명제의 일부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종속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진리치를 갖고 있는 다른 종속절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언어에 나타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조사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본질적으로 어떤 종속절은, 그 전제의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똑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하여 항상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1) 종속절이 어떤 명제의 한 부분만을 표현하는 한 하나의 진리치를 지칭하지 않을 때.
(2) 종속절이 하나의 진리치를 지칭하는 경우, 그 절의 기능은, 그 뜻이 하나의 독립된
명제뿐만 아니라 상위 명제의 부분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치를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첫째 이유는 (a) 단어들이 간접적 지시체를 가질 때와, (b) 문장의 부분이 고유 명칭이 아니면서 불확정적인 표현일 때 적용된다. 둘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되어져야 할 때 적용된다. (a) 종속절이 한 번은 그 일상적 지시체로, 또 한 번은 그 간접적 지시체의 문맥에서 해석된다. (b)종속절의 부분의 뜻은 (i) 그 종속절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현된 명제와 관련하여 전체 문장의 뜻을 보충하여 또한 (ii) 다른 명제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
어떤 절이 똑같은 진리치의 다른 절에 의하여 대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한 문장의 지시체는 그 문장의 진리치이고 그 문장은 어떤 명제를 그 뜻으로 갖는다는 우리의 견해를 논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출발점에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가 a=a와 a=b의 인식적 내용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였을 때 이 차이는 이제 다음의 사실로서 설명된다. 어떤 문장의 인식적 내용에 있어서 그 뜻, 즉 이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는 그 지시체, 말하자면 그 진리치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a=b이면 a와 b의 지시체는 똑같고 그러므로 a=b의 진리치는 a=a의 진리치와 똑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b의 뜻은 a의 뜻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a=b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는 a=a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두 문장들은 똑같은 인식적 내용을 갖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만일 위에서처럼 우리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명제로부터 그 진리치에로의 보냄 또는 확언으로 뜻한다면 두 문장들의 판단들도 서로 다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겠다.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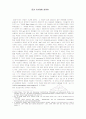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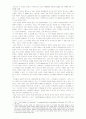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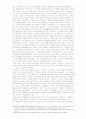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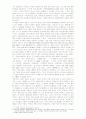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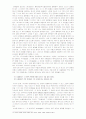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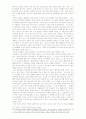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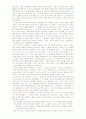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