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⑴ 가시리
⑵ 西京別曲
⑶ 履霜曲
⑷ 이별 소재 노래의 공통점
⑸ 시조
⑹ 현대시
⑺ 高麗歌謠와 現代詩
3. 결론
2. 본론
⑴ 가시리
⑵ 西京別曲
⑶ 履霜曲
⑷ 이별 소재 노래의 공통점
⑸ 시조
⑹ 현대시
⑺ 高麗歌謠와 現代詩
3. 결론
본문내용
, 그러한 정서들을 노래로 형상화시켜 표현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노래들은 자신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이자 마지막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노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시리」의 경우, "셜온 님 보내잎노니 가시다 딪 도셔오쇼셔"라는 기원과 다짐을 둠으로써 「가시리」가 이별의 안타까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닌 말을 통해 심리적 실재가 구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노래하는 것은 그 속에 간절히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西京別曲」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딪 긴힛힝 그츠리잇가"라고 다짐을 하고서야 이별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음은 노래가 하는 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공감은 고려가요가 지닌 문학적 성격을 정서의 문제로 집약하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 본 세 편의 현대시들 속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데서 오는 정서들이 담겨져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은 앞서 살펴 본 고려가요들의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만큼 유사한 정서가 시 속에 담겨져 있으며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재회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 〈孤寂한 날〉이나 〈農舞〉는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려한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서 재회에 대한 미련이나 자신이 바라는 일의 성취에 대한 희망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너에게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해보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고려가요에서 시적 화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별에 대해 애써 위안하려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너에게…〉의 화자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한다. 또한 결국에는 재회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다.
3. 결론
시조와 여러 현대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 시대에나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시대상이 어떻든 간에 이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은-각기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감정들은-거의 비슷하다. 물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 기정사실화 된 이별이라는 상황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자기 상극의 고통. 물론 '恨'이라는 용어가 고려가요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별을 소재로 한 여타 국문학 갈래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까지 쓰여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과 견주어 볼 때 그 정서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고려가요는 그런 보편성 속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나 누구나가 겪을 수 있었던 정서들. 단순히 이별의 안타까움이나 슬픔만을 표현하지 않고 바램 혹은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 데서 생기는 미련까지도 노래로 형상화시킨 점, 노래를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노래라는 행위를 현실 속에서 하는 한 행위로 잇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이별을 소재로 한 고려가요의 미학이 아닐까 한다.
참고 문헌
김대행外,『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고미숙外,『한국 고전 시가선』 創作과 批評社
임경환外,『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정병욱,『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최용수,『고려가요 연구』 계명문화사
최 철,『고려 국어 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영미,『서른, 잔치는 끝났다』 創作과 批評社
「가시리」의 경우, "셜온 님 보내잎노니 가시다 딪 도셔오쇼셔"라는 기원과 다짐을 둠으로써 「가시리」가 이별의 안타까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닌 말을 통해 심리적 실재가 구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노래하는 것은 그 속에 간절히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西京別曲」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딪 긴힛힝 그츠리잇가"라고 다짐을 하고서야 이별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음은 노래가 하는 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공감은 고려가요가 지닌 문학적 성격을 정서의 문제로 집약하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 본 세 편의 현대시들 속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데서 오는 정서들이 담겨져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은 앞서 살펴 본 고려가요들의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만큼 유사한 정서가 시 속에 담겨져 있으며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재회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 〈孤寂한 날〉이나 〈農舞〉는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려한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서 재회에 대한 미련이나 자신이 바라는 일의 성취에 대한 희망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너에게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해보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고려가요에서 시적 화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별에 대해 애써 위안하려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너에게…〉의 화자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한다. 또한 결국에는 재회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다.
3. 결론
시조와 여러 현대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 시대에나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시대상이 어떻든 간에 이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은-각기 표현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감정들은-거의 비슷하다. 물론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한다. 기정사실화 된 이별이라는 상황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자기 상극의 고통. 물론 '恨'이라는 용어가 고려가요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별을 소재로 한 여타 국문학 갈래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까지 쓰여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과 견주어 볼 때 그 정서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고려가요는 그런 보편성 속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나 누구나가 겪을 수 있었던 정서들. 단순히 이별의 안타까움이나 슬픔만을 표현하지 않고 바램 혹은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 데서 생기는 미련까지도 노래로 형상화시킨 점, 노래를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노래라는 행위를 현실 속에서 하는 한 행위로 잇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이별을 소재로 한 고려가요의 미학이 아닐까 한다.
참고 문헌
김대행外,『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고미숙外,『한국 고전 시가선』 創作과 批評社
임경환外,『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정병욱,『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최용수,『고려가요 연구』 계명문화사
최 철,『고려 국어 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영미,『서른, 잔치는 끝났다』 創作과 批評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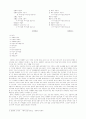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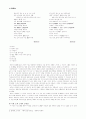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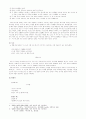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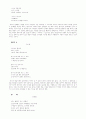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