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이승만 정권 권력구조
ꊲ 장면 정권 권력구조
1. 권력구조
ꊳ 박정희 정권 - 제 3공화국
1. 유사 민간정권으로서의 권력구조
2. 권력핵심기관 : 중앙 정보부와 군부
ꊴ 제 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헌법
2. 비상국무회의
3. 박정희 정권의 지배연합
ꊵ 전두환 정권
1. 신군부세력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3. 지배연합
ꊶ 노태우 정권
1. 권력의 소극적 분산
2. 민간세력의 권력 확대
ꊷ 김영삼 정권
1. 문민정부로서의 권력의 분산과 한계
ꊸ 김대중 정권
1. 정권의 성격과 권력구조
ꊹ 참여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 정권의 형성과 사회변화
2. 대통령과 주요기관
ꊲ 장면 정권 권력구조
1. 권력구조
ꊳ 박정희 정권 - 제 3공화국
1. 유사 민간정권으로서의 권력구조
2. 권력핵심기관 : 중앙 정보부와 군부
ꊴ 제 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헌법
2. 비상국무회의
3. 박정희 정권의 지배연합
ꊵ 전두환 정권
1. 신군부세력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3. 지배연합
ꊶ 노태우 정권
1. 권력의 소극적 분산
2. 민간세력의 권력 확대
ꊷ 김영삼 정권
1. 문민정부로서의 권력의 분산과 한계
ꊸ 김대중 정권
1. 정권의 성격과 권력구조
ꊹ 참여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 정권의 형성과 사회변화
2. 대통령과 주요기관
본문내용
7
38%
241
85
35%
169
41%
72
46%
43%
제4대
322
75
23%
202
44
22%
120
37%
31
41%
26%
제5대
296
70
24%
159
40
25%
137
46%
30
43%
22%
최고회의
1,162
1,015
87%
608
501
82%
554
48%
514
51%
93%
제6대
658
332
50%
242
154
64%
416
63%
178
54%
43%
제7대
535
357
68%
291
234
80%
244
46%
123
34%
50%
제8대
138
39
28%
95
33
35%
43
31%
6
15%
14%
제9대
633
544
86%
479
460
96%
154
24%
84
15%
55%
제10대
129
100
76%
124
97
78%
5
4%
3
3%
60%
입법회의
189
189
100%
156
156
100%
33
17%
33
17%
100%
제11대
489
340
70%
287
257
90%
202
41%
83
24%
41%
제12대
379
222
59%
168
156
93%
211
56%
66
30%
31%
제13대
938
492
52%
368
321
87%
570
61%
171
35%
30%
제14대
902
656
73%
581
537
92%
321
36%
119
18%
37%
제15대
1,951
1,120
57%
807
659
82%
1,144
59%
461
41%
40%
계
9,763
6,071
62%
5,169
3,977
77%
4,594
47%
2,100
35%
46%
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위원회대안 포함.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입안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심사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 정부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과정에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행정부는 실재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입법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입법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권한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는 행정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고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진 예산안의 입법과정에서도 제한적인 의회권한이 주어지고 있고 대다수의 예산안 또한 정부에 의해 조율되고 다듬어져 의회안에서 의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론 의회에서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산안이 정부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아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법안들의 의회통과실례를 실펴보면 의원발의안보다 정부의 발의안이 절대적으로 통과, 가결된 것으로 도표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의회까지 정부의 영향권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 사법부에서의 권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10년이 넘도록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대법관 선임은 독재시대의 유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또한 행정부, 즉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강한 대통령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물론 위의 입법부나 사법부에 관한 내용들은 과거의 정부에서 있었던 형태이다.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대통령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막강한 제왕적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과거의 독재시절의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신장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한국은 민주적공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부터의 권력의 분산을 뜻하고 있지만 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의 입법이나 사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그다지 크게 분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더욱 강화된 것은 아닌가 한다.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의 강화와 여당과의 긴밀한 연계는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민주적인 요소로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6.29이후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룩했고 더 나아가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의 참여정부 또한 최대강령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그러한 외면적인 포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권력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탄핵사건과 더불어 국회권력의 도전을 받았으나 국민적정통성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로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령했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하고 대통령우위의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와 시민사회의 정책발안이 보장되고 또한 정부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최대강령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38%
241
85
35%
169
41%
72
46%
43%
제4대
322
75
23%
202
44
22%
120
37%
31
41%
26%
제5대
296
70
24%
159
40
25%
137
46%
30
43%
22%
최고회의
1,162
1,015
87%
608
501
82%
554
48%
514
51%
93%
제6대
658
332
50%
242
154
64%
416
63%
178
54%
43%
제7대
535
357
68%
291
234
80%
244
46%
123
34%
50%
제8대
138
39
28%
95
33
35%
43
31%
6
15%
14%
제9대
633
544
86%
479
460
96%
154
24%
84
15%
55%
제10대
129
100
76%
124
97
78%
5
4%
3
3%
60%
입법회의
189
189
100%
156
156
100%
33
17%
33
17%
100%
제11대
489
340
70%
287
257
90%
202
41%
83
24%
41%
제12대
379
222
59%
168
156
93%
211
56%
66
30%
31%
제13대
938
492
52%
368
321
87%
570
61%
171
35%
30%
제14대
902
656
73%
581
537
92%
321
36%
119
18%
37%
제15대
1,951
1,120
57%
807
659
82%
1,144
59%
461
41%
40%
계
9,763
6,071
62%
5,169
3,977
77%
4,594
47%
2,100
35%
46%
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위원회대안 포함.
이처럼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입안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심사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 정부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과정에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행정부는 실재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입법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입법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권한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는 행정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고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진 예산안의 입법과정에서도 제한적인 의회권한이 주어지고 있고 대다수의 예산안 또한 정부에 의해 조율되고 다듬어져 의회안에서 의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론 의회에서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산안이 정부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권아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법안들의 의회통과실례를 실펴보면 의원발의안보다 정부의 발의안이 절대적으로 통과, 가결된 것으로 도표는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의회까지 정부의 영향권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 사법부에서의 권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10년이 넘도록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대법관 선임은 독재시대의 유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또한 행정부, 즉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강한 대통령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물론 위의 입법부나 사법부에 관한 내용들은 과거의 정부에서 있었던 형태이다.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대통령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막강한 제왕적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과거의 독재시절의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신장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한국은 민주적공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부터의 권력의 분산을 뜻하고 있지만 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의 입법이나 사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그다지 크게 분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행정적으로 더욱 강화된 것은 아닌가 한다.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의 강화와 여당과의 긴밀한 연계는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민주적인 요소로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6.29이후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룩했고 더 나아가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의 참여정부 또한 최대강령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그러한 외면적인 포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권력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탄핵사건과 더불어 국회권력의 도전을 받았으나 국민적정통성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로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령했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하고 대통령우위의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의 시민사회로의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와 시민사회의 정책발안이 보장되고 또한 정부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최대강령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천자료
 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영작) 관광재정의 중기(참여정부기간) 운용 방향
영작) 관광재정의 중기(참여정부기간) 운용 방향 [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고찰
[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고찰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사례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사례 [부동산시장][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부동산시장 향후 전망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및...
[부동산시장][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부동산시장 향후 전망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및...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실패했나?(8.31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실패했나?(8.31부동산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노무현정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조세관련 평가
노무현정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조세관련 평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각종 조세에 미치는 영향
참여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각종 조세에 미치는 영향 [노무현대통령]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개념,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정부 참여복...
[노무현대통령]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개념, 노무현정부 참여복지의 목표, 노무현정부 참여복...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분석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분석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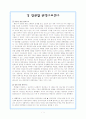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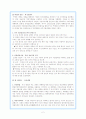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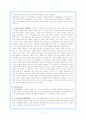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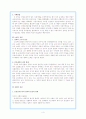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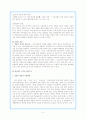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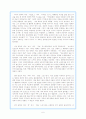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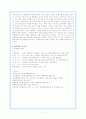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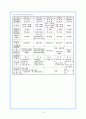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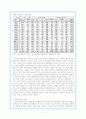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