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절기와 윤달
2. 숭적역서와 정기법의 도입
3. 시헌력에 대한 논란 - 청나라
4. 조선에서의 시헌력시행과 반대론 - 孝宗代
5. 시헌력 시행의 논란 - 顯宗代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절기와 윤달
2. 숭적역서와 정기법의 도입
3. 시헌력에 대한 논란 - 청나라
4. 조선에서의 시헌력시행과 반대론 - 孝宗代
5. 시헌력 시행의 논란 - 顯宗代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의 명과학 체계는 상당부분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거에 명과학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에 의약분업에 대하여 약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과 변리사들에게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1813년 사건
1670년(현종 11년)부터 시헌력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 조선에서 정기법과 평기법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논란은 없었다. 오히려 시헌력은 도입과정에서부터 인정된 정확성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였고, 이후 1896년 태양력으로 바뀌기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1772년 한 달에 세 절기가 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1813년에는 시헌력의 한계를 인식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1813년 윤8월을 두게 되면 동지가 10월에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지는 11월의 중기이므로 동지가 있는 달은 당연히 11월이어야 했다. 진짜 문제는 10월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음해 2월에 있어야할 경칩과 춘분이 5월에 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시헌력의 정기법을 사용하면 이후 모든 달의 중기에 따라 달을 부르는 원칙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1813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중국의 흠천감에서는 다행히 다음 해의 3월에도 중기가 없는 달이 있어서 이것을 윤2월로 정하여 이 해의 윤8월을 다음해인 1814년 윤2월로 고치기로 한다. “하늘의 법칙을 위주로 한다.”는 시헌력의 원칙은 “동지는 11월의 중기”라는 전통역법의 원칙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
결론
Pingyi Chu는 ‘강희역옥(康熙曆獄)’에서 천문학적인 면보다는 강희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론의 논쟁 중에 승리를 획득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과 청이 현실적으로 처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청나라의 역법을 받아쓰는 입장에 있었던 조선이 청에서 이미 채택한 시헌력법 쓰지않고 대통력으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시헌력이 조선의 전문가들에게 잘못된 역법체계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이 독자적으로 시헌력을 버리고 대통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18세기 후반까지도 청나라의 연호를 거부하고 명나라의 연호를 쓰는 숭명사대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한 나라의 역법이 외교적 관계와 실용적 목적을 떠나서 숭명대의만으로 결판날 상황은 결고 아니었다.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 있던 현실성이라는 힘으로 명과학의 논리로 시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양천문학에 기초한 정기법은 역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천문학적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동양적 전통 안으로 들어오면서 천문학적 의미에만 한정될 수는 없었다. 동양의 천문학은 독립된 과학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역법의 역사와 유교의 경전, 명과학적 이론 등 천문학을 포함한 거대한 전통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정기법과 평기법의 논란 속에서 서양 천문학은 동양의 천문학에는 승리했지만, 동양적 전통에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111~149.
Pingyi Chu, Chinese Science 14(1997):7~34.
박성래, “마테오 리치와 한국의 西洋科學收容” 東亞硏究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27~49.
③ 1813년 사건
1670년(현종 11년)부터 시헌력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 조선에서 정기법과 평기법을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논란은 없었다. 오히려 시헌력은 도입과정에서부터 인정된 정확성을 바탕으로 조선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였고, 이후 1896년 태양력으로 바뀌기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1772년 한 달에 세 절기가 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1813년에는 시헌력의 한계를 인식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1813년 윤8월을 두게 되면 동지가 10월에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지는 11월의 중기이므로 동지가 있는 달은 당연히 11월이어야 했다. 진짜 문제는 10월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음해 2월에 있어야할 경칩과 춘분이 5월에 있게 되어버린 것이다. 시헌력의 정기법을 사용하면 이후 모든 달의 중기에 따라 달을 부르는 원칙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1813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중국의 흠천감에서는 다행히 다음 해의 3월에도 중기가 없는 달이 있어서 이것을 윤2월로 정하여 이 해의 윤8월을 다음해인 1814년 윤2월로 고치기로 한다. “하늘의 법칙을 위주로 한다.”는 시헌력의 원칙은 “동지는 11월의 중기”라는 전통역법의 원칙 앞에 무너지게 되었다.
결론
Pingyi Chu는 ‘강희역옥(康熙曆獄)’에서 천문학적인 면보다는 강희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론의 논쟁 중에 승리를 획득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과 청이 현실적으로 처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청나라의 역법을 받아쓰는 입장에 있었던 조선이 청에서 이미 채택한 시헌력법 쓰지않고 대통력으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시헌력이 조선의 전문가들에게 잘못된 역법체계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나라와의 외교적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이 독자적으로 시헌력을 버리고 대통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18세기 후반까지도 청나라의 연호를 거부하고 명나라의 연호를 쓰는 숭명사대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한 나라의 역법이 외교적 관계와 실용적 목적을 떠나서 숭명대의만으로 결판날 상황은 결고 아니었다.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 있던 현실성이라는 힘으로 명과학의 논리로 시헌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양천문학에 기초한 정기법은 역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천문학적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동양적 전통 안으로 들어오면서 천문학적 의미에만 한정될 수는 없었다. 동양의 천문학은 독립된 과학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역법의 역사와 유교의 경전, 명과학적 이론 등 천문학을 포함한 거대한 전통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정기법과 평기법의 논란 속에서 서양 천문학은 동양의 천문학에는 승리했지만, 동양적 전통에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전용훈,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111~149.
Pingyi Chu, Chinese Science 14(1997):7~34.
박성래, “마테오 리치와 한국의 西洋科學收容” 東亞硏究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27~49.
추천자료
 고대의 자연철학과 과학과 기술
고대의 자연철학과 과학과 기술 러시아의 교육기관
러시아의 교육기관 영지주의 연구
영지주의 연구 고궁박물관을 다녀와서
고궁박물관을 다녀와서 신항로 개척을 가능하게 한 요인
신항로 개척을 가능하게 한 요인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즘 - 자라파 여행기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즘 - 자라파 여행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위기 - 정체와 미래에 대하여
인문학의 위기 - 정체와 미래에 대하여 간호관리학(세계간호사업의 변천)
간호관리학(세계간호사업의 변천) 과학 기술로 보는 한국사 열세마당
과학 기술로 보는 한국사 열세마당 조선중엽의 혜성의 출몰과 심각한 기근
조선중엽의 혜성의 출몰과 심각한 기근 [철학] 교육 - 그리스,로마,근대,실학주의,계몽주의,국가주의,신인문주의
[철학] 교육 - 그리스,로마,근대,실학주의,계몽주의,국가주의,신인문주의 장영실의 소개 및 특징과 자격루(自擊漏)를 통해 본 현대과학과의 연관관계 조사분석
장영실의 소개 및 특징과 자격루(自擊漏)를 통해 본 현대과학과의 연관관계 조사분석 러시아 교육제도의 역사, 볼셰비키 혁명 이전 교육제도, 소비에트 시대의 교육제도, 러시아 ...
러시아 교육제도의 역사, 볼셰비키 혁명 이전 교육제도, 소비에트 시대의 교육제도, 러시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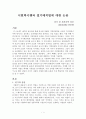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