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1)
본론 : 1.고궁박물관....................................(1)
2.제왕의 기록...................................(2)
3.종묘제례........................................(4)
4.궁궐의 건축...................................(5)
5.과학문화........................................(6)
6.왕실생활........................................(7)
결론 :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와서..............(8)
본론 : 1.고궁박물관....................................(1)
2.제왕의 기록...................................(2)
3.종묘제례........................................(4)
4.궁궐의 건축...................................(5)
5.과학문화........................................(6)
6.왕실생활........................................(7)
결론 :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와서..............(8)
본문내용
삼상향이라는 중요한 의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맞아들인 신에게 첫 번째 술을 용찬에 담아 바닥에 따라 붓고, 신실에 오신 신에게 선물로서 폐를 올린다. 이렇게 신을 맞아들이면 제례가 시작된다.
조선왕조는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예를 중시하였고, 예를 바탕으로 한 유교윤리의 보급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하였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도 질서와 격식이 필요하였고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에 다섯가지 의례, 즉 오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항목과 의식절차, 예법 등을 “국조오례의”에 실었다. 오례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홍례를 일컫는다.
길례는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제례나 땅과 곡신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례를 가리킨다.
가례는 왕실의 혼례 및 성년례인 관례 의식 등의 경사스런 예식을, 빈례는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을 말한다. 군례는 군대의 의식과 예절을, 흉례는 국가 장례 의식 절차를 일컫는다.
이 중 길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으며, 특히 왕실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종묘제례와 농본사회에 있어서 왕의 책임을 다하는 사직제례는 국가 존립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례로서 대제라고 불렀다.
종묘제례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위로는 왕실의 조상을 숭배하고 아래로는 ‘효’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1392년 조선건국이후 먼저 태묘조성도감을 설치하여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그리고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자 궁궐의 왼쪽에 종묘를 지었으며, 지속적인 증축을 통해 현재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을 갖추게 되었다. 정전에는 태조, 세종 등 19명의 왕이 모셔져 있고, 영녕전에는 목조 등 태조의 4대조를 비롯하여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 등 6명의 왕이 모셔져 있다.
종묘제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납일등 5대제를 비롯하여(영녕전에는 봄과 가을 두차례)설이나 추석 혹은 국가에 중대한 일이 때에도 지냈다. 제관은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아 다음과 같은 엄숙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참신례후, 용찬에 부은 울창주를 정전 안 바닥의 관지통에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 후 축문을 읽는다. 아헌관과 종헌관 역시 축문을 읽는 것을 마시는 음복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례를 한다.
이러한 종묘제례는 왕권의 안정적인 승계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여서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다. 유교의 이상정치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자연의 조화인 음악에서 얻고자 하는 예약정치였는데, 조선은 종묘제례를 통하여 이것을 실천하였다. 종묘제례악은 세종 때 만들어져 세조 때 정해진 ‘보태평’과 ‘정대업’을 연주하는데, ‘보태평’은 역대 임금의 문덕을 가리고, ‘전대업’은 역대 임금의 무공을 기린다. 춤은 일무(여러 줄로 서서 추는 춤)로 조선 초기부터 6줄 6열의 6일무로 하였으나, 대한제국시대에는 황제국으로서 8줄 8열
조선왕조는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예를 중시하였고, 예를 바탕으로 한 유교윤리의 보급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하였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도 질서와 격식이 필요하였고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에 다섯가지 의례, 즉 오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항목과 의식절차, 예법 등을 “국조오례의”에 실었다. 오례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홍례를 일컫는다.
길례는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제례나 땅과 곡신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례를 가리킨다.
가례는 왕실의 혼례 및 성년례인 관례 의식 등의 경사스런 예식을, 빈례는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을 말한다. 군례는 군대의 의식과 예절을, 흉례는 국가 장례 의식 절차를 일컫는다.
이 중 길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으며, 특히 왕실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종묘제례와 농본사회에 있어서 왕의 책임을 다하는 사직제례는 국가 존립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례로서 대제라고 불렀다.
종묘제례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위로는 왕실의 조상을 숭배하고 아래로는 ‘효’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1392년 조선건국이후 먼저 태묘조성도감을 설치하여 고려의 종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그리고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자 궁궐의 왼쪽에 종묘를 지었으며, 지속적인 증축을 통해 현재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을 갖추게 되었다. 정전에는 태조, 세종 등 19명의 왕이 모셔져 있고, 영녕전에는 목조 등 태조의 4대조를 비롯하여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 등 6명의 왕이 모셔져 있다.
종묘제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납일등 5대제를 비롯하여(영녕전에는 봄과 가을 두차례)설이나 추석 혹은 국가에 중대한 일이 때에도 지냈다. 제관은 왕이 초헌관, 왕세자가 아헌관, 영의정이 종헌관을 맡아 다음과 같은 엄숙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참신례후, 용찬에 부은 울창주를 정전 안 바닥의 관지통에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 후 축문을 읽는다. 아헌관과 종헌관 역시 축문을 읽는 것을 마시는 음복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축문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례를 한다.
이러한 종묘제례는 왕권의 안정적인 승계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여서 음악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다. 유교의 이상정치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자연의 조화인 음악에서 얻고자 하는 예약정치였는데, 조선은 종묘제례를 통하여 이것을 실천하였다. 종묘제례악은 세종 때 만들어져 세조 때 정해진 ‘보태평’과 ‘정대업’을 연주하는데, ‘보태평’은 역대 임금의 문덕을 가리고, ‘전대업’은 역대 임금의 무공을 기린다. 춤은 일무(여러 줄로 서서 추는 춤)로 조선 초기부터 6줄 6열의 6일무로 하였으나, 대한제국시대에는 황제국으로서 8줄 8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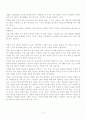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