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하며, 내부 보상체계도 이러한 제안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6. 결 언
이 글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복잡성 과학의 이론들을 기업조직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경영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복잡성 과학은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동력학적 현상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며,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계(system)들이 어떻게 발현하고 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이러한 복잡성 과학은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나 복잡한 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일종인 기업조직의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첫째 복잡한 다체계들이 보이는 협동현상은 기업조직의 전체적인 특질과 힘이 특정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특성보다는 그것들간의 관계들로부터 창출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경영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신뢰와 사랑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자원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살아있는 계가 스스로 프랙탈 구조를 지향하고 전일적으로 고차원적인 구조로 변화하듯이 기업조직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다양성과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랙탈 경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이념, 문화, 전략, 핵심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모범적 원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개인, 부서, 회사 전체 수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하며 이 과정에 우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살아있는 계가 ‘내부모형’을 세우고 그 모형에 의거하여 환경적응을 시도하듯이 기업조직도 경영논리, 비전, 조직문화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모형이 적응을 통해 진화해 나가듯이 이러한 경영요소들도 장기적으로 진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구조의 발현은 적응을 통한 ‘양의 되먹임’의 동력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작은 변화 하나가 우연히 주목을 받고 계속된 양의 되먹음으로 증폭되어 계 전체를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의 되먹임의 동력학을 기업조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용인되는 자유스러운 장(場)을 조성함으로써 우연적인 요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작은 변화들 중 소수의 뛰어난 변화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조직내부의 자원과 권력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안에 자연적으로 몰릴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해 온 기업들은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관료제를 개발하였으며 기계적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유연성과 환경적응력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조직을 유기체 또는 생명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기업조직의 관리를 소수의 경영자가 관리적 대안을 사전에 선택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탁월해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조직화 및 적응을 통하여 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조직을 생명체, 또는 복잡한 적응계로 간주한다면 이 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복잡성 과학으로부터 유익한 시사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잡성 과학과 같은 신과학의 이론들을 기업경영에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는 한국적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비토대론적이고 순환론적인 사고구조는 프랙탈, 홀론, 카오스 이론 등 신과학의 조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P. Bak, C. Tang, and K. Weisenfeld, Phys. Rev. Lett., 59, 381, 1987.
P. Bak and K. Chen, Scientific American, July issue, 44 (1992).
Michael D. Cohen,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7(1972), pp.1-25.
James C. Collins and Jerry I. Porras, Built to Last,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94.
G. A. Cowan, D. Pines, and D. Meltzer ed., Complexity, Addison-Wesley, 1994.
James Gleick, Chaos: Making a New Science, 박배식.성하운 역, 동문사, 1993.
J. H. Holland, Scientific American, July issue, 44 (1992).
S. A. Kauffman, The Origins of Order, Oxford University, 1993.
M. Waldrop, Complexity, (Simon & Schuster, 1992), 박형규, 김기식 번역,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범양사, 1995)
K. Weick,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9.
Margaret J. Wheatley, Leadership and the New Science, Berrette-Koehler Publisher, Inc., 1994.
松田博嗣.石井一成, 생물집단과 진화의 수리, 岩派書店.
西山賢一, 企業의 適應戰略:生物學的 接近, 차근호.조영권 역, 경문사.
西山賢一, 상게서.
김용운.김용국 , 프랙탈: 혼돈속의 질서, 동아출판사.
이장우. 이민화, 경영, 김영사, 1994.
이장우. 김상일, “문명사의 전개과정과 한사상에 기초한 한국기업의 혁신진로”, 한국기업의 혁신과 진로(한국인사조직학회, 다산출판사, 1997)
6. 결 언
이 글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복잡성 과학의 이론들을 기업조직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경영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복잡성 과학은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동력학적 현상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며,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계(system)들이 어떻게 발현하고 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이러한 복잡성 과학은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나 복잡한 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의 일종인 기업조직의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첫째 복잡한 다체계들이 보이는 협동현상은 기업조직의 전체적인 특질과 힘이 특정 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특성보다는 그것들간의 관계들로부터 창출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경영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신뢰와 사랑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자원이 됨을 의미한다.
둘째, 살아있는 계가 스스로 프랙탈 구조를 지향하고 전일적으로 고차원적인 구조로 변화하듯이 기업조직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다양성과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랙탈 경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이념, 문화, 전략, 핵심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모범적 원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개인, 부서, 회사 전체 수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하며 이 과정에 우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살아있는 계가 ‘내부모형’을 세우고 그 모형에 의거하여 환경적응을 시도하듯이 기업조직도 경영논리, 비전, 조직문화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모형이 적응을 통해 진화해 나가듯이 이러한 경영요소들도 장기적으로 진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구조의 발현은 적응을 통한 ‘양의 되먹임’의 동력학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작은 변화 하나가 우연히 주목을 받고 계속된 양의 되먹음으로 증폭되어 계 전체를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의 되먹임의 동력학을 기업조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용인되는 자유스러운 장(場)을 조성함으로써 우연적인 요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작은 변화들 중 소수의 뛰어난 변화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조직내부의 자원과 권력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안에 자연적으로 몰릴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해 온 기업들은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관료제를 개발하였으며 기계적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유연성과 환경적응력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조직을 유기체 또는 생명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기업조직의 관리를 소수의 경영자가 관리적 대안을 사전에 선택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탁월해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조직화 및 적응을 통하여 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조직을 생명체, 또는 복잡한 적응계로 간주한다면 이 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복잡성 과학으로부터 유익한 시사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잡성 과학과 같은 신과학의 이론들을 기업경영에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시도는 한국적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비토대론적이고 순환론적인 사고구조는 프랙탈, 홀론, 카오스 이론 등 신과학의 조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P. Bak, C. Tang, and K. Weisenfeld, Phys. Rev. Lett., 59, 381, 1987.
P. Bak and K. Chen, Scientific American, July issue, 44 (1992).
Michael D. Cohen,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7(1972), pp.1-25.
James C. Collins and Jerry I. Porras, Built to Last,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94.
G. A. Cowan, D. Pines, and D. Meltzer ed., Complexity, Addison-Wesley, 1994.
James Gleick, Chaos: Making a New Science, 박배식.성하운 역, 동문사, 1993.
J. H. Holland, Scientific American, July issue, 44 (1992).
S. A. Kauffman, The Origins of Order, Oxford University, 1993.
M. Waldrop, Complexity, (Simon & Schuster, 1992), 박형규, 김기식 번역,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범양사, 1995)
K. Weick,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9.
Margaret J. Wheatley, Leadership and the New Science, Berrette-Koehler Publisher, Inc., 1994.
松田博嗣.石井一成, 생물집단과 진화의 수리, 岩派書店.
西山賢一, 企業의 適應戰略:生物學的 接近, 차근호.조영권 역, 경문사.
西山賢一, 상게서.
김용운.김용국 , 프랙탈: 혼돈속의 질서, 동아출판사.
이장우. 이민화, 경영, 김영사, 1994.
이장우. 김상일, “문명사의 전개과정과 한사상에 기초한 한국기업의 혁신진로”, 한국기업의 혁신과 진로(한국인사조직학회, 다산출판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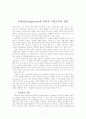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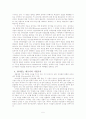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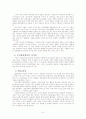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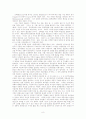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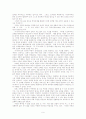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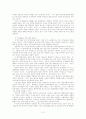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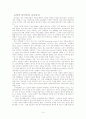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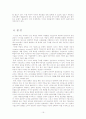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