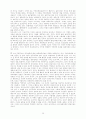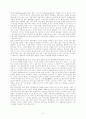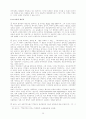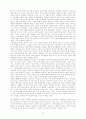목차
ꊱ 현대사회의 성격
1.1 산업사회론
1.2 정보사회론
ꊲ 현대의 철학 Ⅰ
2.1 현상학․실존철학․삶의 철학
2.1.1 현상학
2.1.2 실존철학
2.1.3 삶의 철학
3.1 논리 실증주의․분석철학․비판적 합리론
3.1.1 논리 실증주의
3.2.3 분석철학
3.1.3 비판적 합리론
4.1 마르크스주의․신 마르크스주의
4.1.1 마르크스주의
4.1.2 신 마르크스주의
ꊳ 현대철학 Ⅱ
3.1 현대와 후기현대의 논쟁
3.1.1 현대의 계획
3.1.2 후기 현대 : 현대의 해체
3.1.3 한국적인 철학함의 가능성
1.1 산업사회론
1.2 정보사회론
ꊲ 현대의 철학 Ⅰ
2.1 현상학․실존철학․삶의 철학
2.1.1 현상학
2.1.2 실존철학
2.1.3 삶의 철학
3.1 논리 실증주의․분석철학․비판적 합리론
3.1.1 논리 실증주의
3.2.3 분석철학
3.1.3 비판적 합리론
4.1 마르크스주의․신 마르크스주의
4.1.1 마르크스주의
4.1.2 신 마르크스주의
ꊳ 현대철학 Ⅱ
3.1 현대와 후기현대의 논쟁
3.1.1 현대의 계획
3.1.2 후기 현대 : 현대의 해체
3.1.3 한국적인 철학함의 가능성
본문내용
대해 시안 삼아 분석하는 일로 이 책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2 한국철학의 형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중국사상이라고 하겠다. 중국사상, 특히 송명시대의 대표적 유학인 주자학을 보면, 그들의 인식론으로 격물치지론(格物致知論)을 내세운다. '격물'이란 사(事, 인사를 말함)와 물(物, 사물을 말함)의 이(理)에 궁지(窮至)하여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본질까지를 다 알고자 하는 것이고, '치지'란 나의 지식을 추극(推極)하여 그 지식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는 인식지의 완성 뿐아니라 동시에 덕성지(德性知)의 완성으로, 이른바 외적인 견문적 지식으로서의 과학적 경험적 지 뿐만아니라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을 진지(盡知)함으로써『중용』의 이른바 '명즉성(明卽誠)'의 성덕성성(成德成聖)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격물치지론으 보면, 주자의 인식론은 본질적으로 수신하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을 헤아려 보면, 중국사상에서는 그 강조의 차이가 다소 눈에 띄지만 이론과 실천, 사유와 행위, 인식과 가치와의 근본적인 귀일(歸一)을 중요한 요체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이론은 각각 그 실천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하여 많은 모순을 들어낸다. 공자는 도덕적 가치관, 묵자는 경제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이 어지러운 현실에 질서를, 이 불공평한 현실에 공평을 심어보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당위의 원리는 주지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장자는, 그 괴리와 모순의 근거를 밝히려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의 내용을 검토하기보다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식구조부터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괴리와 모순의 근거를 장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관의 형성자는 자기의 도덕론이 자기의 가치욕구(이기욕)를 명리욕구충족(名利慾求充足) 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질서확립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적 혼동"을 저질러 놓고도 이러한 혼동을 "자의식(自意識)하지 못하는 무의식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무의식이 모순발생의 근거"라는 것이다.
구본명, "노장의 의식구조론", 인문과학 31집(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을 참조함.
노장철학에서는 그 모순발생의 근거를 묻고 있으며, 그 원인은 방법적 혼동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무의식상태를 자의식화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곳에서 다루지 않겠다).
4 가치관의 형성과정 및 그것의 근거에 대한 노장의 해명을 따라가면, 인간은 이기적인 욕구주체이며, 이러한 이기성(利己性)은 생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실천이나 이론은 그것의 주체인 인간의 기대와 가치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거니와, 욕구주체인 인간의 욕구와 가치의식은 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폐되거나 위장되기도 하고, 폭로되거나 왜곡되거나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상이나 이론들은 개인적인, 또는 그 개체가 소속하는 집단적인 이기와 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방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기욕구, 즉 가치의식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구조를 반영하거나 부정하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이러한 견지를 우리의 한국사상과 연관지어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학설은 개인적인 인식주체 및 그 주체가 소속된 집단의 이기욕구와 가치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의식은 그 사회적 상황과 구조를 반영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이퇴계(1501-1570)와 이율곡(1536-1584)의 '이기론(理氣論)'을 가치의식과의 관련에서 살펴보자. 퇴계의 '이기론'은 우선 '이재사선(利在事先)'이라는 이선재설(理先在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에 대한 양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기공재(理氣共在)'라는 이원론을 전개함으로써 기성적인 반상의 윤리질서를 고수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만규,『조선조 초기의 정치사상과 정책론 변동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를 참조함.
이에 반해서 율곡의 '이기론'은 우선 '일이이, 이이일(一而二, 二而一)'설을 가지고 각각의 개인 및 민족, 이를테면 노서대중(奴庶大衆)과 한미족의 자존과 자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하려 하였으며, 그리고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민족이 그 형태의 측면에서는 특수성을 가졌으나 그러한 특수성에는 자존적인 '이(理)'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개체중심의 안민(安民)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검토하려는 데에 있지도 않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렇듯 과학적인 인식이 생활세계에 정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들이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불상용(不相容)의 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립은 현상적으로는 논리적인 차이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실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가치체계 사이의 대결'
박동환, "현상인식에 있어서의 현대철학파들", 『현상과 인식』 제1권 제1호(1977년 4월)를 참조함.
, 다시 말해서 상반(相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립에서는 논리적인 잣대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학설을 하나의 '획일적인 처방'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에 다각적 역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함의하고 있는 사상이나 학설을 하나의 고정된 '중심'에서의 멀고 가까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 그리고 오히려 도구화될 염려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성'에 준거를 두고 논리를 계산하려는 태도는 결코 적합한 것이 아니다.
2 한국철학의 형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중국사상이라고 하겠다. 중국사상, 특히 송명시대의 대표적 유학인 주자학을 보면, 그들의 인식론으로 격물치지론(格物致知論)을 내세운다. '격물'이란 사(事, 인사를 말함)와 물(物, 사물을 말함)의 이(理)에 궁지(窮至)하여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궁극적인 본질까지를 다 알고자 하는 것이고, '치지'란 나의 지식을 추극(推極)하여 그 지식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는 인식지의 완성 뿐아니라 동시에 덕성지(德性知)의 완성으로, 이른바 외적인 견문적 지식으로서의 과학적 경험적 지 뿐만아니라 소이연(所以然)과 소당연(所當然)을 진지(盡知)함으로써『중용』의 이른바 '명즉성(明卽誠)'의 성덕성성(成德成聖)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격물치지론으 보면, 주자의 인식론은 본질적으로 수신하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을 헤아려 보면, 중국사상에서는 그 강조의 차이가 다소 눈에 띄지만 이론과 실천, 사유와 행위, 인식과 가치와의 근본적인 귀일(歸一)을 중요한 요체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이론은 각각 그 실천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하여 많은 모순을 들어낸다. 공자는 도덕적 가치관, 묵자는 경제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이 어지러운 현실에 질서를, 이 불공평한 현실에 공평을 심어보려고 하였지만 그러한 당위의 원리는 주지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장자는, 그 괴리와 모순의 근거를 밝히려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의 내용을 검토하기보다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식구조부터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괴리와 모순의 근거를 장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덕적 가치관의 형성자는 자기의 도덕론이 자기의 가치욕구(이기욕)를 명리욕구충족(名利慾求充足) 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질서확립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적 혼동"을 저질러 놓고도 이러한 혼동을 "자의식(自意識)하지 못하는 무의식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무의식이 모순발생의 근거"라는 것이다.
구본명, "노장의 의식구조론", 인문과학 31집(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을 참조함.
노장철학에서는 그 모순발생의 근거를 묻고 있으며, 그 원인은 방법적 혼동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무의식상태를 자의식화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곳에서 다루지 않겠다).
4 가치관의 형성과정 및 그것의 근거에 대한 노장의 해명을 따라가면, 인간은 이기적인 욕구주체이며, 이러한 이기성(利己性)은 생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실천이나 이론은 그것의 주체인 인간의 기대와 가치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거니와, 욕구주체인 인간의 욕구와 가치의식은 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폐되거나 위장되기도 하고, 폭로되거나 왜곡되거나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상이나 이론들은 개인적인, 또는 그 개체가 소속하는 집단적인 이기와 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방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기욕구, 즉 가치의식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구조를 반영하거나 부정하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이러한 견지를 우리의 한국사상과 연관지어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학설은 개인적인 인식주체 및 그 주체가 소속된 집단의 이기욕구와 가치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의식은 그 사회적 상황과 구조를 반영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이퇴계(1501-1570)와 이율곡(1536-1584)의 '이기론(理氣論)'을 가치의식과의 관련에서 살펴보자. 퇴계의 '이기론'은 우선 '이재사선(利在事先)'이라는 이선재설(理先在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에 대한 양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기공재(理氣共在)'라는 이원론을 전개함으로써 기성적인 반상의 윤리질서를 고수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만규,『조선조 초기의 정치사상과 정책론 변동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를 참조함.
이에 반해서 율곡의 '이기론'은 우선 '일이이, 이이일(一而二, 二而一)'설을 가지고 각각의 개인 및 민족, 이를테면 노서대중(奴庶大衆)과 한미족의 자존과 자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하려 하였으며, 그리고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민족이 그 형태의 측면에서는 특수성을 가졌으나 그러한 특수성에는 자존적인 '이(理)'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개체중심의 안민(安民)과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검토하려는 데에 있지도 않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렇듯 과학적인 인식이 생활세계에 정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들이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불상용(不相容)의 관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립은 현상적으로는 논리적인 차이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실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가치체계 사이의 대결'
박동환, "현상인식에 있어서의 현대철학파들", 『현상과 인식』 제1권 제1호(1977년 4월)를 참조함.
, 다시 말해서 상반(相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립에서는 논리적인 잣대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학설을 하나의 '획일적인 처방'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에 다각적 역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함의하고 있는 사상이나 학설을 하나의 고정된 '중심'에서의 멀고 가까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 그리고 오히려 도구화될 염려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성'에 준거를 두고 논리를 계산하려는 태도는 결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추천자료
 현대 프랑스 철학자 메를르 퐁티의 인식론
현대 프랑스 철학자 메를르 퐁티의 인식론 철학자 가다머 현대 의학을 말하다.
철학자 가다머 현대 의학을 말하다. 중국철학의 특징과 현대적의의
중국철학의 특징과 현대적의의 인도철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인도철학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태권도정신의 완벽상세 분석(역사와 전통,현대정신,스포츠철학)과 발전방안
태권도정신의 완벽상세 분석(역사와 전통,현대정신,스포츠철학)과 발전방안 교육철학의 개념과 현대의 교육사조
교육철학의 개념과 현대의 교육사조 현대 교육 철학 요약
현대 교육 철학 요약 현대 프랑스 철학과 베르그손
현대 프랑스 철학과 베르그손 현대적 아동관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아동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자신의 보육...
현대적 아동관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아동발달 이론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자신의 보육... 01.체육원리 및 체육사 (체육원리, 스포츠 철학, 근대 이전 세계 체육사, 근•현대 ...
01.체육원리 및 체육사 (체육원리, 스포츠 철학, 근대 이전 세계 체육사, 근•현대 ... [교육학개론] 현대 교육사조 항존주의(perennialism) 교육 - 항존주의 교육목적, 항존주의의 ...
[교육학개론] 현대 교육사조 항존주의(perennialism) 교육 - 항존주의 교육목적, 항존주의의 ... 우리나라의 보육철학 특징을 고려시대 이전, 고려시대 이후, 근현대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
우리나라의 보육철학 특징을 고려시대 이전, 고려시대 이후, 근현대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 [보육과정] 보육과정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시대별(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
[보육과정] 보육과정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시대별(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