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편제의 성립과 전승
2. 강도근의 일생과 소리내력
(1) 여러 스승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던 시기
(2) 창극단을 따라다니며 공연하거나 인근 지역의 소리선생으로 활동하던 시기
(3) 남원에 정착하여 국악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던 시기
3. 강도근 소리의 특징
4. 명창 강도근이 판소리사에서 갖는 의의
2. 강도근의 일생과 소리내력
(1) 여러 스승으로부터 소리를 배우던 시기
(2) 창극단을 따라다니며 공연하거나 인근 지역의 소리선생으로 활동하던 시기
(3) 남원에 정착하여 국악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던 시기
3. 강도근 소리의 특징
4. 명창 강도근이 판소리사에서 갖는 의의
본문내용
다. 옛날에는 운봉, 구례에 천하의 명창 송흥록 광록씨 형제분이 났고요, 고다음에는 박중근씨가 났고요, 고 다음에 김정문씨가 났고요, 고 다음에는 인저 저번에 작고하신 강도근씨 그 양반이 동편제 소리를 막고 갔습니다. 딱 막고 갔습니다. 소리는 정말로 강도근씨가 동편을 딱 막고 갔어요.
박동진 명창, 1996년 12월 27일, 남원 KBS 방송국 공개홀에서.
법통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동편 소리만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삶이 있었기에 이러한 평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가 소리를 배워 온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임방울이나 조상선 등 서편제 명창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동편 소리라고만 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편제의 계보에 올려놓은 이유는 소리의 기둥을 동편에 놓고 일관된 법통을 지키려고 애썹기 때문이다. 설령 서편제 명창에게 배웠기에 사설은 서편제의 것과 같다 하더라도 음악적으로 동편제로 소리를 짜 나가력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동편제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송만갑 때부터 법제의 구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바, 김정문에 오면 고제소리로부터 더 멀어지며, 강도근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멀어져 갔던 것이다.
강도근이 소리를 배우게 된 과정은 그리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유파가 다른 명창의 영향도 입었다. 그의 소리는 여러차례 독공을 통하여 일가를 이룬 \'공력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서편제의 영향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기에 부분적으로 계면 성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는 언제나 소리의 기둥을 동편에 놓고 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사설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명창에게서 소리를 배우면서 때워넣어 독공으로 한바탕의 소리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짜임새가 허술한 데가 있으며, 이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평소 자신의 목구성에 맞는 소리 대목을 즐겨 부르거나 소리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제자 지도를 하였다. 한바탕의 개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바탕의 개념을 가지고 소리를 하였는데 풀어먹기를 그렇게 풀어먹어서 빠진 대목이 생기기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야야 할 문제이다. 즉, 전통사회에서 명창이 한바탕의 개념으로 소리를 했는지 의문인데, 박동진 명창이 <흥보가>를 비롯하여 일련의 완창 발표회를 가진 6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 완창을 할 수 있어야만 명창이라는 식의 통념이 생겨난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근 명창은 전통적인 소리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부른 다섯바탕에는 재담이나 방언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 서민적 채취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는 남원에 기반을 둔 그의 삶의 이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는 근대의 세계를 비교적 덜 받은, 그래서 서민 취향의 소리를 부를 수 있었던 서민적 소리꾼이었던 것이다. 유파간 교류가 빈번해진 시대 상황 속에서 강도근 역시 단순치 않은 삶을 살아 왔지만, 일관되게 동편 소리의 법통을 지키려 노력한 점에서 현대 판소리사에 중요한 획을 긋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보형, 「판소리 명창 강도근」, 『판소리 연구 제2집』, 판소리학회, 1991
김기형, 「남원 동편소리의 세계」,『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 민속음악자료집 제2집, 국립민속국악원, 2002
유영대, 「강도근의 삶과 예술세계」, 『강도근 적벽가』, 민속음악자료집 제3집, 국립민속국악원, 2003
박동진 명창, 1996년 12월 27일, 남원 KBS 방송국 공개홀에서.
법통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동편 소리만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삶이 있었기에 이러한 평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가 소리를 배워 온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임방울이나 조상선 등 서편제 명창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오롯이 동편 소리라고만 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편제의 계보에 올려놓은 이유는 소리의 기둥을 동편에 놓고 일관된 법통을 지키려고 애썹기 때문이다. 설령 서편제 명창에게 배웠기에 사설은 서편제의 것과 같다 하더라도 음악적으로 동편제로 소리를 짜 나가력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동편제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송만갑 때부터 법제의 구분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바, 김정문에 오면 고제소리로부터 더 멀어지며, 강도근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멀어져 갔던 것이다.
강도근이 소리를 배우게 된 과정은 그리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유파가 다른 명창의 영향도 입었다. 그의 소리는 여러차례 독공을 통하여 일가를 이룬 \'공력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서편제의 영향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기에 부분적으로 계면 성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는 언제나 소리의 기둥을 동편에 놓고 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사설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명창에게서 소리를 배우면서 때워넣어 독공으로 한바탕의 소리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짜임새가 허술한 데가 있으며, 이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평소 자신의 목구성에 맞는 소리 대목을 즐겨 부르거나 소리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제자 지도를 하였다. 한바탕의 개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한바탕의 개념을 가지고 소리를 하였는데 풀어먹기를 그렇게 풀어먹어서 빠진 대목이 생기기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야야 할 문제이다. 즉, 전통사회에서 명창이 한바탕의 개념으로 소리를 했는지 의문인데, 박동진 명창이 <흥보가>를 비롯하여 일련의 완창 발표회를 가진 6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 완창을 할 수 있어야만 명창이라는 식의 통념이 생겨난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근 명창은 전통적인 소리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부른 다섯바탕에는 재담이나 방언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 서민적 채취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는 남원에 기반을 둔 그의 삶의 이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는 근대의 세계를 비교적 덜 받은, 그래서 서민 취향의 소리를 부를 수 있었던 서민적 소리꾼이었던 것이다. 유파간 교류가 빈번해진 시대 상황 속에서 강도근 역시 단순치 않은 삶을 살아 왔지만, 일관되게 동편 소리의 법통을 지키려 노력한 점에서 현대 판소리사에 중요한 획을 긋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보형, 「판소리 명창 강도근」, 『판소리 연구 제2집』, 판소리학회, 1991
김기형, 「남원 동편소리의 세계」,『음반으로 보는 남원 동편소리의 전통과 세계』, 민속음악자료집 제2집, 국립민속국악원, 2002
유영대, 「강도근의 삶과 예술세계」, 『강도근 적벽가』, 민속음악자료집 제3집, 국립민속국악원,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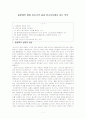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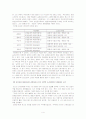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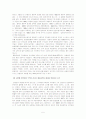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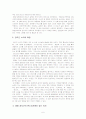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