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항파두리
기획- 제주 삼별초에 얽힌 전승
용담동 무덤유적
삼성혈(三姓穴)
제주의 시조설화와 그에 관한 다른 유적들
관덕정(觀德亭)
오현단(五賢壇)
기획글 - 오현단의 인물들
제주읍성터
삼양동 선사유적(三陽洞 先史遺蹟)
조천 만세동산
연북정
기획- 제주 삼별초에 얽힌 전승
용담동 무덤유적
삼성혈(三姓穴)
제주의 시조설화와 그에 관한 다른 유적들
관덕정(觀德亭)
오현단(五賢壇)
기획글 - 오현단의 인물들
제주읍성터
삼양동 선사유적(三陽洞 先史遺蹟)
조천 만세동산
연북정
본문내용
유학생이었던 김장환(金章煥)이었다. 당시 파고다 공원과 멀지 않은 인사동에 하숙하고 있던 김장환은 31 운동을 직접 목격하였고, 휴교 조치로 인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자 곧 제주도에서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한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김장환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당시 독립선언서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장환은 그의 숙부인 김시범(金時範), 당숙인 김시은(金時殷) 등과 함께 만세를 벌일 것을 꾀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14명의 동지들이 모였고, 300여 장의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세 운동의 준비가 진행된다.
당시 제주도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21일 3월 21일은 제주도의 대유학자였던 만翠(晩翠) 김시우(金時宇)의 기일(忌日)이었다.
부터 24까지 연 4일간, 연인원 7400여 명이 참여해 조천리의 미밋동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3월 21일 미밋동산에는 14인의 동지들 외에 조천리 마을 청년과 서당학생,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는 함덕(咸德), 신촌(新村), 신흥(新興) 등지의 서당학생 등 150여 명이 모여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제주경찰서 조천주재소 서쪽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미밋동산쪽으로 행진하였고, 이를 보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5~6백여 명의 군중을 이루었다. 미밋동산에서 만세운동의 지도자들은 김형배(金瀅培)가 제작한 태극기를 동산 마루에 꽂았고, 김시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김장환의 선창을 시작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시위는 조천 장터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이날 미밋동산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3월 22일에는 조천 장터에서, 23일에는 조천리에서, 24일에는 조천 장터를 중심으로 전 제주도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遺物槪觀-조천 만세동산
이에 일제는 21일부터 제주 본서의 순사 30여 명을 파견하여 무차별 진압을 시작하고 만세운동 지도자를 연행하는 등 시위 진압에 나섰다. 3월 21일에 13명이 검속(檢束)되어 기소되는 등 연인원 29명이 기소되었다. 특히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동자 14명은 보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에서 6개월가량 복역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백응선(白膺善)이 출옥 후 옥고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때 나머지 13인의 동지들이 모여 백응선의 비문을 찬(撰) 하였는데, 이 비문은 일본의 연호를 쓰지 않고 단군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 의지를 드러내었다. 또한 복역 중 받은 임금을 모아 독립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미회(同味會)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미밋동산을 시작으로 한 만세 동산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섬이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만세운동이 늦게 시작되었고 나흘간의 짧은 기간만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연인원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적 사상과 종교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구속된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투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운동은 주로 조천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조천읍이 제주도에서 개화가 빨리 이루어진 곳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팔각정을 지어 이름을 삼일정(三一亭)이라고 하였고, 그 옆에 ‘31운동 독립기념비’를 세웠다. 이후 1991년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 항일공원이 조성되고, 옛 건물들이 모두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조천 만세동산 기념관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에는 애국선열 위패 봉안 및 추모탑 제막식이 열렸다.
written by 02 선비
참고문헌
송광배, 1985《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북제주군지, 1987《북제주군》
한국통신 제주지사, 1995《제주의 문화유산》, 탐라인
遺物槪觀-연북정
연북정
연북(戀北)이란, \"북쪽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서, 고립된 섬 혹은 유배지로서의 제주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육지에 대한 제주 섬사람들의 동경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고픈 유배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 죄를 짓고 제주로 유배온 사람들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연북정에 올라 시와 술로 향수를 달래었고, 한편으로는 다시 자신을 불러줄 북녘의 임금에 대한 충정을 되새기곤 했다.
연북정은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때 제주의 가장 큰 관문인 조천포구에 세워졌으며, 그 당시에는 객사(客舍)의 기능을 하였다. 당시 조천진성 제주를 방어하기 위한 9개의 성 중 가장 작은 성으로, 축성 연대는 미상이나 선조 23년(1590) 이옥에 의해 중창된 기록이 있으며 조천 함덕 해안 일대를 관할하였다. 성 안에는 주방과 마구간, 군기고 등 여러 건물이 있었으나, 동성 위에 있던 연북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바깥에 세워졌던 연북정은 조선 선조 23년(1590)에 제주 목사 이옥이 성을 중창하면서 성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청산녹수(靑山綠水)와 접해 있다 하여 쌍벽정(雙碧亭)이라 바꿔 불리게 되었다. 이후 선조 32년에 (1599)에 제주 목사 성윤문이 건물을 중수하면서 다시 연북정이라 편액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증개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꽤 높다란 축대 위에 서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의 팔작지붕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물 사방이 창호 없이 트인 전형적인 정자 양식으로 되어 있어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축대의 북쪽으로는 옹성 큰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성문밖에 쌓은 작은 성
과 비슷한 타원형의 성곽이 둘러 싸여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연북정이 조천진성의 망루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마을안길에는 마을에 공을 세운 사람과 덕망 있는 사람의 비석을 뜻을 기리는 비석거리가 있다.
written by 02 진금
참고문헌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4《답사 여행의 길잡이》, 돌베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주도에 도착한 김장환은 그의 숙부인 김시범(金時範), 당숙인 김시은(金時殷) 등과 함께 만세를 벌일 것을 꾀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14명의 동지들이 모였고, 300여 장의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세 운동의 준비가 진행된다.
당시 제주도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21일 3월 21일은 제주도의 대유학자였던 만翠(晩翠) 김시우(金時宇)의 기일(忌日)이었다.
부터 24까지 연 4일간, 연인원 7400여 명이 참여해 조천리의 미밋동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3월 21일 미밋동산에는 14인의 동지들 외에 조천리 마을 청년과 서당학생,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는 함덕(咸德), 신촌(新村), 신흥(新興) 등지의 서당학생 등 150여 명이 모여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제주경찰서 조천주재소 서쪽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미밋동산쪽으로 행진하였고, 이를 보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5~6백여 명의 군중을 이루었다. 미밋동산에서 만세운동의 지도자들은 김형배(金瀅培)가 제작한 태극기를 동산 마루에 꽂았고, 김시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김장환의 선창을 시작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시위는 조천 장터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이날 미밋동산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3월 22일에는 조천 장터에서, 23일에는 조천리에서, 24일에는 조천 장터를 중심으로 전 제주도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遺物槪觀-조천 만세동산
이에 일제는 21일부터 제주 본서의 순사 30여 명을 파견하여 무차별 진압을 시작하고 만세운동 지도자를 연행하는 등 시위 진압에 나섰다. 3월 21일에 13명이 검속(檢束)되어 기소되는 등 연인원 29명이 기소되었다. 특히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동자 14명은 보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에서 6개월가량 복역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백응선(白膺善)이 출옥 후 옥고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때 나머지 13인의 동지들이 모여 백응선의 비문을 찬(撰) 하였는데, 이 비문은 일본의 연호를 쓰지 않고 단군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 의지를 드러내었다. 또한 복역 중 받은 임금을 모아 독립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미회(同味會)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미밋동산을 시작으로 한 만세 동산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섬이라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만세운동이 늦게 시작되었고 나흘간의 짧은 기간만 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연인원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적 사상과 종교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구속된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투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운동은 주로 조천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조천읍이 제주도에서 개화가 빨리 이루어진 곳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팔각정을 지어 이름을 삼일정(三一亭)이라고 하였고, 그 옆에 ‘31운동 독립기념비’를 세웠다. 이후 1991년 조천 만세동산 성역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 항일공원이 조성되고, 옛 건물들이 모두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조천 만세동산 기념관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에는 애국선열 위패 봉안 및 추모탑 제막식이 열렸다.
written by 02 선비
참고문헌
송광배, 1985《제주지방의 31운동과 그 후의 항일운동》, 국민대 교육대학원
북제주군지, 1987《북제주군》
한국통신 제주지사, 1995《제주의 문화유산》, 탐라인
遺物槪觀-연북정
연북정
연북(戀北)이란, \"북쪽을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서, 고립된 섬 혹은 유배지로서의 제주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육지에 대한 제주 섬사람들의 동경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고픈 유배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서 죄를 짓고 제주로 유배온 사람들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연북정에 올라 시와 술로 향수를 달래었고, 한편으로는 다시 자신을 불러줄 북녘의 임금에 대한 충정을 되새기곤 했다.
연북정은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때 제주의 가장 큰 관문인 조천포구에 세워졌으며, 그 당시에는 객사(客舍)의 기능을 하였다. 당시 조천진성 제주를 방어하기 위한 9개의 성 중 가장 작은 성으로, 축성 연대는 미상이나 선조 23년(1590) 이옥에 의해 중창된 기록이 있으며 조천 함덕 해안 일대를 관할하였다. 성 안에는 주방과 마구간, 군기고 등 여러 건물이 있었으나, 동성 위에 있던 연북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바깥에 세워졌던 연북정은 조선 선조 23년(1590)에 제주 목사 이옥이 성을 중창하면서 성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청산녹수(靑山綠水)와 접해 있다 하여 쌍벽정(雙碧亭)이라 바꿔 불리게 되었다. 이후 선조 32년에 (1599)에 제주 목사 성윤문이 건물을 중수하면서 다시 연북정이라 편액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증개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현재는 꽤 높다란 축대 위에 서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의 팔작지붕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물 사방이 창호 없이 트인 전형적인 정자 양식으로 되어 있어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축대의 북쪽으로는 옹성 큰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성문밖에 쌓은 작은 성
과 비슷한 타원형의 성곽이 둘러 싸여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연북정이 조천진성의 망루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마을안길에는 마을에 공을 세운 사람과 덕망 있는 사람의 비석을 뜻을 기리는 비석거리가 있다.
written by 02 진금
참고문헌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4《답사 여행의 길잡이》, 돌베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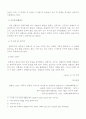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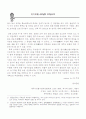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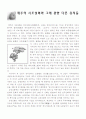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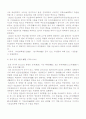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