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본문>
Ⅰ. 고려시대의 교육
1. 중앙의 교육기관
1) 국자감의 성립과 운영
2) 동·서학당(東西學堂)
3) 10학
4) 사학 12도(私學 十二徒)
2. 지방의 교육기관
1) 향교
2) 서경학교
3) 서재
Ⅱ. 과거제
1. 과거제의 도입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1)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2)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4. 응시자격
5.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Ⅲ. 음서제도
1. 음서제의 성립
2. 음서의 종류와 그 범위
1) 음서의 범위
2) 문음과 공음
3. 음서의 시행시기
4. 음서제도의 운영
1) 음서의 연령
2)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인원
<결문>
<본문>
Ⅰ. 고려시대의 교육
1. 중앙의 교육기관
1) 국자감의 성립과 운영
2) 동·서학당(東西學堂)
3) 10학
4) 사학 12도(私學 十二徒)
2. 지방의 교육기관
1) 향교
2) 서경학교
3) 서재
Ⅱ. 과거제
1. 과거제의 도입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1)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2)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4. 응시자격
5.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Ⅲ. 음서제도
1. 음서제의 성립
2. 음서의 종류와 그 범위
1) 음서의 범위
2) 문음과 공음
3. 음서의 시행시기
4. 음서제도의 운영
1) 음서의 연령
2)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인원
<결문>
본문내용
공음신서의 경우 태조 공신이나 삼한공신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음서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이 고려사(高麗史)기사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공신의 자손들은 동일 탁음 자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 음서 즉 문음의 경우에는 어떠하였을까. 이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는 현재 「一人 一子」를 규정짓는 명문이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관료가 5품직에 승진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재임하는데 한번만의 음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실제로 음서 시행의 사례를 볼 때에도 1인의 관료가 여러 사람의 자손에게 음서를 준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一人 多子」 또는 재음, 삼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구체적 명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시행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제간에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의해서 보면 이들이 받은 음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관리 한 명이 여러 차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부음ㆍ조음 등의 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숙부음, 외숙부음과 같은 종류의 음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품 이상의 관리는 1회의 음서 기회를 가질 뿐이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여러 형제가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음서는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음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음서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려의 문벌귀족 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人仕路)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는 음서를 통하여 관계에 조기 진출하여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음서 출신자들은 한품(限品)의 제약 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 41.9%나 되는 인물들이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이후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음서를 제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 대신에 과거로 진출하려 하였으며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관리들도 있을 정도였다.
5. 정리
고려시대 음서제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음서의 한 실례는 신라에서 보이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 하게 되는 것은 고려 성종 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음서는 주로 5품이상 고위관료의 자(子) 손(孫)제(弟)질(姪)등을 서용(敍用)하는 제도라는 좁은 의미로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종(祖宗)의 묘예(苗裔)와 공신 자손의 서용(敍用)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셋째 음서의 혜택이 대체적으로 5품이상관에 한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로 고려시대 음서는 시기상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한 명의 관료가 여러 명의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1人1子의 원칙이라 하여 한 명의 관료가 한 명의 자손에게 한하여 음직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료 상에서 1회의 음서에서 한 명의 관료가 여러 명의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되며 회수가 거듭되었을 때 자연히 혜택도 여러 명한테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한 음서출신자들 대부분이 5품관 이상으로 승진하고 반수 가량은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여준다. 끝으로 음서가 가문 문벌 형성, 계승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의 음서는 일반적이고 떳떳한 출사로(出仕路)의 하나였고 귀족관료들의 신분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봐야할 것이다.
<결문>
고려사회는 성종때 국자감이 설치되고, 문종때 문치정책(文治政策)에 따라 최충(崔) 등이 12도(徒)를 설치하고 인재를 배출하여 문운(文運)을 크게 떨쳤으며, 지방의 향교와 중앙의 국자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의 설치로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등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광종때 설치된 과거제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 공신과 지방과 중앙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틈속에서 고려왕조에 충성하였다. 또한 고려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한 음서제도는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서, 목종때 만들어져 조선사회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우리조가 살펴본 고려사회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그리고 음서제도는 고대사회를 벗어나 중세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특히 유교를 바탕에 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고대의 왕권들이 간절히 바랬던 전제왕권을 향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대로부터 아직 뿌리뽑히지 못한 귀족(호족)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음서제도가 이어졌던 것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사 17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 上 - 박용운
고려음서제도 연구 - 김용선 일조각 1996.
고려시대 음서제도와 과거제도 연구 - 박용운 1990.
고려시대사 - 박용운 일지사 1985.
고려음서에서의 外孫出現과 法制變改 - 김수진 1991.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김판석·윤주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12(제 11권 2호)
형제간에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의해서 보면 이들이 받은 음서의 명칭이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관리 한 명이 여러 차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부음ㆍ조음 등의 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숙부음, 외숙부음과 같은 종류의 음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품 이상의 관리는 1회의 음서 기회를 가질 뿐이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여러 형제가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음서는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음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음서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려의 문벌귀족 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人仕路)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는 음서를 통하여 관계에 조기 진출하여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음서 출신자들은 한품(限品)의 제약 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 41.9%나 되는 인물들이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이후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음서를 제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 대신에 과거로 진출하려 하였으며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관리들도 있을 정도였다.
5. 정리
고려시대 음서제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 나라에서 음서의 한 실례는 신라에서 보이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 하게 되는 것은 고려 성종 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음서는 주로 5품이상 고위관료의 자(子) 손(孫)제(弟)질(姪)등을 서용(敍用)하는 제도라는 좁은 의미로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종(祖宗)의 묘예(苗裔)와 공신 자손의 서용(敍用)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셋째 음서의 혜택이 대체적으로 5품이상관에 한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로 고려시대 음서는 시기상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한 명의 관료가 여러 명의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1人1子의 원칙이라 하여 한 명의 관료가 한 명의 자손에게 한하여 음직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료 상에서 1회의 음서에서 한 명의 관료가 여러 명의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되며 회수가 거듭되었을 때 자연히 혜택도 여러 명한테 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한 음서출신자들 대부분이 5품관 이상으로 승진하고 반수 가량은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여준다. 끝으로 음서가 가문 문벌 형성, 계승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의 음서는 일반적이고 떳떳한 출사로(出仕路)의 하나였고 귀족관료들의 신분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봐야할 것이다.
<결문>
고려사회는 성종때 국자감이 설치되고, 문종때 문치정책(文治政策)에 따라 최충(崔) 등이 12도(徒)를 설치하고 인재를 배출하여 문운(文運)을 크게 떨쳤으며, 지방의 향교와 중앙의 국자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의 설치로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등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은 광종때 설치된 과거제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 공신과 지방과 중앙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틈속에서 고려왕조에 충성하였다. 또한 고려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한 음서제도는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서, 목종때 만들어져 조선사회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
우리조가 살펴본 고려사회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그리고 음서제도는 고대사회를 벗어나 중세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특히 유교를 바탕에 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고대의 왕권들이 간절히 바랬던 전제왕권을 향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고대로부터 아직 뿌리뽑히지 못한 귀족(호족)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음서제도가 이어졌던 것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사 17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 上 - 박용운
고려음서제도 연구 - 김용선 일조각 1996.
고려시대 음서제도와 과거제도 연구 - 박용운 1990.
고려시대사 - 박용운 일지사 1985.
고려음서에서의 外孫出現과 法制變改 - 김수진 1991.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김판석·윤주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12(제 11권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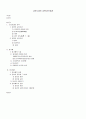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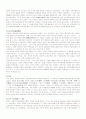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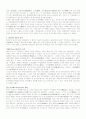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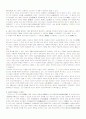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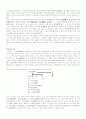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