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민속놀이의 의미
2.민속놀이의 종류(20가지)
2.민속놀이의 종류(20가지)
본문내용
화가 나는 것이다.
21. 알아 맞추기
이 알아 맞추기 놀이는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로서 두 사람 이상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방법은 동전이나 단추 같은 적당한 것을 주먹 안에 넣으면 그 개수를 알아 맞추는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이 개수를 알아 맞추면 손안에 있는 것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주지만, 맞추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수만큼 내놓아야 하며, 따라서 맞출 때까지는 게임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22. 연날리기
이 연날리기 놀이는 지방에 따라서는 섣달(12월)중순경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절정기는 역시 설날에서부터 대보름날 사이이다. 연 날리기는 우리나라의 정초의 「3대 놀이」의 하나로서 남자들이 즐기는 윷놀이와 부녀자들이 즐기는 널뛰기 못지 않게 멋지고 호쾌한 놀이이다. 이 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즉 신라의 진덕여왕1년 (648)에 이미 연날리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의 최영(崔瑩)장군이 제주도를 정복할 때에 연을 활용했다는 설도 있다. 연은 주로 한지(韓紙)와 대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크기는 대략 가로 2자, 세로3자 정도의 종이에 가운데를 동그랗게 오려내고 이 구멍을 중심으로 준비해 둔 얇은 대나무 쪽을 쌀미자(米)형으로 붙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 부분에 가로로 붙인다. 이와 같이 대나무 쪽은 5개가 필요한데, 이 때 머리부분과 중간에 가로 붙여 놓은 대나무를 초생달 모양으로 약간 오그라지게 실로 죄어 묶은 다음 다시 머리와 아래쪽에 실을 매고 또 꼬리를 길게 붙여 공중에 띄우는 것이다. 이 때 각자의 취미에 따라 연에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날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역시 연싸움이다. 이 연싸움은 상대편의 연줄과 서로 엇갈리게 하여 다투다가 끊어지면 지는 것이다.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짓궂은 자는 계책을 쓴다. 즉 사기와 유리가루를 풀에 개어 연줄에 바른 다음 상대와 싸우면 그 날카로운 유리가루에 상대방의 연줄이 끊어지게 된다. 요즘도 연날리기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날리기 국제대회」까지 열리고 있어 매우 흥미 있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속담에 빚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사람에게「대추나무 연 걸리 듯」하다라고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도 옛날에는 연날리기를 꽤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욱 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내추나무 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시골의 민가 근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과거의 우리 농촌의 풍경이 마냥 그리워지기도 한다. 옛날엔 정초부터 날리던 연을 정월대보름 날이면 멀리 날려보냈는데, 이때는 연에다 송액(送厄)이라고 붓으로 크게 써서 하늘 놓아 날린 후 연줄을 끊어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에서 액이 사라지고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의 종류에는 가오리연을 비롯하여 문어연·설개연·방패연·방구연·지네연 등 매우 다양하다.
21. 알아 맞추기
이 알아 맞추기 놀이는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로서 두 사람 이상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방법은 동전이나 단추 같은 적당한 것을 주먹 안에 넣으면 그 개수를 알아 맞추는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이 개수를 알아 맞추면 손안에 있는 것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주지만, 맞추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수만큼 내놓아야 하며, 따라서 맞출 때까지는 게임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22. 연날리기
이 연날리기 놀이는 지방에 따라서는 섣달(12월)중순경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절정기는 역시 설날에서부터 대보름날 사이이다. 연 날리기는 우리나라의 정초의 「3대 놀이」의 하나로서 남자들이 즐기는 윷놀이와 부녀자들이 즐기는 널뛰기 못지 않게 멋지고 호쾌한 놀이이다. 이 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즉 신라의 진덕여왕1년 (648)에 이미 연날리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의 최영(崔瑩)장군이 제주도를 정복할 때에 연을 활용했다는 설도 있다. 연은 주로 한지(韓紙)와 대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크기는 대략 가로 2자, 세로3자 정도의 종이에 가운데를 동그랗게 오려내고 이 구멍을 중심으로 준비해 둔 얇은 대나무 쪽을 쌀미자(米)형으로 붙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 부분에 가로로 붙인다. 이와 같이 대나무 쪽은 5개가 필요한데, 이 때 머리부분과 중간에 가로 붙여 놓은 대나무를 초생달 모양으로 약간 오그라지게 실로 죄어 묶은 다음 다시 머리와 아래쪽에 실을 매고 또 꼬리를 길게 붙여 공중에 띄우는 것이다. 이 때 각자의 취미에 따라 연에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날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역시 연싸움이다. 이 연싸움은 상대편의 연줄과 서로 엇갈리게 하여 다투다가 끊어지면 지는 것이다.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짓궂은 자는 계책을 쓴다. 즉 사기와 유리가루를 풀에 개어 연줄에 바른 다음 상대와 싸우면 그 날카로운 유리가루에 상대방의 연줄이 끊어지게 된다. 요즘도 연날리기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날리기 국제대회」까지 열리고 있어 매우 흥미 있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속담에 빚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사람에게「대추나무 연 걸리 듯」하다라고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도 옛날에는 연날리기를 꽤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욱 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내추나무 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시골의 민가 근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과거의 우리 농촌의 풍경이 마냥 그리워지기도 한다. 옛날엔 정초부터 날리던 연을 정월대보름 날이면 멀리 날려보냈는데, 이때는 연에다 송액(送厄)이라고 붓으로 크게 써서 하늘 놓아 날린 후 연줄을 끊어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에서 액이 사라지고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의 종류에는 가오리연을 비롯하여 문어연·설개연·방패연·방구연·지네연 등 매우 다양하다.
추천자료
 민속놀이 교수학습 과정안
민속놀이 교수학습 과정안 강강술래에 관한 고찰... (민속학, 놀이)
강강술래에 관한 고찰... (민속학, 놀이) 구비문학-민속극론(탈춤,인형극,발탈놀이)
구비문학-민속극론(탈춤,인형극,발탈놀이) [민속예술]영남지역 탈놀이의 언어매체 분석 및 지역적 특성
[민속예술]영남지역 탈놀이의 언어매체 분석 및 지역적 특성 [민속인형극 전래][꼭두각시놀음 역사][꼭두각시놀음 발전][꼭두각시놀음 전승과정][꼭두각시...
[민속인형극 전래][꼭두각시놀음 역사][꼭두각시놀음 발전][꼭두각시놀음 전승과정][꼭두각시... [민속인형극][꼭두각시놀음][인형극놀이][인형극][풍물]한국의 민속인형극 고찰과 꼭두각시놀...
[민속인형극][꼭두각시놀음][인형극놀이][인형극][풍물]한국의 민속인형극 고찰과 꼭두각시놀... [민속론A+] 민속에서 추구하는 해학과 풍자에 관한 작품사례 및 갈등의 화해양상
[민속론A+] 민속에서 추구하는 해학과 풍자에 관한 작품사례 및 갈등의 화해양상 3)체육-여러 가지 민속 놀이하기(제기차기, 투호놀이)(중안)
3)체육-여러 가지 민속 놀이하기(제기차기, 투호놀이)(중안) [민속극][민속극 공연방식][민속극 제의][민속극 연행][민속극 교육론][가면][가면극]민속극...
[민속극][민속극 공연방식][민속극 제의][민속극 연행][민속극 교육론][가면][가면극]민속극... [민속운동][민속][운동][민속운동 종류][민속운동 활용][민속운동 지도자료][민속운동과 기초...
[민속운동][민속][운동][민속운동 종류][민속운동 활용][민속운동 지도자료][민속운동과 기초... [연희][거리굿 연희][마을굿 연희][민속극 연희][박첨지놀이 연희]거리굿의 연희, 마을굿의 ...
[연희][거리굿 연희][마을굿 연희][민속극 연희][박첨지놀이 연희]거리굿의 연희, 마을굿의 ...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 경복궁에 있는 국립 민속 박물관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 경복궁에 있는 국립 민속 박물관 [민속극][민속극 악사][민속극 교육화][민속극과 가면극][민속극과 민속학자]민속극의 특성, ...
[민속극][민속극 악사][민속극 교육화][민속극과 가면극][민속극과 민속학자]민속극의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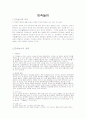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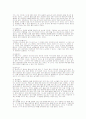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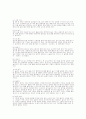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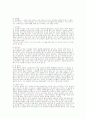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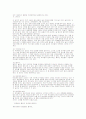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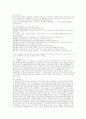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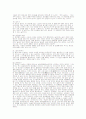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