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한자의 구성 요소
1.1 筆劃
1.2 偏旁
제2장 한자의 구조
제3장 한자의 形音義 결합 관계 : 六書
3.1 표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象形 ② 指事 ③ 會意
3.2 표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形聲
제4장 형성자의 실례
1.1 筆劃
1.2 偏旁
제2장 한자의 구조
제3장 한자의 形音義 결합 관계 : 六書
3.1 표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象形 ② 指事 ③ 會意
3.2 표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形聲
제4장 형성자의 실례
본문내용
, 미묘하다
곡식 가운데 알갱이가 가장 작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末端’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시간의 단위인 ‘秒’라는 뜻이 생겼다
(4) 砂[사; sh■■](形:石, 聲:少) 모래, 약 이름
(5) 紗[사; sh■■](形:, 聲:少) 깁, 엷고 가는 직물
(6) 沙[사; sh■■, sh■■](形:水, 聲:少) 모래, 사막
‘水’와 ‘少’의 회의자이다. 물이 적으면 모래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본의는 ‘모래’이다.
(7) 裟[사; sh■■](形:衣, 聲:沙) 가사, 승려의 옷
(8) 娑[사; su, s■■, sh■■](形:女, 聲:沙) 춤추다, 범어
(9) 莎[사; sh■■, su](形:艸, 聲:沙) 향부자, 베짱이
[참조]
(1) 省[생/성; shng, xng] 덜다, 살피다, 허물다
‘■’(che)와 ‘目’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무언가를 살필 때 눈빛이 사방으로 펴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小篆부터 ‘’이 첨가되었다.
(2) 雀[작; que, qi■■o, qi■■o] 참새, 검 붉은 빛깔
‘小’와 ‘’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작은 새’, ‘참새’를 의미한다.
14. 旬[순; xun] 열 흘, 열 번, 십년
본의는 ‘열흘’이다. 옛사람들은 처음에 열 개의 天干(甲乙丙丁…)을 사용하여 때를 나타내었다. ‘旬’자는 바로 ‘甲’(갑옷의 모양을 나타내는 ‘十’자)자가 한 바퀴 돌았음을 표시하여 열흘이라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
(1) 詢[순; xun](形:言, 聲:旬) 묻다, 꾀하다
(2) 荀[순; xun](形:艸, 聲:旬) 풀 이름, 周의 제후 이름
(3) 栒[순; xun](形:木, 聲:旬) 가름대 나무
(4) 洵[순; xun](形:水, 聲:旬) 참으로, 눈물을 흘리다
(5) 恂[순; xun](形:心, 聲:旬) 정성, 진실하다
(6) 珣[순; xun](形:玉, 聲:旬) 옥 이름, 옥 그릇
(7) 殉[순; xun](形:, 聲:旬) 따라 죽다, 목숨을 바치다, 구하다
(8) 徇[순; xun](形:, 聲:旬) 순행하다, 두루
(9) 筍[순; sn](形:竹, 聲:旬) 죽순
(10) 絢[현; xu■■n](形:, 聲:旬) 무늬, 빠르다, 노끈
15. 寺[사; si] 절
《說文解字》에 “廷也. 有法度者也. 寸之聲”라고 했으니, ‘之’가 聲符인 형성자이다. 본의는 ‘持’이며 가차되어 官署名으로 쓰였다. 후에 서역승이 불경을 실고 들어왔을 때 외국사신을 접대하던 부서인 鴻寺에 머물렀기 때문에 佛寺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 詩[시; sh](形:言, 聲:寺) 시, 詩經
(2) 侍[시; shi](形:人, 聲:寺) 모시다
(3) 恃[시; shi](形:/心, 聲:寺) 믿다
(4) 持[지; chi](形:, 聲:寺) 가지다, 지니다
(5) 峙[치; shi, zhi](形:山, 聲:寺) 우뚝 솟다(對峙政局), 언덕
(6) 痔[치; zhi](形:, 聲:寺) 痔疾
‘’’(병질 안/병들어누울 녁; 病字頭)은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나무조각 장; qi■■ng, p■■n)과 ‘人’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따라서 刑符가 ‘’인 글자들은 ‘病, 疾’처럼 대부분 질명과 관련이 있다.
(7) 待[대; d■■i](形:, 聲:寺) 기다리다, 대접하다 [d■■i] 머무르다, 체류하다
《說文解字》에 “(기다릴 사)也. 從寺聲”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淸代의 段玉裁는 그 당시 사람들이 ‘待’를 쓰지 않고 ‘等’을 쓴다고 주를 달았다.
(8) 等[등; dng](形:竹, 聲:寺) 등급, 무리, 같다. 기다리다
《說文解字》에 “齊簡也(죽간을 가지런히하다). 從竹, 從寺. 寺, 官曹之等平也”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래는 ‘죽간을 가지런히하다’는 뜻이었는데, 후에는 ‘平等’의 의미로 쓰였고 또 ‘기다리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
(9) 特[특; te](形:牛, 聲:寺) 수소, 유다르다, 특히, 다만
16. 我[아; w] 나
본의는 일종의 무기로서, 긴 자루와 세 개의 날이 달려 있다. 그러나 甲骨文에서부터 1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어 대부분 ‘자기’라는 의미를 나타내었고, 본의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1) 餓[아; e](形:食, 聲:我) 주리다, 굶기다
(2) 娥[아; e](形:女, 聲:我) 예쁘다
(3) 峨[아; e](形:山, 聲:我) 높다, 산이름(峨眉山)
(4) 鵝[아; e](形:鳥, 聲:我) 거위
(5) 俄[아; e](形:人, 聲:我) 잠시, 갑자기, 俄羅斯(러시아에 대한 약칭)
(6) 莪[아; e](形:, 聲:我) 쑥
(7) 蛾[아; e](形:, 聲:我) 나방, 눈썹 [의, y] 개미(蟻와 通用)
17. 羊[양; y■■ng] 양
이 글자는 정면에서 본 양의 머리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두 뿔이 아래로 구부러졌고(‘牛’자는 위로 구부러져 있음), 아래는 뽀족한 입이 있다. 고서에서는 ‘羊’이 ‘祥(상서로울 상)’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길상(吉祥)’을 ‘吉羊’이라고 쓴 경우가 있다.
(1) 洋[양; y■■ng](形:水, 聲:羊) 바다
(2) 祥[상; xi■■ng](形:示, 聲:羊) 상서롭다
(3) 詳[상; xi■■ng](形:言, 聲:羊) 자세하다, 詳細하다
≪說文解字≫에 “審議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심의하다’는 뜻에는 ‘자세히’, ‘상세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세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翔[상; xi■■ng](形:羽, 聲:羊) 빙빙 돌아날다(飛翔)
(5) 庠[상; xi■■ng](形:, 聲:羊) 학교
金文의 자형을 보면, 절벽 밑에 있는 오두막집을 본뜬 상형자이다. 刑符가 ‘’인 글자들은 대부분 높고 큰 집(龐)이나 누추한 집을 지칭한다.
(6) 痒[양; y■■ng](形:, 聲:羊) 앓다
(7) 恙[양; y■■ng](形:心, 聲:羊) 근심
(8) 佯[양; y■■ng](形:人, 聲:羊) 거짓
[참조] 鮮[선, xi■■n] 신선하다, 곱다 [선] 드물다
≪說文解字≫에 “鮮魚也. 出國, 從魚省聲”라고 되어 있다. ‘鮮’은 물고기의 명칭이다. 이 글자는 형성자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聲符가 ‘羊’인 글자와는 달리 ‘’)의 생략된 형태가 聲符이다.
곡식 가운데 알갱이가 가장 작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末端’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시간의 단위인 ‘秒’라는 뜻이 생겼다
(4) 砂[사; sh■■](形:石, 聲:少) 모래, 약 이름
(5) 紗[사; sh■■](形:, 聲:少) 깁, 엷고 가는 직물
(6) 沙[사; sh■■, sh■■](形:水, 聲:少) 모래, 사막
‘水’와 ‘少’의 회의자이다. 물이 적으면 모래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본의는 ‘모래’이다.
(7) 裟[사; sh■■](形:衣, 聲:沙) 가사, 승려의 옷
(8) 娑[사; su, s■■, sh■■](形:女, 聲:沙) 춤추다, 범어
(9) 莎[사; sh■■, su](形:艸, 聲:沙) 향부자, 베짱이
[참조]
(1) 省[생/성; shng, xng] 덜다, 살피다, 허물다
‘■’(che)와 ‘目’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무언가를 살필 때 눈빛이 사방으로 펴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小篆부터 ‘’이 첨가되었다.
(2) 雀[작; que, qi■■o, qi■■o] 참새, 검 붉은 빛깔
‘小’와 ‘’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작은 새’, ‘참새’를 의미한다.
14. 旬[순; xun] 열 흘, 열 번, 십년
본의는 ‘열흘’이다. 옛사람들은 처음에 열 개의 天干(甲乙丙丁…)을 사용하여 때를 나타내었다. ‘旬’자는 바로 ‘甲’(갑옷의 모양을 나타내는 ‘十’자)자가 한 바퀴 돌았음을 표시하여 열흘이라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다.
(1) 詢[순; xun](形:言, 聲:旬) 묻다, 꾀하다
(2) 荀[순; xun](形:艸, 聲:旬) 풀 이름, 周의 제후 이름
(3) 栒[순; xun](形:木, 聲:旬) 가름대 나무
(4) 洵[순; xun](形:水, 聲:旬) 참으로, 눈물을 흘리다
(5) 恂[순; xun](形:心, 聲:旬) 정성, 진실하다
(6) 珣[순; xun](形:玉, 聲:旬) 옥 이름, 옥 그릇
(7) 殉[순; xun](形:, 聲:旬) 따라 죽다, 목숨을 바치다, 구하다
(8) 徇[순; xun](形:, 聲:旬) 순행하다, 두루
(9) 筍[순; sn](形:竹, 聲:旬) 죽순
(10) 絢[현; xu■■n](形:, 聲:旬) 무늬, 빠르다, 노끈
15. 寺[사; si] 절
《說文解字》에 “廷也. 有法度者也. 寸之聲”라고 했으니, ‘之’가 聲符인 형성자이다. 본의는 ‘持’이며 가차되어 官署名으로 쓰였다. 후에 서역승이 불경을 실고 들어왔을 때 외국사신을 접대하던 부서인 鴻寺에 머물렀기 때문에 佛寺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 詩[시; sh](形:言, 聲:寺) 시, 詩經
(2) 侍[시; shi](形:人, 聲:寺) 모시다
(3) 恃[시; shi](形:/心, 聲:寺) 믿다
(4) 持[지; chi](形:, 聲:寺) 가지다, 지니다
(5) 峙[치; shi, zhi](形:山, 聲:寺) 우뚝 솟다(對峙政局), 언덕
(6) 痔[치; zhi](形:, 聲:寺) 痔疾
‘’’(병질 안/병들어누울 녁; 病字頭)은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나무조각 장; qi■■ng, p■■n)과 ‘人’으로 이루어진 회의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따라서 刑符가 ‘’인 글자들은 ‘病, 疾’처럼 대부분 질명과 관련이 있다.
(7) 待[대; d■■i](形:, 聲:寺) 기다리다, 대접하다 [d■■i] 머무르다, 체류하다
《說文解字》에 “(기다릴 사)也. 從寺聲”라고 했는데, ‘’이 ‘기다리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淸代의 段玉裁는 그 당시 사람들이 ‘待’를 쓰지 않고 ‘等’을 쓴다고 주를 달았다.
(8) 等[등; dng](形:竹, 聲:寺) 등급, 무리, 같다. 기다리다
《說文解字》에 “齊簡也(죽간을 가지런히하다). 從竹, 從寺. 寺, 官曹之等平也”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래는 ‘죽간을 가지런히하다’는 뜻이었는데, 후에는 ‘平等’의 의미로 쓰였고 또 ‘기다리다’라는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
(9) 特[특; te](形:牛, 聲:寺) 수소, 유다르다, 특히, 다만
16. 我[아; w] 나
본의는 일종의 무기로서, 긴 자루와 세 개의 날이 달려 있다. 그러나 甲骨文에서부터 1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어 대부분 ‘자기’라는 의미를 나타내었고, 본의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1) 餓[아; e](形:食, 聲:我) 주리다, 굶기다
(2) 娥[아; e](形:女, 聲:我) 예쁘다
(3) 峨[아; e](形:山, 聲:我) 높다, 산이름(峨眉山)
(4) 鵝[아; e](形:鳥, 聲:我) 거위
(5) 俄[아; e](形:人, 聲:我) 잠시, 갑자기, 俄羅斯(러시아에 대한 약칭)
(6) 莪[아; e](形:, 聲:我) 쑥
(7) 蛾[아; e](形:, 聲:我) 나방, 눈썹 [의, y] 개미(蟻와 通用)
17. 羊[양; y■■ng] 양
이 글자는 정면에서 본 양의 머리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두 뿔이 아래로 구부러졌고(‘牛’자는 위로 구부러져 있음), 아래는 뽀족한 입이 있다. 고서에서는 ‘羊’이 ‘祥(상서로울 상)’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길상(吉祥)’을 ‘吉羊’이라고 쓴 경우가 있다.
(1) 洋[양; y■■ng](形:水, 聲:羊) 바다
(2) 祥[상; xi■■ng](形:示, 聲:羊) 상서롭다
(3) 詳[상; xi■■ng](形:言, 聲:羊) 자세하다, 詳細하다
≪說文解字≫에 “審議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심의하다’는 뜻에는 ‘자세히’, ‘상세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세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翔[상; xi■■ng](形:羽, 聲:羊) 빙빙 돌아날다(飛翔)
(5) 庠[상; xi■■ng](形:, 聲:羊) 학교
金文의 자형을 보면, 절벽 밑에 있는 오두막집을 본뜬 상형자이다. 刑符가 ‘’인 글자들은 대부분 높고 큰 집(龐)이나 누추한 집을 지칭한다.
(6) 痒[양; y■■ng](形:, 聲:羊) 앓다
(7) 恙[양; y■■ng](形:心, 聲:羊) 근심
(8) 佯[양; y■■ng](形:人, 聲:羊) 거짓
[참조] 鮮[선, xi■■n] 신선하다, 곱다 [선] 드물다
≪說文解字≫에 “鮮魚也. 出國, 從魚省聲”라고 되어 있다. ‘鮮’은 물고기의 명칭이다. 이 글자는 형성자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聲符가 ‘羊’인 글자와는 달리 ‘’)의 생략된 형태가 聲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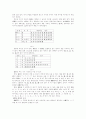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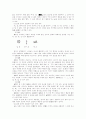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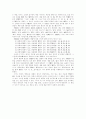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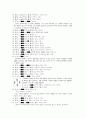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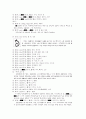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