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문자와 인쇄의 기원
3. 종이의 기원과 전래
4. 우리 나라 인쇄의 기원
5. 통일신라시대의 인쇄
6. 고려시대의 목판인쇄
7.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8. 나오는 말
2. 문자와 인쇄의 기원
3. 종이의 기원과 전래
4. 우리 나라 인쇄의 기원
5. 통일신라시대의 인쇄
6. 고려시대의 목판인쇄
7.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8. 나오는 말
본문내용
재래식 방법으로 주자(鑄字)하였으므로 중앙관서(中央官署)에서의 주자(鑄字)에 비하여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조잡한 편이나, 원(元)의 굴욕적인 지배로 중앙관서의 금속활자 인쇄기능이 마비되었던 당시에,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서적을 인출한 것은 고려 금속활자인쇄술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참으로 큰 것이다.
(5)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는 흥덕사의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다. 이는 최근에 발견된 그 번각본( 刻本)이 국내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번각본( 刻本)「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에는 그 간행연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본서의 금속활자본은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출되고 그 번각( 刻)은 경상도지방에서 행하진 것으로 추정된다.
(6)기타(其他)
이외에도 성암고서박물관(誠菴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전집(前集:1책)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凉答順宗心要法門)」(5장) 등을 고려시대 금속활자인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은 그 권말에 있는 소장인(所藏印)을 \'이영보장(李寗寶藏)\' 인 것으로 잘못 판독함으로써, 그가 고려 인종(仁宗) 2(1124)년에 송(宋) 휘종(徽宗)에게「예성강도(禮成江圖)」를 바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서를 의종(毅宗) 14(1160)년경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①남송(南宋) 말기 또는 원대(元代) 말기의 사람인 황견·진력(陳 )에 의해서 편찬된 것으로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원대(元代) 초기라는 점, ②전록생(田祿生) 14(1365)년에 원(元)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라는 점, ③본서의 서명인「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을 전래한 후에 쓰여진 명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서의 간행은 15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될 뿐인 것이다.
또한,「심요법문(心要法門)」으로 약칭하기도 하는「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凉答順宗心要法門)」은 그 권말에 간행자로 나타나는 \'별불화(別不花)\' 라는 중국인이 고려 충선왕(忠宣王)과 함께 원(元)의 무왕(武王)을 옹립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그가 충렬왕(忠烈王) 23(1297)년 무렵에 중국의 사신으로 고려를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충렬왕 23(1297)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다.
(7)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달한 까닭
인쇄술이 세계 최고라는 중국이 고려보다 금속활자를 늦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한자로 활자 주형을 만들려면 수천 개를 만들어야 했다. 게다가 같은 한자라도 글씨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수는 더 많이 필요했다. 두번째로는 활자 인쇄본이 목판 인쇄본보다 섬세하고 예술적인 면을 결코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주요 인쇄물인 경전에서 예술성이 다른 점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기에 금속 활자의 발달이 더뎠던 것이다. 반면, 고려는 1126년과 1170년의 두 차례에 걸친 궁궐의 화재로 수만 권의 장서가 불탔고 그 무렵 송과 금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송에서 책을 들여오는 것도 절망적이었다.
결국 고려는 가지고 있던 기술로 필요한 책을 인쇄하는 길밖에 없었고, 적은 부수를 여러 종류 인쇄하는 경우, 목판 인쇄로는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해 그 해결이 어려웠다. 더욱이 고려에는 목판이나 목활자를 만드는 데 알맞은 단단한 나무가 적었다. 그러나 고려는 삼국의 청동 주조기술과 금속 세공기술의 전통을 계승했고, 1101년 송에서 배운 기술로 청동전을 만들었으며, 청동종들에 명문을 새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목판이나 목활자 대신에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 나오수 있었다.
8. 나오는 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인쇄는 8세기초에 목판인쇄술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쇄술로 이어져 조선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목판인쇄술은 글자가 만들어지고 책을 제작할 단계까지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글을 옮겨 베꼈으나 잘못 베끼거나 줄을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자 목판에 새기게 되면서 발달하였다. 신라시대에 판각된《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시초로 고려의《초조대장경》,《재조대장경》,《속장경》이 판각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목판인쇄는 불경의 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불교국가를 이상으로 하는 신라왕조의 자주적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려는 국가정책과 영합하여 불교문화를 훌륭하게 한 데 기인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동양에 있어서의 문명국의 위치라는 것이 불교문화의 깊이 여하에 따라 좌우되었던 만큼 국제적인 경쟁정책과 호응하여 그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꽃피게 한 데서 말미암은 것임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활자인쇄 술은 목판인쇄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금속기술이 발달해야 했다. 이에 금속기술이 발달한 고려시대에 활자금속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활자인쇄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여러주제분야에 걸쳐 필요한 책을 고루 찍어 널리 반포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민간에서까지 활자를 다양하게 만들어 인쇄하게 되어 서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문화사적인 면에서 그 의의가 크게 평가된다. 이러한 인쇄는 인류의 두뇌·학문·과학 및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자·광선·자력 등으로 인쇄물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식 연활자가 출연하기 이전에는 오로지 목판과 활자판의 인쇄가 인류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구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목판과 활자인쇄술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뛰어난 문화재이다.
▣참고자료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보진재, 1992
김두종, 한국 고활자 개요, 探求堂, 1974
송병기외, 한국사의 이해, 신서원, 199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6, 탐구당, 1975,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천혜봉, 라려 인쇄술의 연구, 경인문화사, 1996
천혜봉, 고인쇄, 대원사, 1989
(5)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는 흥덕사의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다. 이는 최근에 발견된 그 번각본( 刻本)이 국내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번각본( 刻本)「자비도장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에는 그 간행연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본서의 금속활자본은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출되고 그 번각( 刻)은 경상도지방에서 행하진 것으로 추정된다.
(6)기타(其他)
이외에도 성암고서박물관(誠菴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전집(前集:1책)과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凉答順宗心要法門)」(5장) 등을 고려시대 금속활자인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은 그 권말에 있는 소장인(所藏印)을 \'이영보장(李寗寶藏)\' 인 것으로 잘못 판독함으로써, 그가 고려 인종(仁宗) 2(1124)년에 송(宋) 휘종(徽宗)에게「예성강도(禮成江圖)」를 바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서를 의종(毅宗) 14(1160)년경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①남송(南宋) 말기 또는 원대(元代) 말기의 사람인 황견·진력(陳 )에 의해서 편찬된 것으로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원대(元代) 초기라는 점, ②전록생(田祿生) 14(1365)년에 원(元)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라는 점, ③본서의 서명인「고문진보대전(古文眞寶大全)」을 전래한 후에 쓰여진 명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서의 간행은 15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될 뿐인 것이다.
또한,「심요법문(心要法門)」으로 약칭하기도 하는「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凉答順宗心要法門)」은 그 권말에 간행자로 나타나는 \'별불화(別不花)\' 라는 중국인이 고려 충선왕(忠宣王)과 함께 원(元)의 무왕(武王)을 옹립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그가 충렬왕(忠烈王) 23(1297)년 무렵에 중국의 사신으로 고려를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충렬왕 23(1297)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다.
(7)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달한 까닭
인쇄술이 세계 최고라는 중국이 고려보다 금속활자를 늦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한자로 활자 주형을 만들려면 수천 개를 만들어야 했다. 게다가 같은 한자라도 글씨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수는 더 많이 필요했다. 두번째로는 활자 인쇄본이 목판 인쇄본보다 섬세하고 예술적인 면을 결코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주요 인쇄물인 경전에서 예술성이 다른 점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기에 금속 활자의 발달이 더뎠던 것이다. 반면, 고려는 1126년과 1170년의 두 차례에 걸친 궁궐의 화재로 수만 권의 장서가 불탔고 그 무렵 송과 금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송에서 책을 들여오는 것도 절망적이었다.
결국 고려는 가지고 있던 기술로 필요한 책을 인쇄하는 길밖에 없었고, 적은 부수를 여러 종류 인쇄하는 경우, 목판 인쇄로는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해 그 해결이 어려웠다. 더욱이 고려에는 목판이나 목활자를 만드는 데 알맞은 단단한 나무가 적었다. 그러나 고려는 삼국의 청동 주조기술과 금속 세공기술의 전통을 계승했고, 1101년 송에서 배운 기술로 청동전을 만들었으며, 청동종들에 명문을 새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에서 목판이나 목활자 대신에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 나오수 있었다.
8. 나오는 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인쇄는 8세기초에 목판인쇄술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쇄술로 이어져 조선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목판인쇄술은 글자가 만들어지고 책을 제작할 단계까지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글을 옮겨 베꼈으나 잘못 베끼거나 줄을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자 목판에 새기게 되면서 발달하였다. 신라시대에 판각된《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시초로 고려의《초조대장경》,《재조대장경》,《속장경》이 판각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목판인쇄는 불경의 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불교국가를 이상으로 하는 신라왕조의 자주적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려는 국가정책과 영합하여 불교문화를 훌륭하게 한 데 기인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동양에 있어서의 문명국의 위치라는 것이 불교문화의 깊이 여하에 따라 좌우되었던 만큼 국제적인 경쟁정책과 호응하여 그 문화를 더욱 찬란하게 꽃피게 한 데서 말미암은 것임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활자인쇄 술은 목판인쇄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금속기술이 발달해야 했다. 이에 금속기술이 발달한 고려시대에 활자금속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활자인쇄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여러주제분야에 걸쳐 필요한 책을 고루 찍어 널리 반포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민간에서까지 활자를 다양하게 만들어 인쇄하게 되어 서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문화사적인 면에서 그 의의가 크게 평가된다. 이러한 인쇄는 인류의 두뇌·학문·과학 및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자·광선·자력 등으로 인쇄물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식 연활자가 출연하기 이전에는 오로지 목판과 활자판의 인쇄가 인류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구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목판과 활자인쇄술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뛰어난 문화재이다.
▣참고자료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보진재, 1992
김두종, 한국 고활자 개요, 探求堂, 1974
송병기외, 한국사의 이해, 신서원, 199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6, 탐구당, 1975,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천혜봉, 라려 인쇄술의 연구, 경인문화사, 1996
천혜봉, 고인쇄, 대원사,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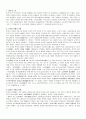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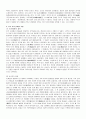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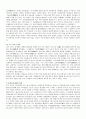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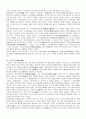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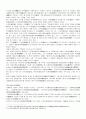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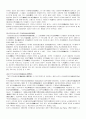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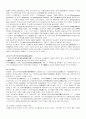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