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전국시대의 통일과 임진왜란 발발배경
Ⅲ.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Ⅳ. 임난이후 조 ․ 일 국교재개과정
Ⅴ. 임진왜란이 조․중․일에 미친 영향
Ⅵ. 결론
Ⅱ. 전국시대의 통일과 임진왜란 발발배경
Ⅲ.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Ⅳ. 임난이후 조 ․ 일 국교재개과정
Ⅴ. 임진왜란이 조․중․일에 미친 영향
Ⅵ. 결론
본문내용
이것은 주인과 하인, 본가와 별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 이르기 까지 모두 차별적인 관계로 다르게 하였다. 무사의 복록은 분할상속이 불가능하여 호주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전해졌고, 농민 또한 전답의 분할이 곤란했으므로 재산은 상속하는 가장이 가장 강한 권한을 갖았다. 그것은 다른 가족들은 집안을 존속시키기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 요메이리혼(女家入り婚-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오는 것)이 원칙이 되어 남존여비의 풍습이 심해졌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저하되었다. 주25)와 같음. p.117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이나, 유곽에서 노는 것이 조금도 나쁜 짓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반면, 처와 첩은 한사람의 남편에게 굳게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 의무를 거역한 여자는 죽음을 당해도 어쩔수 없이 되었다. 남편의 일방적 의지로서 처와 이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슈우토사리(しゅうと去り)」라고 해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내쫓는 것도 인정되어있었다. 이것은 개인보다도 집안을 존중했던 결과였고, 첩을 두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집안을 존속시키기 위한 필요로 인정되어 일부다처가 도덕적으로 시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미혼남녀의 정결한 연애까지도 불의로 간주되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철저히 가르쳐졌다.
그것은 도쿠가와 정권의 평화로 향하기 위한 정책이었음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당당히 같은 문화로 편입되길 바랬음이었다.
이렇듯 도쿠가와 막부가 유학중심사회로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근저에는 국학적 사상이 남아 있었다.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인식은 일본의 속국, 신공황후에게 평정 당했던 땅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임진왜란 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정벌에 나선 것에 대해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도 나왔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을 얕잡아 보는 인식은 계속되어 메이지 유신지사들의 기본 성향이 된다.
하지만 조선은 이전 질서로의 회귀라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고수함으로서, 일본과 중국이 외세라는 강한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동안 ‘은자의 나라’로서 쇄국을 고집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병합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한 일 양국에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중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한 정세변동을 겪게 된다. 명에서 청으로의 변화는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삼번의 난 이후 오히려 만(滿)한(漢)협력체제가 확고해져 간다. 이때, 삼번의 난을 이끈 오삼계 세력과 타이완에서 반청세력을 이끌던 정씨세력이 완전히 정리되었고, 청 왕조를 위협하는 세력은 거의 없어졌다.
임진왜란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한 중 일이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명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중국에서는 주로 명군의 승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명과의 강화교섭과 봉공문제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삼국의 연구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임진왜란에 대한 피해의식을 접고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여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참고도서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
강항저, 이을호 옮김 : 『간양록 : 바다 건너 왜국에서 보낸 환란의 세월』,
서해문집, 2005
김종권역, 류성룡, : 『(신완역)징비록』, 명문당. 1987
국립진주박물관 편 :『싸워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도서출판 혜안, 1999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 비평사, 2003
家永三郞(外), 강형중 역 : 『新日本史』, 문원각, 1995
최관 :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이덕일 : 『살아있는 한국사』, 휴머니스트, 2003
민두기 편, 김경희 : 『일본의 역사』, (주)지식산업사, 1994
김문길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혜안, 1995,
한일관계사 연구논집편찬위원회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이영, 김동철, 이근우 공저 : 『전근대 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손승철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기시모토 미오, 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 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역사비평사, 2003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30』,탐구당. 2003
김승일, 이은우 :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지식마당, 2002
이근명 편역 : 『중국역사(下)』, 도서출판 신서원, 1997
다니가와 이치오모리 마사오 펴냄 , 송정수 옮김 : 『중국 민중 반란사』,
도서출판 혜안, 1996
조중화 :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 학민사, 1996
2. 참고논문
한민호 : 「임진왜란 전기 조선과 일본의 상호인식」, 석사학위논문, 1994
구태훈 : 발행인 : 강두환「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사비평39호, 1997
김문자 :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변천」, 역사비평46호, 1999
河宇鳳 : 「임난 후 국교재개기 사명당유정의 講和活動」, 역사학보 173호, 2002
이지영 :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Vol.4, 1996
최영수 :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南學硏究, 慶尙大學校 南學硏究所7권 1호, 1997
김우현 : 「일본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의 역사적 배경」, 부산산업대학논문집 제2권, 1981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유보전 : 「임진왜란기 조명관계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3
具兌勳 : 「도쿠가와시대 초기의 천도사상과 천리관념」, 일본역사연구 10호,
도서출판 계명, 1999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이나, 유곽에서 노는 것이 조금도 나쁜 짓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반면, 처와 첩은 한사람의 남편에게 굳게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그 의무를 거역한 여자는 죽음을 당해도 어쩔수 없이 되었다. 남편의 일방적 의지로서 처와 이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슈우토사리(しゅうと去り)」라고 해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내쫓는 것도 인정되어있었다. 이것은 개인보다도 집안을 존중했던 결과였고, 첩을 두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집안을 존속시키기 위한 필요로 인정되어 일부다처가 도덕적으로 시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미혼남녀의 정결한 연애까지도 불의로 간주되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철저히 가르쳐졌다.
그것은 도쿠가와 정권의 평화로 향하기 위한 정책이었음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당당히 같은 문화로 편입되길 바랬음이었다.
이렇듯 도쿠가와 막부가 유학중심사회로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근저에는 국학적 사상이 남아 있었다.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인식은 일본의 속국, 신공황후에게 평정 당했던 땅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임진왜란 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정벌에 나선 것에 대해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도 나왔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을 얕잡아 보는 인식은 계속되어 메이지 유신지사들의 기본 성향이 된다.
하지만 조선은 이전 질서로의 회귀라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고수함으로서, 일본과 중국이 외세라는 강한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동안 ‘은자의 나라’로서 쇄국을 고집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병합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한 일 양국에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중국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한 정세변동을 겪게 된다. 명에서 청으로의 변화는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삼번의 난 이후 오히려 만(滿)한(漢)협력체제가 확고해져 간다. 이때, 삼번의 난을 이끈 오삼계 세력과 타이완에서 반청세력을 이끌던 정씨세력이 완전히 정리되었고, 청 왕조를 위협하는 세력은 거의 없어졌다.
임진왜란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한 중 일이 각각 자국의 입장에서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명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중국에서는 주로 명군의 승전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명과의 강화교섭과 봉공문제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삼국의 연구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가 임진왜란에 대한 피해의식을 접고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여 앞으로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참고도서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
강항저, 이을호 옮김 : 『간양록 : 바다 건너 왜국에서 보낸 환란의 세월』,
서해문집, 2005
김종권역, 류성룡, : 『(신완역)징비록』, 명문당. 1987
국립진주박물관 편 :『싸워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도서출판 혜안, 1999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 비평사, 2003
家永三郞(外), 강형중 역 : 『新日本史』, 문원각, 1995
최관 :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이덕일 : 『살아있는 한국사』, 휴머니스트, 2003
민두기 편, 김경희 : 『일본의 역사』, (주)지식산업사, 1994
김문길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혜안, 1995,
한일관계사 연구논집편찬위원회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이영, 김동철, 이근우 공저 : 『전근대 한일관계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손승철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기시모토 미오, 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 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역사비평사, 2003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30』,탐구당. 2003
김승일, 이은우 :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지식마당, 2002
이근명 편역 : 『중국역사(下)』, 도서출판 신서원, 1997
다니가와 이치오모리 마사오 펴냄 , 송정수 옮김 : 『중국 민중 반란사』,
도서출판 혜안, 1996
조중화 :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 학민사, 1996
2. 참고논문
한민호 : 「임진왜란 전기 조선과 일본의 상호인식」, 석사학위논문, 1994
구태훈 : 발행인 : 강두환「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사비평39호, 1997
김문자 :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변천」, 역사비평46호, 1999
河宇鳳 : 「임난 후 국교재개기 사명당유정의 講和活動」, 역사학보 173호, 2002
이지영 :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동국역사교육Vol.4, 1996
최영수 :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南學硏究, 慶尙大學校 南學硏究所7권 1호, 1997
김우현 : 「일본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의 역사적 배경」, 부산산업대학논문집 제2권, 1981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양국의 상호인식』, 국학자료원, 1998
유보전 : 「임진왜란기 조명관계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3
具兌勳 : 「도쿠가와시대 초기의 천도사상과 천리관념」, 일본역사연구 10호,
도서출판 계명,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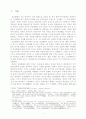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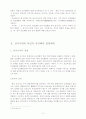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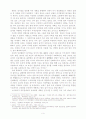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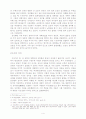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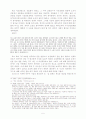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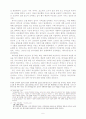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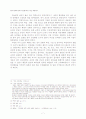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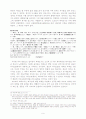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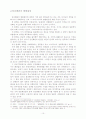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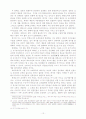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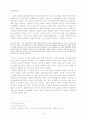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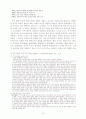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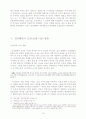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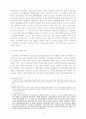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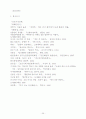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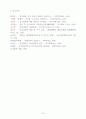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