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있었던 광해군의 실록을 대신할 수 없어 1624년(인조 2) 2월 29일 《광해군일기》의 편찬을 결정하였다.
그 해 6월 찬수청(纂修廳)을 남별궁(南別宮)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시정기》와 《정원일기》는 이괄(李适)의 난으로 산일(散逸)되었기 때문에 광해군 즉위 후의 조보(朝報)와 사관의 가장(家藏)된 사초(史草), 상소문의 초고, 야사·문집 등을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광해군일기》는 당시 집권한 서인이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현재 중초본(中草本;태백산본, 187권 64책)과 정초본(正草本;정족산본, 187권 40책)이 남아 있다. 필사본.
105. 선조수정실록
광해군 때 편찬된 〈선조실록〉을 수정·보완한 책.
42권 8책. 활자본(훈련도감자). 〈선조실록〉은 북인의 입장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서인과 남인에 대해서 불리한 기술이 많았다. 이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여 새로 편찬한 것이 수정실록이다. 그러나 기존의 실록에는 손을 대지 않고 기존 실록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조사한 후 자료를 수집하여 보유편(補遺篇) 형식으로 편찬했다. 1641년(인조 19) 서인인 이식(李植)이 전담하여 편찬을 시작했다. 중도에 이식이 죽어 중단되었다가 1657년(효종 8) 3월에 다시 시작하여 9월에 완성했다. 선조 29년까지 30권은 이식의 편찬이고 이후 12권은 채유후(蔡裕後)의 편찬이다.
106. 현종개수실록
현종실록이 급하게 만들어져 착오·소략한 곳이 많고, 허적 등 남인(南人)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680년(숙종 6) 서인이 남인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개수에 착수하여 1683년 3월에 완성했다. 28권·부록 합29책. 편찬자는 김수항(金壽恒)·이단하(李端夏)·신정(申晸)·신완(申琓)·윤세기(尹世紀) 등이다.
107. 숙종실록보궐정오
숙종 연간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였다.
{숙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될 무렵 정권을 잡은 소론은
{숙종실록} 각 권의 말미에 \' 보궐정오(補闕正誤) \'를
만들어 기존에 노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숙종실록}
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108. 경종수정실록
경종실록이 소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778년(정조 2) 영조실록 편찬 당시 이사겸(李師謙)의 건의로 선조개수실록·현종개수실록의 예에 따라 경종실록을 수정하기로 하고 1781년에 완성되었다. 5권 3책. 편찬자는 정존겸(鄭存謙)·채제공(蔡濟恭)·황경원(黃景源)·박천형(朴天衡) 등이다.
과 실록각(實錄閣)터, 선원각(璿源閣)터, 책을 볕에 쬐게 하는 포쇄관(曝館)터, 근천관(近天館)터 등 당시의 사고 건물의 배치관계가 확인되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09. 오대산사고
조선 후기 5사고 가운데 하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북쪽에 있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그전에 있던 4사고 가운데 전주사고만 남아 그 기록을 내장산·해주·강화도·묘향산 등으로 옮겼다. 1603년 7월에서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804권의 실록을 다시 출판했다. 이때 출판한 3부와 교정본,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을 합친 5부의 실록을 강화도 마니산, 봉화군 태백산, 영변군 묘향산, 평창군 오대산에 각 1부씩 나누어두었다. 이 가운데 오대산사고에는 교정본을 봉안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으로 춘추관사고가 없어졌고, 1633년 후금과의 관계 악화로 묘향산사고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했으며, 1636년 병자호란으로 마니산사고가 크게 파괴당하자 1678년(숙종 4) 정족산으로 옮겼다. 오대산사고는 조선 말기까지 보존되었던 사고였으나 1913년 일제가 오대산사고에 있던 실록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으로 가져갔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거의 다 타버렸다. 남은 잔본 약간만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져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다.
110. 정족산사고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고 가운데 하나.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안에 있는 전등사(傳燈寺) 서쪽에 자리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청군(淸軍)에 의해 파괴되어 기록이 많이 없어졌던 마니산실록을 현종 때 완전히 보수하여, 같은 강화도 안에 있는 정족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그곳으로 이전했다. 인조 이후의 실록은 4부씩 인쇄하여 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와 함께 정족산에 각 1부씩 보관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정족산실록은 태백산실록과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 도서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으로 옮겨졌다.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국보로 보전·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실록의 원본으로는 정족산실록과 태백산실록뿐이다. 정족산사고의 자리에는 주춧돌만 놓여 있는데, 1931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에 정족산사고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를 전후하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11. 태백산사고
1592년(선조 25)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춘추관(春秋館) 및 충주와 성주(星州)에 있던 사고가 불타 실록 등 중요한 서적이 소실되고 전주사고만 남게 되자 1606년 명종(明宗)까지의 실록은 다시 발간하고 영변(寧邊)의 묘향산, 강릉의 오대산, 무주의 적상산(赤裳山)과 함께 봉화의 태백산에 사고를 지어 새로 발간한 실록을 보관하였다. 태백산사고는 명종 이후에 편찬 간행된 역대왕들의 실록을 계속 보관 관리하다가 1910년의 국권침탈 뒤 실록 등 서적들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종친부(宗親府) 건물로 옮겨짐에 따라 그 기능이 정지되어 건물도 폐허화하였다. 태백산 사고본은 정족산본 ·규장각도서와 함께 1930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에 옮겨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태백산사고터에 대해서는 1988년 8~9월 대구대학 박물관(단장 이명식)이 발굴조사한 결과 실록각(實錄閣)터, 선원각(璿源閣)터, 책을 볕에 쬐게 하는 포쇄관(曝館)터, 근천관(近天館)터 등 당시의 사고 건물의 배치관계가 확인되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해 6월 찬수청(纂修廳)을 남별궁(南別宮)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시정기》와 《정원일기》는 이괄(李适)의 난으로 산일(散逸)되었기 때문에 광해군 즉위 후의 조보(朝報)와 사관의 가장(家藏)된 사초(史草), 상소문의 초고, 야사·문집 등을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광해군일기》는 당시 집권한 서인이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현재 중초본(中草本;태백산본, 187권 64책)과 정초본(正草本;정족산본, 187권 40책)이 남아 있다. 필사본.
105. 선조수정실록
광해군 때 편찬된 〈선조실록〉을 수정·보완한 책.
42권 8책. 활자본(훈련도감자). 〈선조실록〉은 북인의 입장에서 편찬한 것으로서 서인과 남인에 대해서 불리한 기술이 많았다. 이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여 새로 편찬한 것이 수정실록이다. 그러나 기존의 실록에는 손을 대지 않고 기존 실록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조사한 후 자료를 수집하여 보유편(補遺篇) 형식으로 편찬했다. 1641년(인조 19) 서인인 이식(李植)이 전담하여 편찬을 시작했다. 중도에 이식이 죽어 중단되었다가 1657년(효종 8) 3월에 다시 시작하여 9월에 완성했다. 선조 29년까지 30권은 이식의 편찬이고 이후 12권은 채유후(蔡裕後)의 편찬이다.
106. 현종개수실록
현종실록이 급하게 만들어져 착오·소략한 곳이 많고, 허적 등 남인(南人)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680년(숙종 6) 서인이 남인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개수에 착수하여 1683년 3월에 완성했다. 28권·부록 합29책. 편찬자는 김수항(金壽恒)·이단하(李端夏)·신정(申晸)·신완(申琓)·윤세기(尹世紀) 등이다.
107. 숙종실록보궐정오
숙종 연간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였다.
{숙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될 무렵 정권을 잡은 소론은
{숙종실록} 각 권의 말미에 \' 보궐정오(補闕正誤) \'를
만들어 기존에 노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숙종실록}
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108. 경종수정실록
경종실록이 소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기 때문에 1778년(정조 2) 영조실록 편찬 당시 이사겸(李師謙)의 건의로 선조개수실록·현종개수실록의 예에 따라 경종실록을 수정하기로 하고 1781년에 완성되었다. 5권 3책. 편찬자는 정존겸(鄭存謙)·채제공(蔡濟恭)·황경원(黃景源)·박천형(朴天衡) 등이다.
과 실록각(實錄閣)터, 선원각(璿源閣)터, 책을 볕에 쬐게 하는 포쇄관(曝館)터, 근천관(近天館)터 등 당시의 사고 건물의 배치관계가 확인되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09. 오대산사고
조선 후기 5사고 가운데 하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북쪽에 있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그전에 있던 4사고 가운데 전주사고만 남아 그 기록을 내장산·해주·강화도·묘향산 등으로 옮겼다. 1603년 7월에서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804권의 실록을 다시 출판했다. 이때 출판한 3부와 교정본,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을 합친 5부의 실록을 강화도 마니산, 봉화군 태백산, 영변군 묘향산, 평창군 오대산에 각 1부씩 나누어두었다. 이 가운데 오대산사고에는 교정본을 봉안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으로 춘추관사고가 없어졌고, 1633년 후금과의 관계 악화로 묘향산사고를 적상산(赤裳山)으로 이전했으며, 1636년 병자호란으로 마니산사고가 크게 파괴당하자 1678년(숙종 4) 정족산으로 옮겼다. 오대산사고는 조선 말기까지 보존되었던 사고였으나 1913년 일제가 오대산사고에 있던 실록을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으로 가져갔으며,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거의 다 타버렸다. 남은 잔본 약간만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져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다.
110. 정족산사고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고 가운데 하나.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안에 있는 전등사(傳燈寺) 서쪽에 자리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청군(淸軍)에 의해 파괴되어 기록이 많이 없어졌던 마니산실록을 현종 때 완전히 보수하여, 같은 강화도 안에 있는 정족산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고 그곳으로 이전했다. 인조 이후의 실록은 4부씩 인쇄하여 태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와 함께 정족산에 각 1부씩 보관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정족산실록은 태백산실록과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 도서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으로 옮겨졌다.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으로 보관·전환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국보로 보전·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실록의 원본으로는 정족산실록과 태백산실록뿐이다. 정족산사고의 자리에는 주춧돌만 놓여 있는데, 1931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에 정족산사고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를 전후하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11. 태백산사고
1592년(선조 25)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춘추관(春秋館) 및 충주와 성주(星州)에 있던 사고가 불타 실록 등 중요한 서적이 소실되고 전주사고만 남게 되자 1606년 명종(明宗)까지의 실록은 다시 발간하고 영변(寧邊)의 묘향산, 강릉의 오대산, 무주의 적상산(赤裳山)과 함께 봉화의 태백산에 사고를 지어 새로 발간한 실록을 보관하였다. 태백산사고는 명종 이후에 편찬 간행된 역대왕들의 실록을 계속 보관 관리하다가 1910년의 국권침탈 뒤 실록 등 서적들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종친부(宗親府) 건물로 옮겨짐에 따라 그 기능이 정지되어 건물도 폐허화하였다. 태백산 사고본은 정족산본 ·규장각도서와 함께 1930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에 옮겨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태백산사고터에 대해서는 1988년 8~9월 대구대학 박물관(단장 이명식)이 발굴조사한 결과 실록각(實錄閣)터, 선원각(璿源閣)터, 책을 볕에 쬐게 하는 포쇄관(曝館)터, 근천관(近天館)터 등 당시의 사고 건물의 배치관계가 확인되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 연구에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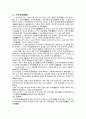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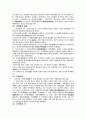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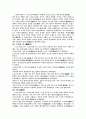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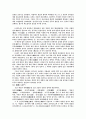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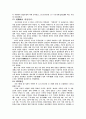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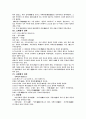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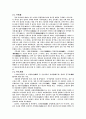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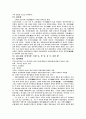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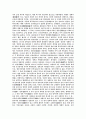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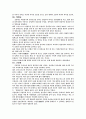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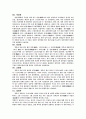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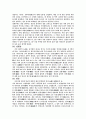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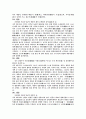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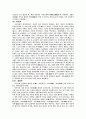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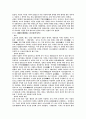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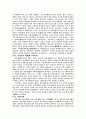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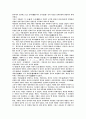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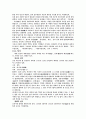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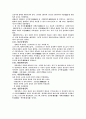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