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 次
1. 서론
2. 본론
1)초기의 회화
2)중기의 회화
3)후기의 회화
4)말기의 회화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2. 본론
1)초기의 회화
2)중기의 회화
3)후기의 회화
4)말기의 회화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남종화풍을 우리 나라 화단에 고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해랑,『韓國美術史』, 정화인쇄문화사, 1984, p442~p443
다)오원(吾園) 장승업(長承業) 1843~1897
⇒오원은 출신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그림 수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그 집 아들들의 글 읽는 것을 곁들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집에 소장되어 있는 원명 이래의 명적들을 접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이 통한 듯 그림을 능숙하게 그리게 되어 계속 화명을 날리게 되었다. 술과 여자를 몹시 좋아하였고 아무 것에도 매이기를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승업의 화풍은 그의 성격대로 매우 호방하고 활달하나 바로크적인 형태의 과장과 직업화가적인 기질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량은 풍부하나 그의 시대를 지배한 문자향, 서권기는 결여하고 있어 못내 아쉽다. 그가 만약 안견이나 김홍도가 안평대군이나 강세황으로부터 받았던 정도의 지도와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그의 화격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후대에 미친 영향 또한 좀더 크고 수준 높았을 것이다.
그는 산수, 인물, 영모 새와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원래 영모는 새털의 의미로 그것이 새종유만을 지칭하는 말이였으나 두 글자를 각각 떼어 동물 털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됨으로써 새와 동물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여진다. 털 하나까지 섬세하게 묘사한걸 말한다.
, 기명, 절지, 사군자 등 다양한 소재를 폭 넓게 다루었다. 산수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남종화풍과 각체의 북종화풍 북종화(北宗) : 화원이나 직업적인 화가들이 짙은 채색과 꼼꼼한 필채를 써서 사진처럼 외형묘사에 주력하여 그린 장식적이고 격조 없는 공필의 그림을 말한다. 남송의 마원이나 하규처럼 수묵을 주로 사용하여 그린 화가들도 북종화가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명대의 남북종화론에서는 채색이나 수묵에 의한 구분이기보다는 화가의 신분이 구분의 큰 기준이 되었던 듯 하다.
도 함께 그렸다. 이해랑,『韓國美術史』, 정화인쇄문화사, 1984, p446~p447
김원용,『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148
3. 결론
이상으로 조선시대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회화는 앞 시기인 고려시대와의 연대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거두게 된다. 고려시대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불화들이 발전을 이루었고, 조선시대엔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화가 억제되었다. 물론 불화가 억제되어서 발전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산수화나 풍속화나 인물화 등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초기엔 고려시대의 화풍과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던 많은 중국 화풍의 영향으로 중국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견 같은 대 화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기엔 혼란기를 틈타 초기에 유행했던 산수화들이 특색 있게 발전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대 화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후기엔 英正祖 시대를 거치면서 실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풍속화가 발전을 하고 또한 서민 화가들이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 조에선 화원의 춘추전국시대라 부르고 싶다. 말기엔 후기와 바로 이어지는 시기로 더욱 발전을 하고 서양화풍의 유입으로 인하여 현대 회화사에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조에서 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거의 모든 회화와 관련된 소장품들은 서울에 있고, 또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몽유도원도 같은 걸작이 우리 나라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원용,『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250(0132~p150)
안휘준,『韓國繪畵史』, 일지사, 1980, p413(p90~p320)
이해랑,『韓國美術史』, 정화인쇄문화사, 1984, p673(p391~p447)
서희건,『박물관대학』, 조광인쇄, 1985, p414
안휘준,『韓國繪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8, p470
김종태,『韓國畵論』, 일지사, 1989
김철순,『韓國民論考』, 예경산업사, 1991, p345
안휘준 외,『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p484(p305~p328)
김원룡.안휘준,『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610(p269~p320)
김영종,『역사신문』3, 사계절, 1996, p116
김영종,『역사신문』4, 사계절, 1996, p135
이동주,『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 p383(p93~p363)
이홍직,『國史大事典』, 민중서관, 1997, p1980
유홍준,『조선시대화론연구』, 학고재, 1998, p276
임두빈,『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1998, p359(p151~p319)
진준현,『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p733
오주석,『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227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안휘준,『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414(p153~p390)
안휘준,『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p861(p309~p798)
정병모,『회화』1, 예경, 2001, p323
정병모,『회화』2, 예경, 2001, p303
최석태,『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화가 김홍도』,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90
조정육,『신선이 되고 싶은 화가 장승업』,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p208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風俗畵』, 삼화인쇄, 2002, p311
국립광주박물관, 『朝鮮時代 風俗畵』, 삼화인쇄, 2002, p175
위순선,「조선시대 계회도」, 제63회 동아시아문물연구소월례발표회, 2001년10월13일 발표
★참고사이트
http://www.artsquare.co.kr/p-hiskorea.htm 그림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http://www.towooart.com/oldart/old_korea/jangseungyub/jangsy_note_03.htm 오원 장승업
http://100.empas.com/ 엠파스 백과사전
다)오원(吾園) 장승업(長承業) 1843~1897
⇒오원은 출신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그림 수업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그 집 아들들의 글 읽는 것을 곁들어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집에 소장되어 있는 원명 이래의 명적들을 접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이 통한 듯 그림을 능숙하게 그리게 되어 계속 화명을 날리게 되었다. 술과 여자를 몹시 좋아하였고 아무 것에도 매이기를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승업의 화풍은 그의 성격대로 매우 호방하고 활달하나 바로크적인 형태의 과장과 직업화가적인 기질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량은 풍부하나 그의 시대를 지배한 문자향, 서권기는 결여하고 있어 못내 아쉽다. 그가 만약 안견이나 김홍도가 안평대군이나 강세황으로부터 받았던 정도의 지도와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면 그의 화격은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후대에 미친 영향 또한 좀더 크고 수준 높았을 것이다.
그는 산수, 인물, 영모 새와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원래 영모는 새털의 의미로 그것이 새종유만을 지칭하는 말이였으나 두 글자를 각각 떼어 동물 털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됨으로써 새와 동물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여진다. 털 하나까지 섬세하게 묘사한걸 말한다.
, 기명, 절지, 사군자 등 다양한 소재를 폭 넓게 다루었다. 산수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남종화풍과 각체의 북종화풍 북종화(北宗) : 화원이나 직업적인 화가들이 짙은 채색과 꼼꼼한 필채를 써서 사진처럼 외형묘사에 주력하여 그린 장식적이고 격조 없는 공필의 그림을 말한다. 남송의 마원이나 하규처럼 수묵을 주로 사용하여 그린 화가들도 북종화가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명대의 남북종화론에서는 채색이나 수묵에 의한 구분이기보다는 화가의 신분이 구분의 큰 기준이 되었던 듯 하다.
도 함께 그렸다. 이해랑,『韓國美術史』, 정화인쇄문화사, 1984, p446~p447
김원용,『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148
3. 결론
이상으로 조선시대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회화는 앞 시기인 고려시대와의 연대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거두게 된다. 고려시대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불화들이 발전을 이루었고, 조선시대엔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화가 억제되었다. 물론 불화가 억제되어서 발전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산수화나 풍속화나 인물화 등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초기엔 고려시대의 화풍과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던 많은 중국 화풍의 영향으로 중국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견 같은 대 화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기엔 혼란기를 틈타 초기에 유행했던 산수화들이 특색 있게 발전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대 화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후기엔 英正祖 시대를 거치면서 실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풍속화가 발전을 하고 또한 서민 화가들이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 조에선 화원의 춘추전국시대라 부르고 싶다. 말기엔 후기와 바로 이어지는 시기로 더욱 발전을 하고 서양화풍의 유입으로 인하여 현대 회화사에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조에서 조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거의 모든 회화와 관련된 소장품들은 서울에 있고, 또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몽유도원도 같은 걸작이 우리 나라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원용,『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250(0132~p150)
안휘준,『韓國繪畵史』, 일지사, 1980, p413(p90~p320)
이해랑,『韓國美術史』, 정화인쇄문화사, 1984, p673(p391~p447)
서희건,『박물관대학』, 조광인쇄, 1985, p414
안휘준,『韓國繪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8, p470
김종태,『韓國畵論』, 일지사, 1989
김철순,『韓國民論考』, 예경산업사, 1991, p345
안휘준 외,『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p484(p305~p328)
김원룡.안휘준,『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610(p269~p320)
김영종,『역사신문』3, 사계절, 1996, p116
김영종,『역사신문』4, 사계절, 1996, p135
이동주,『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1996, p383(p93~p363)
이홍직,『國史大事典』, 민중서관, 1997, p1980
유홍준,『조선시대화론연구』, 학고재, 1998, p276
임두빈,『한국미술사 101장면』, 가람기획, 1998, p359(p151~p319)
진준현,『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p733
오주석,『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1999, p227
홍선표,『조선시대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안휘준,『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0, p414(p153~p390)
안휘준,『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p861(p309~p798)
정병모,『회화』1, 예경, 2001, p323
정병모,『회화』2, 예경, 2001, p303
최석태,『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화가 김홍도』,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90
조정육,『신선이 되고 싶은 화가 장승업』,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p208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風俗畵』, 삼화인쇄, 2002, p311
국립광주박물관, 『朝鮮時代 風俗畵』, 삼화인쇄, 2002, p175
위순선,「조선시대 계회도」, 제63회 동아시아문물연구소월례발표회, 2001년10월13일 발표
★참고사이트
http://www.artsquare.co.kr/p-hiskorea.htm 그림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http://www.towooart.com/oldart/old_korea/jangseungyub/jangsy_note_03.htm 오원 장승업
http://100.empas.com/ 엠파스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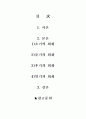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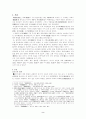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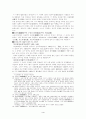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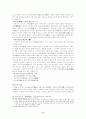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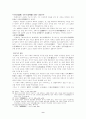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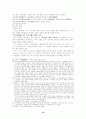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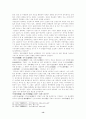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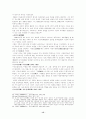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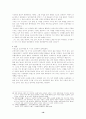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