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구려의 산성과 성곽기술
고구려 산성의 의미
고구려 산성의 특질
고구려 산성의 구조물
1) 성문(城門)
2) 옹성(甕城)
3) 치성(雉城)
4) 여장(女牆: 雉堞)
5) 수원지(水源池: 못)
6) 점장대(點將臺: 帥將臺)
7) 수구문(水口門)과 배수구(排水口)
8) 기타시설
고구려 산성의 의미
고구려 산성의 특질
고구려 산성의 구조물
1) 성문(城門)
2) 옹성(甕城)
3) 치성(雉城)
4) 여장(女牆: 雉堞)
5) 수원지(水源池: 못)
6) 점장대(點將臺: 帥將臺)
7) 수구문(水口門)과 배수구(排水口)
8) 기타시설
본문내용
선시대에 나온 용어이고, 그 이전 고려에서는 성두(城頭)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구려 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기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치나 치성이란 용어를 썼다. 치와 성가퀴를 아울러 치첩(雉堞)이라고 부른다.
● 치성(雉城)의 기능에 따른 분류
① 치(雉) - 성벽에 밖으로 설치한 치.
치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성곽시설이다. 평지성이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잡은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평지성이나 완만한 경사지의 산성은 성벽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에 부적합하고, 특히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방법이 없다. 이에 성벽 바깥으로 돌출한 치를 축조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였다. 반면, 험준한 산악지대나 굴곡이 심한 지형에 위치한 산성은 만곡부(彎曲部) 휘어진부분
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를 설치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② 각대(角臺) - 성벽 귀퉁이에 설치한 치.
각대는 높은 지점, 모서리나 돌출부 등에 자리잡고 있다. 모든 성에서 확인되는데,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석축이나 토축으로 평대를 구축하였다.
③ 적대(敵臺) - 성문 밖에 설치하여 성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치.
적대는 성문 가까운 양쪽에 성벽과 같은 너비와 높이를 돌출시킨 것으로 이 역시 성문에 다가오는 적을 정면과 좌우에서 격퇴 시키는 시설물이다.
성벽을 직선으로 쌓으면 시각이 좁아 사각(死角)지대가 생기므로 성벽 바로 밑에 접근하는 적을 놓칠 수 있고, 공격할 때도 전면에서밖에 공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벽에서 접근하는 적을 일찍 관측하고, 전투를 할 때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양쪽 측면, 즉 3면에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내 쌓은 치(雉, 또는 雉城)이다.
4) 여장(女牆: 雉堞)
여장은 성가퀴라고도 하는데 성벽 위에 설치한 시설로 사격할 때 몸을 숨기는 장벽으로 치와 함께 성벽의 기본 방어 시설의 하나이다. 화살을 막는 곳이라는 뜻에서 ‘살받이터’라고도 한다. 한문으로는 ‘성가퀴 첩(堞)’, ‘살받이터 타()’자를 써서 첩(堞) 또는 타()라고 하며, 여장(女墻)여첩(女堞)여원(女垣)성첩(城堞)첩원(堞垣)희장(姬牆)치비()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적을 사격하는 시설물로 치(雉:馬面)의 상층부에 대게 凹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파괴되었으므로, 후세에 보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가퀴 안쪽에는 돌구덩이가 있는데 이 돌구덩이는 고구려 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설이다. 같은 시대인 신라, 백제의 유적에서 이러한 시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고구려의 치나 옹성 같은 시설은 후대에 많이 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구덩이는 아직 그 예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특징적 시설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문헌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 구덩이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둥구덩이의 쓰임새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굴림통나무(滾木)를 매다는 기둥구덩이(柱洞)
2. 쇠뇌(弩砲) 여러 개의 화살이 잇달아 나가게 만든 활의 한 가지.
를 설치하는 기둥구덩이
3. 성가퀴의 높이와 보호력을 높이는 목책기둥의 구덩이
4. 깃대자리
5) 수원지(水源池: 못)
이것은 산성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장기간에 항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다. 그리하여 산성은 수원(水源)이 풍부한 골짜기를 감싸고 있든가 내부에 천연샘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수지나 우물을 조성하거나 빗물 저장시설 등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포곡식산성은 계곡이나 개울이 있기 때문에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중대형급 산성은 대부분 저수지나 연못을 축조하여 물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수원 확보를 위해 오룡산성을 비롯하여 태자성, 용수산성 등에서 인공우물을 판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천연 샘물은 철령의 최진보산성, 요동의 마권자산성 등에서 확인되었다.
6) 점장대(點將臺: 帥將臺)
점장대는 전투지휘소로서 성 내외의 동향을 살피는 기능과 아울러 작전연락 및 상황보고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로 높은 고지나 정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 두거나, 지대가 낮지만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돌로 쌓고 준대 위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7) 수구문(水口門)과 배수구(排水口)
수구문과 배수구는 성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배수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은 성문처럼 트여 있기 때문에 군사방어상 취약한 곳이다. 이에 성문처럼 튼튼하게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이 흐르는 계곡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붕괴되고 원모습이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처럼 수구문은 붕괴되기 쉬울 뿐 아니라 군사방어상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문과 별도 위치에 구축하였다.
8) 기타시설
위에서 언급했던 시설 이외에도 지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나 위치를 달리한 시설들이 있는데 환도산성, 동모산의 경우 군사훈련지(戊兵地)가 있다.
지리적으로 산악지방에서 성장한 고구려는 대규모의 인력을 앞세운 중국 세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는 지형을 활용한 산성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영토 확장의 루트를 따라 그것을 보호하는 요새를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장기간의 항쟁과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산성에는 많은 시설들이 존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05년 동안 번영을 누리며 중국에서무려 35개의 나라들이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변국들의 대 혼란기에 외부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내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신형식(申瀅植) [韓國의 古代史] 서울: 삼영사(三英社), 2002.
고고학연구소 [고구려문화]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1995.
여호규 [高句麗 城 2] 북방군사연구소, 1999.
김용간 박진욱 [조선고고학전서]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고구려 축성법 연구] -서길수- 2001.01
● 치성(雉城)의 기능에 따른 분류
① 치(雉) - 성벽에 밖으로 설치한 치.
치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성곽시설이다. 평지성이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잡은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평지성이나 완만한 경사지의 산성은 성벽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에 부적합하고, 특히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방법이 없다. 이에 성벽 바깥으로 돌출한 치를 축조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였다. 반면, 험준한 산악지대나 굴곡이 심한 지형에 위치한 산성은 만곡부(彎曲部) 휘어진부분
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를 설치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② 각대(角臺) - 성벽 귀퉁이에 설치한 치.
각대는 높은 지점, 모서리나 돌출부 등에 자리잡고 있다. 모든 성에서 확인되는데,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석축이나 토축으로 평대를 구축하였다.
③ 적대(敵臺) - 성문 밖에 설치하여 성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치.
적대는 성문 가까운 양쪽에 성벽과 같은 너비와 높이를 돌출시킨 것으로 이 역시 성문에 다가오는 적을 정면과 좌우에서 격퇴 시키는 시설물이다.
성벽을 직선으로 쌓으면 시각이 좁아 사각(死角)지대가 생기므로 성벽 바로 밑에 접근하는 적을 놓칠 수 있고, 공격할 때도 전면에서밖에 공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벽에서 접근하는 적을 일찍 관측하고, 전투를 할 때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양쪽 측면, 즉 3면에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내 쌓은 치(雉, 또는 雉城)이다.
4) 여장(女牆: 雉堞)
여장은 성가퀴라고도 하는데 성벽 위에 설치한 시설로 사격할 때 몸을 숨기는 장벽으로 치와 함께 성벽의 기본 방어 시설의 하나이다. 화살을 막는 곳이라는 뜻에서 ‘살받이터’라고도 한다. 한문으로는 ‘성가퀴 첩(堞)’, ‘살받이터 타()’자를 써서 첩(堞) 또는 타()라고 하며, 여장(女墻)여첩(女堞)여원(女垣)성첩(城堞)첩원(堞垣)희장(姬牆)치비()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적을 사격하는 시설물로 치(雉:馬面)의 상층부에 대게 凹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파괴되었으므로, 후세에 보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성가퀴 안쪽에는 돌구덩이가 있는데 이 돌구덩이는 고구려 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설이다. 같은 시대인 신라, 백제의 유적에서 이러한 시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고구려의 치나 옹성 같은 시설은 후대에 많이 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구덩이는 아직 그 예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특징적 시설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문헌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 구덩이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둥구덩이의 쓰임새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굴림통나무(滾木)를 매다는 기둥구덩이(柱洞)
2. 쇠뇌(弩砲) 여러 개의 화살이 잇달아 나가게 만든 활의 한 가지.
를 설치하는 기둥구덩이
3. 성가퀴의 높이와 보호력을 높이는 목책기둥의 구덩이
4. 깃대자리
5) 수원지(水源池: 못)
이것은 산성의 절대적인 요건으로서 장기간에 항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다. 그리하여 산성은 수원(水源)이 풍부한 골짜기를 감싸고 있든가 내부에 천연샘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수지나 우물을 조성하거나 빗물 저장시설 등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포곡식산성은 계곡이나 개울이 있기 때문에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중대형급 산성은 대부분 저수지나 연못을 축조하여 물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수원 확보를 위해 오룡산성을 비롯하여 태자성, 용수산성 등에서 인공우물을 판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천연 샘물은 철령의 최진보산성, 요동의 마권자산성 등에서 확인되었다.
6) 점장대(點將臺: 帥將臺)
점장대는 전투지휘소로서 성 내외의 동향을 살피는 기능과 아울러 작전연락 및 상황보고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로 높은 고지나 정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 두거나, 지대가 낮지만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는 돌로 쌓고 준대 위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7) 수구문(水口門)과 배수구(排水口)
수구문과 배수구는 성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배수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은 성문처럼 트여 있기 때문에 군사방어상 취약한 곳이다. 이에 성문처럼 튼튼하게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이 흐르는 계곡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붕괴되고 원모습이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처럼 수구문은 붕괴되기 쉬울 뿐 아니라 군사방어상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문과 별도 위치에 구축하였다.
8) 기타시설
위에서 언급했던 시설 이외에도 지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나 위치를 달리한 시설들이 있는데 환도산성, 동모산의 경우 군사훈련지(戊兵地)가 있다.
지리적으로 산악지방에서 성장한 고구려는 대규모의 인력을 앞세운 중국 세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는 지형을 활용한 산성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영토 확장의 루트를 따라 그것을 보호하는 요새를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장기간의 항쟁과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산성에는 많은 시설들이 존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05년 동안 번영을 누리며 중국에서무려 35개의 나라들이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변국들의 대 혼란기에 외부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내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신형식(申瀅植) [韓國의 古代史] 서울: 삼영사(三英社), 2002.
고고학연구소 [고구려문화]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1995.
여호규 [高句麗 城 2] 북방군사연구소, 1999.
김용간 박진욱 [조선고고학전서]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고구려 축성법 연구] -서길수- 2001.01
키워드
추천자료
 (축구의 사회학) 한국사회에서의 축구의 의미와 이상적 한국축구의 방향
(축구의 사회학) 한국사회에서의 축구의 의미와 이상적 한국축구의 방향 왜 신라 마립간들은 금관을 쓰게 되었는가?-신라 금관의 상징적, 역사적 의미.
왜 신라 마립간들은 금관을 쓰게 되었는가?-신라 금관의 상징적, 역사적 의미. [월드컵][월드컵 경제적 파급효과][월드컵을 통한 국가발전][월드컵 마케팅][축구]월드컵의 ...
[월드컵][월드컵 경제적 파급효과][월드컵을 통한 국가발전][월드컵 마케팅][축구]월드컵의 ... [신화][단군신화][홍익인간][건국신화][단군][단군신화 교육]신화의 개념, 신화의 기능과 단...
[신화][단군신화][홍익인간][건국신화][단군][단군신화 교육]신화의 개념, 신화의 기능과 단... [전라남도][전라북도]호남지역(전라도)의 축제, 호남지역(전라도)의 고속전철, 호남지역(전라...
[전라남도][전라북도]호남지역(전라도)의 축제, 호남지역(전라도)의 고속전철, 호남지역(전라... 국악(한국전통음악)의 의미와 용어, 국악(한국전통음악)과 국악기(한국전통악기), 국악(한국...
국악(한국전통음악)의 의미와 용어, 국악(한국전통음악)과 국악기(한국전통악기), 국악(한국...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그 존제 의미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그 존제 의미 [목공예][나무공예][가구]목공예(나무공예)의 기원, 목공예(나무공예)의 역사와 목공예(나무...
[목공예][나무공예][가구]목공예(나무공예)의 기원, 목공예(나무공예)의 역사와 목공예(나무... [학교][역할갈등][학교거부증][환경운동 사례][학교의 내실화방안]학교의 의미, 학교의 변천...
[학교][역할갈등][학교거부증][환경운동 사례][학교의 내실화방안]학교의 의미, 학교의 변천... pH, 산도 및 알칼리도 - pH의 정의와 산도 및 알칼리도의 정의를 알고 실험을 하여 그 의미를...
pH, 산도 및 알칼리도 - pH의 정의와 산도 및 알칼리도의 정의를 알고 실험을 하여 그 의미를... [오방색][오방색 색채의식][오방색과 전통미술][오방색과 민화][오방색 현대적 변용]오방색의...
[오방색][오방색 색채의식][오방색과 전통미술][오방색과 민화][오방색 현대적 변용]오방색의... 한국 민속놀이(전통놀이) 가마싸움놀이(가마타기)의 의미, 유래, 한국 민속놀이(전통놀이) 가...
한국 민속놀이(전통놀이) 가마싸움놀이(가마타기)의 의미, 유래, 한국 민속놀이(전통놀이) 가... 여왕을 통해 본 신라시대 정치와 여성 (신라의 건국설화, 우리역사의 여왕들, 선덕여왕의 통...
여왕을 통해 본 신라시대 정치와 여성 (신라의 건국설화, 우리역사의 여왕들, 선덕여왕의 통... (취미와예술 A) 교재 5장에 나와 있는 국내 주요 생태관광지 중 한 곳을 여행한 후 여행기를 ...
(취미와예술 A) 교재 5장에 나와 있는 국내 주요 생태관광지 중 한 곳을 여행한 후 여행기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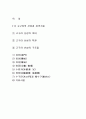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