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며 속이 급하고 뒤가 묵직하면 무기환 향련환이고, 혹은 이중탕에다 황련 목향을 가미한다.
風宜微發 寒溫이오,虛補積消 濕升하라。
설사에 풍사는 의당 약간 발산하고 한사는 온난 깔깔하게 하고 허증은 보하고 적은 소멸케 하고 습사는 삼설 승제하라.
凡瀉는 皆兼濕하니,初直分理中焦하며,利下焦요,
설사는 모두 습사를 겸하니 초기에 직접 중초를 나눠 다스리며 하초를 삼설 이수케 한다.
久則升提하대,必滑脫不禁,然後에 用藥이 之니라。
오래되면 승제하되 반드시 활탈함이 멎지 않은 연후에 약을 사용해 깔깔하게 한다.
其間에 有風勝이면 兼以解表하라,
그 사이에 풍사가 이기면 겸하여 표부를 풀어준다.
寒勝이면 兼以溫中하라,
한사가 이기면 겸하여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滑脫이면 住하고,虛弱이면 補益하고,食積이면 消導하고,濕則淡하고,陷則升하야,隨證變用하고,又不拘於次序는,與痢로 大同이라。
설사로 활탈하면 수삽약으로 머무르게 하고, 허약하면 보익하고 식적이면 소식도체하고 습사이면 담미로 삼설하고, 함몰하면 승거하여 증상에 따라서 변화하혀 사용하고 또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음은 이질과 함께 크게 같다.
且補虛에 不可純用甘溫이니,太甘則生濕이오;
또한 허증을 보함에 순전히 감온약으로 사용하면 안되니 너무 감미면 습을 생성할 수 있다.
熱에 亦不太苦니,苦則傷脾라,
열을 끔에 또한 너무 고미면 안되니 고미는 비를 손상한다.
每兼淡劑하야 利竅로 爲妙니라。
매번 담미약제를 겸하여 이수함을 오묘함으로 여긴다.
抑考이면《難經》에 云胃泄은,食不化,色黃이오;
다시 고찰하면 난경에 말하길 위의 설사는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황색이다.
脾泄은 腹脹嘔逆이라 하니,言瀉也요;
비의 설사는 복부창만하고 구역한다고 하니 쏟아냄을 말함이다.
大腸泄은,食已 窘迫하고,色白하며,腸鳴切痛이오;
대장설사는 음식을 먹은 후 군박하고 백색이면서 장이 울리며 끊어지게 아프다.
小腸泄은,而便膿血하며,小腹痛이오;
소장 설사는 소변보면 농혈을 보고 소복부가 아프다.
大泄은,裏急後重하야,數至하대 而不能便하며,莖中이 痛而溺이라 하니,言痢也라。
대하설은 속이 급하고 뒤가 묵직하여 자주 변소에 가되 대변을 보지 못하고 음경 속이 아프고, 소변이 깔깔하니 이질을 말함이다.
(괴밸, 목병, 기생충병 하; -총14획; jia)
(뒷간, 변소 청; -총11획; qng)
觀此 瀉與痢면,亦惟膿血與糞之異요,
이 설사와 이질을 보면 또한 오직 농혈과 똥의 차이가 있다.
除傷寒의 三陽、三陰傳變自利와,雜病의 濕熱,食積之根이면,皆責腸胃라。
상한의 3양 3음이 전변하여 자리함과 잡병의 습열 식적의 근원을 제외하면 모두 위장에 책임이 있다.
蓋泄瀉、、痢는,同由暑月食所致로,輕者면 便作 泄瀉하고,重者면 停爲痢로대,痰衝胸脅則爲하고,積滯腸胃則爲痢라。
설사 학질 이질은 모두 여름철 음식의 연유로 같으니 경증으면 곧 설사하고 중증이면 머물러서 학질 이질이 되나, 담이 가슴과 옆구리를 상충하면 학질이 되고, 위장에 적체가 되면 이질이 된다.
《局方》에 有分《難經》五瀉者는,不免失之牽이로다。
화제국방에 난경의 5종 설사를 구분함은 실수의 억지를 면치 못한다.
風宜微發 寒溫이오,虛補積消 濕升하라。
설사에 풍사는 의당 약간 발산하고 한사는 온난 깔깔하게 하고 허증은 보하고 적은 소멸케 하고 습사는 삼설 승제하라.
凡瀉는 皆兼濕하니,初直分理中焦하며,利下焦요,
설사는 모두 습사를 겸하니 초기에 직접 중초를 나눠 다스리며 하초를 삼설 이수케 한다.
久則升提하대,必滑脫不禁,然後에 用藥이 之니라。
오래되면 승제하되 반드시 활탈함이 멎지 않은 연후에 약을 사용해 깔깔하게 한다.
其間에 有風勝이면 兼以解表하라,
그 사이에 풍사가 이기면 겸하여 표부를 풀어준다.
寒勝이면 兼以溫中하라,
한사가 이기면 겸하여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滑脫이면 住하고,虛弱이면 補益하고,食積이면 消導하고,濕則淡하고,陷則升하야,隨證變用하고,又不拘於次序는,與痢로 大同이라。
설사로 활탈하면 수삽약으로 머무르게 하고, 허약하면 보익하고 식적이면 소식도체하고 습사이면 담미로 삼설하고, 함몰하면 승거하여 증상에 따라서 변화하혀 사용하고 또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음은 이질과 함께 크게 같다.
且補虛에 不可純用甘溫이니,太甘則生濕이오;
또한 허증을 보함에 순전히 감온약으로 사용하면 안되니 너무 감미면 습을 생성할 수 있다.
熱에 亦不太苦니,苦則傷脾라,
열을 끔에 또한 너무 고미면 안되니 고미는 비를 손상한다.
每兼淡劑하야 利竅로 爲妙니라。
매번 담미약제를 겸하여 이수함을 오묘함으로 여긴다.
抑考이면《難經》에 云胃泄은,食不化,色黃이오;
다시 고찰하면 난경에 말하길 위의 설사는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황색이다.
脾泄은 腹脹嘔逆이라 하니,言瀉也요;
비의 설사는 복부창만하고 구역한다고 하니 쏟아냄을 말함이다.
大腸泄은,食已 窘迫하고,色白하며,腸鳴切痛이오;
대장설사는 음식을 먹은 후 군박하고 백색이면서 장이 울리며 끊어지게 아프다.
小腸泄은,而便膿血하며,小腹痛이오;
소장 설사는 소변보면 농혈을 보고 소복부가 아프다.
大泄은,裏急後重하야,數至하대 而不能便하며,莖中이 痛而溺이라 하니,言痢也라。
대하설은 속이 급하고 뒤가 묵직하여 자주 변소에 가되 대변을 보지 못하고 음경 속이 아프고, 소변이 깔깔하니 이질을 말함이다.
(괴밸, 목병, 기생충병 하; -총14획; jia)
(뒷간, 변소 청; -총11획; qng)
觀此 瀉與痢면,亦惟膿血與糞之異요,
이 설사와 이질을 보면 또한 오직 농혈과 똥의 차이가 있다.
除傷寒의 三陽、三陰傳變自利와,雜病의 濕熱,食積之根이면,皆責腸胃라。
상한의 3양 3음이 전변하여 자리함과 잡병의 습열 식적의 근원을 제외하면 모두 위장에 책임이 있다.
蓋泄瀉、、痢는,同由暑月食所致로,輕者면 便作 泄瀉하고,重者면 停爲痢로대,痰衝胸脅則爲하고,積滯腸胃則爲痢라。
설사 학질 이질은 모두 여름철 음식의 연유로 같으니 경증으면 곧 설사하고 중증이면 머물러서 학질 이질이 되나, 담이 가슴과 옆구리를 상충하면 학질이 되고, 위장에 적체가 되면 이질이 된다.
《局方》에 有分《難經》五瀉者는,不免失之牽이로다。
화제국방에 난경의 5종 설사를 구분함은 실수의 억지를 면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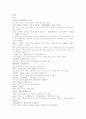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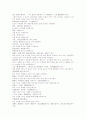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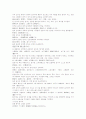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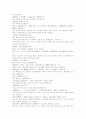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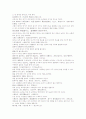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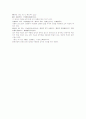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