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려의 귀족제사회설
(1) 귀족과 귀족사회의 개념
(2) 귀족제사회설의 논거
(3) 음서제
(4) 공음전시제
(5) 고려시대의 문벌귀족가문 연구
2. 고려의 관료제사회론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사회론의 논거
(3) 과거제
3. 귀족제사회설과 관료제사회론의 논쟁
(1) 관료제사회론의 비판
(2) 귀족제사회설의 비판
Ⅲ. 결론
Ⅱ. 본론
1. 고려의 귀족제사회설
(1) 귀족과 귀족사회의 개념
(2) 귀족제사회설의 논거
(3) 음서제
(4) 공음전시제
(5) 고려시대의 문벌귀족가문 연구
2. 고려의 관료제사회론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사회론의 논거
(3) 과거제
3. 귀족제사회설과 관료제사회론의 논쟁
(1) 관료제사회론의 비판
(2) 귀족제사회설의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듯 그 원리를 오해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음서란 5품 이상의 관리 자손에게 재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관직을 수여하는 것이니 이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특전의 혜택을 누리는 유음자손이란 남다른 귀속적 지위를 지닌 자이며 남보다 앞서 출세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자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음서제란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음서제가 귀속적 요소 내지 귀족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귀족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귀족제적 요소만 가지고 말한다면 근대 이후의 사회 심지어는 오늘날의 사회에서까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상속제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상속제가 귀족적 요소 내지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근대 이후의 사회를 귀족사회라고 하지는 않는다. 음서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박창희는 음서제가 “취직자의 승진 및 도달직위까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서제=귀족제’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즉 개인은 초직선(初職線)에서부터는 원칙상 자수성가해 나가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음서제가 고위관인의 재생산기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었다.
이기백은, 비록 과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실제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사회적 특권신분층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귀족 중심의 사회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제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제가 원리적으로 반 귀족제인 이상, 설사 향리층 이상의 사람 중에서도 주로 문벌자제들에 의해 이용되고 말았다 하더라도 과거제가 가진 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는 정도 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은 과거제가 일부 제한된 층에서만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귀족제적 질서를 파괴하는 속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의 귀족제사회설을 부정하는 이기백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도 원칙은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제도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물며 신분제도 하의 고려시대에는 어떠하였겠는가? 시대를 불문하고 인재의 선발에 있어 100%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실력이라는 원칙적 선발 기준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하여 과거제를 고려시대의 관료제론에 대한 근거로서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전(前)시대에 비하여 한 단계 더 능력본위의 시대로 발전한 고려시대는 더 이상 귀족사회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에 대해 그 개념을 정립해보고 각각의 논거를 알아보았다. 당연시 여겨져 오던 귀족제설에 대해 관료제론이라는 이설이 제기되기 전에는 엄밀한 연구와 분석의 과정이 없이 막연히 이해하여 왔던 고려의 통치구조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그 연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통설에 대한 이설의 제기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고려사회가 과연 귀족제사회였는가, 관료제사회였는가 하는 문제에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의 논쟁 상황처럼 그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를 직접 살았던 당시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귀족제사회였는지 관료제사회였는지에 대한 확답은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논거를 내세울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서로의 학설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내세울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의 학설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 상황의 시점에서 필자 또한 조금이나마 더 공감이 가는 학설에 대해 약간의 지지를 표해보려 한다.
항상 들어오던 고려시대의 특징이 바로 ‘귀족사회’여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고려사회의 관료제론에 대해서는 낯선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아직 스스로의 연구와 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료제론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 끝없이 조사되고 연구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귀족제설에 대해 다소 더 수긍이 되었다는 말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고려시대는 과거에 비해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것이 웅덩이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번에 건너뛰듯이 아무런 과도기적 단계가 없이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고려가 혈계 본위에서 능력 본위로의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하면서 문벌과 가문만을 중시하는 귀족제의 탈피를 시도한 것이지, 그것을 시도하였다고 해서 귀족제적 성격을 탈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은 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제의 시행은 귀족제사회 속에서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관료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씨앗과 같은 제도이지 그 시행을 근거로 삼아 고려사회를 관료제사회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단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열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의규,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 지식산업사, 1985
박용운, <<한국사>> 12. 고려왕조의 성립과 발전 :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론’, 국사편찬 위원회, 1993
______, <<高麗時代史>>, 일지사, 1988
______,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유승원, ‘역사비평’ 36호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문제연구소, 1997
김운태, <<高麗 政治制度와 官僚制>> 박영사, 2005
음서란 5품 이상의 관리 자손에게 재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관직을 수여하는 것이니 이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지는 큰 특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특전의 혜택을 누리는 유음자손이란 남다른 귀속적 지위를 지닌 자이며 남보다 앞서 출세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자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음서제란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음서제가 귀속적 요소 내지 귀족제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귀족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귀족제적 요소만 가지고 말한다면 근대 이후의 사회 심지어는 오늘날의 사회에서까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상속제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상속제가 귀족적 요소 내지 귀족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근대 이후의 사회를 귀족사회라고 하지는 않는다. 음서제도 기본적으로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박창희는 음서제가 “취직자의 승진 및 도달직위까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서제=귀족제’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즉 개인은 초직선(初職線)에서부터는 원칙상 자수성가해 나가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음서제가 고위관인의 재생산기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었다.
이기백은, 비록 과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실제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사회적 특권신분층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귀족 중심의 사회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제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제가 원리적으로 반 귀족제인 이상, 설사 향리층 이상의 사람 중에서도 주로 문벌자제들에 의해 이용되고 말았다 하더라도 과거제가 가진 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는 정도 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은 과거제가 일부 제한된 층에서만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귀족제적 질서를 파괴하는 속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려의 귀족제사회설을 부정하는 이기백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도 원칙은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제도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물며 신분제도 하의 고려시대에는 어떠하였겠는가? 시대를 불문하고 인재의 선발에 있어 100%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실력이라는 원칙적 선발 기준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하여 과거제를 고려시대의 관료제론에 대한 근거로서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전(前)시대에 비하여 한 단계 더 능력본위의 시대로 발전한 고려시대는 더 이상 귀족사회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귀족제설과 관료제론에 대해 그 개념을 정립해보고 각각의 논거를 알아보았다. 당연시 여겨져 오던 귀족제설에 대해 관료제론이라는 이설이 제기되기 전에는 엄밀한 연구와 분석의 과정이 없이 막연히 이해하여 왔던 고려의 통치구조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그 연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통설에 대한 이설의 제기는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고려사회가 과연 귀족제사회였는가, 관료제사회였는가 하는 문제에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의 논쟁 상황처럼 그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를 직접 살았던 당시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귀족제사회였는지 관료제사회였는지에 대한 확답은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논거를 내세울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서로의 학설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내세울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의 학설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 상황의 시점에서 필자 또한 조금이나마 더 공감이 가는 학설에 대해 약간의 지지를 표해보려 한다.
항상 들어오던 고려시대의 특징이 바로 ‘귀족사회’여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고려사회의 관료제론에 대해서는 낯선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아직 스스로의 연구와 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료제론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 끝없이 조사되고 연구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귀족제설에 대해 다소 더 수긍이 되었다는 말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고려시대는 과거에 비해 능력이 더 중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것이 웅덩이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번에 건너뛰듯이 아무런 과도기적 단계가 없이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고려가 혈계 본위에서 능력 본위로의 과도기적 단계에 위치하면서 문벌과 가문만을 중시하는 귀족제의 탈피를 시도한 것이지, 그것을 시도하였다고 해서 귀족제적 성격을 탈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은 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제의 시행은 귀족제사회 속에서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관료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씨앗과 같은 제도이지 그 시행을 근거로 삼아 고려사회를 관료제사회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단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열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의규, <<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 지식산업사, 1985
박용운, <<한국사>> 12. 고려왕조의 성립과 발전 : ‘고려사회 지배세력의 성격론’, 국사편찬 위원회, 1993
______, <<高麗時代史>>, 일지사, 1988
______,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유승원, ‘역사비평’ 36호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문제연구소, 1997
김운태, <<高麗 政治制度와 官僚制>> 박영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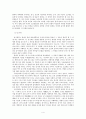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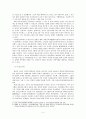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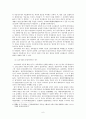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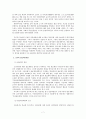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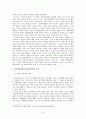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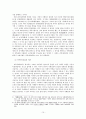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