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듯이 우리의 춤은 축제 분위기에 따른 신이 나고 흥겨운 맛이 나야 하는 것이지 대단한 기교나 특정한 개인의 춤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춤에 참여하는 것은 판에 어울리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 묘기를 표출하는 기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춤은 혼자 추는 것보다는 다 같이 어울려 출 때 어깨 짓과 선체 움직임의 흐름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축제적 성격에서 형성된 서양의 민속무용의 경우 이는 우리와는 달리 매우 개인적인 성격이 짙다. 우선 이들의 대표적인 춤의 형태가 남녀가 한쌍이 되어 추는 이 인무이다. 그리고 서민사회나 궁정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들 춤의 이름이 바로 여성에 대한 구애의 뜻을 지닌 사교춤(court dance)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춤은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 의식하의 사교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집단 공동체에의 참여정신에서 이루어지는 신명과 흥취의 춤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나 춤이 중시되는 경우는 없고 이러한 쌍쌍춤의 형태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용 문화으 l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춤은 여러 부족 공동체의 제천행사나 왕정시대의 국가적인 종교축제에서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져 왔기에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무용의 이해, 예전사 2003 , 김말복 저
한국무용사, 대원사 1995 , 김매자 저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5, 정병호 저
무용문화사, 금광 1987, 오화진 편저
※참고문헌
무용의 이해, 예전사 2003 , 김말복 저
한국무용사, 대원사 1995 , 김매자 저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5, 정병호 저
무용문화사, 금광 1987, 오화진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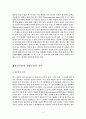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