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백제노래 자료가 부족한 이유>
2. 전해지고 있는 백제의 노래들
1) <무등산가><지리산가><방등산가><선운산가>의 작품소개 및 배경설화
2) 정읍사
(1) 원문 및 내용연구
(2) 정읍사의 배경설화
(3) 창작시기
(4) 정읍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
3. 백제노래의 복원가능성
4. 도솔가
1) 작품해독
2) 도솔가의 배경설화
3) 작품해설
(1)작품의 성격
(2)이일병헌을 자연재해로 보는 견해
(3)이일병헌을 모반자 출현으로 보는 견해
(4)도솔가와 산화가의 관계
4) 지은이 월명사
5. 결론
<참고자료 & 참고문헌>
<백제노래 자료가 부족한 이유>
2. 전해지고 있는 백제의 노래들
1) <무등산가><지리산가><방등산가><선운산가>의 작품소개 및 배경설화
2) 정읍사
(1) 원문 및 내용연구
(2) 정읍사의 배경설화
(3) 창작시기
(4) 정읍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
3. 백제노래의 복원가능성
4. 도솔가
1) 작품해독
2) 도솔가의 배경설화
3) 작품해설
(1)작품의 성격
(2)이일병헌을 자연재해로 보는 견해
(3)이일병헌을 모반자 출현으로 보는 견해
(4)도솔가와 산화가의 관계
4) 지은이 월명사
5. 결론
<참고자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다
삼국유사의 찬자가, 지금 세간에서는 이것을 산화가라고 하나 잘못이다. 마땅히 도솔가라고 해야 한다. 산화가는 따로 있는데 그 글이 번거로워 싣지 않는다. 라고 하였음과, 월명사가 자신은 단지 향가만 알 뿐, 범패는 익숙치 못하다고 함에 대해 왕이 향가라도 좋다고 하였음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정식의 산화공양의식에는 범패로 산화악과 같은 류의 산화가를 불렀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도솔가는 變文의 영향 하에 신라어로 부른 산화가가 아니었던가 추정해 본다.
4) 지은이 월명사
월명사는 그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그에 대한 자료는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에 실린 몇몇 일화가 전부이다. 자신을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한 승려라고 밝힌다든가 신라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세운 사천왕사(四天王寺)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통해 화랑집단에 소속된 낭도승(郎徒僧)으로 국가의 안녕과 관련된 일을 맡았으리라 짐작된다.
신라 경덕왕 19년(760년) 서라벌에 느닷없이 해가 두 개 떠서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는 변괴가 일어났다. 당시 경덕왕은 산화공덕(散花功德)의 불교 의식으로 이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다. 그때 부름을 받고 \'도솔가\'를 지어 변괴를 사라지게 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신라인은 향가를 숭상했는데 그것이 천지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월명사는 그 신라 전통 시가인 향가에 뛰어난 시인이었다.
죽은 누이동생이 서방정토로 가기를 기원하며 부른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월명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친근한 비유와 절실한 시상의 전개로 현전하는 향가 가운데 절창으로 꼽힌다. 오죽했으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겠는가.
현세를 중시하는 미륵불을 섬긴 화랑집단에 속했으면서 아미타불을 외우며 내세를 희구했다는 이유에서 월명사의 승려로서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월명사의 내면세계이다. 그는 인간의 번뇌를 초탈해야 하는 불제자이기 전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낀 인간이었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해야 하는 낭도승(郞徒僧)이기 전에 내면의 비감을 진솔하게 노래한 음유시인이었다.
월명사는 신라시대 향가의 최고 작가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달밤에 혼자 피리를 불며 거리를 배회한 월명사의 모습에는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행적은 왜 그리 쓸쓸했을까? 몸담았던 시대와 불화했기 때문이다.
산화공덕 의식을 치르려던 경덕왕에게 불려온 월명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나 알 뿐 범패(梵唄)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왕은 \"이미 인연이 있는 승려로 지목되었으니 향가를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이들 대화에서 국가적 의식은 불교식 범패를 부를 줄 아는 승려가 주관해야지 화랑에 속한 낭도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삼국통일을 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화랑 세력은 통일 이후 급속히 하강곡선을 그렸다. 경덕왕 대에 이르면 이미 지난날의 영화는 거의 스러져버리고 만다. 화랑의 풍류도를 대신해 불교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던 그때 월명사는 점차 왜소해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부침을 곱씹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낡은 인물\' 월명사는 그래서 쓸쓸히 피리를 불며 달밤을 배회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5. 결 론
우리는 이상과 같이 현전하는 백제의 노래 다섯 편과 백제노래 복구의 가능성, 신라 사뇌가인 도솔가의 작품분석 및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정읍사를 제외한 네 편의 백제노래는 노래가사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제목과 배경설화만을 소개했고, 정읍사는 시기와 견해가 여러 학자의 의견으로 분분했으나 우리는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정읍사는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것과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도솔가는 산화공덕의 자리에서 부른 변괴의 즉멸을 바란 제의적 성격의 노래임을 조사하였다. 현재에는 백제노래의 복원가능성이 미비하지만 후학들이 좀 더 발굴하고 연구에 힘을 써서 우리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高麗歌謠(全圭泰, 正音社, 1968),
高麗歌謠의 語釋硏究(朴炳采, 宣明文化社, 1968),
高麗歌謠硏究(崔龍洙, 계명문화사, 1996),
井邑詞硏究(姜貴守, 公州師大論文集 4, 1966),
井邑詞再攷(崔正如, 啓明論叢 3, 1967),
井邑詞에 대한 諸說考(朴晟義, 文潮 5, 1969),
井邑詞의 情緖 構造(이사라, 高麗詩歌의 情緖, 開文社, 1985)
井邑詞는 百濟 노래인가(양태순,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中世전기문학 제1기, 百濟노래,1982)
백제의 언어와 문화(도수희, 주류성,2004)
국문학전사(이병기, 백철, 신구문화사,1957)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삼국유사 향가연구(양희철, 태학사, 1997)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정렬모, 향가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1999
양주동, (增訂)古歌硏究, 서울 : 일조각, 1965
윤영옥, 新羅詩歌의 硏究, 서울 : 형설출판사, 1988.
조동일, 한국문학강의, 서울 : 길벗, 1994
李姸淑, 新羅鄕歌文學硏究, 서울 : 박이정출판사 ,1999
신재홍, 향가의 해석, 서울 : 집문당, 2000
도수희, 백제의 언어와 문학 서울 : 도서출판 주류성
임기종 외 지음, 새로 읽는 향가문학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8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eid=p6Iyg5u7JJNU19gB3hKhi3Pfkh6K1MNF
http://blog.naver.com/kko2e?Redirect=Log&logNo=100023215148
http://www.seelotus.com/
이완근 이태준의 희망의 문학
http://100.naver.com/100.nhn?docid=136674
NAVER 백과사전
삼국유사의 찬자가, 지금 세간에서는 이것을 산화가라고 하나 잘못이다. 마땅히 도솔가라고 해야 한다. 산화가는 따로 있는데 그 글이 번거로워 싣지 않는다. 라고 하였음과, 월명사가 자신은 단지 향가만 알 뿐, 범패는 익숙치 못하다고 함에 대해 왕이 향가라도 좋다고 하였음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정식의 산화공양의식에는 범패로 산화악과 같은 류의 산화가를 불렀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도솔가는 變文의 영향 하에 신라어로 부른 산화가가 아니었던가 추정해 본다.
4) 지은이 월명사
월명사는 그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그에 대한 자료는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에 실린 몇몇 일화가 전부이다. 자신을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한 승려라고 밝힌다든가 신라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세운 사천왕사(四天王寺)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통해 화랑집단에 소속된 낭도승(郎徒僧)으로 국가의 안녕과 관련된 일을 맡았으리라 짐작된다.
신라 경덕왕 19년(760년) 서라벌에 느닷없이 해가 두 개 떠서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는 변괴가 일어났다. 당시 경덕왕은 산화공덕(散花功德)의 불교 의식으로 이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다. 그때 부름을 받고 \'도솔가\'를 지어 변괴를 사라지게 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신라인은 향가를 숭상했는데 그것이 천지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월명사는 그 신라 전통 시가인 향가에 뛰어난 시인이었다.
죽은 누이동생이 서방정토로 가기를 기원하며 부른 \'제망매가(祭亡妹歌)\'는 월명사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친근한 비유와 절실한 시상의 전개로 현전하는 향가 가운데 절창으로 꼽힌다. 오죽했으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겠는가.
현세를 중시하는 미륵불을 섬긴 화랑집단에 속했으면서 아미타불을 외우며 내세를 희구했다는 이유에서 월명사의 승려로서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월명사의 내면세계이다. 그는 인간의 번뇌를 초탈해야 하는 불제자이기 전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낀 인간이었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해야 하는 낭도승(郞徒僧)이기 전에 내면의 비감을 진솔하게 노래한 음유시인이었다.
월명사는 신라시대 향가의 최고 작가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달밤에 혼자 피리를 불며 거리를 배회한 월명사의 모습에는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행적은 왜 그리 쓸쓸했을까? 몸담았던 시대와 불화했기 때문이다.
산화공덕 의식을 치르려던 경덕왕에게 불려온 월명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나 알 뿐 범패(梵唄)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왕은 \"이미 인연이 있는 승려로 지목되었으니 향가를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이들 대화에서 국가적 의식은 불교식 범패를 부를 줄 아는 승려가 주관해야지 화랑에 속한 낭도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삼국통일을 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화랑 세력은 통일 이후 급속히 하강곡선을 그렸다. 경덕왕 대에 이르면 이미 지난날의 영화는 거의 스러져버리고 만다. 화랑의 풍류도를 대신해 불교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던 그때 월명사는 점차 왜소해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인간사의 부침을 곱씹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낡은 인물\' 월명사는 그래서 쓸쓸히 피리를 불며 달밤을 배회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5. 결 론
우리는 이상과 같이 현전하는 백제의 노래 다섯 편과 백제노래 복구의 가능성, 신라 사뇌가인 도솔가의 작품분석 및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정읍사를 제외한 네 편의 백제노래는 노래가사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제목과 배경설화만을 소개했고, 정읍사는 시기와 견해가 여러 학자의 의견으로 분분했으나 우리는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정읍사는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것과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도솔가는 산화공덕의 자리에서 부른 변괴의 즉멸을 바란 제의적 성격의 노래임을 조사하였다. 현재에는 백제노래의 복원가능성이 미비하지만 후학들이 좀 더 발굴하고 연구에 힘을 써서 우리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高麗歌謠(全圭泰, 正音社, 1968),
高麗歌謠의 語釋硏究(朴炳采, 宣明文化社, 1968),
高麗歌謠硏究(崔龍洙, 계명문화사, 1996),
井邑詞硏究(姜貴守, 公州師大論文集 4, 1966),
井邑詞再攷(崔正如, 啓明論叢 3, 1967),
井邑詞에 대한 諸說考(朴晟義, 文潮 5, 1969),
井邑詞의 情緖 構造(이사라, 高麗詩歌의 情緖, 開文社, 1985)
井邑詞는 百濟 노래인가(양태순,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中世전기문학 제1기, 百濟노래,1982)
백제의 언어와 문화(도수희, 주류성,2004)
국문학전사(이병기, 백철, 신구문화사,1957)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삼국유사 향가연구(양희철, 태학사, 1997)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정렬모, 향가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1999
양주동, (增訂)古歌硏究, 서울 : 일조각, 1965
윤영옥, 新羅詩歌의 硏究, 서울 : 형설출판사, 1988.
조동일, 한국문학강의, 서울 : 길벗, 1994
李姸淑, 新羅鄕歌文學硏究, 서울 : 박이정출판사 ,1999
신재홍, 향가의 해석, 서울 : 집문당, 2000
도수희, 백제의 언어와 문학 서울 : 도서출판 주류성
임기종 외 지음, 새로 읽는 향가문학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8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eid=p6Iyg5u7JJNU19gB3hKhi3Pfkh6K1MNF
http://blog.naver.com/kko2e?Redirect=Log&logNo=100023215148
http://www.seelotus.com/
이완근 이태준의 희망의 문학
http://100.naver.com/100.nhn?docid=136674
NAVER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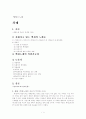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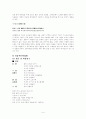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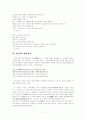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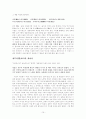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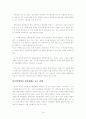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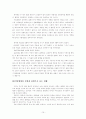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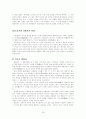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