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효기간의 만료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4. 이른바 ‘무협약(無協約) 상태’에서의 노동관계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4. 이른바 ‘무협약(無協約) 상태’에서의 노동관계
본문내용
는 상태, 즉 이른바 무협약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이지만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건 등 개별적 노동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흔히 여후효(餘後效)의 문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협약 상태에서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 근거는 달리 하더라도,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판례 또한 같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노동자의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노동자의 노동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규범적 부분은 새로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단체협약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
무협약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개별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고 또한 합법적인 취업규칙의 변경은 허용된다는 견해/그럴 경우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단체교섭이 아닌 방법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뒤의 견해는 새겨들을 만하고, 또한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과정으로 변경된 노동조건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앞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은, 또한 실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미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면, 여전히 실효된 단체협약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여, 결국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효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협약 상태에서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 근거는 달리 하더라도,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판례 또한 같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노동자의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노동자의 노동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규범적 부분은 새로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단체협약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
무협약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교섭이 계속되는 경우, 개별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고 또한 합법적인 취업규칙의 변경은 허용된다는 견해/그럴 경우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단체교섭이 아닌 방법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사실상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뒤의 견해는 새겨들을 만하고, 또한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과정으로 변경된 노동조건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앞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결은, 또한 실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미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면, 여전히 실효된 단체협약이 노사 모두를 규율한다고 하여, 결국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효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97년 노동동관계법 개정내용
97년 노동동관계법 개정내용 노동조합전임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전임제도에 관한 연구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노사관계][정부][노사관계 경영자 전략][노사관계 개선방안]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의 요...
[노사관계][정부][노사관계 경영자 전략][노사관계 개선방안]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의 요...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동법)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법)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교원(교사)의 권위, 교원(교사)의 전문성,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의 복지, 교원(교사...
교원(교사)의 권위, 교원(교사)의 전문성, 교원(교사)의 신분, 교원(교사)의 복지, 교원(교사... 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
노동법상 중재와 관련한 판례 연구 단체행동
단체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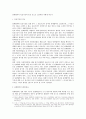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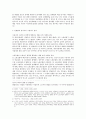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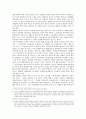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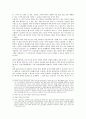











소개글